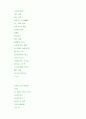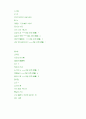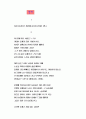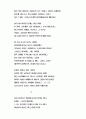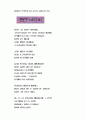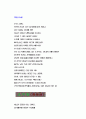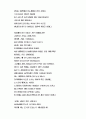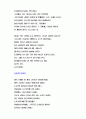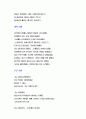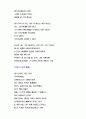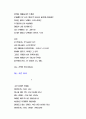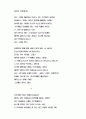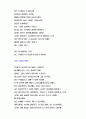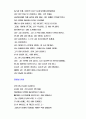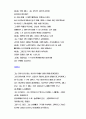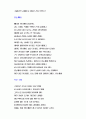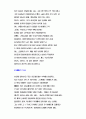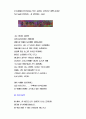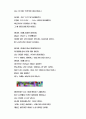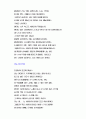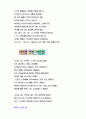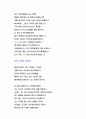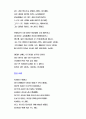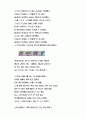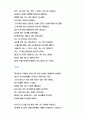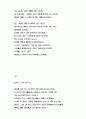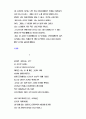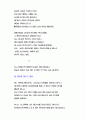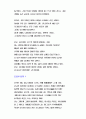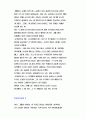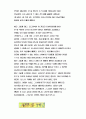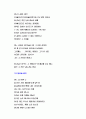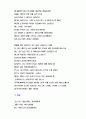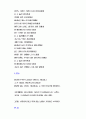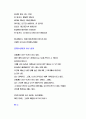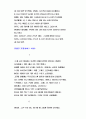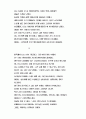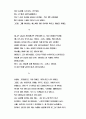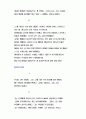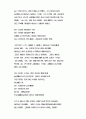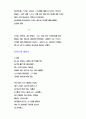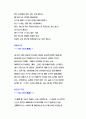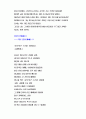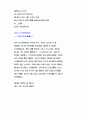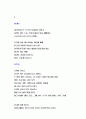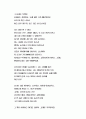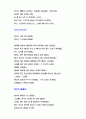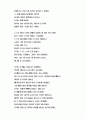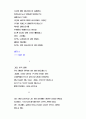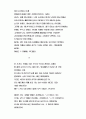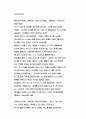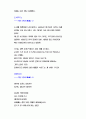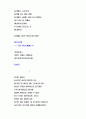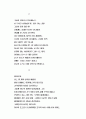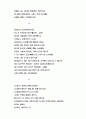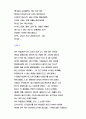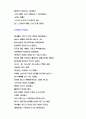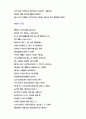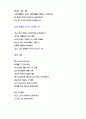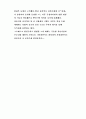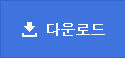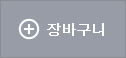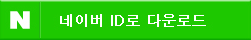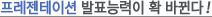-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목차
1.안개
2.전문가(專門家)
3.백야(白夜)
4.조치원(鳥致院)
5.나쁘게 말하다
6.대학 시절
7.늙은 사람
8.오래 된 서적(書籍)
9.어느 푸른 저녁
10.오후 4시의 희망
11.장미빛 인생
12.여행자
2.전문가(專門家)
3.백야(白夜)
4.조치원(鳥致院)
5.나쁘게 말하다
6.대학 시절
7.늙은 사람
8.오래 된 서적(書籍)
9.어느 푸른 저녁
10.오후 4시의 희망
11.장미빛 인생
12.여행자
본문내용
과 거리는 늘상 보던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천정에 대고
조그맣게 말했다. \'나는 압핀처럼 꽂혀 있답니다\' 그가 조금전까지
서있던 자리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희미한 빛깔이 조금 고여있었다.
\'아무도 없을 때는 발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법이죠\'
스위치를 내릴 때 무슨 소리가 들렸다.
내 가슴 알 수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익숙한 그 소리는 분명히 내게 들렸다.
소리의 뼈
김교수님이 새로운 학설을 발표했다.
소리에도 뼈가 있다는 것이었다.
모두 그 말을 웃어넘겼다, 몇몇 학자들은
잠시 즐거운 시간을 제공한 김교수의 유머에 감사했다.
학장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일 학기 강의를 개설했다.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장난삼아 신청했다.
한 학기 내내 그는
모든 수업 시간마다 침묵하는
무서운 고집을 보여주었다.
참지 못한 학생들이, 소리의 뼈란 무엇일까
각자 일가견을 피력했다.
이군은 그것이 침묵일 거라고 말했다.
박군은 그것을 숨은 의미라 보았다.
또 누군가는 그것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모든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에 접근하기 위하여 채택된
방법론적 비유라는 것이었다.
그의 견해는 너무 난해하여 곧 묵살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다음 학기부터 우리들의 귀는
모든 소리들을 훨씬 더 잘 듣게 되었다.
우리동네 목사님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쑤군거렸다.
학생회 소년들과 목사관 뒷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정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봄날은 간다
햇빛은 분가루처럼 흩날리고
쉽사리 키가 변하는 그림자들은
한 장 열풍(熱風)에 말려 둥글게 휘어지는구나
아무 때나 손을 흔드는
미루나무 얕은 그늘 속을 첨벙이며
2시반 시외버스도 떠난 지 오래인데
아까부터 서울집 툇마루에 앉은 여자
외상값처럼 밀려드는 대낮
신작로 위에는 흙먼지, 더러운 비닐들
빈 들판에 꽂혀 있는 저 희미한 연기들은
어느 쓸쓸한 풀잎의 자손들일까
밤마다 숱한 나무젓가락들은 두 쪽으로 갈라지고
사내들은 화투패마냥 모여들어 또 그렇게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간다
여자가 속옷을 헹구는 시냇가엔
하룻밤새 없어져버린 풀꽃들
다시 흘러들어온 것들의 인사(人事)
흐린 알전구 아래 엉망으로 취한 군인은
몇 해 전 누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자는
자신의 생을 계산하지 못한다.
몇 번인가 아이를 지울 때 그랬듯이
습관적으로 주르르 눈물을 흘릴 뿐
끌어안은 무릎 사이에서
추억은 내용물 없이 떠오르고
소읍(小邑)은 무서우리만치 고요하다, 누구일까
세숫대야 속에 삶은 달걀처럼 잠긴 얼굴은
봄날이 가면 그뿐
숙취(宿醉)는 몇 장 지전(紙錢)속에서 구겨지는데
몇 개의 언덕을 넘어야 저 흙먼지들은
굳은 땅 속으로 하나둘 섞여들는지
나의 플래시 속으로 들어온 개
그날 너무 캄캄한 길모퉁이를 돌아서다가
익숙한 장애물을 찾고 있던
나의 감각이, 딱딱한 소스라침 속에서
최초로 만난 사상(事象), 불현 듯
존재의 비밀을 알아버린
그날, 나의 플래시 속으로 갑자기, 흰
엄마 걱정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詩作메모
오랫동안 글을 쓰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이 땅의 날씨가 나빴고 나는 그 날씨를 견디지 못했다.
그때도 거리는 있었고 자동차는 지나갔다.
가을에는 퇴근길에서 친구를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시를 쓰지 못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은 형식을
찾지 못한 채 대부분 공중에 흩어졌다.
적어도 내게 있어 글을 쓰지 못하는 무력감이 육체에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 때 알았다.
그 때 눈이 몹시 내렸다. 눈은 하늘 높은 곳에서 지상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지상은 눈을 받아주지 않았다.
대지 위에 닿을 듯하던 눈발은 바람의 세찬 거부에 떠밀려 다시
공중으로 날아갔다. 하늘과 지상 어느 곳에서도 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처럼 쓸쓸한 밤눈들이 언젠가는 지상에 내려앉을 것임을
안다. 바람이 그치고 쩡쩡 얼었던 사나운 밤이 물러가면 눈은 또다른
세상 위에 눈물이 되어 스밀 것임을 나는 믿는다.
그때까지 어떠한 죽음도 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 詩作메모 (1988.11)
작가 소개
시인 기형도씨는 1960년 경기도 연평에서 출생하여 연세대학교
정외과를 졸업했으며 84년에 중앙일보사에 입사, 정치부.문화부.
편집부 등에서 근무했다. 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안개」
가 당선되어 문단에 등장한 그는 이후 독창적이면서 강한 개성
의 시들을 발표했으나 89년 3월 아까운 나이에 타계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이 시집에서 기형도 시인은 일상 속에
내재하는 폭압과 공포의 심리 구조를 추억의 형식을 통해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로테스크 현실주의로 명명될 그의 세계는 우울한 유년시절과
부조리한 체험의 기억들을 기이하면서도 따뜻하며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시 공간속에 펼쳐보인다.....
조그맣게 말했다. \'나는 압핀처럼 꽂혀 있답니다\' 그가 조금전까지
서있던 자리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희미한 빛깔이 조금 고여있었다.
\'아무도 없을 때는 발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법이죠\'
스위치를 내릴 때 무슨 소리가 들렸다.
내 가슴 알 수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익숙한 그 소리는 분명히 내게 들렸다.
소리의 뼈
김교수님이 새로운 학설을 발표했다.
소리에도 뼈가 있다는 것이었다.
모두 그 말을 웃어넘겼다, 몇몇 학자들은
잠시 즐거운 시간을 제공한 김교수의 유머에 감사했다.
학장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일 학기 강의를 개설했다.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장난삼아 신청했다.
한 학기 내내 그는
모든 수업 시간마다 침묵하는
무서운 고집을 보여주었다.
참지 못한 학생들이, 소리의 뼈란 무엇일까
각자 일가견을 피력했다.
이군은 그것이 침묵일 거라고 말했다.
박군은 그것을 숨은 의미라 보았다.
또 누군가는 그것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모든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에 접근하기 위하여 채택된
방법론적 비유라는 것이었다.
그의 견해는 너무 난해하여 곧 묵살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다음 학기부터 우리들의 귀는
모든 소리들을 훨씬 더 잘 듣게 되었다.
우리동네 목사님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쑤군거렸다.
학생회 소년들과 목사관 뒷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정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봄날은 간다
햇빛은 분가루처럼 흩날리고
쉽사리 키가 변하는 그림자들은
한 장 열풍(熱風)에 말려 둥글게 휘어지는구나
아무 때나 손을 흔드는
미루나무 얕은 그늘 속을 첨벙이며
2시반 시외버스도 떠난 지 오래인데
아까부터 서울집 툇마루에 앉은 여자
외상값처럼 밀려드는 대낮
신작로 위에는 흙먼지, 더러운 비닐들
빈 들판에 꽂혀 있는 저 희미한 연기들은
어느 쓸쓸한 풀잎의 자손들일까
밤마다 숱한 나무젓가락들은 두 쪽으로 갈라지고
사내들은 화투패마냥 모여들어 또 그렇게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간다
여자가 속옷을 헹구는 시냇가엔
하룻밤새 없어져버린 풀꽃들
다시 흘러들어온 것들의 인사(人事)
흐린 알전구 아래 엉망으로 취한 군인은
몇 해 전 누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자는
자신의 생을 계산하지 못한다.
몇 번인가 아이를 지울 때 그랬듯이
습관적으로 주르르 눈물을 흘릴 뿐
끌어안은 무릎 사이에서
추억은 내용물 없이 떠오르고
소읍(小邑)은 무서우리만치 고요하다, 누구일까
세숫대야 속에 삶은 달걀처럼 잠긴 얼굴은
봄날이 가면 그뿐
숙취(宿醉)는 몇 장 지전(紙錢)속에서 구겨지는데
몇 개의 언덕을 넘어야 저 흙먼지들은
굳은 땅 속으로 하나둘 섞여들는지
나의 플래시 속으로 들어온 개
그날 너무 캄캄한 길모퉁이를 돌아서다가
익숙한 장애물을 찾고 있던
나의 감각이, 딱딱한 소스라침 속에서
최초로 만난 사상(事象), 불현 듯
존재의 비밀을 알아버린
그날, 나의 플래시 속으로 갑자기, 흰
엄마 걱정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詩作메모
오랫동안 글을 쓰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이 땅의 날씨가 나빴고 나는 그 날씨를 견디지 못했다.
그때도 거리는 있었고 자동차는 지나갔다.
가을에는 퇴근길에서 친구를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시를 쓰지 못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은 형식을
찾지 못한 채 대부분 공중에 흩어졌다.
적어도 내게 있어 글을 쓰지 못하는 무력감이 육체에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 때 알았다.
그 때 눈이 몹시 내렸다. 눈은 하늘 높은 곳에서 지상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지상은 눈을 받아주지 않았다.
대지 위에 닿을 듯하던 눈발은 바람의 세찬 거부에 떠밀려 다시
공중으로 날아갔다. 하늘과 지상 어느 곳에서도 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처럼 쓸쓸한 밤눈들이 언젠가는 지상에 내려앉을 것임을
안다. 바람이 그치고 쩡쩡 얼었던 사나운 밤이 물러가면 눈은 또다른
세상 위에 눈물이 되어 스밀 것임을 나는 믿는다.
그때까지 어떠한 죽음도 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 詩作메모 (1988.11)
작가 소개
시인 기형도씨는 1960년 경기도 연평에서 출생하여 연세대학교
정외과를 졸업했으며 84년에 중앙일보사에 입사, 정치부.문화부.
편집부 등에서 근무했다. 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안개」
가 당선되어 문단에 등장한 그는 이후 독창적이면서 강한 개성
의 시들을 발표했으나 89년 3월 아까운 나이에 타계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이 시집에서 기형도 시인은 일상 속에
내재하는 폭압과 공포의 심리 구조를 추억의 형식을 통해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로테스크 현실주의로 명명될 그의 세계는 우울한 유년시절과
부조리한 체험의 기억들을 기이하면서도 따뜻하며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시 공간속에 펼쳐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