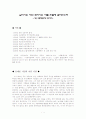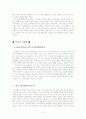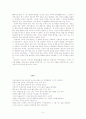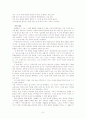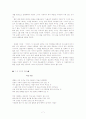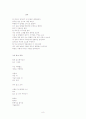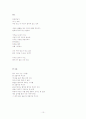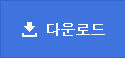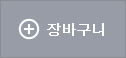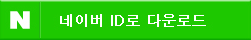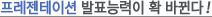목차
◆ 약력 ◆
◆ 문태준 시인의 어린 시절 ◆
◆ 시인의 시세계 ◆
◆ 작품 감상 ◆
◆ 문태준 시인의 어린 시절 ◆
◆ 시인의 시세계 ◆
◆ 작품 감상 ◆
본문내용
를 보고 운다.
여섯 번째 행에서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하고서 그녀는 자신을 죽음을, 화자의 눈은 그녀의 삶을 바라본다.
이제 ‘가재미’의 비유는 삶 전체의 이미지로 확장된다. 그녀 자신이 가재미가 되어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의 깊은 바닥을 헤엄쳐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녀의 삶은 “좌우를 흔드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가재미는 위아래로 몸을 흔들며 움직인다. 그러나 ‘위아래로’라고 표현할 수 없었던 이유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녀의 삶에선 솟구쳐 오르는 상승을 없었을 것이기에 “좌우로”라 표현했을 수 밖에 없었을 듯하다.
여덟 번째에서 열한 번째의 시행들은 그녀 삶의 굴곡을 표현하고 있다. 동경과 외로움이 기거하던 조촐한 생활과 척박한 형편, 점차 가중되는 생활의 무게로 두 다리는 “가랑이지고”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가장 곤고했던 세월들을 돌이켜본다. 그것은 가재미가 수압을 이기지 못해 제 몸뚱어리를 납작하게 만들 수 밖에 없었던 세월들일 것이다. 그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내다 마침내 그녀가 가재미가 되어 죽음을 기다리며 누워 있는 것이다.
열두 번째 행에서 화자는 현실로 되돌아온다. “느릅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 그녀의 숨소리 때문이다. 화자는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는 온통 죽음에 사로잡혀 있다. 그녀의 눈은 오로지 한 방향으로 향하고, 나는 삶보다 죽음에 한결 가깝게 다가선 그녀를 그저 바라만보고,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 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누울 수 밖에 없다.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가재미’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녀가 그러했듯 거대하고 무거운 삶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서의 삶을 살아온 그녀는 “죽음 바깥의 세상”에 남겨진 그를 위해, 마른 몸 위에 물을 가만히 적셔준다. 그녀의 삶 전체가, 그녀가 내뿜는 거친 숨결이 도리어 그를 적시고, 그의 삶을 다독거리고, 그의 손을 따스하게 맞잡아 세상 속으로 발걸음을 내닫게 만든다.
*
문태준 시인의 「가재미」가 따스하게 읽히는 것은 가족애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파랑 같은 삶’을 포용하고 있기에 점점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가 횡행하는 이 시대를 되돌아보게 한다. 그리하여 몸 안쪽에 두 눈이 달려 있는 ‘가재미’의 눈은 작지만 멀리까지 내다본다는 휴머니즘의 의미를 갖는다.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라는 시인의 행동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의 한 특성은 멀리 내다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본주의는 단지 현재에만 관심을 둔다. 「가재미」는 자본주의의 이러한 근시안과는 대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인의 눈길은 미래의 상황까지, 즉 ‘그녀의 죽음상황’까지 내다본다. 「가재미」는 자본주의의 상황을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원시안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 그 외 시인의 작품 ◆
역전 이발
때때로 나의 오후는 역전 이발에서 저물어 행복했다
간판이 지워져 간단히 역전 이발이라고만 남아 있는 곳
역이 없는데 역전 이발이고 이발사 혼자 우겨서 부르는 곳
그 집엘 가면 어머니가 뒤란에서 박 속을 긁어내는 풍경이 생각난다
마른 모래 같은 손으로 곱사등이 이발사가 내 머리통을 벅벅 긁어주는 곳
벽에 걸린 춘화를 넘보다 서로 들켜선 헤헤헤 웃는 곳
역전 이발에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저녁빛이 살고 있고
말라가면서도 공중에 향기를 밀어넣는 한송이 꽃이 있다
그의 인생은 수초처럼 흐르는 물 위에 있었으나
구정물에 담근 듯 흐린 나의 물빛에 맑게 해주는 곱사등이 이발사
水平
단 하나의 잠자리가 내 눈앞에 내려앉았다
염주알 같은 눈으로 나를 보면서
투명한 두 날개를 水平으로 펼쳤다
모시 같은 날개를 연잎처럼 수평으로 펼쳤다
좌우가 미동조차 없다
물 위에 뜬 머구리밥 같다
나는 생각의 고개를 돌려 좌우를 보는데
가문 날 땅벌레가 봉긋이 지어놓은 구멍도 보고
마당을 점점 덮어 오는 잡풀의 억센 손도 더듬어 보는데
내 생각이 좌우로 두리번거려 흔들리는 동안에도
잠자리는 여전히 고요한 수평이다
한 마리 잡자리가 만들어놓은 이 수평 앞에
내가 세워 놓았던 수많은 좌우의 병풍들이 쓰러진다
하늘은 이렇게 무서운 수평을 길러내신다
누가 울고 간다
밤새 잘그랑거리다
눈이 그쳤다
나는 외따롭고
생각은 머츰하다
넝쿨에
작은 새
가슴이 붉은 새
와서 운다
와서 울고 간다
이름도 못 불러볼 사이
와서
울고 갈 것은 무엇인가
울음은
빛처럼
문풍지로 들어온
겨울빛처럼
여리고 여려
누가
내 귀에서
그 소릴 꺼내 펴나
저렇게
울고
떠난 사람이 있었다
가슴속으로
붉게
번지고 스며
이제는
누구도 끄집어낼 수 없는
혼동
가을밤에 뒷마당에 서 있는데
풀벌레가 울었다
바람이 일고
시누대 댓잎들이 바람에 쓸렸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풀벌레 소리
댓잎 소리
또 한 번은
겹쳐
서로 겹쳐서
그러나 댓잎 소리가 풀벌레 소리를 쓸어내거나
그러나 풀벌레 소리가 댓잎 소리 위에 앉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혼동이라는
그 말에
큰 오해가 있음을 알았다
혼동이라는
그 말로
나를 너무 내세웠다
염소
언제부턴가
내 눈 속에
까만 염소 두 마리가 들어와 살고 있다
새로운 풀밭을 찾아 만삭의 배를 채우라고
말뚝에 묶어두지는 않았다
저녁을 다 뜯어 먹고
나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와
어두운 마당을 중얼거리고
묶어달라고
목청을 떨며
나를 기다리고
나는 까만 염소가 되고 싶다
봄의 저녁을 다 울고 있겠지
아직은 혼자가 아닌,
태어나지 않은 나의 염소
한 호흡
꽃이 피고 지는 사이를
한 호흡이라 부르자
제 몸을 올려 꽃을 피워 내고
피어난 꽃은 한번 더 울려
꽃잎을 떨어뜨려 버리는 사이를
한 호흡이라 부르자
꽃나무에게도 뻘처럼 펼쳐진 허파가 있어
썰물이 왔다가 가버리는 한 호흡
바람에 차르르 키를 한번 흔들어 보이는 한 호흡
예순 갑자를 돌아 나온 아버지처럼
그 홍역 같은 삶을 한 호흡이라 부르자
여섯 번째 행에서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하고서 그녀는 자신을 죽음을, 화자의 눈은 그녀의 삶을 바라본다.
이제 ‘가재미’의 비유는 삶 전체의 이미지로 확장된다. 그녀 자신이 가재미가 되어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의 깊은 바닥을 헤엄쳐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녀의 삶은 “좌우를 흔드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가재미는 위아래로 몸을 흔들며 움직인다. 그러나 ‘위아래로’라고 표현할 수 없었던 이유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녀의 삶에선 솟구쳐 오르는 상승을 없었을 것이기에 “좌우로”라 표현했을 수 밖에 없었을 듯하다.
여덟 번째에서 열한 번째의 시행들은 그녀 삶의 굴곡을 표현하고 있다. 동경과 외로움이 기거하던 조촐한 생활과 척박한 형편, 점차 가중되는 생활의 무게로 두 다리는 “가랑이지고”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가장 곤고했던 세월들을 돌이켜본다. 그것은 가재미가 수압을 이기지 못해 제 몸뚱어리를 납작하게 만들 수 밖에 없었던 세월들일 것이다. 그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내다 마침내 그녀가 가재미가 되어 죽음을 기다리며 누워 있는 것이다.
열두 번째 행에서 화자는 현실로 되돌아온다. “느릅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 그녀의 숨소리 때문이다. 화자는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는 온통 죽음에 사로잡혀 있다. 그녀의 눈은 오로지 한 방향으로 향하고, 나는 삶보다 죽음에 한결 가깝게 다가선 그녀를 그저 바라만보고,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 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누울 수 밖에 없다.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가재미’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녀가 그러했듯 거대하고 무거운 삶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서의 삶을 살아온 그녀는 “죽음 바깥의 세상”에 남겨진 그를 위해, 마른 몸 위에 물을 가만히 적셔준다. 그녀의 삶 전체가, 그녀가 내뿜는 거친 숨결이 도리어 그를 적시고, 그의 삶을 다독거리고, 그의 손을 따스하게 맞잡아 세상 속으로 발걸음을 내닫게 만든다.
*
문태준 시인의 「가재미」가 따스하게 읽히는 것은 가족애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파랑 같은 삶’을 포용하고 있기에 점점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가 횡행하는 이 시대를 되돌아보게 한다. 그리하여 몸 안쪽에 두 눈이 달려 있는 ‘가재미’의 눈은 작지만 멀리까지 내다본다는 휴머니즘의 의미를 갖는다.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라는 시인의 행동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의 한 특성은 멀리 내다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본주의는 단지 현재에만 관심을 둔다. 「가재미」는 자본주의의 이러한 근시안과는 대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인의 눈길은 미래의 상황까지, 즉 ‘그녀의 죽음상황’까지 내다본다. 「가재미」는 자본주의의 상황을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원시안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 그 외 시인의 작품 ◆
역전 이발
때때로 나의 오후는 역전 이발에서 저물어 행복했다
간판이 지워져 간단히 역전 이발이라고만 남아 있는 곳
역이 없는데 역전 이발이고 이발사 혼자 우겨서 부르는 곳
그 집엘 가면 어머니가 뒤란에서 박 속을 긁어내는 풍경이 생각난다
마른 모래 같은 손으로 곱사등이 이발사가 내 머리통을 벅벅 긁어주는 곳
벽에 걸린 춘화를 넘보다 서로 들켜선 헤헤헤 웃는 곳
역전 이발에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저녁빛이 살고 있고
말라가면서도 공중에 향기를 밀어넣는 한송이 꽃이 있다
그의 인생은 수초처럼 흐르는 물 위에 있었으나
구정물에 담근 듯 흐린 나의 물빛에 맑게 해주는 곱사등이 이발사
水平
단 하나의 잠자리가 내 눈앞에 내려앉았다
염주알 같은 눈으로 나를 보면서
투명한 두 날개를 水平으로 펼쳤다
모시 같은 날개를 연잎처럼 수평으로 펼쳤다
좌우가 미동조차 없다
물 위에 뜬 머구리밥 같다
나는 생각의 고개를 돌려 좌우를 보는데
가문 날 땅벌레가 봉긋이 지어놓은 구멍도 보고
마당을 점점 덮어 오는 잡풀의 억센 손도 더듬어 보는데
내 생각이 좌우로 두리번거려 흔들리는 동안에도
잠자리는 여전히 고요한 수평이다
한 마리 잡자리가 만들어놓은 이 수평 앞에
내가 세워 놓았던 수많은 좌우의 병풍들이 쓰러진다
하늘은 이렇게 무서운 수평을 길러내신다
누가 울고 간다
밤새 잘그랑거리다
눈이 그쳤다
나는 외따롭고
생각은 머츰하다
넝쿨에
작은 새
가슴이 붉은 새
와서 운다
와서 울고 간다
이름도 못 불러볼 사이
와서
울고 갈 것은 무엇인가
울음은
빛처럼
문풍지로 들어온
겨울빛처럼
여리고 여려
누가
내 귀에서
그 소릴 꺼내 펴나
저렇게
울고
떠난 사람이 있었다
가슴속으로
붉게
번지고 스며
이제는
누구도 끄집어낼 수 없는
혼동
가을밤에 뒷마당에 서 있는데
풀벌레가 울었다
바람이 일고
시누대 댓잎들이 바람에 쓸렸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풀벌레 소리
댓잎 소리
또 한 번은
겹쳐
서로 겹쳐서
그러나 댓잎 소리가 풀벌레 소리를 쓸어내거나
그러나 풀벌레 소리가 댓잎 소리 위에 앉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혼동이라는
그 말에
큰 오해가 있음을 알았다
혼동이라는
그 말로
나를 너무 내세웠다
염소
언제부턴가
내 눈 속에
까만 염소 두 마리가 들어와 살고 있다
새로운 풀밭을 찾아 만삭의 배를 채우라고
말뚝에 묶어두지는 않았다
저녁을 다 뜯어 먹고
나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와
어두운 마당을 중얼거리고
묶어달라고
목청을 떨며
나를 기다리고
나는 까만 염소가 되고 싶다
봄의 저녁을 다 울고 있겠지
아직은 혼자가 아닌,
태어나지 않은 나의 염소
한 호흡
꽃이 피고 지는 사이를
한 호흡이라 부르자
제 몸을 올려 꽃을 피워 내고
피어난 꽃은 한번 더 울려
꽃잎을 떨어뜨려 버리는 사이를
한 호흡이라 부르자
꽃나무에게도 뻘처럼 펼쳐진 허파가 있어
썰물이 왔다가 가버리는 한 호흡
바람에 차르르 키를 한번 흔들어 보이는 한 호흡
예순 갑자를 돌아 나온 아버지처럼
그 홍역 같은 삶을 한 호흡이라 부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