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라캉과 새로운 무의식
2. 주체와 실재적 무의식
3. 전이의 삼단계
참고문헌
1. 라캉과 새로운 무의식
2. 주체와 실재적 무의식
3. 전이의 삼단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주체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도 이미 결정된 것이며,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도 이미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타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 주체는 자유를 상실하는 대신 주체의‘위치’는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프로이트의 분석실천과 라캉의 분석실천은 바로 여기서 서로 구분된다. 프로이트가 치료가 아닌 연구로서의 정신분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는 초월적 타자로서의 무의식을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프로이트는 실재 속에 고풍스럽고 우아하게 작동하는 법칙으로서의 지식이 존재하며 분석을 통해 그것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프로이트는 인간주체를 무의식에 의해 이미 결정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임상을 통해 무의식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환자가 공유하기를 원했으며 길을 잃은 주체에게 특정한 위치를 부여하고자 했다. 반대로 라캉은 이러한 결정론적 세계를 운용하는 타자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가정되는 과정 자체를 ‘사기’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르주 앙드레는 정신분석은 사기라는 라캉의 주장을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한다. “사기란 정신분석가의 사기가 아니라 시니피앙 그 자체, 즉 S2를 약속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S1의 사기다.”
분석에서 촉발되는 무의식에 대한 가정과 그것에 대한 열정은 S1의 농간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주체가 두 번째 시니피앙을 찾아내기 위해, 즉 무의미한 현상에서 어떤 무의식적 의미를 읽어내는 까닭은 주체가 아직은 법칙 개념에 반대하는, 아직은 개념화할 수 없고 지식으로 환원할 수도 없는 원인(cause)으로서의 실재와 대면했기 때문이다 주체는 무의식적인 법칙과 그것을 주관하는 타자의 존재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바로 프로이트적인 믿음이다. 그러한 타자적 지식이 존재한다는 믿음만이 문제를 해결해준다. 라캉은 이 믿음의 허상을 폭로하고 주체가 누리고자 하는 작은 안정감을 박탈하는 대신 주체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주체의 행위가 이미 결정되어있다면, 진정한 자유는 애초에 불가능한 개념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정신분석이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면, 이는 분석적 실천이 의미와 인과의 연쇄에 대한주체의 믿음을 절단하기 때문이다.주체가 실재속에서 어떤 규칙성을 읽어낼 수 있다면 주체가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시선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리비도적이고 불투명한 응시, 의도가 담긴 사악한 눈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악한 눈, 즉 선한 바라봄과 반대되는 응시는 주체가 가져본 적도 없으며 바로 이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대상인지도 모르면서 그러한 대상을 가진(가졌다고 가정되는) 타자를 부러워하며, 그러한 대상을 갖기를 원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정확히 무의식적 지식은 그 정의상 주체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는 그러한 지식의 존재를 가정하고 그것을 가지기를 욕망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체의 바라봄은 지극히 ‘환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라캉의 분석이 목표로 하는 바는 분석 주체가 그토록 획득하기를 원하는 대상이 바로 자신의 사악한 바라봄에 의해 형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보아야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라캉은 ‘분석가와의 동일시’를 분석의 목표로 권유하지 않았다. 전이가 형성되어 무의식의 형성물들을 능동적으로 분석하는 주체들을 가리켜‘분석가와 동일시’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마치 분석가처럼 관찰하는 자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행동을 분석하며 의미를 생산한다. 어떤 학파의 분석가들은 이를 분석의 목표로 삼지만 라캉주의의 관점에서 이는 환자가 S1의 효과에 의해 기만당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환자는 한창 전이중에 있는 것이지 아직 전이의 마지막 단계, 기만적 진리(veitemen teuse)를 넘어서는 정신분석의 끝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참고문헌
이장호·정남운·조성호 (2011), 『상담심리학의 기초』, 학지사
Dor, J. (1994), Clinique psychanalytique, seuil, 홍준기 역. (2005) 『프로이트·라깡 정
신분석임상』 , 아난케
Freud, S. (1897), “Letter 70\", 임진수 역. (2009) “편지 70-1897년 10월 3일”, 『정신
분석의 탄생』, 열린책들
Freud, S. (1897), \"Letter 75\", 임진수 역. (2009) “편지 75-1897년 11월 14일”, 『정
신분석의 탄생』, 열린책들
Freud, S. (1895), Studies on Hysteria, 김미리혜 역. (2011) 『히스테리연구』, 열린책
들
Freud, S. (1900),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김인순 역. (2010)『꿈의 해석』, 열린
책들
Freud, S (1901), The psychopathology of everyday life, 이현우 역. (2011) 『일상생
활의 정신병리학』, 열린책들
Freud, S. (1905), “Fragment of an analysis of a case of hysteria”, 김재혁·권세훈 역.
(2010), “도라의 히스테리 분석”,『꼬마한스와 도라』, 열린책들
Lacan, J. (1977), \"ouverture de la section clinique\" Ornicar? n.9, Navarin
Lindley, D. (2007), Uncertainty, 박배식 역. (2009) 『불확정성』, 마루벌
Miller, J. A \"Psychotheaphie et psychanalyse\" http://atelierclinique.unblog.fr
Rosenblum, B. (2011), Quantum Enigma, 전대호 옮김. (2012) 『양자 불가사의 - 물리
학과 의식의 만남』, 지양사
k, S. (1996), The indivisible remainder: An essay on Schelling and related
matters, Verso, 이재환 역. (2010) 『나눌수 없는 잔여: 셸링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에세이』, 도서출판b
분석에서 촉발되는 무의식에 대한 가정과 그것에 대한 열정은 S1의 농간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주체가 두 번째 시니피앙을 찾아내기 위해, 즉 무의미한 현상에서 어떤 무의식적 의미를 읽어내는 까닭은 주체가 아직은 법칙 개념에 반대하는, 아직은 개념화할 수 없고 지식으로 환원할 수도 없는 원인(cause)으로서의 실재와 대면했기 때문이다 주체는 무의식적인 법칙과 그것을 주관하는 타자의 존재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바로 프로이트적인 믿음이다. 그러한 타자적 지식이 존재한다는 믿음만이 문제를 해결해준다. 라캉은 이 믿음의 허상을 폭로하고 주체가 누리고자 하는 작은 안정감을 박탈하는 대신 주체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주체의 행위가 이미 결정되어있다면, 진정한 자유는 애초에 불가능한 개념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정신분석이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면, 이는 분석적 실천이 의미와 인과의 연쇄에 대한주체의 믿음을 절단하기 때문이다.주체가 실재속에서 어떤 규칙성을 읽어낼 수 있다면 주체가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시선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리비도적이고 불투명한 응시, 의도가 담긴 사악한 눈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악한 눈, 즉 선한 바라봄과 반대되는 응시는 주체가 가져본 적도 없으며 바로 이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대상인지도 모르면서 그러한 대상을 가진(가졌다고 가정되는) 타자를 부러워하며, 그러한 대상을 갖기를 원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정확히 무의식적 지식은 그 정의상 주체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는 그러한 지식의 존재를 가정하고 그것을 가지기를 욕망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체의 바라봄은 지극히 ‘환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라캉의 분석이 목표로 하는 바는 분석 주체가 그토록 획득하기를 원하는 대상이 바로 자신의 사악한 바라봄에 의해 형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보아야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라캉은 ‘분석가와의 동일시’를 분석의 목표로 권유하지 않았다. 전이가 형성되어 무의식의 형성물들을 능동적으로 분석하는 주체들을 가리켜‘분석가와 동일시’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마치 분석가처럼 관찰하는 자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행동을 분석하며 의미를 생산한다. 어떤 학파의 분석가들은 이를 분석의 목표로 삼지만 라캉주의의 관점에서 이는 환자가 S1의 효과에 의해 기만당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환자는 한창 전이중에 있는 것이지 아직 전이의 마지막 단계, 기만적 진리(veitemen teuse)를 넘어서는 정신분석의 끝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참고문헌
이장호·정남운·조성호 (2011), 『상담심리학의 기초』, 학지사
Dor, J. (1994), Clinique psychanalytique, seuil, 홍준기 역. (2005) 『프로이트·라깡 정
신분석임상』 , 아난케
Freud, S. (1897), “Letter 70\", 임진수 역. (2009) “편지 70-1897년 10월 3일”, 『정신
분석의 탄생』, 열린책들
Freud, S. (1897), \"Letter 75\", 임진수 역. (2009) “편지 75-1897년 11월 14일”, 『정
신분석의 탄생』, 열린책들
Freud, S. (1895), Studies on Hysteria, 김미리혜 역. (2011) 『히스테리연구』, 열린책
들
Freud, S. (1900),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김인순 역. (2010)『꿈의 해석』, 열린
책들
Freud, S (1901), The psychopathology of everyday life, 이현우 역. (2011) 『일상생
활의 정신병리학』, 열린책들
Freud, S. (1905), “Fragment of an analysis of a case of hysteria”, 김재혁·권세훈 역.
(2010), “도라의 히스테리 분석”,『꼬마한스와 도라』, 열린책들
Lacan, J. (1977), \"ouverture de la section clinique\" Ornicar? n.9, Navarin
Lindley, D. (2007), Uncertainty, 박배식 역. (2009) 『불확정성』, 마루벌
Miller, J. A \"Psychotheaphie et psychanalyse\" http://atelierclinique.unblog.fr
Rosenblum, B. (2011), Quantum Enigma, 전대호 옮김. (2012) 『양자 불가사의 - 물리
학과 의식의 만남』, 지양사
k, S. (1996), The indivisible remainder: An essay on Schelling and related
matters, Verso, 이재환 역. (2010) 『나눌수 없는 잔여: 셸링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에세이』, 도서출판b
추천자료
 상담심리학 집단상담 Freud 상담심리 심리 상담자
상담심리학 집단상담 Freud 상담심리 심리 상담자 [상담심리학] 가족치료이론
[상담심리학] 가족치료이론 [상담심리학] 상담에 대한 분석
[상담심리학] 상담에 대한 분석 상담심리학의 관점에서 정신분석학적 치료, 인간중심의 치료, 행동수정을 비교
상담심리학의 관점에서 정신분석학적 치료, 인간중심의 치료, 행동수정을 비교 상담심리학의 기초
상담심리학의 기초 [상담심리학]치료의선물 독후감
[상담심리학]치료의선물 독후감 상담심리학-인간중심 접근
상담심리학-인간중심 접근 [상담심리학] 상담심리학의 관계적 접근
[상담심리학] 상담심리학의 관계적 접근 상담심리학의 내용과 사회복지상담학의 필요성
상담심리학의 내용과 사회복지상담학의 필요성 [상담심리학] 자신, 주변사람, 또는 여러 대중매체(TV, 책, 드라마, 영화)의 주인공 중에서 ...
[상담심리학] 자신, 주변사람, 또는 여러 대중매체(TV, 책, 드라마, 영화)의 주인공 중에서 ... [상담심리학] 분석심리학에서 언급하는 무의식에 대해 서술하면서 자신과 연결시켜 보세요 - ...
[상담심리학] 분석심리학에서 언급하는 무의식에 대해 서술하면서 자신과 연결시켜 보세요 - ... [상담심리학]행동주의 상담의 공헌점과 비판점을 자신의 의견도 넣어서 기술하시오.
[상담심리학]행동주의 상담의 공헌점과 비판점을 자신의 의견도 넣어서 기술하시오. [상담심리학] 상담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자신의 생각을 ...
[상담심리학] 상담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자신의 생각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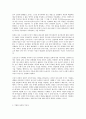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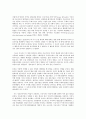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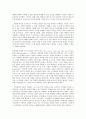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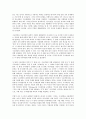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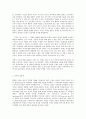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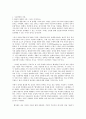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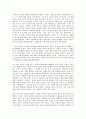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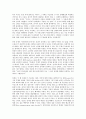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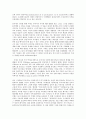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