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본문내용
몸이다. 그러므로 창조는 계속되는 과정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신적 로고스는 특별한 인격적 에너지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표명되어 진다. 죄와 분열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장하는 모든 만물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희미하게 한다할지라도, 성육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조화와 일치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와 관계를 맺게 하고 화해시킨다.
(3).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세계
맥페이그는 세계를 하나님의 몸으로 이해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녀는 이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네 가지 모델들을 소개한다.
첫째 모델은 이신론적(Deistic) 모델이다.
둘째 모델은 대화적(Dialogic) 모델이다.
셋째 모델은 군주적(Monarchical) 모델이다.
넷째 모델은 행위자(Agential) 모델이다.
(4). 우주론적 신학
우주론적 신학은 지구를 하나님의 식구로 파악한다. 맥페이그는 교회의 보편성을 폭 넓게 적용하여 지구를 교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식구는 지구전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식구는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더불어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상호의존되어 있고,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면 복음은 우리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로서 이 세계를 포함한다. 만일 그리스도교가 그렇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교는 ‘세계 종교’가 될 수 없다. 구원이 모든 피조물의 행복을 뜻한다면, 교회의 보편성은 피조물을 제외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기독교 신학은 우주론적 신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5). 통전적 진리 이해
통전적 진리 이해 속에서 우주가 바로 ‘나’이며 ‘하나님 집’이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하늘과 땅과 모두가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곧 바로 나다.” 장일순은 이 진리를 깨우칠 것을 부탁한다. 나락 한알 속에도, 아주 작다고 하는 머리털 하나 속에도 우주의 존재가 내포되어 있다. 머리털은 사람이 없으면 안되고, 사람은 그 부모가 없으면 안되고, 부모는 또 그 부모의 부모가 없으면 안되고, 그 부모나 우리는 천지만물, 하늘과 땅이 없으면 안된다. 그리고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터럭 속에 전 우주가 있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된다.
(6). 생태학적 수치심
인간의 오만과 교만 그리고 실수는 자신을 탄생시킨 자연을 하루아침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 기계론적 사고를 비롯한 종래의 지배하는 가치관으로는 지구 생태계를 구원할 수 없다. 지구 생태계를 구원할 가치관이 필요하다. 생태학자인 토마스 베리 신부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의 세상으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세상만을 보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적 심성을 생태적 수치심이라 불렀다. 우리는 생태학적 수치심을 느끼고 이에 대한 치유를 고려해야 한다. 토마스 베리는 인간의 생태학적 수치심을 인간이 지녀야 할 종교적 영성의 본질로 보았다.우리의 생태적 수치심이 치유될 때 우주 만물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 생태학적 수치심의 시각에서 보면, 각종의 난 개발과 환경오염은 엄청난 죄로 인식되어야 한다. 생태계의 문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우리가 성서를 관계성의 틀 속에서 보면 생태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4. 세계 공동체 삶의 원리로서의 관계성
1. 관계학으로서의 생태학
우리의 생태계는 서로 돕는 한 유지되고 존재한다. 우리의 성서는 인간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고귀한 임무를 지니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창조세계의 파괴현상에 대해서 인간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로 닦아오고 있는 것은 인간이 그 파괴현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서의 가르침과는 달리 그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창조와 피조물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 같아서 배반, 욕심, 이기심, 탐심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우리 인간들을 포함하여 모든 생태계는 서로의 존엄성과 존경을 깨우쳐 주는 관계의 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이 관계의 규범을 분명히 지킬 때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2. 세계 공동체의 삶의 위기와 파괴의 극복
(1) 창조신앙의 해석학적 이해
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
우리는 세계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세계 공동체의 참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신학에서는 생명의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은 피조물들 안에서 그리고 피조물들을 통하여 활동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이 서로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갖도록 창조하셨고 또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섭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와 섭리를 행하시도록 허용하는 한,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된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생명과 죽음의 관계
보프는 영은 모든 인간적 표현의 에너지와 활기를 가리키는 말이며, 그것은 인간의 일부가 아니라 생명의 총체로 체험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영을 육체와 대립하는 인간의 일부로 보지 않고 생명, 또는 생명력의 원천으로서의 인간 전체로 본다. 대립하는 것은 물질과 영, 또는 육체와 정신이 아니라 생명(삶)과 죽음(생명의 부정)이다. 영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생명이고 온전한 생명을 주는 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성은 생명을 부여하고 확장하고 옹호하고 존중한다. 따라서 영성은 모든 생명형태를 중시한다.
(2) 생태학적 삶의 구조로의 전환
오늘날 우리의 생태계와 우리의 삶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자연의 지배를 정당시해 온 인간의 정복의 논리는 공존과 화해의 논리로 전향되어야 한다.
둘째로, 현대의 삶의 위기의 극복을 위해, 자연을 ‘그것’으로 보지 말고 ‘나와너’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셋째로, 생태적 불균형을 풀어야 한다.
넷째는 탐욕과의 관계에서 패배하지 말아야 한다.
(3).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세계
맥페이그는 세계를 하나님의 몸으로 이해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녀는 이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네 가지 모델들을 소개한다.
첫째 모델은 이신론적(Deistic) 모델이다.
둘째 모델은 대화적(Dialogic) 모델이다.
셋째 모델은 군주적(Monarchical) 모델이다.
넷째 모델은 행위자(Agential) 모델이다.
(4). 우주론적 신학
우주론적 신학은 지구를 하나님의 식구로 파악한다. 맥페이그는 교회의 보편성을 폭 넓게 적용하여 지구를 교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식구는 지구전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식구는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더불어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상호의존되어 있고,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면 복음은 우리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로서 이 세계를 포함한다. 만일 그리스도교가 그렇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교는 ‘세계 종교’가 될 수 없다. 구원이 모든 피조물의 행복을 뜻한다면, 교회의 보편성은 피조물을 제외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기독교 신학은 우주론적 신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5). 통전적 진리 이해
통전적 진리 이해 속에서 우주가 바로 ‘나’이며 ‘하나님 집’이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하늘과 땅과 모두가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곧 바로 나다.” 장일순은 이 진리를 깨우칠 것을 부탁한다. 나락 한알 속에도, 아주 작다고 하는 머리털 하나 속에도 우주의 존재가 내포되어 있다. 머리털은 사람이 없으면 안되고, 사람은 그 부모가 없으면 안되고, 부모는 또 그 부모의 부모가 없으면 안되고, 그 부모나 우리는 천지만물, 하늘과 땅이 없으면 안된다. 그리고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터럭 속에 전 우주가 있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된다.
(6). 생태학적 수치심
인간의 오만과 교만 그리고 실수는 자신을 탄생시킨 자연을 하루아침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 기계론적 사고를 비롯한 종래의 지배하는 가치관으로는 지구 생태계를 구원할 수 없다. 지구 생태계를 구원할 가치관이 필요하다. 생태학자인 토마스 베리 신부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의 세상으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세상만을 보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적 심성을 생태적 수치심이라 불렀다. 우리는 생태학적 수치심을 느끼고 이에 대한 치유를 고려해야 한다. 토마스 베리는 인간의 생태학적 수치심을 인간이 지녀야 할 종교적 영성의 본질로 보았다.우리의 생태적 수치심이 치유될 때 우주 만물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 생태학적 수치심의 시각에서 보면, 각종의 난 개발과 환경오염은 엄청난 죄로 인식되어야 한다. 생태계의 문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우리가 성서를 관계성의 틀 속에서 보면 생태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4. 세계 공동체 삶의 원리로서의 관계성
1. 관계학으로서의 생태학
우리의 생태계는 서로 돕는 한 유지되고 존재한다. 우리의 성서는 인간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고귀한 임무를 지니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창조세계의 파괴현상에 대해서 인간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로 닦아오고 있는 것은 인간이 그 파괴현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서의 가르침과는 달리 그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창조와 피조물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 같아서 배반, 욕심, 이기심, 탐심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우리 인간들을 포함하여 모든 생태계는 서로의 존엄성과 존경을 깨우쳐 주는 관계의 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이 관계의 규범을 분명히 지킬 때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2. 세계 공동체의 삶의 위기와 파괴의 극복
(1) 창조신앙의 해석학적 이해
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
우리는 세계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세계 공동체의 참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신학에서는 생명의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은 피조물들 안에서 그리고 피조물들을 통하여 활동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이 서로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갖도록 창조하셨고 또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섭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와 섭리를 행하시도록 허용하는 한,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된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생명과 죽음의 관계
보프는 영은 모든 인간적 표현의 에너지와 활기를 가리키는 말이며, 그것은 인간의 일부가 아니라 생명의 총체로 체험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영을 육체와 대립하는 인간의 일부로 보지 않고 생명, 또는 생명력의 원천으로서의 인간 전체로 본다. 대립하는 것은 물질과 영, 또는 육체와 정신이 아니라 생명(삶)과 죽음(생명의 부정)이다. 영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생명이고 온전한 생명을 주는 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성은 생명을 부여하고 확장하고 옹호하고 존중한다. 따라서 영성은 모든 생명형태를 중시한다.
(2) 생태학적 삶의 구조로의 전환
오늘날 우리의 생태계와 우리의 삶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자연의 지배를 정당시해 온 인간의 정복의 논리는 공존과 화해의 논리로 전향되어야 한다.
둘째로, 현대의 삶의 위기의 극복을 위해, 자연을 ‘그것’으로 보지 말고 ‘나와너’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셋째로, 생태적 불균형을 풀어야 한다.
넷째는 탐욕과의 관계에서 패배하지 말아야 한다.
추천자료
 대인관계론 중간고사 요약정리자료
대인관계론 중간고사 요약정리자료 카네기 인간관계론 읽고 요약정리 및 감상문
카네기 인간관계론 읽고 요약정리 및 감상문 김득중 저 요한의 신학 요약정리
김득중 저 요한의 신학 요약정리 신학자 불트만에 대하여 요약정리하고 다른 신학자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논평을10줄 정도 기...
신학자 불트만에 대하여 요약정리하고 다른 신학자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논평을10줄 정도 기... 조직신학 서론과신론 요약정리
조직신학 서론과신론 요약정리 사회적 및 대인관계적 장애(사회적장애, 대인관계장애, 성격장애, 물질관련장애, 물질사용장...
사회적 및 대인관계적 장애(사회적장애, 대인관계장애, 성격장애, 물질관련장애, 물질사용장... CRM 요약정리 레포트(CRM요약정리, 고객관계관리요약정리, 고객관계관리)
CRM 요약정리 레포트(CRM요약정리, 고객관계관리요약정리, 고객관계관리) 인간관계론)인간관계의 심리(정진선,문미란,시그마프레스,2008)책을 요약정리하시오.
인간관계론)인간관계의 심리(정진선,문미란,시그마프레스,2008)책을 요약정리하시오. 부적응적 인간관계 유형을 분류하여 요약정리하고 본인이 속한 인간관계에서 부적응적 유형중...
부적응적 인간관계 유형을 분류하여 요약정리하고 본인이 속한 인간관계에서 부적응적 유형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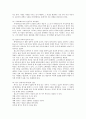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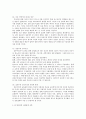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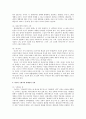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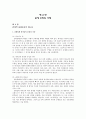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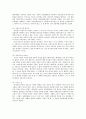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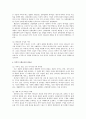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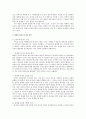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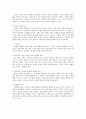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