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 있고 각 장은 4음보로 되어 있으며, 초장 ‘3 4 3 4’, 중장 ‘3 4 3 4’ , 종장 ‘3 5 4 3’의 글자 수도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어부사시사는 연시조의 형식으로 보아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어부사시사의 청자계층에 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어 보인다. 여타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듯이 윤선도는 어부사시사 서문에서 이미 청자층에 대해 규정짓고 있다. 위에서 정리한 논의를 다시 한 번 반복하자면, 첫 번째 청자는 ‘소리 맞추어 함께 노저을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일상어와 방언을 작품 속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자를 창주일사로 지적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 어부사시사의 청자계층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것이며, 어부사시사는 상층의 문학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두루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 이르러야만 할 것 같다.
어부사시사의 공간의식에서 중요한 점은 공간이 바다, 석실, 인간 세상으로 삼분되어 있다는 점이라기보다는, 석실이 내포하고 있는 의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석실을 바다와 인간 세상의 중간에 위치시킴으로써 자연과 세속 간의 갈등 -나름대로는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것은 자연을 점차 인위적이고 인공적으로 만들어가는, 훼손시키는 행태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을 해결하고자 한 고산의 노력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어부사시사는 그저 강호의 한정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읊은 작품이라고만 생각해왔다. 그러나 거기에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고산의 마음 등이 담겨 있고,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반해 자연으로 돌아간 사나이!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전라남도를 찾아 윤선도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싶다.
<참고문헌>
이경민, <漁父四時詞>에 대한 數三問題 再考, 『孤山硏究』 제3호, 孤山硏究會, 1989.
박규홍, 「시조와 가사의 장르 구분 -고산의 <어부사시사>를 중심으로-」, 한국시조학회, 2004.
김대행, 漁父四時詞의 外延과 內包, 『孤山硏究』 창간호, 孤山硏究會, 1987.
강전섭, 「尹孤山의 <漁父四時詞>에 對하여」, 『孤山硏究』 제2호, 孤山硏究會, 1988.
김대행, 「시조유형론」, 이대 출판부, 1986.
김성기, 남도의 시가, 역락, 2002.
한춘섭, 고시조 해설, 홍신문화사, 1999.
어부사시사의 청자계층에 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어 보인다. 여타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듯이 윤선도는 어부사시사 서문에서 이미 청자층에 대해 규정짓고 있다. 위에서 정리한 논의를 다시 한 번 반복하자면, 첫 번째 청자는 ‘소리 맞추어 함께 노저을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일상어와 방언을 작품 속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자를 창주일사로 지적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 어부사시사의 청자계층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것이며, 어부사시사는 상층의 문학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두루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 이르러야만 할 것 같다.
어부사시사의 공간의식에서 중요한 점은 공간이 바다, 석실, 인간 세상으로 삼분되어 있다는 점이라기보다는, 석실이 내포하고 있는 의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석실을 바다와 인간 세상의 중간에 위치시킴으로써 자연과 세속 간의 갈등 -나름대로는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것은 자연을 점차 인위적이고 인공적으로 만들어가는, 훼손시키는 행태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을 해결하고자 한 고산의 노력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어부사시사는 그저 강호의 한정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읊은 작품이라고만 생각해왔다. 그러나 거기에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고산의 마음 등이 담겨 있고,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반해 자연으로 돌아간 사나이!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전라남도를 찾아 윤선도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싶다.
<참고문헌>
이경민, <漁父四時詞>에 대한 數三問題 再考, 『孤山硏究』 제3호, 孤山硏究會, 1989.
박규홍, 「시조와 가사의 장르 구분 -고산의 <어부사시사>를 중심으로-」, 한국시조학회, 2004.
김대행, 漁父四時詞의 外延과 內包, 『孤山硏究』 창간호, 孤山硏究會, 1987.
강전섭, 「尹孤山의 <漁父四時詞>에 對하여」, 『孤山硏究』 제2호, 孤山硏究會, 1988.
김대행, 「시조유형론」, 이대 출판부, 1986.
김성기, 남도의 시가, 역락, 2002.
한춘섭, 고시조 해설, 홍신문화사,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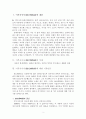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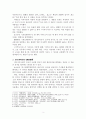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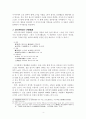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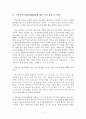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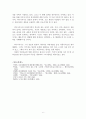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