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줄거리
Ⅱ. 주제
Ⅲ. 기존 연구 검토
Ⅳ. 감상
Ⅱ. 주제
Ⅲ. 기존 연구 검토
Ⅳ. 감상
본문내용
대해서는 아직 다른 의견이 있다. 물론 현재까지는 동래 유배설이 가장 유력하지만, 제작 연대에 따라서 정과정의 화자가 그리는 ‘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위 책에 게재된 권영철 님의 표를 인용하기로 한다.
정과정의 제작연대에 대해서 대체로 세 가지의 다른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의종 시대로 정서가 의종 5년 (1151)에 동래로 유배 간 시기부터 의종 24년(1170)거제도에서 해배(解配)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창작했다는 견해
둘째는 동래시대로 의종 5년(1151)에서 의종 11년(1157) 거제도로 유배되기까지의 기간 중에 창작했다는 견해,
셋째는, 거제시대로 의종 24년(1170) 9월 정중부 등에게 왕위를 찬탈 당하고 거제로 유배된 시기부터 정서가 명종의 소환을 받아 개경에 복귀한 10월까지의 1개월 사이에 창작된 것으로 의종이 정중부에게 축출되었음을 슬퍼하는 동시에 자기의 곧은 절개에 대해 변치 않겠다는 맹세에서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보는 견해, 다음도 역시 거제시대로 의종 24년 (1170) 9월 ~ 10월이지만, 연군의 대상은 의종이 아닌 명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3. ‘임’은 누구인가?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정과정의 제작시기를 거제시대로 보고 연군의 대상을 명종으로 설정하여 본 견해가 있었는데, 통용되고 있지는 견해이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임’이 명종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의 근거는 의종과 정서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과 정서가 의종 재위 시에 의종을 ‘임’으로 하여 이 노래를 불렀다면 그는 명종이 즉위한 후 곧 소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과정이 동래의 유배지에서 지어졌고, 의종을 들어 연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4.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정과정은 비교적 쉬운 어휘로 되어 있어서 해석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몇 부분에서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특히 서술의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이다.
첫째, ‘아니시며 거츠르신 ’ 에 대한 해석은 ① 왕을 주체로 해서 ‘(임금님의 판결이)잘못이며 경솔했던 것임을’ 로 보거나 ② 諫臣을 주체로 해서 ‘(참소하는 무리들의 말이) 아니며 거짓인 줄을’의 두 가지로 나뉜다. ① 과 ② 어느 해석을 따르냐에 따라서 ‘벼기더시니’의 해석도 ‘임이 (함께 지내자고) 그렇게 우기시더니’와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우기던 이들’로 해석이 나뉘게 된다.
둘째,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힛마리신뎌’ 는 위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의견이 나눠질 수 있는데, ‘(임이 같이 지내자고 한 약속이)온통 거짓의 말씀 뿐이었구료.’ 로 해석되거나 ‘뭇사람들의 참소하는 말’ 정도로 해석된다.
셋째, ‘읏븐뎌’는 어문학적인 문제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데, ‘읏븐뎌’를 ‘읏브 + ㄴ + + 여’ 로 보아 ‘슬프구나.’로 해석하거나 ‘’을 銷(소)로 보아서 ‘사라지다 혹은 죽고 싶다.’로 해석하려는 견해가 있다. 이 밖에도 ‘’을 ‘
정과정의 제작연대에 대해서 대체로 세 가지의 다른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의종 시대로 정서가 의종 5년 (1151)에 동래로 유배 간 시기부터 의종 24년(1170)거제도에서 해배(解配)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창작했다는 견해
둘째는 동래시대로 의종 5년(1151)에서 의종 11년(1157) 거제도로 유배되기까지의 기간 중에 창작했다는 견해,
셋째는, 거제시대로 의종 24년(1170) 9월 정중부 등에게 왕위를 찬탈 당하고 거제로 유배된 시기부터 정서가 명종의 소환을 받아 개경에 복귀한 10월까지의 1개월 사이에 창작된 것으로 의종이 정중부에게 축출되었음을 슬퍼하는 동시에 자기의 곧은 절개에 대해 변치 않겠다는 맹세에서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보는 견해, 다음도 역시 거제시대로 의종 24년 (1170) 9월 ~ 10월이지만, 연군의 대상은 의종이 아닌 명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3. ‘임’은 누구인가?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정과정의 제작시기를 거제시대로 보고 연군의 대상을 명종으로 설정하여 본 견해가 있었는데, 통용되고 있지는 견해이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임’이 명종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의 근거는 의종과 정서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과 정서가 의종 재위 시에 의종을 ‘임’으로 하여 이 노래를 불렀다면 그는 명종이 즉위한 후 곧 소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과정이 동래의 유배지에서 지어졌고, 의종을 들어 연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4.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정과정은 비교적 쉬운 어휘로 되어 있어서 해석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몇 부분에서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특히 서술의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이다.
첫째, ‘아니시며 거츠르신 ’ 에 대한 해석은 ① 왕을 주체로 해서 ‘(임금님의 판결이)잘못이며 경솔했던 것임을’ 로 보거나 ② 諫臣을 주체로 해서 ‘(참소하는 무리들의 말이) 아니며 거짓인 줄을’의 두 가지로 나뉜다. ① 과 ② 어느 해석을 따르냐에 따라서 ‘벼기더시니’의 해석도 ‘임이 (함께 지내자고) 그렇게 우기시더니’와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우기던 이들’로 해석이 나뉘게 된다.
둘째,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힛마리신뎌’ 는 위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의견이 나눠질 수 있는데, ‘(임이 같이 지내자고 한 약속이)온통 거짓의 말씀 뿐이었구료.’ 로 해석되거나 ‘뭇사람들의 참소하는 말’ 정도로 해석된다.
셋째, ‘읏븐뎌’는 어문학적인 문제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데, ‘읏븐뎌’를 ‘읏브 + ㄴ + + 여’ 로 보아 ‘슬프구나.’로 해석하거나 ‘’을 銷(소)로 보아서 ‘사라지다 혹은 죽고 싶다.’로 해석하려는 견해가 있다. 이 밖에도 ‘’을 ‘
추천자료
 김소월 문학에 관하여(꿈으로 오는 恨 사람 - 김소월)
김소월 문학에 관하여(꿈으로 오는 恨 사람 - 김소월) 한국전쟁기 소설의 사회현실과 문학작품과의 조응관계 및 반성적 시각
한국전쟁기 소설의 사회현실과 문학작품과의 조응관계 및 반성적 시각 한강의 작품세계와 '왼손'에 관하여
한강의 작품세계와 '왼손'에 관하여 [이육사][이육사의 시][이육사의 문학][이육사의 전거수사][육사 수필][이육사의 작품][주리...
[이육사][이육사의 시][이육사의 문학][이육사의 전거수사][육사 수필][이육사의 작품][주리... 생활동화 종류에 따라 각각의 주제에 따른 동화 5권을 찾아 지은이, 년도, 책제목, 출판사를 ...
생활동화 종류에 따라 각각의 주제에 따른 동화 5권을 찾아 지은이, 년도, 책제목, 출판사를 ... 고려속요(고려가요) 가시리, 정과정 작품분석, 고려속요(고려가요) 처용가, 쌍화점 작품분석,...
고려속요(고려가요) 가시리, 정과정 작품분석, 고려속요(고려가요) 처용가, 쌍화점 작품분석,... [작품분석][공무도하가][구지가]고전시가 공무도하가 작품분석, 고전시가 구지가 작품분석, ...
[작품분석][공무도하가][구지가]고전시가 공무도하가 작품분석, 고전시가 구지가 작품분석, ...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의 생애 및 시대배경과 작품세계를 논하고, 그의 문학의 의의를 서...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의 생애 및 시대배경과 작품세계를 논하고, 그의 문학의 의의를 서... [문학교육] 구체적 작품의 실재적 교수와 평가 방안(김건원의 현대 단편 소설 '대목'을 중심...
[문학교육] 구체적 작품의 실재적 교수와 평가 방안(김건원의 현대 단편 소설 '대목'을 중심... 《 정과정곡 》작품론
《 정과정곡 》작품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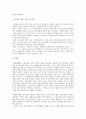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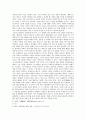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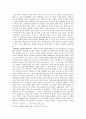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