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곳은 괴로운 번뇌의 세계이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도 그 안에서 정신이 바르고 평정할 수 있으면 ‘시끄러운 곳’ 이 곧 극락세계가 된다. ‘열반의 세계’ 라고 정해져 있거나 ‘극락세계’ 라고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이 어떻게 세계를 대하는가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고요한 숲속에서 모든 중생의 아픔과 함께 있고, 시장에서 선정 상태에 있다면 이는 이미 보살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이옥은 번뇌를 다 지우고 세상 사람의 아픔을 제하기 위한 보살상으로 부목한을 그리고 있다. 왜인가. 깨닫고 산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거대한 ‘극락’ 임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알고 보면 이러한 사실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른다. 우리 곁의 여러 보살들을 통해서 말이다. “밭에서 일하는 여인이 반드시 백의관음이 아닌 것도 아니요, 호숫가를 지나가는 나그네가 임금님이 아니라고 어찌 단정할 수 있겠는가?”(전집, 249p). 그들이 다 부목한이 아니라고 어찌 말할 수 있을 텐가. 단지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가 아닌가,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에 따라 ‘부처’ 와 ‘중생’ 이 나뉠 뿐임을 말이다.
이옥은 번뇌를 다 지우고 세상 사람의 아픔을 제하기 위한 보살상으로 부목한을 그리고 있다. 왜인가. 깨닫고 산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거대한 ‘극락’ 임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알고 보면 이러한 사실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른다. 우리 곁의 여러 보살들을 통해서 말이다. “밭에서 일하는 여인이 반드시 백의관음이 아닌 것도 아니요, 호숫가를 지나가는 나그네가 임금님이 아니라고 어찌 단정할 수 있겠는가?”(전집, 249p). 그들이 다 부목한이 아니라고 어찌 말할 수 있을 텐가. 단지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가 아닌가,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에 따라 ‘부처’ 와 ‘중생’ 이 나뉠 뿐임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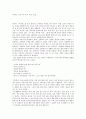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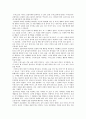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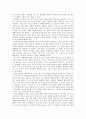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