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출어람, 사실성의 확보
사랑의 이중주
사회적 소용돌이 속에서
나오며
사랑의 이중주
사회적 소용돌이 속에서
나오며
본문내용
가 가져온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반영인 것이다.
배도는 주생이 자신과 관계를 맺으려 하자 자신은 현재는 비록 기적에 이름이 올라와 있지만 자신의 조부는 벼슬을 하다가 죄를 지어 서인으로 되었으며 자신은 조실부모하여 기적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여 자신의 혈통이 천민이 아니라고 내세운다. 배도의 이러한 고백은 주생의 경우처럼 조선후기 신분변동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신분변동 현상에 의해 양인이 천민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배도는 현재 몰락하여 보잘 것이 없지만 그래도 장차 벼슬을 할지도 모르는 주생을 매개로 하여 기녀라는 신분적 질곡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생과 관계를 맺지만, 주생은 그러한 배도를 일시적 향락적 대상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집안의 딸 선화를 본 뒤에는 배도를 잊어버리게 되고, 선화와 관계를 맺은 뒤 선화의 상사병으로 선화 모친의 승낙을 얻어낸다. 그 결과 천민 배도는 죽음이라는 비극적 운명에 처하게 된다.
주생의 이러한 행위는 몰락양반층이 자신들의 실제적 처지와 양반이라는 형식적 신분에 대해 객관적인 인식을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갖게 되는 낭만적인 시각 및 계층적 이기성을 첨예하게 드러내는 것으로서, 신분제 사회 내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의 본질적 태도가 무엇인가를 사실적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사실과 낭만의 소설사적 전개양상-, 집문당, 1993.
나오며
<주생전>에는 조강지처를 버리고 쉽게 다른 여자에게 마음 주는 남자, 이러한 남자 때문에 다른 여자를 질투하고 자신을 버린 남자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자가 등장한다. 이러한 배신과 질투의 모습은 마치 현대소설 속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과거나 현재나 정답도 없고 어려운 것이 사랑이 아닐까. 단순히 세 남녀의 삼각관계 로맨스로만 이 소설을 본다면 나쁜 남자와 불쌍한 여자의 통속적인 해석뿐이겠지만 <주생전>은 선비의 신분을 떨치고 장사꾼으로 나서는 주생에게서 새로운 시대 의식을 엿볼 수 있으며, 배도라는 기생은 애정을 통해 신분을 상승시키려는 민중들의 소박한 삶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고대소설과 달리 삼각관계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갈등을 통해 우리의 인생사까지 뒤돌아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사랑의 무게를 모르는 속물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배도는 주생이 자신과 관계를 맺으려 하자 자신은 현재는 비록 기적에 이름이 올라와 있지만 자신의 조부는 벼슬을 하다가 죄를 지어 서인으로 되었으며 자신은 조실부모하여 기적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여 자신의 혈통이 천민이 아니라고 내세운다. 배도의 이러한 고백은 주생의 경우처럼 조선후기 신분변동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신분변동 현상에 의해 양인이 천민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배도는 현재 몰락하여 보잘 것이 없지만 그래도 장차 벼슬을 할지도 모르는 주생을 매개로 하여 기녀라는 신분적 질곡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생과 관계를 맺지만, 주생은 그러한 배도를 일시적 향락적 대상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집안의 딸 선화를 본 뒤에는 배도를 잊어버리게 되고, 선화와 관계를 맺은 뒤 선화의 상사병으로 선화 모친의 승낙을 얻어낸다. 그 결과 천민 배도는 죽음이라는 비극적 운명에 처하게 된다.
주생의 이러한 행위는 몰락양반층이 자신들의 실제적 처지와 양반이라는 형식적 신분에 대해 객관적인 인식을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갖게 되는 낭만적인 시각 및 계층적 이기성을 첨예하게 드러내는 것으로서, 신분제 사회 내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의 본질적 태도가 무엇인가를 사실적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사실과 낭만의 소설사적 전개양상-, 집문당, 1993.
나오며
<주생전>에는 조강지처를 버리고 쉽게 다른 여자에게 마음 주는 남자, 이러한 남자 때문에 다른 여자를 질투하고 자신을 버린 남자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자가 등장한다. 이러한 배신과 질투의 모습은 마치 현대소설 속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과거나 현재나 정답도 없고 어려운 것이 사랑이 아닐까. 단순히 세 남녀의 삼각관계 로맨스로만 이 소설을 본다면 나쁜 남자와 불쌍한 여자의 통속적인 해석뿐이겠지만 <주생전>은 선비의 신분을 떨치고 장사꾼으로 나서는 주생에게서 새로운 시대 의식을 엿볼 수 있으며, 배도라는 기생은 애정을 통해 신분을 상승시키려는 민중들의 소박한 삶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고대소설과 달리 삼각관계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갈등을 통해 우리의 인생사까지 뒤돌아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사랑의 무게를 모르는 속물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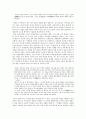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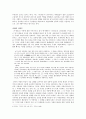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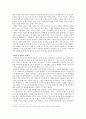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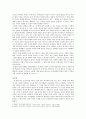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