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회분열과 한국교회
2. 민중교회운동과 한국교회
3. 민주화운동과 한국교회
4. 통일운동과 한국교회
2. 민중교회운동과 한국교회
3. 민주화운동과 한국교회
4. 통일운동과 한국교회
본문내용
회 지도자들은 강원용의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동시에 우익독재나 독점 자본주의와도 대결”을 통일을 위한 기독교인의 과제로 제시 -> 전투적 대결 논리(북진통일, 무력으로 남한 사회를 지키는 것)에서 벗어나 비판의 화살이 남한 사회도 겨냥했다는 점에서 통일 논의의 전환점 마련
- 1960년 4월 4·19혁명, 이승만 독재정권 무너짐 -> 한반도 통일의 기대가 높아짐
-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박정희 군사정권 시작
- 1964년 베트남전 파병(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전교회가 지지, 한국교회의 반공노선)
- 1970년대 초반, 여전히 남북 대치, 그러나 국제적 정세 1969년 베트남전쟁을 치르던 미국은 어려움에 봉착하여 하루빨리 베트남전쟁의 종결과 냉전체제의 해소를 바라게 된다. 이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냉전체제를 청산하자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낸다. 닉슨 독트린은 냉전체제에서 벗어나 이른바 ‘데탕트’의 시대로 접어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때 소련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느낀 중국과 어려움을 겪던 미국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마침내 1972년 미국과 중국은 수교를 맺으며 전 세계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 남과 북이 대결만을 지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화해에 자극되어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에 자극
- 1972년 7월 2일 7·4 남북공동성명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 간 정치적 대화통로와 한반도 평화정착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발표 -> 체결 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통일 및 사회정의 기독교협의회 창립 -> 민주수호국민협회는 “7.4 공동성명”을 맞아 성명서 이 성명서는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의 실체인 민중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이 시기 통일 논의를 한걸음 진보시켰다. 하지만 군사정권에 인권유린과 민주주의 탄압으로 통일운동보다는 사회운동에 집중되었다.
발표
- 1980년대 초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국가적 화해와 통일에 대한 굳은 의지와 함께 미국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열망은 강해진다. 계속되는 군부독재와 반공산주의를 내세우는 보안법으로의 억압은 분단국가가 가져온 결과라는 생각이 팽배했고, 통일운동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한국교회 또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한국 정부에 대항하는 정치적 운동 = 국가화해와 통일 운동
- 19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 -> 통일의 논의, 운동 활발히 전개
- 1988년 7월 7일 노태우 정권 7.7선언(문익환 목사 평양방북의 대내적 이유가 됨)
- 1989년 초반 동구, 미·소의 화해분위기 조성(문익환 목사 평양방북의 내외적 이유가 됨)
2) 통일운동의 전개
(1) KNCC의 통일운동
- 1981년 KNCC 한국 기독교회협의회(The Korea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는 ‘제 4차 한국 독일 교회협의회’에서 분단국가로서 한국과 독일의 위상, 통일 전망 논의, 한국교회는 민중이 배제되지 않는 통일 논의를 전담 연구할 것을 제안
- 1982년 KNCC 내에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 조직(체계적으로 통일문제 연구함)
- 10.26 1979년 10월 26일 밤 7시 40분 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安家)에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살해한 사건.
이후 군사정부의 방해로 KNCC의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없게 됨
- 김관석 통일문제 연구위원회 위원장.
은 민족통일이 세계 평화 운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 -> WCC 제 6차 총회에서 논의 -> 1984년 일본 도잔소에서 WCC는 ‘동북아시아 평화와 정의에 관한 협의회’ 개최
- 1985년 제34회 KNCC 총회에서 「한국 교회 평화통일 선언」을 발표
- 1985년 5월 “KNCC 통일문제협의회”의 개최
-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세계교회협의회의 주선으로 남한의 KNCC 대표들과 조선기독교도련맹 대표들이 처음으로 통일 대화를 함
- 1987년 제 3차 통일문제협의회 진행
- 1988년 2월 제 37차 총회,「민족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의 선언」, 이 선언은 정치적 문제들과 희년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이 선언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한국 교회의 선교적 전통”, “민족분단의 현실”, “분단과 증오에 대한 죄책 고백”, “민족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기본원칙”, “남북한 정복에 대한 한국교회의 건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하고 그 준비 작업으로 교회의 갱신운동, 평화통일 교육시행 화해와 일치의 실천, 그리고 다양한 통일운동들과의 연대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을 실천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것으로 인해 한국여성신학자협회는 자신들의 선언문을 발표하며, 기독교 여성들의 참여라는 발전을 이루었다.
선언
- 1988년 11월의 스위스 글리온 제 2차 모임에서 조선기독교도련맹 대표들과 남한교회 대표들은 1995년을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년으로 정함
- 1993년 8월 15일 교회는 서울 독립문에서 임진각으로 이어지는 길 위에서 남북 인간띠잇기 대회를 주최
- 한계 : KNCC의 통일논의는 상당한 정도 반공기독교를 수정하려고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반공의 잔재를 대체로 그대로 지님, 통일의 전망과 방향을 명시하지 못한 채 머무름
(2) 방북운동
- 1989년 3월 25일 토요일 문익환 목사의 평양방문 -> 4.2 공동성명을 발표
- 문익환 방북 후 정부는 국가보안법 제 6조 ‘탈출 잠입죄’로 대응
- 그의 방북 이후 전대협의 임수경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문규현의 방북을 필두로 시민 사회의 통일 열기를 고조 -> 무수한 통일 운동가들을 길러내는 계기가 됨
- 문익환 방북으로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통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 =>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됨
- 문익환 방북으로 정부는 민주통일운동의 선봉에 선 재야인사들을 대거 구속하는 등 더욱 탄압함
- 1960년 4월 4·19혁명, 이승만 독재정권 무너짐 -> 한반도 통일의 기대가 높아짐
-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박정희 군사정권 시작
- 1964년 베트남전 파병(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전교회가 지지, 한국교회의 반공노선)
- 1970년대 초반, 여전히 남북 대치, 그러나 국제적 정세 1969년 베트남전쟁을 치르던 미국은 어려움에 봉착하여 하루빨리 베트남전쟁의 종결과 냉전체제의 해소를 바라게 된다. 이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냉전체제를 청산하자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낸다. 닉슨 독트린은 냉전체제에서 벗어나 이른바 ‘데탕트’의 시대로 접어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때 소련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느낀 중국과 어려움을 겪던 미국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마침내 1972년 미국과 중국은 수교를 맺으며 전 세계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 남과 북이 대결만을 지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화해에 자극되어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에 자극
- 1972년 7월 2일 7·4 남북공동성명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 간 정치적 대화통로와 한반도 평화정착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발표 -> 체결 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통일 및 사회정의 기독교협의회 창립 -> 민주수호국민협회는 “7.4 공동성명”을 맞아 성명서 이 성명서는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의 실체인 민중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이 시기 통일 논의를 한걸음 진보시켰다. 하지만 군사정권에 인권유린과 민주주의 탄압으로 통일운동보다는 사회운동에 집중되었다.
발표
- 1980년대 초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국가적 화해와 통일에 대한 굳은 의지와 함께 미국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열망은 강해진다. 계속되는 군부독재와 반공산주의를 내세우는 보안법으로의 억압은 분단국가가 가져온 결과라는 생각이 팽배했고, 통일운동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한국교회 또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한국 정부에 대항하는 정치적 운동 = 국가화해와 통일 운동
- 19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 -> 통일의 논의, 운동 활발히 전개
- 1988년 7월 7일 노태우 정권 7.7선언(문익환 목사 평양방북의 대내적 이유가 됨)
- 1989년 초반 동구, 미·소의 화해분위기 조성(문익환 목사 평양방북의 내외적 이유가 됨)
2) 통일운동의 전개
(1) KNCC의 통일운동
- 1981년 KNCC 한국 기독교회협의회(The Korea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는 ‘제 4차 한국 독일 교회협의회’에서 분단국가로서 한국과 독일의 위상, 통일 전망 논의, 한국교회는 민중이 배제되지 않는 통일 논의를 전담 연구할 것을 제안
- 1982년 KNCC 내에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 조직(체계적으로 통일문제 연구함)
- 10.26 1979년 10월 26일 밤 7시 40분 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安家)에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살해한 사건.
이후 군사정부의 방해로 KNCC의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없게 됨
- 김관석 통일문제 연구위원회 위원장.
은 민족통일이 세계 평화 운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 -> WCC 제 6차 총회에서 논의 -> 1984년 일본 도잔소에서 WCC는 ‘동북아시아 평화와 정의에 관한 협의회’ 개최
- 1985년 제34회 KNCC 총회에서 「한국 교회 평화통일 선언」을 발표
- 1985년 5월 “KNCC 통일문제협의회”의 개최
-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세계교회협의회의 주선으로 남한의 KNCC 대표들과 조선기독교도련맹 대표들이 처음으로 통일 대화를 함
- 1987년 제 3차 통일문제협의회 진행
- 1988년 2월 제 37차 총회,「민족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의 선언」, 이 선언은 정치적 문제들과 희년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이 선언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한국 교회의 선교적 전통”, “민족분단의 현실”, “분단과 증오에 대한 죄책 고백”, “민족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기본원칙”, “남북한 정복에 대한 한국교회의 건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하고 그 준비 작업으로 교회의 갱신운동, 평화통일 교육시행 화해와 일치의 실천, 그리고 다양한 통일운동들과의 연대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을 실천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것으로 인해 한국여성신학자협회는 자신들의 선언문을 발표하며, 기독교 여성들의 참여라는 발전을 이루었다.
선언
- 1988년 11월의 스위스 글리온 제 2차 모임에서 조선기독교도련맹 대표들과 남한교회 대표들은 1995년을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년으로 정함
- 1993년 8월 15일 교회는 서울 독립문에서 임진각으로 이어지는 길 위에서 남북 인간띠잇기 대회를 주최
- 한계 : KNCC의 통일논의는 상당한 정도 반공기독교를 수정하려고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반공의 잔재를 대체로 그대로 지님, 통일의 전망과 방향을 명시하지 못한 채 머무름
(2) 방북운동
- 1989년 3월 25일 토요일 문익환 목사의 평양방문 -> 4.2 공동성명을 발표
- 문익환 방북 후 정부는 국가보안법 제 6조 ‘탈출 잠입죄’로 대응
- 그의 방북 이후 전대협의 임수경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문규현의 방북을 필두로 시민 사회의 통일 열기를 고조 -> 무수한 통일 운동가들을 길러내는 계기가 됨
- 문익환 방북으로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통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 =>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됨
- 문익환 방북으로 정부는 민주통일운동의 선봉에 선 재야인사들을 대거 구속하는 등 더욱 탄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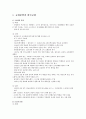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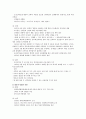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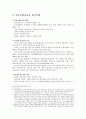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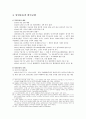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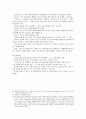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