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규정 속도로 달리셨습니다.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오던 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갑자기 핸들을 꺾더니, 중앙선을 넘어 우리 차는 물론 우리 앞에 가던 차마저 앞지르고는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쯧쯧, 저렇게 난폭하게 운전하다가는 사고 나기 쉬운데…….”
아버지께서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려면 어때? 다른 차는 사고도 안 나고 빨리 달리던데…….’ 생각했지만 더 이상 아버지를 재촉할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차들이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차가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사고라도 난 걸까요?”
“글쎄, 경찰관에게 물어 보자꾸나.”
경찰관 아저씨는 앞에 충돌 사고가 났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 중앙선 가운데에 승용차 두 대가 충돌 사고가 났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고, 차만 모두 조금씩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를 낸 차는 조금 전에 우리 차를 앞질러 가던 흰색 차였습니다.
처음으로 교통사고 현장을 직접 보니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만일 아까 아버지께서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앞차를 앞질러서 가려 했다면, 우리도 혹시.......’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내가 계속 재촉을 하는데도 규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애써 유지하시던 아버지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교통 규칙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편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나오는 아버지와 ‘나’라는 인물이 극명하게 대비되어진다. 아버지는 칸트의 이론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정 속도를 지켜야한다’는 자기 자신의 준칙에 의해서 선의지를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준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는 인물은 아버지에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 관점을 조금 들어내면서 규정 속도를 지키지 말고 조금 더 빨리 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가 주장하고 있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그러나 역기 오류가 있다. ‘나’의 가족들은 빨리 가서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나오는 초보 운전자들은 오히려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행복만 고려하고 다른 이들의 행복을 무시하는 것은 진정한 공리주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공리주의 관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리주의 관점의 한계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결과를 우선하기 보다는 보편타당한 준칙에 따르는 선의지가 발현되는 것을 아버지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서 학생들에게 이 본문은 큰 의의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글을 마치며
평소에 철학이다 하면 머리 아픈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대로 철학은 참으로도 머리가 아픈 노동이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철학은 아픈 만큼 생각을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칸트의 사상에 대해서 이전에 윤리 시간에 배운 지식 말고는 아는 지식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러한 고된 작업을 통해서 칸트의 이론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표본을 세울 수 있었다. 칸트의 사상을 공부하기 전에는 칸트의 사상은 너무 형식적인 면에만 치우쳐서 융통성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리주의가 더 옳은 사상이라고 짧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칸트의 사상들을 깊게 접하다 보니 이렇게 융통성 없이 형식주의로 치우친 보편타당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정언명법, 선의지,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등이 머릿속에서 쉽사리 떠나지 않을 것 같다.
“쯧쯧, 저렇게 난폭하게 운전하다가는 사고 나기 쉬운데…….”
아버지께서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려면 어때? 다른 차는 사고도 안 나고 빨리 달리던데…….’ 생각했지만 더 이상 아버지를 재촉할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차들이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차가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사고라도 난 걸까요?”
“글쎄, 경찰관에게 물어 보자꾸나.”
경찰관 아저씨는 앞에 충돌 사고가 났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 중앙선 가운데에 승용차 두 대가 충돌 사고가 났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고, 차만 모두 조금씩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를 낸 차는 조금 전에 우리 차를 앞질러 가던 흰색 차였습니다.
처음으로 교통사고 현장을 직접 보니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만일 아까 아버지께서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앞차를 앞질러서 가려 했다면, 우리도 혹시.......’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내가 계속 재촉을 하는데도 규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애써 유지하시던 아버지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교통 규칙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편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나오는 아버지와 ‘나’라는 인물이 극명하게 대비되어진다. 아버지는 칸트의 이론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정 속도를 지켜야한다’는 자기 자신의 준칙에 의해서 선의지를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준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는 인물은 아버지에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 관점을 조금 들어내면서 규정 속도를 지키지 말고 조금 더 빨리 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가 주장하고 있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그러나 역기 오류가 있다. ‘나’의 가족들은 빨리 가서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나오는 초보 운전자들은 오히려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행복만 고려하고 다른 이들의 행복을 무시하는 것은 진정한 공리주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공리주의 관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리주의 관점의 한계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결과를 우선하기 보다는 보편타당한 준칙에 따르는 선의지가 발현되는 것을 아버지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서 학생들에게 이 본문은 큰 의의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글을 마치며
평소에 철학이다 하면 머리 아픈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대로 철학은 참으로도 머리가 아픈 노동이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철학은 아픈 만큼 생각을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칸트의 사상에 대해서 이전에 윤리 시간에 배운 지식 말고는 아는 지식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러한 고된 작업을 통해서 칸트의 이론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표본을 세울 수 있었다. 칸트의 사상을 공부하기 전에는 칸트의 사상은 너무 형식적인 면에만 치우쳐서 융통성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리주의가 더 옳은 사상이라고 짧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칸트의 사상들을 깊게 접하다 보니 이렇게 융통성 없이 형식주의로 치우친 보편타당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정언명법, 선의지,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등이 머릿속에서 쉽사리 떠나지 않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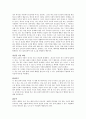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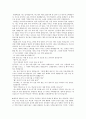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