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흄의 시대와 일생
-시대
-일생
2.흄의 전반적 사상
-회의주의와 자연주의자로서의 흄
3.흄의 자아 동일성 비판
-인상과 관념
-관념의 연합원리
-신념의 본성
4. 인격동일성(자아동일성)
5. 실제 사례에의 적용 - 영화 ‘메멘토’
6. 도덕 교육에의 적용
-시대
-일생
2.흄의 전반적 사상
-회의주의와 자연주의자로서의 흄
3.흄의 자아 동일성 비판
-인상과 관념
-관념의 연합원리
-신념의 본성
4. 인격동일성(자아동일성)
5. 실제 사례에의 적용 - 영화 ‘메멘토’
6. 도덕 교육에의 적용
본문내용
에의 적용
학교 다닐 때, 도덕이나 윤리, 참으로 식상하고 짜증나고 납득가지 않는 과목이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덕목들을 1,2,3,4로 나눠서 정답을 고르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은 고등학교쯤 되어서였고, 그 과목의 선생님들은 기억조자 나지 않는 몰개성의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말하자면, 윤리나 도덕은 철학이 그 근간일진대, 내가 배웠던 도덕이나 윤리 선생님들에게는 철학의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고, 고리타분한 논어만 주구장창 외운 사람같이 느껴졌던 것이 그때의 이미지이다. 물론, 공자의 논어는 그리 고리타분하지도 않고, 논어만 잘 공부해도 사람 사는 데 별 문제는 없을 정도로 훌륭한 책이라는 것은 대학이나 가서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도덕교육에는 파시즘이 있다. 현행교과서는 학생들을 단지 노예를 기르기 위한 도덕교육으로 치닫고 있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도덕, 타인의 불의에 대한 침묵,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에게 예절을 강요한다면, 사회적 강자의 폭력과 횡포에 대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할 지 말해주지 않는 도덕교육에 대해서 비판하고 도덕적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타율적 도덕교육, 사람들 사이의 비협력자를 가려내어 제재하는 일이 국가의 가장 큰 기능중의 하나라고 가르치는 국가주의로서의 도덕교육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도덕책을 읽어오면서 윤리책을 읽어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도덕 윤리 교과서의 이런 부분을 대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오면서 한 번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할만큼 세뇌당해 있었던 것이다.
흄의 이론은 이런 도덕교육의 현실 속에서 신념을 매우 강조한다. 신념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신념은 교육에 의해 생길 수 있으며, 또한 관념들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흄은 신념을, 그것들의 영향력이 갖는 우월성에 관한 나의 느낌을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우리 본성의 인지적 작용 보다는 감성적 부분의 작용이 크다고 한다. 원인들과 결과들에 관한 우리의 모든 추론들은 단지 습관에서 유래하며 (경험이 수없이 반복), 흄은 종종 습관은 인간의 삶에서 지배적일 뿐만 아니라 지배적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어떤 근본적인 습관적 신념들이 있다는 주장이다. 지속적이고 독립된 물체들의 존재에 대한 신념과, 존재하기 시작하는 모든 것은 원인을 가진다는 신념이 그것이다. 따라서 도덕교육이 문제가 있다면 도덕 교육을 펼치는 우리는 경험적 신념을 쌓아 가치관의 정립을 해야한다.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혼돈밖에 남지 않는다. 손쉽게 남들이 정의해주는 논리에 따라가는 정신적 노예이길 자청하는 것도 쉽게 사는 법의 하나이겠지만, 한 번 사는 인생에 대해서 왜 그런지 스스로에게조차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학생은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자식은 어떻게 키우고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학교 다닐 때, 도덕이나 윤리, 참으로 식상하고 짜증나고 납득가지 않는 과목이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덕목들을 1,2,3,4로 나눠서 정답을 고르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은 고등학교쯤 되어서였고, 그 과목의 선생님들은 기억조자 나지 않는 몰개성의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말하자면, 윤리나 도덕은 철학이 그 근간일진대, 내가 배웠던 도덕이나 윤리 선생님들에게는 철학의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고, 고리타분한 논어만 주구장창 외운 사람같이 느껴졌던 것이 그때의 이미지이다. 물론, 공자의 논어는 그리 고리타분하지도 않고, 논어만 잘 공부해도 사람 사는 데 별 문제는 없을 정도로 훌륭한 책이라는 것은 대학이나 가서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도덕교육에는 파시즘이 있다. 현행교과서는 학생들을 단지 노예를 기르기 위한 도덕교육으로 치닫고 있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도덕, 타인의 불의에 대한 침묵,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에게 예절을 강요한다면, 사회적 강자의 폭력과 횡포에 대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할 지 말해주지 않는 도덕교육에 대해서 비판하고 도덕적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타율적 도덕교육, 사람들 사이의 비협력자를 가려내어 제재하는 일이 국가의 가장 큰 기능중의 하나라고 가르치는 국가주의로서의 도덕교육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도덕책을 읽어오면서 윤리책을 읽어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도덕 윤리 교과서의 이런 부분을 대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오면서 한 번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할만큼 세뇌당해 있었던 것이다.
흄의 이론은 이런 도덕교육의 현실 속에서 신념을 매우 강조한다. 신념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신념은 교육에 의해 생길 수 있으며, 또한 관념들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흄은 신념을, 그것들의 영향력이 갖는 우월성에 관한 나의 느낌을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우리 본성의 인지적 작용 보다는 감성적 부분의 작용이 크다고 한다. 원인들과 결과들에 관한 우리의 모든 추론들은 단지 습관에서 유래하며 (경험이 수없이 반복), 흄은 종종 습관은 인간의 삶에서 지배적일 뿐만 아니라 지배적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어떤 근본적인 습관적 신념들이 있다는 주장이다. 지속적이고 독립된 물체들의 존재에 대한 신념과, 존재하기 시작하는 모든 것은 원인을 가진다는 신념이 그것이다. 따라서 도덕교육이 문제가 있다면 도덕 교육을 펼치는 우리는 경험적 신념을 쌓아 가치관의 정립을 해야한다.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혼돈밖에 남지 않는다. 손쉽게 남들이 정의해주는 논리에 따라가는 정신적 노예이길 자청하는 것도 쉽게 사는 법의 하나이겠지만, 한 번 사는 인생에 대해서 왜 그런지 스스로에게조차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학생은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자식은 어떻게 키우고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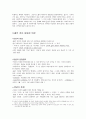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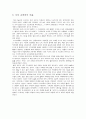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