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탐구한다면 知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性은 인간과 사물에 모두 내재한 일종의 공통적인 본질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에 비해 양명학에서의 心은 인간의 마음으로, 性에서 본질적인 측면과 사물을 모두 배제한 순수한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천인합일’이란 무엇인가? 개괄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는 유가의 인식 틀로 일종의 목적론으로 시작하였다. 선진유학의 기준에서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인간은 본디, ‘초인간적인 天’과 동일한 본성(性)을 지니고 있었다.(天命之謂性, 천명은 곧 성을 일컫는다, 개체(적 본질)는 만물 작용 본질을 내재한다 : 맹자) 하지만 인간은 자라며 필연적으로 천인이 분리되는데, 이는 자신의 ‘감각 기관’을 중심으로 ‘육체’에 대해 파악하며 자연스레 남과 나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다시금 天으로 합일되어야 한다(목적). 이에 맹자는 大人者 不失其赤子之心者(「중용」), 즉 대인(완성된 이)은 갓난 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 즉 천인합일된 이라 이야기하였다. 이는 곧, 성선설이다. 또한 유학은 천인이 분리된 상황을 곧 ‘천지 질서의 혼란’이라고 보았으며, 합일의 과정을 ‘정치, 도덕 상의 질서에 대한 복종’이라 보았다.
그렇다면 ‘천인합일’이란 무엇인가? 개괄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는 유가의 인식 틀로 일종의 목적론으로 시작하였다. 선진유학의 기준에서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인간은 본디, ‘초인간적인 天’과 동일한 본성(性)을 지니고 있었다.(天命之謂性, 천명은 곧 성을 일컫는다, 개체(적 본질)는 만물 작용 본질을 내재한다 : 맹자) 하지만 인간은 자라며 필연적으로 천인이 분리되는데, 이는 자신의 ‘감각 기관’을 중심으로 ‘육체’에 대해 파악하며 자연스레 남과 나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다시금 天으로 합일되어야 한다(목적). 이에 맹자는 大人者 不失其赤子之心者(「중용」), 즉 대인(완성된 이)은 갓난 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 즉 천인합일된 이라 이야기하였다. 이는 곧, 성선설이다. 또한 유학은 천인이 분리된 상황을 곧 ‘천지 질서의 혼란’이라고 보았으며, 합일의 과정을 ‘정치, 도덕 상의 질서에 대한 복종’이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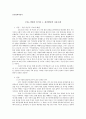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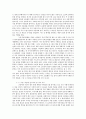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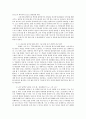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