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는 주인공의 좌절이나 패배가 없다. 아무리 모자라고 저능한 인물이라 해도 그는 끝내 성공하고 만다. 민담 줄거리의 이러한 전개는 민담이 인간의 능력에 대해 긍정하면서 그러한 가능성을 무한히 펼쳐 보이려는 관심의 소산임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민담은 인간의 능력을 긍정하며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등장 인물이 성취하는 결말은 인간이 지닌 욕구의 무제한적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민담은 하층민을 등장시켜 삶의 성취 과정을 그리되, 성취된 결말은 거의가 기대 이상의 상황, 곧 행복한 결말과 의외의 행운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는 민중의 무의식적 소망의 자유로운 실현이라는 의미를 띠는 것임을 뜻한다. 민담 속의 보상이나 행운은 경험을 통한 합리성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며 잠재된 욕구의 일방적인 투사일 뿐이다. 그 때문에 민담에서의 행운은 다다익선의 원리에 따르며, 그래서 크고 많을수록 좋은데 이렇게 볼 때 사회적 억압으로 누적된 불만을 지배계층의 몰락을 통해 그리고 잠재된 욕구의 자유로운 성취를 통해 민중들의 사유세계를 자유로이 펼쳐 보이고 있는 점이 민담이 지향하는 가치관이며, 이런 점에 대한 폭넓은 공감이 민담의 전승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 할 수 있다.
붙임) 쌀 나오는 구멍
충청도 어느 산에 미암사라는 절이 있다고 합니다.
절 뒤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멀리서 보면 쌀이 박혀있는 것처럼 희끗희끗하여서 쌀바위절이라는 뜻으로 미암사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바위에 있는것은 쌀이 아니라 차돌이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 바위 아래에 굴이 하나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좀 넓은 데가 나오고 더 들어가면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는 조그마한 구멍이 있다고합니다.
옛날에 이 굴속에서 노승이 수도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미암사의 주지 스님이었는데, 조용히 수도하기 위하여 바위에 굴을 파고 들어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체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굴 안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에서 노승 혼자 먹고 살 만큼 쌀이 매일 나왔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먹고 살았는데, 하루는 노승이 잘 아는 한 신도가 굴 속에 들어와서 굳이 거기에서 불공을 드리겠다고 고집하였습니다. 이제 밥을 먹을때가 되었습니다. 구멍에서 나오는 쌀은 노승 한 사람만 먹을 양이므로 불공드리러 온 사람에게는 줄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을 만큼만 나오지 보통 우리가 먹듯이 세 끼 먹을 쌀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수도하는 사람은 되도록 적게 먹고 때로는 얼마 동안 전혀 먹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는 배가 몹시 고픈 모양입니다. 그래서 쌀이 좀더 나오기를 바라서 나무 막대로 쌀 나오는 구멍을 쑤셔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치 쌀이 나오더니 계속 막대를 넣어대니 이번에는 물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먼저 나온 쌀도 먹을 수가 없었고, 그보다도 먹을 식량이 없어졌으므로 노승은 더 이상 수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옛날에 쌀이 나오던 구멍은 그대로 있지만 물이 조금 나올 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절에 대단히 많습니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지요. 우리 모두 욕심을 부리지 맙시다.
* 참고문헉
김의숙 이창식, 구비문학이란 무엇인가, 푸른사상, 2004
홍태한, 인물전설의 현실인식, 민속원, 2000
브라디미르 프롭, 민담형태론, 예림기획, 1998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원, 1980
김열규, 민담학개론, 일조가, 1982
이러한 등장 인물이 성취하는 결말은 인간이 지닌 욕구의 무제한적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민담은 하층민을 등장시켜 삶의 성취 과정을 그리되, 성취된 결말은 거의가 기대 이상의 상황, 곧 행복한 결말과 의외의 행운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는 민중의 무의식적 소망의 자유로운 실현이라는 의미를 띠는 것임을 뜻한다. 민담 속의 보상이나 행운은 경험을 통한 합리성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며 잠재된 욕구의 일방적인 투사일 뿐이다. 그 때문에 민담에서의 행운은 다다익선의 원리에 따르며, 그래서 크고 많을수록 좋은데 이렇게 볼 때 사회적 억압으로 누적된 불만을 지배계층의 몰락을 통해 그리고 잠재된 욕구의 자유로운 성취를 통해 민중들의 사유세계를 자유로이 펼쳐 보이고 있는 점이 민담이 지향하는 가치관이며, 이런 점에 대한 폭넓은 공감이 민담의 전승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 할 수 있다.
붙임) 쌀 나오는 구멍
충청도 어느 산에 미암사라는 절이 있다고 합니다.
절 뒤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멀리서 보면 쌀이 박혀있는 것처럼 희끗희끗하여서 쌀바위절이라는 뜻으로 미암사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바위에 있는것은 쌀이 아니라 차돌이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 바위 아래에 굴이 하나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좀 넓은 데가 나오고 더 들어가면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는 조그마한 구멍이 있다고합니다.
옛날에 이 굴속에서 노승이 수도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미암사의 주지 스님이었는데, 조용히 수도하기 위하여 바위에 굴을 파고 들어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체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굴 안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에서 노승 혼자 먹고 살 만큼 쌀이 매일 나왔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먹고 살았는데, 하루는 노승이 잘 아는 한 신도가 굴 속에 들어와서 굳이 거기에서 불공을 드리겠다고 고집하였습니다. 이제 밥을 먹을때가 되었습니다. 구멍에서 나오는 쌀은 노승 한 사람만 먹을 양이므로 불공드리러 온 사람에게는 줄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을 만큼만 나오지 보통 우리가 먹듯이 세 끼 먹을 쌀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수도하는 사람은 되도록 적게 먹고 때로는 얼마 동안 전혀 먹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는 배가 몹시 고픈 모양입니다. 그래서 쌀이 좀더 나오기를 바라서 나무 막대로 쌀 나오는 구멍을 쑤셔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치 쌀이 나오더니 계속 막대를 넣어대니 이번에는 물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먼저 나온 쌀도 먹을 수가 없었고, 그보다도 먹을 식량이 없어졌으므로 노승은 더 이상 수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옛날에 쌀이 나오던 구멍은 그대로 있지만 물이 조금 나올 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절에 대단히 많습니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지요. 우리 모두 욕심을 부리지 맙시다.
* 참고문헉
김의숙 이창식, 구비문학이란 무엇인가, 푸른사상, 2004
홍태한, 인물전설의 현실인식, 민속원, 2000
브라디미르 프롭, 민담형태론, 예림기획, 1998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원, 1980
김열규, 민담학개론, 일조가,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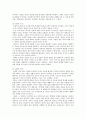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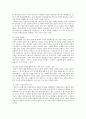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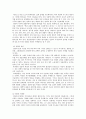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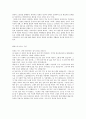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