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 차원을 넘어서게 되었는데 그 좋은 예가 심성론 특히 사단칠정론이다. 퇴계는 기대승과의 4단7정론을 통하여 이기론의 이론을 심성 개념의 분석과 해명에 적용하여 한국 유학의 중요한 특징인 심성론(인성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퇴계의 사상으로 인하여 한국 성리학은 강한 독자성을 지니고 발전하게 된다.
⑶ 수양론
《시경(詩經)》《서경(書經)》《중용(中庸)》《대학(大學)》에 나타나는 천도(天道)를 외경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수양론의 연원이다. 공자는 군자(君子)가 되는 것을 수양의 목표로 보았다. 그리고 수양의 요체로 경(敬)을 제시하였다. 곧, 경으로써 자신을 수양하고 나아가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함으로써 수양이 완성된다고 보았다.
맹자의 수양론은 성선설(性善說)에 입각한 것이다. 즉 수양의 목표는 사단(四端)을 통한 사덕(四德)의 회복에 있다고 주장하고, 구체적 방법은 진심(盡心:내적 성찰)이라 했다. 인간은 진심을 통해 자신에게 있던 보편적 인간 본성을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맹자의 수양론은 송(宋)나라 때 주자(朱子)에 의해 더욱 체계화되었다. 주자학의 학문과 수양의 중요한 방법론인 격물치지(格物致知)는 사물이나 현상 속에 내재한 이치를 탐구하여 나의 지식을 완전히 이룬다는 뜻이다. 격물치지는 《대학》의 8조목 중 치지(致知)는 격물(格物)에 있다는 말에서 나왔다. 《근사록》에 의하면 주자는 거경궁리(居敬窮理)성의정심(誠意正心)하여 수양함으로써 인욕 물욕 등 사욕(私慾)을 통해 드러나는 현실적 악(惡)의 상태로부터 본래의 완전함으로 되돌아간다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이황(李滉)이 공의(公義)와 사리(私利)를 선과 악의 판단 준거로 삼고 주자와 같이 거경궁리함을 수양의 요체로 삼았다. 또 이이(李珥)의 수양론은 내적으로는 존심궁리(存心窮理)를, 외적으로는 수기치지(修己致知)하여, 수양을 통해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양론의 윤리적 의의는 지나친 욕망을 조절하고 중용(中庸)의 상태에 이르러 인간 기질을 변화시키고 본래의 자기 모습을 회복하는 데 있다. 즉 완성된 인격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도덕 사회를 이룩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
이황 - 퇴계의 학문정신은 이론적 정밀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완성을 추구하는 수양론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심성을 살아 움직이는 현실 속에서 이해한다는데 중요한 특징이 있다. 퇴계의 수양론은 심(心)과 경(敬)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은 수양이 이루어지는 바탕이요, 경은 수양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퇴계의 학문적 관심은 항상 인간의 도덕적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수양론으로 귀결되고 있으므로 이 \'경\'이야말로 퇴계 사상의 핵심이며, 퇴계가 존경받는 이유도 이러한 경의 태도를 한 평생 몸소 실천한 인격자이기 때문이다.
문인 정유일은 퇴계의 이러한 학문과 사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선생의 학문은 오로지 정주를 표준으로 한다. 경과 의가 같이 지탱하고(경의협지, 敬義夾持), 지와 행이 함께 나아가며(지행병진, 知行幷進), 밖과 안이 한결 같고(표리여일, 表裏如一), 본과 말을 함께 하며(본말병거, 本末幷擧), 대원을 뚫어보고 대본을 심어 세운다(식립대본 植立大本), 그 이른 경지를 논한다면 우리 동방에는 오직 그 한 분 뿐이다.
7. 주요 저서
⑴ 천명도설, 천명도설후서(1553)
정지운의 저술인 천명도와 천명도설을 정지운과 토론하면서 수정한 것이다. 이 도와 도설에 따라 고봉 기대승과 8년간에 걸친 왕복 편지를 통해 한국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적 토론인 4단칠정논변(1559~1566)을 전개하게 되었다.
⑵ 주자서절요(1556)
주자대전에서 41권에 달하는 편지 가운데 학문과 생활에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14권 7책으로 편찬한 것으로, 그는 이 주자의 편지에서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도학의 학문세계와 학문 방법을 드러내고 있다.
⑶ 자성록(1558)
퇴계 자신이 제자와 후학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22편을 골라 수록한 것으로 항상 곁에 두고 사색과 성찰의 자료로 삼았던 것이다. 편지를 통하여 진리탐구와 인격수양의 방법을 찾았던 것인데 후에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⑷ 전습록논변(1566)
왕양명의 전습록에 대해 심즉리설, 지행합일설 등 기본 문제를 분석하여 비판한 것으로, 도학의 정통입장을 논리적으로 확인시키고 있다.
⑸ 무진육조소(1568)
선조 임금에게 올린 상소로서 도학의 통치원리와 방법을 현실문제에서 제시한 것이다.
⑹ 성학십도(1568)
퇴계가 68세의 만년에 선조 임금에게 바쳤던 것으로, 그의 원숙한 철학정신이 응집한 것이다. 이 저술의 첫머리에서 그는\"도를 깨달아 성인이 되는 요령과 근본을 바로잡아 나라를 경륜하는 근원이 모두 여기에 갖추어져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10개의 도와 도설로 이루어져 있다.
8. 일화
그가 도산서원에 있을 때 어느 행인이 말을 타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시중을 들던 제자들과 하인들이 지나가는 이의 무례함을 지적했다. \'선생님, 저 사람 행동이 지나칩니다. 선생님 앞을 지나면서도 말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황은 \'내버려 두어라, 말 탄 사람이 그림속의 사람처럼 좋은 경치를 더해 주는데 무슨 허물이냐?\'라며 하인과 제자들에게 자신을 못알아보는 행인을 내버려 두라고 지시한다.
이문형, 윤두수, 윤근수 등을 탄핵했던 훈구파 권신 이감은 경상도관찰사로 있을 때 그를 찾아 문안인사를 드렸다 한다.
9. 조선의 영원한 스승
이황(李滉)은 인간 심성론에 대한 연구와 강학을 통해 조선 성리학(性理學)의 수준을 격상시킨 학자로 평가받는다. 기대승(奇大升)과의 논쟁은 조선 전역으로 파급되어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며, 향약 제정과 서원 건립은 성리학적 정치관이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의 인품과 처세 또한 동시기 여러 지식인들의 존경을 받았고 후세 학자들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었다. 또한 그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남인(南人)은 조선 후기 정치의 큰 축으로 활동하였다.
한민석교육학, 한민석, 2014.07.03
한국사 콘텐츠, 이민정,
참고자료
⑶ 수양론
《시경(詩經)》《서경(書經)》《중용(中庸)》《대학(大學)》에 나타나는 천도(天道)를 외경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수양론의 연원이다. 공자는 군자(君子)가 되는 것을 수양의 목표로 보았다. 그리고 수양의 요체로 경(敬)을 제시하였다. 곧, 경으로써 자신을 수양하고 나아가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함으로써 수양이 완성된다고 보았다.
맹자의 수양론은 성선설(性善說)에 입각한 것이다. 즉 수양의 목표는 사단(四端)을 통한 사덕(四德)의 회복에 있다고 주장하고, 구체적 방법은 진심(盡心:내적 성찰)이라 했다. 인간은 진심을 통해 자신에게 있던 보편적 인간 본성을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맹자의 수양론은 송(宋)나라 때 주자(朱子)에 의해 더욱 체계화되었다. 주자학의 학문과 수양의 중요한 방법론인 격물치지(格物致知)는 사물이나 현상 속에 내재한 이치를 탐구하여 나의 지식을 완전히 이룬다는 뜻이다. 격물치지는 《대학》의 8조목 중 치지(致知)는 격물(格物)에 있다는 말에서 나왔다. 《근사록》에 의하면 주자는 거경궁리(居敬窮理)성의정심(誠意正心)하여 수양함으로써 인욕 물욕 등 사욕(私慾)을 통해 드러나는 현실적 악(惡)의 상태로부터 본래의 완전함으로 되돌아간다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이황(李滉)이 공의(公義)와 사리(私利)를 선과 악의 판단 준거로 삼고 주자와 같이 거경궁리함을 수양의 요체로 삼았다. 또 이이(李珥)의 수양론은 내적으로는 존심궁리(存心窮理)를, 외적으로는 수기치지(修己致知)하여, 수양을 통해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양론의 윤리적 의의는 지나친 욕망을 조절하고 중용(中庸)의 상태에 이르러 인간 기질을 변화시키고 본래의 자기 모습을 회복하는 데 있다. 즉 완성된 인격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도덕 사회를 이룩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
이황 - 퇴계의 학문정신은 이론적 정밀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완성을 추구하는 수양론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심성을 살아 움직이는 현실 속에서 이해한다는데 중요한 특징이 있다. 퇴계의 수양론은 심(心)과 경(敬)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은 수양이 이루어지는 바탕이요, 경은 수양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퇴계의 학문적 관심은 항상 인간의 도덕적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수양론으로 귀결되고 있으므로 이 \'경\'이야말로 퇴계 사상의 핵심이며, 퇴계가 존경받는 이유도 이러한 경의 태도를 한 평생 몸소 실천한 인격자이기 때문이다.
문인 정유일은 퇴계의 이러한 학문과 사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선생의 학문은 오로지 정주를 표준으로 한다. 경과 의가 같이 지탱하고(경의협지, 敬義夾持), 지와 행이 함께 나아가며(지행병진, 知行幷進), 밖과 안이 한결 같고(표리여일, 表裏如一), 본과 말을 함께 하며(본말병거, 本末幷擧), 대원을 뚫어보고 대본을 심어 세운다(식립대본 植立大本), 그 이른 경지를 논한다면 우리 동방에는 오직 그 한 분 뿐이다.
7. 주요 저서
⑴ 천명도설, 천명도설후서(1553)
정지운의 저술인 천명도와 천명도설을 정지운과 토론하면서 수정한 것이다. 이 도와 도설에 따라 고봉 기대승과 8년간에 걸친 왕복 편지를 통해 한국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적 토론인 4단칠정논변(1559~1566)을 전개하게 되었다.
⑵ 주자서절요(1556)
주자대전에서 41권에 달하는 편지 가운데 학문과 생활에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14권 7책으로 편찬한 것으로, 그는 이 주자의 편지에서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도학의 학문세계와 학문 방법을 드러내고 있다.
⑶ 자성록(1558)
퇴계 자신이 제자와 후학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22편을 골라 수록한 것으로 항상 곁에 두고 사색과 성찰의 자료로 삼았던 것이다. 편지를 통하여 진리탐구와 인격수양의 방법을 찾았던 것인데 후에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⑷ 전습록논변(1566)
왕양명의 전습록에 대해 심즉리설, 지행합일설 등 기본 문제를 분석하여 비판한 것으로, 도학의 정통입장을 논리적으로 확인시키고 있다.
⑸ 무진육조소(1568)
선조 임금에게 올린 상소로서 도학의 통치원리와 방법을 현실문제에서 제시한 것이다.
⑹ 성학십도(1568)
퇴계가 68세의 만년에 선조 임금에게 바쳤던 것으로, 그의 원숙한 철학정신이 응집한 것이다. 이 저술의 첫머리에서 그는\"도를 깨달아 성인이 되는 요령과 근본을 바로잡아 나라를 경륜하는 근원이 모두 여기에 갖추어져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10개의 도와 도설로 이루어져 있다.
8. 일화
그가 도산서원에 있을 때 어느 행인이 말을 타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시중을 들던 제자들과 하인들이 지나가는 이의 무례함을 지적했다. \'선생님, 저 사람 행동이 지나칩니다. 선생님 앞을 지나면서도 말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황은 \'내버려 두어라, 말 탄 사람이 그림속의 사람처럼 좋은 경치를 더해 주는데 무슨 허물이냐?\'라며 하인과 제자들에게 자신을 못알아보는 행인을 내버려 두라고 지시한다.
이문형, 윤두수, 윤근수 등을 탄핵했던 훈구파 권신 이감은 경상도관찰사로 있을 때 그를 찾아 문안인사를 드렸다 한다.
9. 조선의 영원한 스승
이황(李滉)은 인간 심성론에 대한 연구와 강학을 통해 조선 성리학(性理學)의 수준을 격상시킨 학자로 평가받는다. 기대승(奇大升)과의 논쟁은 조선 전역으로 파급되어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며, 향약 제정과 서원 건립은 성리학적 정치관이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의 인품과 처세 또한 동시기 여러 지식인들의 존경을 받았고 후세 학자들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었다. 또한 그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남인(南人)은 조선 후기 정치의 큰 축으로 활동하였다.
한민석교육학, 한민석, 2014.07.03
한국사 콘텐츠, 이민정,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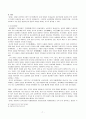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