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나눌 수 있고, 발생의 선후와 세력의 우열에 따라 선생두레와 제자두레, 또는 형두레와 아우두레가 있으며 세대별로는 청년두레, 장년두레, 노인두레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악의 유무에 따라 농악 있는 두레와 농악 없는 두레가 있었다. 전통적인 공동노동 조직으로는 두레 외에도 \'품앗이\'가 있으나, 품앗이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소규모의 노동력 상호교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반하여 두레는 한 마을의 성년 남자 전원이 거의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했다. 두레에 가입하려는 남자는 자기의 힘을 마을 사람들에게 시험해 보여서 그들의 찬동을 얻어야 했다. 이러한 신참례(新參禮)는 지방에 따라 진새, 팔례, 공배, 주먹다드미, 돌창례, 바구리, 나다리 등으로 불렀는데, 여기에서 고대부터 있어 온 성년식의 유풍을 찾을 수도 있다.
두레에 의한 공동 노동은 모내기, 물 내기, 김매기, 벼 베기, 타작 등 경작 전 과정에 걸친 것이고, 특히 일시적으로 많은 품이 요구되는 모내기와 김매기에는 거의 반드시 두레가 동원되었다. 1970년대 중반 강원도 횡성군에서 조사된 두레는 그 조직이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모내기를 1주일 정도 앞두고 두레를 짜게 된다. 그것을 \"못날 받으러 간다. \"고 하며, \'모 공론\', \'질공론\', \'일공론\'이라고도 하였다. 두레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에 농악이 있다. 농악 있는 두레는 작업을 하러 갈 때에 농기를 앞세우고 장구, 정과리, 북 등을 풍물 잡이들이 치며 간다. 김맬 때에는 장구 잡이 혼자만 소리를 하면서 풍물을 잡는다.
농악의 \'선왕긋\'은 서남제 의식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제의(聚慶)와 노동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이다. 농악은 노동의 고통을 경감시켜 더욱 힘을 내게 하고, 협동심을 북돋우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 참고문헌
자원봉사 여가 및 취미생활 - 한국생애설계협회 저,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자원봉사관리론 - 최유미 저, 공동체, 201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자원봉사 여가 및 취미생활 - 한국생애설계협회 저, 2016
두레에 의한 공동 노동은 모내기, 물 내기, 김매기, 벼 베기, 타작 등 경작 전 과정에 걸친 것이고, 특히 일시적으로 많은 품이 요구되는 모내기와 김매기에는 거의 반드시 두레가 동원되었다. 1970년대 중반 강원도 횡성군에서 조사된 두레는 그 조직이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모내기를 1주일 정도 앞두고 두레를 짜게 된다. 그것을 \"못날 받으러 간다. \"고 하며, \'모 공론\', \'질공론\', \'일공론\'이라고도 하였다. 두레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에 농악이 있다. 농악 있는 두레는 작업을 하러 갈 때에 농기를 앞세우고 장구, 정과리, 북 등을 풍물 잡이들이 치며 간다. 김맬 때에는 장구 잡이 혼자만 소리를 하면서 풍물을 잡는다.
농악의 \'선왕긋\'은 서남제 의식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제의(聚慶)와 노동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이다. 농악은 노동의 고통을 경감시켜 더욱 힘을 내게 하고, 협동심을 북돋우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 참고문헌
자원봉사 여가 및 취미생활 - 한국생애설계협회 저,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자원봉사관리론 - 최유미 저, 공동체, 201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자원봉사 여가 및 취미생활 - 한국생애설계협회 저,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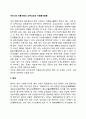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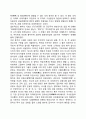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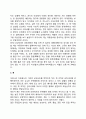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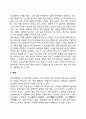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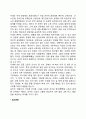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