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나의 가족 이야기
2) 보완해야 할 내용
3. 결론
- 참고 문헌 -
2. 본론
1) 나의 가족 이야기
2) 보완해야 할 내용
3.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고, 친부모 중 한 명이 죽고 양부, 양모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살아가다가 늦게 깨닫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성인이 되어서 깨달았다면 이는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과 자신의 삶에서 그들의 존재에 대한 배신감을 느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우선 구체적으로 바라보자면,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의 부모, 즉 이혼한 부모를 각자 만나게 되었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이 있을 것이다. 한 명은 같이 살고 있는 부모, 다른 한 명은 따로 살고 있는 부모라고 볼 수 있다. 이들과의 만남이 적지는 않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을 건내고, 그런 삶을 살게 된 선택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고 이는 부모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상처가 되는 말보다는 부드럽게 접근하고 나 또한 성인이 되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표현을 가르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법처럼 이를 지원하는 정신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오로지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정을 짓기에는 많은 요소가 존재한다. 오늘날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가족 내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는 자녀가 어리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부모님의 이혼 소식은 상당히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늦게 깨달았다고 해도 그 속에 생기는 감정은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법이기도 하다.
나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지원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에 대해 감사하면서 대학교 생활을 마치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서서히 소극적인 마음도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행동을 유동적으로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지만, 모든 것이 시간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기도 한다. 부모님의 삶에 의해 내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지원에서 어느 정도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나는 판단한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물질적 지원 외에 그들이 정신적으로 나에게 준 충격에 대해서는 조금은 안타깝다고 여겨진다.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과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복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지만 현재의 사회에서 이들 외에도 사회적 약자, 혹은 주위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이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자녀가 성인이 된다고 해서 제외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된다. 여러 내용들이나 기사들을 보았을 때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행사들은 존재하고 있지만, 성인들을 위한 행사는 없다. 이에 대한 복지 시스템이나 여러 행사 없다는 것에서 성인이 되어서 이혼하게 된 자녀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쉽게 털어놓기도 어렵고 그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청소년들보다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물론 성인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이혼가정이 나의 가정처럼 평탄하고 오히려 유대감이 끈끈해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가정 내의 불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이는 자녀가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된다고 해도 변화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본다. 성인이라면 성인에 맡게 조금 더 수준이 높은 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 나에게는 조금 상처가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를 알아냈지만, 이를 쉽게 타인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며, 타인들이 들었을 때 드는 생각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편협된 사고 방식을 지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혼을 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언제나 변수가 있는 것처럼 모든 성인들이 이를 좋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후에 내가 살게 되면서 나보다 연배가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 쉽게 꺼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처법이나 여러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은 성인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위와 같은 다양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3. 결론
끝으로 이혼가정에 대해서 나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주변의 도움만큼이나 가정 내의 노력과 생각이 있다면 스스로 극복이 가능한 문제라고 본다. 물론 이러한 환경이 되지 않는 경우, 가정의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경우에는 결국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통틀어서 보았을 때,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며, 어떻게 보면 도움면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본다. 물론 40대, 50대의 경우에는 연륜이나 여러 문제에 있어서 자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찾을 수 있겠지만, 20대의 경우에는 대학교를 다니고 아직까지는 사회의 초년생이라고 불릴 정도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며, 그에 따르는 제도도 별도로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성인, 청소년, 아동을 떠나서 모두 다 사람이며, 그에 대한 고통이나 불안감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벗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
이혼가정 모-자간 의사소통에 대한 모래상자놀이 사례연구 = A case study of Sand Tray Therapy on Communication between Mother-Child dyad in Divorced Family 학위논문(석사) -정유진- 대구대학교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분석 = Analysis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hildren adaptation with parents\' divorce 학위논문(석사) - 진정민 -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우선 구체적으로 바라보자면,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의 부모, 즉 이혼한 부모를 각자 만나게 되었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이 있을 것이다. 한 명은 같이 살고 있는 부모, 다른 한 명은 따로 살고 있는 부모라고 볼 수 있다. 이들과의 만남이 적지는 않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을 건내고, 그런 삶을 살게 된 선택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고 이는 부모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상처가 되는 말보다는 부드럽게 접근하고 나 또한 성인이 되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표현을 가르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법처럼 이를 지원하는 정신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오로지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정을 짓기에는 많은 요소가 존재한다. 오늘날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가족 내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는 자녀가 어리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부모님의 이혼 소식은 상당히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늦게 깨달았다고 해도 그 속에 생기는 감정은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법이기도 하다.
나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지원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에 대해 감사하면서 대학교 생활을 마치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서서히 소극적인 마음도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행동을 유동적으로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지만, 모든 것이 시간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기도 한다. 부모님의 삶에 의해 내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지원에서 어느 정도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나는 판단한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물질적 지원 외에 그들이 정신적으로 나에게 준 충격에 대해서는 조금은 안타깝다고 여겨진다.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과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복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지만 현재의 사회에서 이들 외에도 사회적 약자, 혹은 주위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이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자녀가 성인이 된다고 해서 제외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된다. 여러 내용들이나 기사들을 보았을 때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행사들은 존재하고 있지만, 성인들을 위한 행사는 없다. 이에 대한 복지 시스템이나 여러 행사 없다는 것에서 성인이 되어서 이혼하게 된 자녀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쉽게 털어놓기도 어렵고 그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청소년들보다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물론 성인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이혼가정이 나의 가정처럼 평탄하고 오히려 유대감이 끈끈해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가정 내의 불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이는 자녀가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된다고 해도 변화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본다. 성인이라면 성인에 맡게 조금 더 수준이 높은 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 나에게는 조금 상처가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를 알아냈지만, 이를 쉽게 타인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며, 타인들이 들었을 때 드는 생각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편협된 사고 방식을 지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혼을 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언제나 변수가 있는 것처럼 모든 성인들이 이를 좋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후에 내가 살게 되면서 나보다 연배가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 쉽게 꺼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처법이나 여러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은 성인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위와 같은 다양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3. 결론
끝으로 이혼가정에 대해서 나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주변의 도움만큼이나 가정 내의 노력과 생각이 있다면 스스로 극복이 가능한 문제라고 본다. 물론 이러한 환경이 되지 않는 경우, 가정의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경우에는 결국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통틀어서 보았을 때,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며, 어떻게 보면 도움면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본다. 물론 40대, 50대의 경우에는 연륜이나 여러 문제에 있어서 자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찾을 수 있겠지만, 20대의 경우에는 대학교를 다니고 아직까지는 사회의 초년생이라고 불릴 정도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며, 그에 따르는 제도도 별도로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성인, 청소년, 아동을 떠나서 모두 다 사람이며, 그에 대한 고통이나 불안감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벗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
이혼가정 모-자간 의사소통에 대한 모래상자놀이 사례연구 = A case study of Sand Tray Therapy on Communication between Mother-Child dyad in Divorced Family 학위논문(석사) -정유진- 대구대학교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분석 = Analysis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hildren adaptation with parents\' divorce 학위논문(석사) - 진정민 -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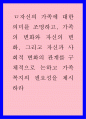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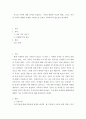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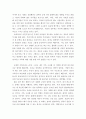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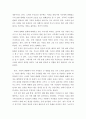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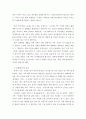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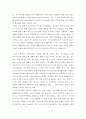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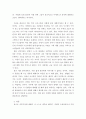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