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평균의 원칙
2. 개개인성 원칙
3. 변화
4. 결론
2. 개개인성 원칙
3. 변화
4. 결론
본문내용
이라고 한다.
책의 결론 부분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주제화되고 있는 기회균등을 설명하고 잇다. 저자는 평균의 시대에서 기회균등이란 평등한 접근권이라고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접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평균의 시대에 맞게 평등한 접근권은 개개인의 기회를 평균적으로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2018, 267) 이와 달리 개개인성의 원칙에 따르면 평등한 맞춤만이 평등한 기회의 밑거름이다.(2018, 268) 평균적인 교재, 표준화된 교육과정, 전체 집단의 평균과 비교하는 평가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색 있는 교재, 개인별 능력과 속도에 맞는 교육과정, 속도가 아니라 결과의 질에 따른 평가, 개인별 진도에 따른 학습 평가 등이 필요하다. 이처럼 평등한 맞춤 교육은 교육에서 자기조절이 가능한 여러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 책에서 논의된 평균주의 과학과 개개인의 과학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평균주의의 과학
개개인의 과학
개개인의 특성
오류, 계층
재능
활용 수리
정적인 통계학
역동적 값
주 연구 방법
종합 후 분석
분석 후 종합
특징
일차원적 사고, 본질주의적 사고, 규범적 사고
다차원적 사고, 맥락의 원칙, 경로의 원칙
종합 후 분석이란 다른 사람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유형으로 개개인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고, 분석 후 종합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평균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입시 결과이다. 평균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행동이 계속되면서 평균은 엄격한 기준이 되어 버렸다.
이 책에서 평균의 허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인 자격증, 실력 평가, 학생의 자율 선택 등이 과연 한국 사회가 가능할까?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 그렇지 않다. 학위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지 않는 현상은 우리 사회도 개개인성의 원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의심하는 기업들이 느는 것 같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방향이 더 많다. ‘지잡대’라는 신조어가 있다. 이제 법에 의해 학위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대학 강단에도 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학벌과 학위에 의해 사회적 지위가 고착화되어 있고, 표준화된 사회 구조가 적용되는 우리 사회에서 개개인성의 원칙은 요원하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일류대학에 입학했고, 어떻게 졸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학벌만이 중요하다.
책의 결론 부분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주제화되고 있는 기회균등을 설명하고 잇다. 저자는 평균의 시대에서 기회균등이란 평등한 접근권이라고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접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평균의 시대에 맞게 평등한 접근권은 개개인의 기회를 평균적으로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2018, 267) 이와 달리 개개인성의 원칙에 따르면 평등한 맞춤만이 평등한 기회의 밑거름이다.(2018, 268) 평균적인 교재, 표준화된 교육과정, 전체 집단의 평균과 비교하는 평가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색 있는 교재, 개인별 능력과 속도에 맞는 교육과정, 속도가 아니라 결과의 질에 따른 평가, 개인별 진도에 따른 학습 평가 등이 필요하다. 이처럼 평등한 맞춤 교육은 교육에서 자기조절이 가능한 여러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 책에서 논의된 평균주의 과학과 개개인의 과학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평균주의의 과학
개개인의 과학
개개인의 특성
오류, 계층
재능
활용 수리
정적인 통계학
역동적 값
주 연구 방법
종합 후 분석
분석 후 종합
특징
일차원적 사고, 본질주의적 사고, 규범적 사고
다차원적 사고, 맥락의 원칙, 경로의 원칙
종합 후 분석이란 다른 사람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유형으로 개개인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고, 분석 후 종합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평균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입시 결과이다. 평균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행동이 계속되면서 평균은 엄격한 기준이 되어 버렸다.
이 책에서 평균의 허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인 자격증, 실력 평가, 학생의 자율 선택 등이 과연 한국 사회가 가능할까?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 그렇지 않다. 학위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지 않는 현상은 우리 사회도 개개인성의 원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의심하는 기업들이 느는 것 같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방향이 더 많다. ‘지잡대’라는 신조어가 있다. 이제 법에 의해 학위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대학 강단에도 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학벌과 학위에 의해 사회적 지위가 고착화되어 있고, 표준화된 사회 구조가 적용되는 우리 사회에서 개개인성의 원칙은 요원하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일류대학에 입학했고, 어떻게 졸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학벌만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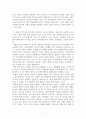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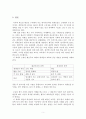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