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정지상은 누구인가?
1) 정지상 작가 소개
2) 정지상의 작품
2. ′정지상<송인>′
1) 소개 및 핵심정리
2) 작품해석
3) 내가 해석하는 ′정지상<송인>′
4) 내가 바꾼 ′정지상<송인>′
3. ′정지상<제변산소래사>′
1) 소개 및 핵심정리
2) 작품해석
3) 내가 해석하는 ′정지상<제변산소래사>′
4) 내가 바꾼 ′정지상<제변산소래사>′
Ⅲ. 결론
Ⅱ. 본론
1.정지상은 누구인가?
1) 정지상 작가 소개
2) 정지상의 작품
2. ′정지상<송인>′
1) 소개 및 핵심정리
2) 작품해석
3) 내가 해석하는 ′정지상<송인>′
4) 내가 바꾼 ′정지상<송인>′
3. ′정지상<제변산소래사>′
1) 소개 및 핵심정리
2) 작품해석
3) 내가 해석하는 ′정지상<제변산소래사>′
4) 내가 바꾼 ′정지상<제변산소래사>′
Ⅲ. 결론
본문내용
나타내고, 4연에서는 속세를 떠도는 나그네와 대조 하였다. 5,6연에서는 석양과 산에 뜬 달 등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잔나비소리를 통해 청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산사의 고요하고 아늑한 맑고 깨끗한(탈속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속세에서 벗어나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변산반도에 있는 내소사에 도착해 그곳에서 이 시를 지어 제목이 제변산소래사이다.
3) 내가 해석하는정지상<제변산소래사>′
정지상<제변산소래사>에서는 화자가 속세에 얽히고 싶지 않아서 속세와 단절하고 산으로 가려는 듯하다. 즉, 속세에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정지상<제변산소래사>‘를 ’옛날에 살던 곳은 시끄러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매우 멀다.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화자는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사에 맑고 깨끗함을 느끼고 있다. 내소사에 있는 스님은 자연사에만 있어서 인간사의 시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해석하였다.
4) 내가 해석하는정지상<제변산소래사>′
옛 길은 적막한 채 솔뿌리는 얽혀 있고, → 탄핵안 가결은 적막한 채 청와대는 얽혀 있고,
하늘이 가까워 북두칠성을 만질 듯하구나. → 그녀는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이 드는구나.
뜬 구름과 흐르는 물인 양 나그네 절 찾으니, → 뜬 구름과 흐르는 물인 양 하루하루 지내니
붉은 잎 푸른 이끼 속에 스님은 문 닫네. → 붉은 촛불 하야 속에 그녀는 문을 닫네.
가을바람 솔솔 석양 속에 불고 가니, → 겨울바람 춥고 촛불은 더욱 붉어 가니,
산에 뜬 달 훤해지자 잔나비 소리 맑구나. → 그녀의 웃음은 울음으로 바뀌었구나.
기특하도다, 긴 눈썹의 늙은 스님은 → 기특하도다, 매 주 하야를 외치는 시민들은
한평생 인간사의 시끄러움은 꿈도 꾸지 않고 있네. → 그녀가 스스로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네.
이렇게 나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으로 시를 바꾸어 보았다. 정지상은 속세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그녀는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녀도 정지상처럼 속세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정지상<제변산소래사>’를 나만의 방식으로 바꾸어 보았다. 제목도 바꾸자면 정지상이 변산반도에 있는 내소사에서 이 시를 읊어 제목이 제변산소래사 이니까 나는 촛불시위를 벌이는 장소인 광화문광장으로 바꿀 것이다.
Ⅲ. 결론
정지상 작가를 소개하고 그의 작품인 송인과 제변산소래사를 소개한 다음 나의 생각으로 시를 해석하고 바꾸어 보았다. 그의 많은 작품들 중 송인과 제변산소래사를 택한 이유는 이별을 이야기 하는 듯해서였다. 송인은 주제와 내용자체가 이별, 슬픔에 관한 시라 주제가 이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제변산소래사는 사실상 이별이 아니라 탈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탈속을 이별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였다. 제변산소래사 에서의 화자는 ‘속세와 단절했다’라고 하였는데 나는 속세와 단절한 것이 ‘인간사와 이별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이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이별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별을 피하려 하지 말고 마주하고 인정해야 자신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정지상”,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이응백, 김원경, 김선풍, 1998., 한국사전연구사)
“정지상 작품”, 『네이버 지식백과』, (한시작가작품사전, 2007. 11. 15., 국학자료원)
“제변산내소사 [題邊山來蘇寺] - 변산반도의 내소사에서 짓다.”, 『네이버 지식백과』,(한시작가작품사전, 2007. 11. 15., 국학자료원)
네이버, “제변산소래사”,
http://blog.naver.com/kyorai?Redirect=Log&logNo=120136108859 (2016.12.11)
3) 내가 해석하는정지상<제변산소래사>′
정지상<제변산소래사>에서는 화자가 속세에 얽히고 싶지 않아서 속세와 단절하고 산으로 가려는 듯하다. 즉, 속세에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정지상<제변산소래사>‘를 ’옛날에 살던 곳은 시끄러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매우 멀다.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화자는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사에 맑고 깨끗함을 느끼고 있다. 내소사에 있는 스님은 자연사에만 있어서 인간사의 시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해석하였다.
4) 내가 해석하는정지상<제변산소래사>′
옛 길은 적막한 채 솔뿌리는 얽혀 있고, → 탄핵안 가결은 적막한 채 청와대는 얽혀 있고,
하늘이 가까워 북두칠성을 만질 듯하구나. → 그녀는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이 드는구나.
뜬 구름과 흐르는 물인 양 나그네 절 찾으니, → 뜬 구름과 흐르는 물인 양 하루하루 지내니
붉은 잎 푸른 이끼 속에 스님은 문 닫네. → 붉은 촛불 하야 속에 그녀는 문을 닫네.
가을바람 솔솔 석양 속에 불고 가니, → 겨울바람 춥고 촛불은 더욱 붉어 가니,
산에 뜬 달 훤해지자 잔나비 소리 맑구나. → 그녀의 웃음은 울음으로 바뀌었구나.
기특하도다, 긴 눈썹의 늙은 스님은 → 기특하도다, 매 주 하야를 외치는 시민들은
한평생 인간사의 시끄러움은 꿈도 꾸지 않고 있네. → 그녀가 스스로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네.
이렇게 나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으로 시를 바꾸어 보았다. 정지상은 속세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그녀는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녀도 정지상처럼 속세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정지상<제변산소래사>’를 나만의 방식으로 바꾸어 보았다. 제목도 바꾸자면 정지상이 변산반도에 있는 내소사에서 이 시를 읊어 제목이 제변산소래사 이니까 나는 촛불시위를 벌이는 장소인 광화문광장으로 바꿀 것이다.
Ⅲ. 결론
정지상 작가를 소개하고 그의 작품인 송인과 제변산소래사를 소개한 다음 나의 생각으로 시를 해석하고 바꾸어 보았다. 그의 많은 작품들 중 송인과 제변산소래사를 택한 이유는 이별을 이야기 하는 듯해서였다. 송인은 주제와 내용자체가 이별, 슬픔에 관한 시라 주제가 이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제변산소래사는 사실상 이별이 아니라 탈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탈속을 이별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였다. 제변산소래사 에서의 화자는 ‘속세와 단절했다’라고 하였는데 나는 속세와 단절한 것이 ‘인간사와 이별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이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이별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별을 피하려 하지 말고 마주하고 인정해야 자신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정지상”,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이응백, 김원경, 김선풍, 1998., 한국사전연구사)
“정지상 작품”, 『네이버 지식백과』, (한시작가작품사전, 2007. 11. 15., 국학자료원)
“제변산내소사 [題邊山來蘇寺] - 변산반도의 내소사에서 짓다.”, 『네이버 지식백과』,(한시작가작품사전, 2007. 11. 15., 국학자료원)
네이버, “제변산소래사”,
http://blog.naver.com/kyorai?Redirect=Log&logNo=120136108859 (2016.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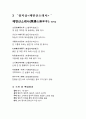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