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시조의 개념
2. 시조의 명칭
3. 시조의 기원 및 형성
4. 시조의 형식
5. 시조의 내용
6. 시조의 특질
2. 시조의 명칭
3. 시조의 기원 및 형성
4. 시조의 형식
5. 시조의 내용
6. 시조의 특질
본문내용
문으로 된 <將進酒> 작품도 있다..
향가 고려속요에서는 취락을 주제로 한 작품은 없고 경기체가인 <한림별곡> 제 4장에서 비로소 술이 나타난다.
先人들이 취락시조를 즐겨 읊은 것은 어지러웠던 현실적인 관념을 일시적이나마 망각하고 술로써 무아의 경지에 빠지려는 의미도 컸으며 소동파의 赤壁賦가 수입된 이래로 다수의 선인들은 적벽부를 너무나도 즐겼고 그의 여파로써 조선시대나 가사에 적벽부의 영향을 입은 작품이 많다.
취락을 읊은 시조 223수 중 유명씨 작품이 90수이니 취락시조는 사회적인 계층의 차가 없이 널리 지어졌음을 알겠다. 작가로 본다면 숙종 이후의 작가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취락시조는 사절계 중 봄에 많이 지어졌고 엇시조와 사설시조가 20여수 된다.
時調史上 취락시조를 최초로 지은 사람은 맹사성으로 <강호사시가> 중 제일수가 취락을 읊었고 황희도 취락을 읊었다.
<취락류 시조의 예>
한 잔(盞) 먹사이다 또 한잔 먹사이다. 곶 것거 산(算) 노코 무진무진(無盡無盡) 먹사이다.
이 몸 주근 후면 지게 우희 거적 더퍼 주리혀 매여 가나 유소보장(流蘇寶帳)의 만인(萬人)이 우러네나, 어욱새 속새 덥가나무 백양(白楊) 수페 가기곳 가면, 누른 해, 흰 달, 굴근 눈, 쇼쇼리 바람 불 제 뉘 한잔 먹쟈할고.
하믈며 무덤 우희 잔나비 휘파람 불제 뉘우친달 엇더리
(술 한잔 먹세그려 또 한자 먹세그려 꽃을 꺾어 셈하며 다함 없이 먹세그려
이 몸이 죽은 후에는 지게 위에 거적을 덮어 졸라 메어 가거나, 좋은 상여에 만 사람이 울며 따라 가거나, 억새와 속새와 떡갈나무와 백양 숲 속에 가기만 하면 누런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에 회오리바람이 불 때 누가 한 잔 먹자고 할꼬.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들이 휘파람을 불며 놀 때 가서야 뉘우친들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은가?)
이는 송강가사 이선본으로 송강 정철이 지은 <장진주사>이다. 이 사설 시조의 내용은 인생은 허무한 것이나 후회하지 말고 죽기 전에 술을 무진장 먹어 그 허무함을 잊어버리자는 권주가이다. 전체적으로 암울한 분위기에 걸맞은 소재를 선택해서 삶의 허무함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어두운 어조로 잘 나타내고 있는데, 삶의 극단적인 허무의식에 빠지지 않고, 일반인의 호응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것은 고사성어나 한문 조어를 피하고 우리말의 일상적 생활어를 시어로 선택함으로써 대중과의 공감대를 넓게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3) 閑庭類 時調
선인들은 부귀, 공명, 영욕의 어려움을 알면서 이에서 벗어나 산과 강을 집으로 삼고, 학과 백구를 벗하며 달빛 아래에서 고기를 낚으며 구름 속에서 밭을 갈며 속세를 초월한 생활을 매우 소망하였다. 그들은 송풍을 거문고 소리로 들었으며, 社鵑聲을 노랫소리로 들으면서 한정을 즐겼고, 나그네는 길을 걷다가 遠村에서 들리는 鷄鳴聲 소리를 들으면서 목적지가 가까워진 것을 아는 여유작작한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강호생활에 심취하면서 그들은 강산의 주인으로 자처했고, 또 무사안일로써 산수를 즐기면서 읊은 시조 중에 한정시조가 많다. 선인들은 한정생활을 하면서 그 덕을 군왕에 돌려, 태평을 누리는 데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고려의 경기체가 작품들이 대체로 한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조선 초엽 황희로부터 시작되어 면면히 한정시조가 지어졌다. 한정 태평시조는 216首인데 그 중에서 95首가 작가가 밝혀져 있다. 그 중 한정가를 특히 많이 지은 작자로는 권호문, 이퇴계, 이율곡, 윤선도, 김천택 등이 있다. 특히 연시조인 閑居十八曲, 陶山十二曲, 高山九曲歌, 五友歌에서 한정을 읊은 것도 특색이라 할 수 있다.
< 한정류 시조의 예 >
○ 白鷗야 말 물어 보자 놀라지 말아스라
名區勝地를 어디 어디 보았는다
날다려 자세히 일러든 너와 게 가 놀리라
(갈매기야 말 물어보자 놀라지 말려무나. 산수 경치 좋기로 이름난 곳-명승구, 명승지-을 어디 어디 보았느냐. 나에게 자세히 말해 주면 너와 거기 가 같이 놀리라.)
이 시조는 영조대 김천택의 것으로 출전은 해동가요이다. 갈매기에게 산수 경치 좋은 곳을 묻는 작자의 심경은, 자연 속에서 자연의 경관을 완상하며 유유자적하려는, 자연과의 화합과 몰입을 희구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갈매기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 \'명구 승지를 어디 어디 보았는다\'는 이 세상의 명승지를 다 관람하고 싶은 심정을 말한 것이다. \'너와 게 가 놀리라\'에서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시적 자아의 정서를 알 수 있다.
○ 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無心한 달빗만 싯고 뷘 배 저어 오노매라.
(가을 강에 밤이 되니 물결이 차도다. 낚시를 드리우니 고기가 물지 않는구나. 비록 고기는 못 잡았으나 사심 없는 달빛만 배에 가득히 싣고 돌아오도다.)
이 시조의 출전은 청구영언으로 조선 성종 때 월산대군에 의해 쓰여진 시조이다.
가을 강의 밤 경치와 낚시와 달빛이 어우러진 강을 배 저어 오는 작가의 마음에는 빈 배로 돌아오는 아쉬움 같은 것은 아랑곳없다. 평화롭고 한가로운 삶이 표현되어 있다. 물욕과 명리를 초월한 작가의 유유자적(悠悠自適)하는 삶의 정신이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오는 빈 배의 정경에서 느낄 수 있다.
(4) 自然類 時調
자연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고 인간의 정서는 자연 속에서 길러졌고, 자연의 변이는 인간의 생활에 지혜와 섭리를 안겨주기도 하였다. 특히 시가는 인간의 감성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에 서사시든 서정시든 주제는 각기 다르다 하더라도 그 소재는 어느 것이나 자연과의 관계에서 밀접한 영향을 입었던 것이다. 자연이라하면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나 여기에서는 자연경치, 조류, 화목류 만을 한정하여 보기로 하겠다.
특히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자연과 함께 생활해 왔고, 자연의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왔다. 따라서 자연의 신비는 인간에게 가장 큰 것이며, 으뜸가는 것으로 자연히 시조의 주요 소재로 다루어져 왔다. 자연류 시조는 169首인데 자연경치를 읊은 것이 61首, 조류를 읊은 것이 62首, 화류를 읊은 것이 46首이다.
< 자연류 시조의 예 >
어리고 성
향가 고려속요에서는 취락을 주제로 한 작품은 없고 경기체가인 <한림별곡> 제 4장에서 비로소 술이 나타난다.
先人들이 취락시조를 즐겨 읊은 것은 어지러웠던 현실적인 관념을 일시적이나마 망각하고 술로써 무아의 경지에 빠지려는 의미도 컸으며 소동파의 赤壁賦가 수입된 이래로 다수의 선인들은 적벽부를 너무나도 즐겼고 그의 여파로써 조선시대나 가사에 적벽부의 영향을 입은 작품이 많다.
취락을 읊은 시조 223수 중 유명씨 작품이 90수이니 취락시조는 사회적인 계층의 차가 없이 널리 지어졌음을 알겠다. 작가로 본다면 숙종 이후의 작가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취락시조는 사절계 중 봄에 많이 지어졌고 엇시조와 사설시조가 20여수 된다.
時調史上 취락시조를 최초로 지은 사람은 맹사성으로 <강호사시가> 중 제일수가 취락을 읊었고 황희도 취락을 읊었다.
<취락류 시조의 예>
한 잔(盞) 먹사이다 또 한잔 먹사이다. 곶 것거 산(算) 노코 무진무진(無盡無盡) 먹사이다.
이 몸 주근 후면 지게 우희 거적 더퍼 주리혀 매여 가나 유소보장(流蘇寶帳)의 만인(萬人)이 우러네나, 어욱새 속새 덥가나무 백양(白楊) 수페 가기곳 가면, 누른 해, 흰 달, 굴근 눈, 쇼쇼리 바람 불 제 뉘 한잔 먹쟈할고.
하믈며 무덤 우희 잔나비 휘파람 불제 뉘우친달 엇더리
(술 한잔 먹세그려 또 한자 먹세그려 꽃을 꺾어 셈하며 다함 없이 먹세그려
이 몸이 죽은 후에는 지게 위에 거적을 덮어 졸라 메어 가거나, 좋은 상여에 만 사람이 울며 따라 가거나, 억새와 속새와 떡갈나무와 백양 숲 속에 가기만 하면 누런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에 회오리바람이 불 때 누가 한 잔 먹자고 할꼬.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들이 휘파람을 불며 놀 때 가서야 뉘우친들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은가?)
이는 송강가사 이선본으로 송강 정철이 지은 <장진주사>이다. 이 사설 시조의 내용은 인생은 허무한 것이나 후회하지 말고 죽기 전에 술을 무진장 먹어 그 허무함을 잊어버리자는 권주가이다. 전체적으로 암울한 분위기에 걸맞은 소재를 선택해서 삶의 허무함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어두운 어조로 잘 나타내고 있는데, 삶의 극단적인 허무의식에 빠지지 않고, 일반인의 호응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것은 고사성어나 한문 조어를 피하고 우리말의 일상적 생활어를 시어로 선택함으로써 대중과의 공감대를 넓게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3) 閑庭類 時調
선인들은 부귀, 공명, 영욕의 어려움을 알면서 이에서 벗어나 산과 강을 집으로 삼고, 학과 백구를 벗하며 달빛 아래에서 고기를 낚으며 구름 속에서 밭을 갈며 속세를 초월한 생활을 매우 소망하였다. 그들은 송풍을 거문고 소리로 들었으며, 社鵑聲을 노랫소리로 들으면서 한정을 즐겼고, 나그네는 길을 걷다가 遠村에서 들리는 鷄鳴聲 소리를 들으면서 목적지가 가까워진 것을 아는 여유작작한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강호생활에 심취하면서 그들은 강산의 주인으로 자처했고, 또 무사안일로써 산수를 즐기면서 읊은 시조 중에 한정시조가 많다. 선인들은 한정생활을 하면서 그 덕을 군왕에 돌려, 태평을 누리는 데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고려의 경기체가 작품들이 대체로 한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조선 초엽 황희로부터 시작되어 면면히 한정시조가 지어졌다. 한정 태평시조는 216首인데 그 중에서 95首가 작가가 밝혀져 있다. 그 중 한정가를 특히 많이 지은 작자로는 권호문, 이퇴계, 이율곡, 윤선도, 김천택 등이 있다. 특히 연시조인 閑居十八曲, 陶山十二曲, 高山九曲歌, 五友歌에서 한정을 읊은 것도 특색이라 할 수 있다.
< 한정류 시조의 예 >
○ 白鷗야 말 물어 보자 놀라지 말아스라
名區勝地를 어디 어디 보았는다
날다려 자세히 일러든 너와 게 가 놀리라
(갈매기야 말 물어보자 놀라지 말려무나. 산수 경치 좋기로 이름난 곳-명승구, 명승지-을 어디 어디 보았느냐. 나에게 자세히 말해 주면 너와 거기 가 같이 놀리라.)
이 시조는 영조대 김천택의 것으로 출전은 해동가요이다. 갈매기에게 산수 경치 좋은 곳을 묻는 작자의 심경은, 자연 속에서 자연의 경관을 완상하며 유유자적하려는, 자연과의 화합과 몰입을 희구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갈매기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 \'명구 승지를 어디 어디 보았는다\'는 이 세상의 명승지를 다 관람하고 싶은 심정을 말한 것이다. \'너와 게 가 놀리라\'에서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시적 자아의 정서를 알 수 있다.
○ 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無心한 달빗만 싯고 뷘 배 저어 오노매라.
(가을 강에 밤이 되니 물결이 차도다. 낚시를 드리우니 고기가 물지 않는구나. 비록 고기는 못 잡았으나 사심 없는 달빛만 배에 가득히 싣고 돌아오도다.)
이 시조의 출전은 청구영언으로 조선 성종 때 월산대군에 의해 쓰여진 시조이다.
가을 강의 밤 경치와 낚시와 달빛이 어우러진 강을 배 저어 오는 작가의 마음에는 빈 배로 돌아오는 아쉬움 같은 것은 아랑곳없다. 평화롭고 한가로운 삶이 표현되어 있다. 물욕과 명리를 초월한 작가의 유유자적(悠悠自適)하는 삶의 정신이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오는 빈 배의 정경에서 느낄 수 있다.
(4) 自然類 時調
자연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고 인간의 정서는 자연 속에서 길러졌고, 자연의 변이는 인간의 생활에 지혜와 섭리를 안겨주기도 하였다. 특히 시가는 인간의 감성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에 서사시든 서정시든 주제는 각기 다르다 하더라도 그 소재는 어느 것이나 자연과의 관계에서 밀접한 영향을 입었던 것이다. 자연이라하면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나 여기에서는 자연경치, 조류, 화목류 만을 한정하여 보기로 하겠다.
특히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자연과 함께 생활해 왔고, 자연의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왔다. 따라서 자연의 신비는 인간에게 가장 큰 것이며, 으뜸가는 것으로 자연히 시조의 주요 소재로 다루어져 왔다. 자연류 시조는 169首인데 자연경치를 읊은 것이 61首, 조류를 읊은 것이 62首, 화류를 읊은 것이 46首이다.
< 자연류 시조의 예 >
어리고 성
키워드
추천자료
 시조의 발생과 담당층의 시조문학 고찰-조선 전기 사대부시조와 기녀시조를 중심으로
시조의 발생과 담당층의 시조문학 고찰-조선 전기 사대부시조와 기녀시조를 중심으로 [사설시조][역사][형식][특징][사설시조 표현][사설시조 작품]사설시조의 역사, 사설시조의 ...
[사설시조][역사][형식][특징][사설시조 표현][사설시조 작품]사설시조의 역사, 사설시조의 ... [시조][시조작가][시조집][도가][변신모티브][고구려시조][고대시조]시조와 시조작가, 시조와...
[시조][시조작가][시조집][도가][변신모티브][고구려시조][고대시조]시조와 시조작가, 시조와... [시조][시조 개념][시조 의미][시조 명칭][시조 역사][시조 형성][시조 변이]시조의 개념, 시...
[시조][시조 개념][시조 의미][시조 명칭][시조 역사][시조 형성][시조 변이]시조의 개념, 시... [시조][시조 의미][시조 기원][시조 형식][시조 명칭][시조 종류][시조 내용]시조의 의미, 시...
[시조][시조 의미][시조 기원][시조 형식][시조 명칭][시조 종류][시조 내용]시조의 의미, 시... 조선시대 시조 도산십이곡, 어부가 작품분석, 조선시대 시조 어부사시사, 님 작품분석, 조선...
조선시대 시조 도산십이곡, 어부가 작품분석, 조선시대 시조 어부사시사, 님 작품분석, 조선... 고려 시조 산중가, 송인 작품분석, 고려시대 시조 백발가 작품분석, 조선시대 시조 도산십이...
고려 시조 산중가, 송인 작품분석, 고려시대 시조 백발가 작품분석, 조선시대 시조 도산십이... [시조][시조집][전문가객][도가][개화기시조]시조와 시조집, 시조와 전문가객, 시조와 도가, ...
[시조][시조집][전문가객][도가][개화기시조]시조와 시조집, 시조와 전문가객, 시조와 도가, ... [시조][시조 정의][시조 명칭][시조 종류][시조 형식][시조 성격][시조 역사][시조 변화][시...
[시조][시조 정의][시조 명칭][시조 종류][시조 형식][시조 성격][시조 역사][시조 변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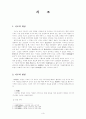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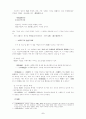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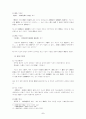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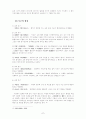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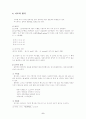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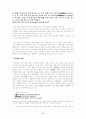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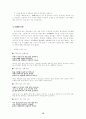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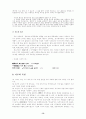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