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세계의 역사> 교과목의 성격
1) 역사란 무엇인가
2) 역사의 쓸모
3) <세계의 역사> 교과목의 성격
3. <세계의 역사> 학습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1)역사를 배우는 목적
2) <세계의 역사> 학습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4. <세계의 역사> 학습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
5. 결론
6. 참고문헌
2. <세계의 역사> 교과목의 성격
1) 역사란 무엇인가
2) 역사의 쓸모
3) <세계의 역사> 교과목의 성격
3. <세계의 역사> 학습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1)역사를 배우는 목적
2) <세계의 역사> 학습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4. <세계의 역사> 학습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각 장에는 연습문제를 배치하고 그 해설까지 친절하게 담고 있다. 다만, 해설부터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자기 생각부터 정리해보고 해설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장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기말시험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습문제 풀이가 끝나면 생각해 볼 문제를 통해 심화학습을 하는 과정도 마련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에 정답이 없으므로 자신만의 정답을 찾는 시간으로 삼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는 글쓰기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교재에서도 먼저 스스로 생각하여 작성한 뒤 워크북의 서술 내용과 대조해 볼 것을 추전하고 있다. 끝으로 각 장의 마지막에는 서술형의 요약이 있어 해당 장의 공부 내용을 복기할 수 있게 도와준다.
모든 과목에서 최고의 교재는 교과서와 강의라고 생각한다. 교재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학습방법으로, 방송강의 진도에 맞추어 미리 기본교재의 해당 내용을 읽어 맥락을 이해하고, 필기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 강의를 시청한 후 다시 워크북을 참조하여 학습 한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을 강조한다.
흔히 역사 공부를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해과목이다. 사건과 현상에 대한 이해 없는 역사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다. 역사는 주사위 놀이가 아니다. 자연현상에만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인과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따라서 그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만 하는 것은 죽은 역사 공부로 시험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제대로 배우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교재를 숙지하고 다양한 관점과 학설을 비교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세계사를 통해 배운 내용을 단순히 시험 점수를 얻기 위한 목적에 두지 않고, 오늘의 나와 우리나라에 어떤 관계와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 보면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카(1892~1982) 또한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한, 현재를 살고 있는 역사가의 해석을 강조하였다. 역사란 역사가와 과거에 일어난 사실 간의 상호 작용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인 것이다.
5. 결론
동양의 역사서의 이름을 보면 ‘통감(通鑑)’이라고 쓰인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자치통감, 동국통감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통감은 역사를 본보기(거울)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통감’으로 생각하여 역사책을 편찬했다.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보기인 것이다.
역사를 오늘의 좋은 거울로 삼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공부 방향과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비전공자에게 그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비전공자는 역사의 수많은 사건과 인물에 이리저리 흔들리기 쉬운 까닭이다. 수영을 하기 전에 목적지와 방향, 그리고 수영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무턱대고 깊은 물에 뛰어들면, 물살에 이리저리 휩쓸리다 그 물살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역사 공부의 방향과 방법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다. 자신만의 역사 공부 목적을 정하고 교재와 강의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교양인이 갖춰야 할 세계의 역사에 대한 안목을 얻고,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문헌
박구병·신성곤·원지연·윤혜영·이광수·이한규·이혜령·이희수·조흥국(2016), 세계의역사, 출판문화원.
최태성(2019), 역사의 쓸모, 다산초당.
E. H. 카, 김택현 옮김(2016), 역사란 무엇인가 개정판 2판, 까치.
각 장에는 연습문제를 배치하고 그 해설까지 친절하게 담고 있다. 다만, 해설부터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자기 생각부터 정리해보고 해설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장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기말시험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습문제 풀이가 끝나면 생각해 볼 문제를 통해 심화학습을 하는 과정도 마련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에 정답이 없으므로 자신만의 정답을 찾는 시간으로 삼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는 글쓰기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교재에서도 먼저 스스로 생각하여 작성한 뒤 워크북의 서술 내용과 대조해 볼 것을 추전하고 있다. 끝으로 각 장의 마지막에는 서술형의 요약이 있어 해당 장의 공부 내용을 복기할 수 있게 도와준다.
모든 과목에서 최고의 교재는 교과서와 강의라고 생각한다. 교재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학습방법으로, 방송강의 진도에 맞추어 미리 기본교재의 해당 내용을 읽어 맥락을 이해하고, 필기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 강의를 시청한 후 다시 워크북을 참조하여 학습 한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을 강조한다.
흔히 역사 공부를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해과목이다. 사건과 현상에 대한 이해 없는 역사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다. 역사는 주사위 놀이가 아니다. 자연현상에만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인과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따라서 그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만 하는 것은 죽은 역사 공부로 시험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제대로 배우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교재를 숙지하고 다양한 관점과 학설을 비교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세계사를 통해 배운 내용을 단순히 시험 점수를 얻기 위한 목적에 두지 않고, 오늘의 나와 우리나라에 어떤 관계와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 보면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카(1892~1982) 또한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한, 현재를 살고 있는 역사가의 해석을 강조하였다. 역사란 역사가와 과거에 일어난 사실 간의 상호 작용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인 것이다.
5. 결론
동양의 역사서의 이름을 보면 ‘통감(通鑑)’이라고 쓰인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자치통감, 동국통감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통감은 역사를 본보기(거울)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통감’으로 생각하여 역사책을 편찬했다.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보기인 것이다.
역사를 오늘의 좋은 거울로 삼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공부 방향과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비전공자에게 그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비전공자는 역사의 수많은 사건과 인물에 이리저리 흔들리기 쉬운 까닭이다. 수영을 하기 전에 목적지와 방향, 그리고 수영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무턱대고 깊은 물에 뛰어들면, 물살에 이리저리 휩쓸리다 그 물살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역사 공부의 방향과 방법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다. 자신만의 역사 공부 목적을 정하고 교재와 강의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교양인이 갖춰야 할 세계의 역사에 대한 안목을 얻고,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문헌
박구병·신성곤·원지연·윤혜영·이광수·이한규·이혜령·이희수·조흥국(2016), 세계의역사, 출판문화원.
최태성(2019), 역사의 쓸모, 다산초당.
E. H. 카, 김택현 옮김(2016), 역사란 무엇인가 개정판 2판, 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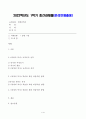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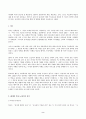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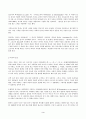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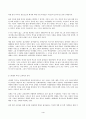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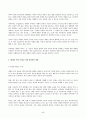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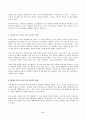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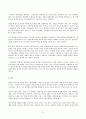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