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해, 질병, 고통은 개인적인 것인가
2. 사회역학이라는 학문, 의료의 사회화
3. 우리 사회 속의 ‘고통의 외주화’들
4. 혐오와 낙인이라는 질병
5. 사회적 아픔과 과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반성
2. 사회역학이라는 학문, 의료의 사회화
3. 우리 사회 속의 ‘고통의 외주화’들
4. 혐오와 낙인이라는 질병
5. 사회적 아픔과 과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반성
본문내용
다.
5. 사회적 아픔과 과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반성
사회적 고통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책은 한편으로는 과학과 학문에 대한 반성으로도 읽혔다. 2017년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자가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미국 박사 유학 중에 동기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너는 네가 하는 공부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 같니?\" 기존의 전공에 회의가 들었던 저자는 정말 하고 싶은 공부인 사회역학 쪽으로 전공을 바꾼다. 저자의 독특한 행보에서 학문의 사회기여에 관한 고민을 알 수 있었다. 미국 IBM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의 역학적 자문을 제공한 리처드 클랩 교수의 말을 인용한 것도 이와 닿아있다. “법정에서 노동자들은 보통 이길 수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는 어떤 학자는 그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108쪽) 우리 곁의 학문과 학자 됨에 대해 생각게 하는 대목이었다. 학위와 실적을 위해, 자기 일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연구를 하거나 이 책에도 나오는 사례처럼 경제적 이득을 위해 학문적 소신을 팔아넘기는 학자들이 우리 사회에는 없었던가.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안을 주로 예시로 든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 윤리적 호소를 하거나 도덕적 당위를 내세우는 책의 어조는 자칫 감상적이고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다. 그리고 질병과 고통에 관해 사회구조라든가 ‘거시적’ 차원을 부각하다보니 논의가 거친 감도 없잖아 있다. 인간 몸의 고통과 아픔이 저마다 세세한 결을 가지고 있다는 데 기반 한 미시적 분석이 아쉽다. 하지만 몸과 질병에 관한 개인적인 성찰이나 존재론적이고 철학적인 반성의 글들은 심심찮게 존재했던 반면 데이터에 기반 한 과학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수치의 생산과 합리적 사회변화”(156쪽)를 꾀한 글을 드물었기에 이 책의 지위는 독특하다. 아마도 수치화되고 가시화되지 못했기에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되었던 사회의 아픔에 대해 이 글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고 느꼈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대목에서 저자는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되지 않은 참사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166쪽) 사회적 고통과 비극들이 망각되거나 반복되지 않기를. 고통을 기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억하는 작업으로 이 책을 기억할 것 같다.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이처럼 맑고 선한 연구와 시선이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5. 사회적 아픔과 과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반성
사회적 고통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책은 한편으로는 과학과 학문에 대한 반성으로도 읽혔다. 2017년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자가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미국 박사 유학 중에 동기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너는 네가 하는 공부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 같니?\" 기존의 전공에 회의가 들었던 저자는 정말 하고 싶은 공부인 사회역학 쪽으로 전공을 바꾼다. 저자의 독특한 행보에서 학문의 사회기여에 관한 고민을 알 수 있었다. 미국 IBM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의 역학적 자문을 제공한 리처드 클랩 교수의 말을 인용한 것도 이와 닿아있다. “법정에서 노동자들은 보통 이길 수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는 어떤 학자는 그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108쪽) 우리 곁의 학문과 학자 됨에 대해 생각게 하는 대목이었다. 학위와 실적을 위해, 자기 일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연구를 하거나 이 책에도 나오는 사례처럼 경제적 이득을 위해 학문적 소신을 팔아넘기는 학자들이 우리 사회에는 없었던가.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안을 주로 예시로 든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 윤리적 호소를 하거나 도덕적 당위를 내세우는 책의 어조는 자칫 감상적이고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다. 그리고 질병과 고통에 관해 사회구조라든가 ‘거시적’ 차원을 부각하다보니 논의가 거친 감도 없잖아 있다. 인간 몸의 고통과 아픔이 저마다 세세한 결을 가지고 있다는 데 기반 한 미시적 분석이 아쉽다. 하지만 몸과 질병에 관한 개인적인 성찰이나 존재론적이고 철학적인 반성의 글들은 심심찮게 존재했던 반면 데이터에 기반 한 과학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수치의 생산과 합리적 사회변화”(156쪽)를 꾀한 글을 드물었기에 이 책의 지위는 독특하다. 아마도 수치화되고 가시화되지 못했기에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되었던 사회의 아픔에 대해 이 글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고 느꼈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대목에서 저자는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되지 않은 참사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166쪽) 사회적 고통과 비극들이 망각되거나 반복되지 않기를. 고통을 기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억하는 작업으로 이 책을 기억할 것 같다.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이처럼 맑고 선한 연구와 시선이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키워드
추천자료
 [사회문제론 C형] 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으며, 건강한 삶의 문제...
[사회문제론 C형] 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으며, 건강한 삶의 문제... [전학과] 사회문제론)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으며 건강한 삶의 문...
[전학과] 사회문제론)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으며 건강한 삶의 문... 사회문제론)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으며 건강한 삶의 문제가 왜 사...
사회문제론)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으며 건강한 삶의 문제가 왜 사... 사회문제론)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으며, 건강한 삶의 문제가 왜 ...
사회문제론)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으며, 건강한 삶의 문제가 왜 ... (의료사회사업론 A형)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
(의료사회사업론 A형)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 [의료사회사업론 A형]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
[의료사회사업론 A형]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 [2019 의료사회사업론2B] 유튜브 등에서 ‘아픔이 길이 되려면’ 관련 영상을 보고 주요 내용을...
[2019 의료사회사업론2B] 유튜브 등에서 ‘아픔이 길이 되려면’ 관련 영상을 보고 주요 내용을... 아픔의 사회적 해석) 아픔이 길이 되려면 서평(서평, 독후감)
아픔의 사회적 해석) 아픔이 길이 되려면 서평(서평, 독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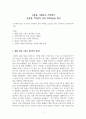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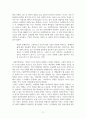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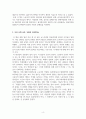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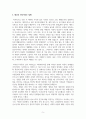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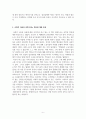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