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재를 기준으로 하여 1장부터 4장 중에서 하나를, 5장부터 7장 중에서 하나를, 8장부터 11장 중에서 하나를, 그리고 12장부터 15장 중에서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각각 A4지 1매씩 총 네 작품에 대해 서술하되, 내용은 영화내용요약(50%)+본인의 감상과 해석(50%)가 되도록 작성합니다. (A4지 1매씩 총 4매, 50점)
목차
제2장 그리스인 조르바 - 자기 충족적 삶과 행복의 의미
제6장 귀신이 온다 - 국가와 폭력 그리고 국민 되기의 어려움
제10장 기생충 - 실패한 희생제의
제12장 노예 12년 - 양심과 동전 사이: 노예제와 자본주의
참고문헌
목차
제2장 그리스인 조르바 - 자기 충족적 삶과 행복의 의미
제6장 귀신이 온다 - 국가와 폭력 그리고 국민 되기의 어려움
제10장 기생충 - 실패한 희생제의
제12장 노예 12년 - 양심과 동전 사이: 노예제와 자본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워싱턴 D. C.에서 납치되어 노예로 팔린 솔로몬 노섭이 1853년에 쓴 동명의 회고록인《노예 12년》을 각색했다. 영화는 12년 동안 노예가 되어 인생과 자아를 도둑맞았던 한 자유인의 경험을 다루면서 동시에, 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노예제도 자체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있으며 동시에 노예제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다진 미국(유럽 등 서방세계)사회의 원죄를 묻고 있다.
1841년 미국 뉴욕 주 새러에 사는 솔로몬 노섭은 숙련된 목수일과 바이올린 연주도 하는 자유흑인으로 아내와 두 어린 자녀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 사건은 낯선 두 남성이 노섭에게 2주간의 연주여행을 제안하면서 생기고 만다. 노섭은 어느새 마취 된 채 쇠사슬에 묶여 인신매매단에 의해 팔리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이후 배에 태워 보내지고 조지아주에서 도망친 노예의 신분으로 \"플랫\"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고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실제로 1840년대는 노예 가격이 올라 자유인이었던 흑인들이 노예로 납치당하는 일이 빈번하였다고 한다.
뉴욕의 자유인 ‘솔로몬’이 아닌 루이지애나의 노예 ‘플랫’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이처럼 노섭에게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 아닌 짐승취급을 받는 건 순간의 일이었다. 백인의 채찍이 지나간 자리, 말초적인 충격보다 오래 남는 건 수치심과 억울함으로 인한 심적 고통으로 흑인문제라는 거대하고 자극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예 12년>은 노섭이 겪는 거짓말 같은 경험담을 묵묵히 따라가는 데 주목해야 한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으로 자유인과 노예 두 인물을 연기하는 치웨텔 에지오포는 12년간의 고통을 표정에 담아냄으로써 묵직한 울림을 선사한다. 흥미로운 지점은 영화에서 노섭이 접하는 다양한 백인들의 양상인데 노예주 윌리엄 포드는 흑인 가족을 갈라서 파는 노예상인을 질책할 정도로 최소한의 정의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인물인데 정작 노섭이 자유인 신분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가진 빚 때문에 노섭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는 위선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이해심 많아 보이지만, 가학적인 에드윈과 마찬가지로 백인 주인일 뿐인 것이다. 또 다른 노예주 에드윈은 노예는 자신의 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벌하고 능욕할 수 있다고 믿는 인물로 윌리엄 포드와 에드윈의 대조적인 백인 캐릭터는 흑인문제에 관한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스티브 맥퀸 감독에 따르면 160년이나 지난 책의 역사적 가치를 21세기에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현대인들에게 솔로몬의 용기와 자존심이라는 보편적인 공감대를 나누고자 했다고 하며 노예제와 자본주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도 한다. 더불어 맥퀸 감독은 조리개를 활짝 열어 밝고 선명하게 찍음으로써 배경, 등장인물을 모두 선명하게 부각시켰는데 스티브 맥퀸 감독은 화면을 밝고 선명하게 잡은 것에 대해 “노예제 시대의 남부 대농장에 한 번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을 관객들에게 주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영화로생각하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1841년 미국 뉴욕 주 새러에 사는 솔로몬 노섭은 숙련된 목수일과 바이올린 연주도 하는 자유흑인으로 아내와 두 어린 자녀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 사건은 낯선 두 남성이 노섭에게 2주간의 연주여행을 제안하면서 생기고 만다. 노섭은 어느새 마취 된 채 쇠사슬에 묶여 인신매매단에 의해 팔리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이후 배에 태워 보내지고 조지아주에서 도망친 노예의 신분으로 \"플랫\"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고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실제로 1840년대는 노예 가격이 올라 자유인이었던 흑인들이 노예로 납치당하는 일이 빈번하였다고 한다.
뉴욕의 자유인 ‘솔로몬’이 아닌 루이지애나의 노예 ‘플랫’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이처럼 노섭에게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 아닌 짐승취급을 받는 건 순간의 일이었다. 백인의 채찍이 지나간 자리, 말초적인 충격보다 오래 남는 건 수치심과 억울함으로 인한 심적 고통으로 흑인문제라는 거대하고 자극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예 12년>은 노섭이 겪는 거짓말 같은 경험담을 묵묵히 따라가는 데 주목해야 한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으로 자유인과 노예 두 인물을 연기하는 치웨텔 에지오포는 12년간의 고통을 표정에 담아냄으로써 묵직한 울림을 선사한다. 흥미로운 지점은 영화에서 노섭이 접하는 다양한 백인들의 양상인데 노예주 윌리엄 포드는 흑인 가족을 갈라서 파는 노예상인을 질책할 정도로 최소한의 정의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인물인데 정작 노섭이 자유인 신분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가진 빚 때문에 노섭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는 위선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이해심 많아 보이지만, 가학적인 에드윈과 마찬가지로 백인 주인일 뿐인 것이다. 또 다른 노예주 에드윈은 노예는 자신의 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벌하고 능욕할 수 있다고 믿는 인물로 윌리엄 포드와 에드윈의 대조적인 백인 캐릭터는 흑인문제에 관한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스티브 맥퀸 감독에 따르면 160년이나 지난 책의 역사적 가치를 21세기에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현대인들에게 솔로몬의 용기와 자존심이라는 보편적인 공감대를 나누고자 했다고 하며 노예제와 자본주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도 한다. 더불어 맥퀸 감독은 조리개를 활짝 열어 밝고 선명하게 찍음으로써 배경, 등장인물을 모두 선명하게 부각시켰는데 스티브 맥퀸 감독은 화면을 밝고 선명하게 잡은 것에 대해 “노예제 시대의 남부 대농장에 한 번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을 관객들에게 주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영화로생각하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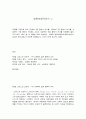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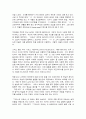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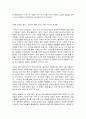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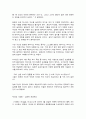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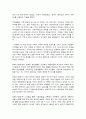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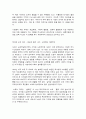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