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다음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서술해주세요. (25점)
⑴ 우리 역사에서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들고, 나에게 끼친 영향을 서술해주세요.
① 선정 이유
② 간략한 인물 소개
③ 나에게 끼친 영향
④ 현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2. 다음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서술해주세요. (25점)
⑴ 나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을 꼽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1) 고구려사 요약
2) 우리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꼽은 이유
참고문헌
⑴ 우리 역사에서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들고, 나에게 끼친 영향을 서술해주세요.
① 선정 이유
② 간략한 인물 소개
③ 나에게 끼친 영향
④ 현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2. 다음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서술해주세요. (25점)
⑴ 나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을 꼽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1) 고구려사 요약
2) 우리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꼽은 이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8년(378년)에 거란의 침입으로 잡혀갔던 1만 여 명의 백성들을 되찾는다. 395년에는 염수(鹽水)[83] 로 진출하여 거란족 패려(稗麗)를 정벌하였다.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의 아들로, 연가(延嘉), 연수(延壽), 건흥(建興) 등의 연호가 새겨진 유물이 일부 발견되고 있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대체로 안정된 가운데 장수왕은 백제를 정벌하는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구려 제25대왕 평원왕은 559년 즉위하여 도읍을 대성산성(大城山城, 평양직할시 대성산)에서 평양성(平壤城, 현 평양직할시 평양역 주변)로 이전하였는데 이는 국내성과와 평양파로 고구려가 갈리는 계기가 된다.
589년 수나라는 남쪽 진나라를 정복하고 중국을 통일하였다. 이때부터 중국의 압력이 고구려로 향하기 시작했다. 수나라는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의 영토를 염탐하였고, 그 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사신을 보내 지형을 알아보게 하였다. 실제로 수문제는 수륙군 30만 명을 동원하여 수륙양진책으로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하였으나 태풍 등으로 병력의 대부분을 잃고 작전은 실패하였다. 612년 정월 수양제는 113만 3800명을 이끌고 대대적인 고구려 공격에 나섰으나 고구려의 수성전, 청야전과 요동의 혹독한 기후 등으로 사실상 패퇴하였으며 이는 당나라로 정권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고구려-수 전쟁에서 2인자에 해당하는 막리지에 있던 을지문덕과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등공신 영류왕은 강경노선이었던 영양왕에 뒤를 이어 즉위한 후 줄곧 친당 노선을 유지했으나 연개소문 등 강경파들은 이러한 화친정책에 불만을 갖기 시작했으며 천리장성 축조를 계기로 중앙정계로 진출한 연개소문은 천리장성 축조 기념식을 빌미로 영류왕과 신료들을 대거 살해하는데 이를 막리지의 난이라고 한다. 막리지의 난은 그간 국내성에 기반을 둔 구 귀족이자 화친파인 국내성파와 평양성에 근거를 둔 신진 세력인 강경파 평양성파의 근본적인 대립이 대당정책을 두고 생긴 파국이었다.
이로 인해 국내성파는 상당수가 살해되고 망명하거나 몸을 사리는 지경이 되고 정권은 연개소문을 필두로 한 평양성파의 전제로 귀결되었으며 당나라와의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되었다. 보장왕을 왕으로 세운 뒤 2인자였던 막리지보다 더 높은 사실상의 1인자 대막리지라는 직위를 신설하고 그 자리에 올라 정권을 찬탈해 이후 642년부터 668년까지 26년간 연개소문의 아들들인 연남생, 연남건 등이 대대로 권력을 세습하는 연씨정권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당나라의 침략이 개시되었고 연개소문 생전에는 이를 잘 막아내었으나 사후 연남생, 남건 형제의 분열로 인해 고구려는 멸망의 길로 치닫는다.
2) 우리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꼽은 이유
연개소문의 정변은 연개소문의 과격하고 잔인한 품성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감정의 결과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대 당 외교정책을 두고 벌어진 고구려 지배 계층의 분열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고구려는 초기 수도인 국내성에서 25대왕 평원왕 시기에 평양으로 천도하였지만 그 이전인 광개토대왕 시절부터 평양은 중시되었고 실제로 광개토대왕은 직접 평양에 행차하기도 하였다. 409년에는 나라 동쪽에 독산성 등 6개의 성을 쌓고 평양의 민호를 옮겨 살게 하였다는 기록도 보인다. 아들인 장수왕 역시 대성산성(大城山城)을 쌓고 안학궁(安鶴宮)을 건설해 왕실의 위엄을 높이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는 모두가 국내성(國內城, 집안)의 귀족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연개소문 이전부터 국내성파와 평양성파의 갈등은 지속되어 왔으며 두 세력은 수시로 상대를 무시하고 비난하면서 대립하였다.
다만 연개소문의 등장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존의 지배 세력의 갈등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수나라나 당나라에 비해 인구 수도 압도적으로 적고 영토도 좁은데 여기서도 분열이 지속된 것이다. 연개소문은 정변을 통해 지배계층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했고 1인 지배체제를 확립했다. 그는 평양성파라는 강경파들의 지지로 정권 찬탈에 성공했으나 이들은 거의 연개소문의 가신들로 이후 연개소문의 행보에는 거침이 없었다. 하지만 고구려는 이후 쇠락을 길을 걷고 만다. 겉으로는 당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지만 갈등이 심화되고 내분이 깊어지고 있었던 셈이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연개소문의 정변이 기존 영류와의 대당 화친정책을 뒤엎는 것이어서 당나라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으며 고구려는 당나라의 압도적인 물량공세를 막아야 했다. 이로 인해 기존 내부 분열로 인해 약화되었던 국력이 더욱 소진되고 이로 인한 내부 분열의 싹은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연개소문이 살아 있을 때는 이러한 분열의 씨앗이 잠잠하다가 정치경험이 부족한 그의 아들들이 집권하자 갈등의 불씨는 더욱 커져 파국으로 치닫고 만다. 누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수많은 정변 중에 가장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쿠데타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이 사건을 꼽을 것이다. 바로 연개소문의 정변이다.
고구려는 이후 당나라, 신라 등과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하게 되고 국력을 총결집하여 침략에 맞서야 했지만 내분으로 인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 고구려의 멸망은 이러한 지배층의 갈등과 분열의 최종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요동과 만주를 영원히 잃게 된다.
고구려가 망한 것은 단순히 지리적, 인구사회학적 손실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드넓은 인식의 지평을 포기하고 성리학적 질서라는 중국 중심의 강고한 이념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반도에서 묶이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 『한국사의 이해』 교재 및 방송강의
- 역사문제연구소 기획,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1~5권, 웅진지식하우스, 2011
-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20.(2005년판, 2013년판을 참고해도 무방함)
-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고대사 1,2』 『고려시대사 1,2』 『조선시대사 1,2』, 『한국근대사 1,2』, 『한국현대사 1,2』, 푸른역사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의 아들로, 연가(延嘉), 연수(延壽), 건흥(建興) 등의 연호가 새겨진 유물이 일부 발견되고 있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대체로 안정된 가운데 장수왕은 백제를 정벌하는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구려 제25대왕 평원왕은 559년 즉위하여 도읍을 대성산성(大城山城, 평양직할시 대성산)에서 평양성(平壤城, 현 평양직할시 평양역 주변)로 이전하였는데 이는 국내성과와 평양파로 고구려가 갈리는 계기가 된다.
589년 수나라는 남쪽 진나라를 정복하고 중국을 통일하였다. 이때부터 중국의 압력이 고구려로 향하기 시작했다. 수나라는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의 영토를 염탐하였고, 그 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사신을 보내 지형을 알아보게 하였다. 실제로 수문제는 수륙군 30만 명을 동원하여 수륙양진책으로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하였으나 태풍 등으로 병력의 대부분을 잃고 작전은 실패하였다. 612년 정월 수양제는 113만 3800명을 이끌고 대대적인 고구려 공격에 나섰으나 고구려의 수성전, 청야전과 요동의 혹독한 기후 등으로 사실상 패퇴하였으며 이는 당나라로 정권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고구려-수 전쟁에서 2인자에 해당하는 막리지에 있던 을지문덕과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등공신 영류왕은 강경노선이었던 영양왕에 뒤를 이어 즉위한 후 줄곧 친당 노선을 유지했으나 연개소문 등 강경파들은 이러한 화친정책에 불만을 갖기 시작했으며 천리장성 축조를 계기로 중앙정계로 진출한 연개소문은 천리장성 축조 기념식을 빌미로 영류왕과 신료들을 대거 살해하는데 이를 막리지의 난이라고 한다. 막리지의 난은 그간 국내성에 기반을 둔 구 귀족이자 화친파인 국내성파와 평양성에 근거를 둔 신진 세력인 강경파 평양성파의 근본적인 대립이 대당정책을 두고 생긴 파국이었다.
이로 인해 국내성파는 상당수가 살해되고 망명하거나 몸을 사리는 지경이 되고 정권은 연개소문을 필두로 한 평양성파의 전제로 귀결되었으며 당나라와의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되었다. 보장왕을 왕으로 세운 뒤 2인자였던 막리지보다 더 높은 사실상의 1인자 대막리지라는 직위를 신설하고 그 자리에 올라 정권을 찬탈해 이후 642년부터 668년까지 26년간 연개소문의 아들들인 연남생, 연남건 등이 대대로 권력을 세습하는 연씨정권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당나라의 침략이 개시되었고 연개소문 생전에는 이를 잘 막아내었으나 사후 연남생, 남건 형제의 분열로 인해 고구려는 멸망의 길로 치닫는다.
2) 우리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꼽은 이유
연개소문의 정변은 연개소문의 과격하고 잔인한 품성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감정의 결과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대 당 외교정책을 두고 벌어진 고구려 지배 계층의 분열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고구려는 초기 수도인 국내성에서 25대왕 평원왕 시기에 평양으로 천도하였지만 그 이전인 광개토대왕 시절부터 평양은 중시되었고 실제로 광개토대왕은 직접 평양에 행차하기도 하였다. 409년에는 나라 동쪽에 독산성 등 6개의 성을 쌓고 평양의 민호를 옮겨 살게 하였다는 기록도 보인다. 아들인 장수왕 역시 대성산성(大城山城)을 쌓고 안학궁(安鶴宮)을 건설해 왕실의 위엄을 높이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는 모두가 국내성(國內城, 집안)의 귀족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연개소문 이전부터 국내성파와 평양성파의 갈등은 지속되어 왔으며 두 세력은 수시로 상대를 무시하고 비난하면서 대립하였다.
다만 연개소문의 등장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존의 지배 세력의 갈등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수나라나 당나라에 비해 인구 수도 압도적으로 적고 영토도 좁은데 여기서도 분열이 지속된 것이다. 연개소문은 정변을 통해 지배계층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했고 1인 지배체제를 확립했다. 그는 평양성파라는 강경파들의 지지로 정권 찬탈에 성공했으나 이들은 거의 연개소문의 가신들로 이후 연개소문의 행보에는 거침이 없었다. 하지만 고구려는 이후 쇠락을 길을 걷고 만다. 겉으로는 당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지만 갈등이 심화되고 내분이 깊어지고 있었던 셈이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연개소문의 정변이 기존 영류와의 대당 화친정책을 뒤엎는 것이어서 당나라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으며 고구려는 당나라의 압도적인 물량공세를 막아야 했다. 이로 인해 기존 내부 분열로 인해 약화되었던 국력이 더욱 소진되고 이로 인한 내부 분열의 싹은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연개소문이 살아 있을 때는 이러한 분열의 씨앗이 잠잠하다가 정치경험이 부족한 그의 아들들이 집권하자 갈등의 불씨는 더욱 커져 파국으로 치닫고 만다. 누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수많은 정변 중에 가장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쿠데타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이 사건을 꼽을 것이다. 바로 연개소문의 정변이다.
고구려는 이후 당나라, 신라 등과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하게 되고 국력을 총결집하여 침략에 맞서야 했지만 내분으로 인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 고구려의 멸망은 이러한 지배층의 갈등과 분열의 최종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요동과 만주를 영원히 잃게 된다.
고구려가 망한 것은 단순히 지리적, 인구사회학적 손실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드넓은 인식의 지평을 포기하고 성리학적 질서라는 중국 중심의 강고한 이념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반도에서 묶이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 『한국사의 이해』 교재 및 방송강의
- 역사문제연구소 기획,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1~5권, 웅진지식하우스, 2011
-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20.(2005년판, 2013년판을 참고해도 무방함)
-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고대사 1,2』 『고려시대사 1,2』 『조선시대사 1,2』, 『한국근대사 1,2』, 『한국현대사 1,2』, 푸른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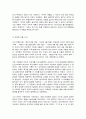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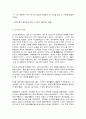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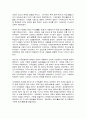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