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본론
1) 봄
2) 여름
3) 가을
4) 겨울
3.결론
4.참고문헌
2.본론
1) 봄
2) 여름
3) 가을
4) 겨울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모양으로 가장해 집집이 찾아다녀 즐겁게 놀아 주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며, 추석의 놀이로 빼먹을 수 없는 씨름도 있다.
4월 단오와 음력 7월 백중에도 즐기는 놀이지만 추석놀이로 가장 많이 즐기는데 장사는 그 자리에서 도전자가 없을 때까지 겨루어 뽑고 이기면 판막음했다고 한다. 마을과 마을의 대항전이었으며 경쟁심이 높고 추석 무렵 알찬 수확을 과시하기 위한 놀이였다.
4) 겨울
겨울의 가장 잘 알려진 세시풍속은 동지로 작은 설이라고도 한다. 24절기의 스물두 번째에 해당하며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며 낮은 가장 짧은 날로 대체로 양력 12월 22일 혹은 23일 무렵이다. 동지가 음력으로 11월 초순에 들면 애동지고 중순에 들면 중동지, 그믐 무렵이면 노동지라고 하는데 태양력인 동지에다 대음력을 잇대어 달의 모양 변화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태음태양력으로 세시풍속을 만들고 뜻을 부여했다.
동지를 아세 또는 작은 설이라고 불렀는데 이때 태양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었다.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동지 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비롯된 것이고 이를 동지 첨치라고 한다.
동지하면 바로 생각나는 것은 동지 팥죽이다. 동지 팥죽은 팥을 고아서 죽으로 만들고 여기에 찹쌀로 단자를 만들어서 넣어 끓이는데 단자는 새알만 한 크기로 만드는 반죽으로 새알심이라고도 부른다. 사당에 먼저 올려서 동지 고사를 지내고 난 뒤에 각 방과 장독, 헛간과 같이 집안 여러 곳에 놓았다가 식은 다음 식구들이 모여서 먹는 것이다. 사당에 놓은 것은 천신의 뜻이며 집 안 곳곳에 놓은 것은 축귀의 뜻으로 팥의 붉은색은 양색이라 음귀를 쫓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대문이나 문 근처의 벽에다가 팥을 뿌리는 것도 악귀를 쫓는 주술행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애동지에는 아이들에게는 나쁘다고 해서 팥죽을 쑤지 않았다고 한다.
3.결론
세시풍속은 월령, 세시로 불리기도 하면서 예로부터 전해지는 농경사회의 풍속이라는 것으로 해마다 농사력에 따라 관습적으로 행했던 전승 행사다. 근본적으로 세시풍속은 생존의 수단이었던 노동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시풍속은 전통적으로 24절기와 명절로 구분했다고 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역법은 태양력과 태음력이 혼합된 음력으로 24절기는 양력, 명절은 음력에 따라 만들었다고 한다. 24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1년을 24등분하고, 춘하추동으로 4등분 하여 6절기씩 나눠서 한 달에 2절기가 들어가며 절기 하나하나마다 고유한 세시풍속이 형성됐다. 명절은 음력으로 정해진 절기며, 음력의 달력 숫자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해서 만드는데 날짜에 대한 자의적 의미 부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설날과 추석과 같은 대표적인 세시풍속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태양을 기준으로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고, 달의 주기를 보고 달력을 만들어 내면서 세시풍속은 우리 조상의 생활 과정에서 리듬을 주는 생활의 악센트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계절별로 가장 대표적인 세시풍속을 알아봄으로써 조상들이 각 계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 특징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시풍속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그 의미도 각기 다르지만, 대표적인 설날, 단오, 추석, 동지는 변화가 있으나 과거 조상들의 풍습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시대가 변화하더라도 우리나라만의 세시풍속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참고문헌
1) 고운기. 한국 문화자원의 이해. 서울: KNOU Press, 2017.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세시풍속,
4월 단오와 음력 7월 백중에도 즐기는 놀이지만 추석놀이로 가장 많이 즐기는데 장사는 그 자리에서 도전자가 없을 때까지 겨루어 뽑고 이기면 판막음했다고 한다. 마을과 마을의 대항전이었으며 경쟁심이 높고 추석 무렵 알찬 수확을 과시하기 위한 놀이였다.
4) 겨울
겨울의 가장 잘 알려진 세시풍속은 동지로 작은 설이라고도 한다. 24절기의 스물두 번째에 해당하며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며 낮은 가장 짧은 날로 대체로 양력 12월 22일 혹은 23일 무렵이다. 동지가 음력으로 11월 초순에 들면 애동지고 중순에 들면 중동지, 그믐 무렵이면 노동지라고 하는데 태양력인 동지에다 대음력을 잇대어 달의 모양 변화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태음태양력으로 세시풍속을 만들고 뜻을 부여했다.
동지를 아세 또는 작은 설이라고 불렀는데 이때 태양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었다.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동지 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비롯된 것이고 이를 동지 첨치라고 한다.
동지하면 바로 생각나는 것은 동지 팥죽이다. 동지 팥죽은 팥을 고아서 죽으로 만들고 여기에 찹쌀로 단자를 만들어서 넣어 끓이는데 단자는 새알만 한 크기로 만드는 반죽으로 새알심이라고도 부른다. 사당에 먼저 올려서 동지 고사를 지내고 난 뒤에 각 방과 장독, 헛간과 같이 집안 여러 곳에 놓았다가 식은 다음 식구들이 모여서 먹는 것이다. 사당에 놓은 것은 천신의 뜻이며 집 안 곳곳에 놓은 것은 축귀의 뜻으로 팥의 붉은색은 양색이라 음귀를 쫓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대문이나 문 근처의 벽에다가 팥을 뿌리는 것도 악귀를 쫓는 주술행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애동지에는 아이들에게는 나쁘다고 해서 팥죽을 쑤지 않았다고 한다.
3.결론
세시풍속은 월령, 세시로 불리기도 하면서 예로부터 전해지는 농경사회의 풍속이라는 것으로 해마다 농사력에 따라 관습적으로 행했던 전승 행사다. 근본적으로 세시풍속은 생존의 수단이었던 노동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시풍속은 전통적으로 24절기와 명절로 구분했다고 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역법은 태양력과 태음력이 혼합된 음력으로 24절기는 양력, 명절은 음력에 따라 만들었다고 한다. 24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1년을 24등분하고, 춘하추동으로 4등분 하여 6절기씩 나눠서 한 달에 2절기가 들어가며 절기 하나하나마다 고유한 세시풍속이 형성됐다. 명절은 음력으로 정해진 절기며, 음력의 달력 숫자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해서 만드는데 날짜에 대한 자의적 의미 부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설날과 추석과 같은 대표적인 세시풍속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태양을 기준으로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고, 달의 주기를 보고 달력을 만들어 내면서 세시풍속은 우리 조상의 생활 과정에서 리듬을 주는 생활의 악센트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계절별로 가장 대표적인 세시풍속을 알아봄으로써 조상들이 각 계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 특징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시풍속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그 의미도 각기 다르지만, 대표적인 설날, 단오, 추석, 동지는 변화가 있으나 과거 조상들의 풍습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시대가 변화하더라도 우리나라만의 세시풍속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참고문헌
1) 고운기. 한국 문화자원의 이해. 서울: KNOU Press, 2017.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세시풍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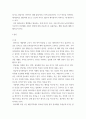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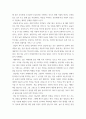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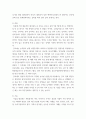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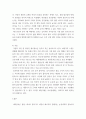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