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동승에서의 ‘도념’은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주지의 역할은 무엇일까?
2.1 극의 요약 및 해설
2.1.1 극의 초반부
2.1.2 극의 중반부
2.1.3 극의 후반부
2.2 관련 논문 소개 및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
3. 결론
참고문헌
2. 본론: 동승에서의 ‘도념’은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주지의 역할은 무엇일까?
2.1 극의 요약 및 해설
2.1.1 극의 초반부
2.1.2 극의 중반부
2.1.3 극의 후반부
2.2 관련 논문 소개 및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무시되고 결국 도념은 떠나게 된다. 이를 보고 논문 저자는 함세덕의 희곡에서 소년은 순진무구, 결백의 이미지이며, 그들이 훼손되는 과정은 관객에게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 관객은 어린이의 순수함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이 파괴당하면서 전개되는 극의 내용에 더욱더 집중을 하며 어린아이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본인은 이에 대하여 스님은 오히려 도념의 순수한 욕망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스님의 강압적인 태도는 오히려 도념이 어머니를 찾아 속세로 떠나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는 역할을 하였지만, 만일 스님의 이러한 태도와 돌봄이 존재하지 않는 속세에서 도념이 살고 있었다면 이러한 순수함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을까 싶었다. 본 극에서 나이가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번뇌를 얻게 될 것이라는 미망인의 언급에 스님은 그렇더라도 속세를 가게 되었으면 술을 먹거나 계집을 탐내는 등의 육계를 행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나 여기서는 단지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기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서 스님은 오히려 어린이라는 순수함 그 자체의 모습을 유지시켜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하였다. 즉, 스님에 주인공인 도념을 오히려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동승의 도념과 주지 스님을 비교하여 함세덕의 소설에서 담고 있는 소년 주인공의 모습을 설명하고자 하였고, 도념은 순수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주지와 대결 구도를 보이지만 결국 수난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고 떠나는 성장형 어린이의 모습을 보인다. 주지는 이러한 순수한 욕망을 훼손시킴으로써 주인공인 도념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극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며 강압적으로 불교적인 윤리를 강조함으로써 도념의 의지를 꺾고자 하는 어른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이에 대하여 조금 다르게 보았다. 주지를 악인으로 설명한 본 논문과는 다르게 본인은 주지가 오히려 이러한 도념의 신념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유지시켜주는 매개체이며, 도념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매개체라고 생각하였다. 도념이 주지의 보살핌이 없었더라면 속세에서 살아가며 마냥 어머니만을 그리워하는 순수한 욕망을 보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도념을 속세로 보내지 않고자 하는 주지의 행동으로 인해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굴복하고 살아갔던 도념이 직접 속세로 떠나 어머니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3. 결론
본 보고서는 함세덕의 ‘동승’을 통해서 함세덕이 소설 속에 담고자 하였던 소년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어린이와 대치하는 어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이에 따라 함세덕의 동승을 주인공인 ‘도념’을 중심으로 하여 내용 정리를 하였으며, ‘도념’이 왜 이런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연결되는 연결 고리를 일부 인용하여 담았다.
본 보고서에서 참고한 논문은 함세덕의 소설에서 소년이란 순수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순진무구의 역할이며, 이러한 순수함이 훼손되면서 극이 전개되고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관객은 전개 상황에 따라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 어린이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소년의 의지를 꺾는 역할을 어른으로 정하였으며, 어른의 강압에 의해 어린이는 신념이 꺾일 뻔 하지만 결국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는 인물로 성장하여 떠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이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를 두며 생각하였다. 어른을 악인으로 본 논문과는 다르게 어른은 오히려 소년의 순수한 욕망을 유지해 주고, 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일 주지라는 어른이 없었더라면 소년은 속세에서 살아가며 어머니를 보고 싶다는 순수한 욕망만을 가지고 있는 소년으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스님의 신념에 덕분에 소년은 상황에 굴복하고 사는 어린이가 아닌 더욱 성장하여 나아가는 소년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즉, 함세덕의 소설 ‘동승’에서 소년은 악인이라고 여겨지는 어른 ‘주지’에 의하여 순수함이 유지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참고문헌
양신, (2017). 동승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윤경, (2010). 함세덕 초기 희곡의 성장 모티프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이상우, (2009). 함세덕과 아이들, 한국극예술학회
하지만 본인은 이에 대하여 스님은 오히려 도념의 순수한 욕망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스님의 강압적인 태도는 오히려 도념이 어머니를 찾아 속세로 떠나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는 역할을 하였지만, 만일 스님의 이러한 태도와 돌봄이 존재하지 않는 속세에서 도념이 살고 있었다면 이러한 순수함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을까 싶었다. 본 극에서 나이가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번뇌를 얻게 될 것이라는 미망인의 언급에 스님은 그렇더라도 속세를 가게 되었으면 술을 먹거나 계집을 탐내는 등의 육계를 행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나 여기서는 단지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기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서 스님은 오히려 어린이라는 순수함 그 자체의 모습을 유지시켜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하였다. 즉, 스님에 주인공인 도념을 오히려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동승의 도념과 주지 스님을 비교하여 함세덕의 소설에서 담고 있는 소년 주인공의 모습을 설명하고자 하였고, 도념은 순수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주지와 대결 구도를 보이지만 결국 수난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고 떠나는 성장형 어린이의 모습을 보인다. 주지는 이러한 순수한 욕망을 훼손시킴으로써 주인공인 도념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극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며 강압적으로 불교적인 윤리를 강조함으로써 도념의 의지를 꺾고자 하는 어른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이에 대하여 조금 다르게 보았다. 주지를 악인으로 설명한 본 논문과는 다르게 본인은 주지가 오히려 이러한 도념의 신념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유지시켜주는 매개체이며, 도념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매개체라고 생각하였다. 도념이 주지의 보살핌이 없었더라면 속세에서 살아가며 마냥 어머니만을 그리워하는 순수한 욕망을 보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도념을 속세로 보내지 않고자 하는 주지의 행동으로 인해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굴복하고 살아갔던 도념이 직접 속세로 떠나 어머니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3. 결론
본 보고서는 함세덕의 ‘동승’을 통해서 함세덕이 소설 속에 담고자 하였던 소년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어린이와 대치하는 어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이에 따라 함세덕의 동승을 주인공인 ‘도념’을 중심으로 하여 내용 정리를 하였으며, ‘도념’이 왜 이런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연결되는 연결 고리를 일부 인용하여 담았다.
본 보고서에서 참고한 논문은 함세덕의 소설에서 소년이란 순수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순진무구의 역할이며, 이러한 순수함이 훼손되면서 극이 전개되고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관객은 전개 상황에 따라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 어린이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소년의 의지를 꺾는 역할을 어른으로 정하였으며, 어른의 강압에 의해 어린이는 신념이 꺾일 뻔 하지만 결국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는 인물로 성장하여 떠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이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를 두며 생각하였다. 어른을 악인으로 본 논문과는 다르게 어른은 오히려 소년의 순수한 욕망을 유지해 주고, 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일 주지라는 어른이 없었더라면 소년은 속세에서 살아가며 어머니를 보고 싶다는 순수한 욕망만을 가지고 있는 소년으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스님의 신념에 덕분에 소년은 상황에 굴복하고 사는 어린이가 아닌 더욱 성장하여 나아가는 소년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즉, 함세덕의 소설 ‘동승’에서 소년은 악인이라고 여겨지는 어른 ‘주지’에 의하여 순수함이 유지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참고문헌
양신, (2017). 동승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윤경, (2010). 함세덕 초기 희곡의 성장 모티프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이상우, (2009). 함세덕과 아이들, 한국극예술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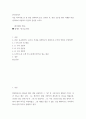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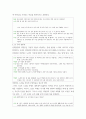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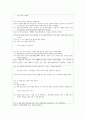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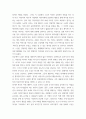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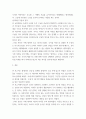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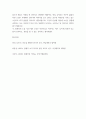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