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실험목적
2. 실험 원리
3. 실험 도구 및 실험 방법
4. 측정값
5. 실험 결과
6. 결과에 대한 논의
7. 결론
8. 참고문헌 및 출처
2. 실험 원리
3. 실험 도구 및 실험 방법
4. 측정값
5. 실험 결과
6. 결과에 대한 논의
7. 결론
8.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a gel과의 상호작용이 더 강하므로 이동상에 의한 이동이 느리다. 따라서 극성이 큰 물질일수록 값이 작으므로 미지시료에 목단피보다 극성이 큰 미지시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TLC를 이용한 행인의 확인시험
실험1차) 행인과 미지시료의 값이 같으므로 미지시료에 행인이 들어있다.
실험2차) 행인과 미지시료의 값이 같으므로 미지시료에 행인이 들어있다.
실험 1차와 2차에서 미지시료에 행인에 나타나지 않는 spot이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 미지시료에 행인이외의 다른 생약으로 인해 발색반응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7. 결론
미지시료에는 갈근, 백지, 치자, 목단피, 행인 5가지의 생약 중 백지, 치자, 행인 3가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백지, 치자, 행인은 미지시료와 같은 값이 나왔지만 갈근과 목단피는 미지시료와 다른 값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때, 갈근과 목단피의 값을 통해 미지시료를 구성하는 생약들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실험 1에서는 미지시료에 갈근보다 값이 큰 spot이 나왔고, 실험 4에서는 미지시료에 목단피보다 값이 작은 spot이 나왔다. 따라서 미지시료에는 갈근보다 극성이 작은 생약과 목단피보다 극성이 큰 생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험 5에서 행인에 나타나지 않은 spot이 미지시료에 나타난 이유가 백지 혹은 치자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험 1~5까지 사용한 미지시료는 같았으나 미지시료의 값이 서로 다르게 나왔다. 그 이유로는 전개용매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전개용매의 혼합비율이 다르거나 사용되는 전개용매가 다르다면 전개용매의 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값이 차이난다.
TLC를 이용한 갈근의 확인시험에서 실험 1차와 실험 2차의 값의 차이가 컸다. 같은 생약과 미지시료를 사용했지만 값이 차이나는 이유로는 앞에서 언급했던 전개용매 혼합비율의 차이로 들 수 있다. 실험 2차에서는 다시 전개용매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실험 1차와 전개용매의 혼합비율에서 오차가 생겨 값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TLC를 진행하면서 오차가 생긴 원인으로는 전개 용매가 정확히 용매선에서 멈추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조와 달리 TLC 판에서 번짐 정도가 큰 spot 나왔는데 그 이유는 생약 추출물을 TLC 판에 한 번 점적할 때의 양 때문이었다. 오른쪽 그림에서 왼쪽 갈근은 한 번 점적할 때 모세관을 통해 많은 양을 점적했었지만 오른쪽 미지시료의 경우 한 번 점적할 때 적은 양을 점적했었다. 두 경우 모두 한 번 점적 후 드라이기로 말린 후 다시 점적하는 과정을 똑같이 4번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모든 과정을 똑같이 진행하였다. 따라서 한 번 점적할 때의 양이 많아질수록 번짐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LC를 진행한 후 값을 측정할 때는 오른쪽과 같이 한 번에 적게 점적한 생약이 계산하기 수월하므로 다음 실험에서는 적게 점적하도록 진행하도록 결심하였다.
8. 참고문헌 및 출처
1) 숙명여자대학교 강교빈 교수님 강의 자료, TLC를 이용한 생약의 확인시험
5) TLC를 이용한 행인의 확인시험
실험1차) 행인과 미지시료의 값이 같으므로 미지시료에 행인이 들어있다.
실험2차) 행인과 미지시료의 값이 같으므로 미지시료에 행인이 들어있다.
실험 1차와 2차에서 미지시료에 행인에 나타나지 않는 spot이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 미지시료에 행인이외의 다른 생약으로 인해 발색반응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7. 결론
미지시료에는 갈근, 백지, 치자, 목단피, 행인 5가지의 생약 중 백지, 치자, 행인 3가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백지, 치자, 행인은 미지시료와 같은 값이 나왔지만 갈근과 목단피는 미지시료와 다른 값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때, 갈근과 목단피의 값을 통해 미지시료를 구성하는 생약들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실험 1에서는 미지시료에 갈근보다 값이 큰 spot이 나왔고, 실험 4에서는 미지시료에 목단피보다 값이 작은 spot이 나왔다. 따라서 미지시료에는 갈근보다 극성이 작은 생약과 목단피보다 극성이 큰 생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험 5에서 행인에 나타나지 않은 spot이 미지시료에 나타난 이유가 백지 혹은 치자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험 1~5까지 사용한 미지시료는 같았으나 미지시료의 값이 서로 다르게 나왔다. 그 이유로는 전개용매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전개용매의 혼합비율이 다르거나 사용되는 전개용매가 다르다면 전개용매의 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값이 차이난다.
TLC를 이용한 갈근의 확인시험에서 실험 1차와 실험 2차의 값의 차이가 컸다. 같은 생약과 미지시료를 사용했지만 값이 차이나는 이유로는 앞에서 언급했던 전개용매 혼합비율의 차이로 들 수 있다. 실험 2차에서는 다시 전개용매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실험 1차와 전개용매의 혼합비율에서 오차가 생겨 값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TLC를 진행하면서 오차가 생긴 원인으로는 전개 용매가 정확히 용매선에서 멈추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조와 달리 TLC 판에서 번짐 정도가 큰 spot 나왔는데 그 이유는 생약 추출물을 TLC 판에 한 번 점적할 때의 양 때문이었다. 오른쪽 그림에서 왼쪽 갈근은 한 번 점적할 때 모세관을 통해 많은 양을 점적했었지만 오른쪽 미지시료의 경우 한 번 점적할 때 적은 양을 점적했었다. 두 경우 모두 한 번 점적 후 드라이기로 말린 후 다시 점적하는 과정을 똑같이 4번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모든 과정을 똑같이 진행하였다. 따라서 한 번 점적할 때의 양이 많아질수록 번짐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LC를 진행한 후 값을 측정할 때는 오른쪽과 같이 한 번에 적게 점적한 생약이 계산하기 수월하므로 다음 실험에서는 적게 점적하도록 진행하도록 결심하였다.
8. 참고문헌 및 출처
1) 숙명여자대학교 강교빈 교수님 강의 자료, TLC를 이용한 생약의 확인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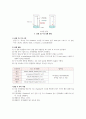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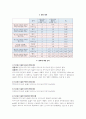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