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조선 여성이 제국주의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 동원된 과정을 서술하시오
2. 일본 신중간층의 형성과 그 생활난에 대해 서술하시오
3. 거트루드 지킬이 정원 디자이너라는 업종을 개척해간 과정에 대해 서술하시오
4. 인디언 혼혈 여성 ‘산비둘기’가 집필한 소설 『혼혈인 코지위아』의 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5. 1984년 알제리 의회에서 전격 가결된 가족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2. 일본 신중간층의 형성과 그 생활난에 대해 서술하시오
3. 거트루드 지킬이 정원 디자이너라는 업종을 개척해간 과정에 대해 서술하시오
4. 인디언 혼혈 여성 ‘산비둘기’가 집필한 소설 『혼혈인 코지위아』의 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5. 1984년 알제리 의회에서 전격 가결된 가족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인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유언장을 썼지만, 이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른 코지위아의 아버지의 유언장은 무효가 되고, 아버지의 실수 덕분에 아버지의 혼혈인 자식들이 유산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소설은 훗날 출간되면서, 철저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백인 캐릭터에 백인 독자들이 많은 충격을 느꼈다.
5. 1984년 알제리 의회에서 전격 가결된 가족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 알제리는 식민지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제적·문화적 혼란에 빠졌다. 20세기 후박에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은 쿠데타와 혁명을 겪어야 했다. 알제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알제리는 자신들의 지배했던 국가인 프랑스에 대한 분노가 컸다. 이들은 이에서 벗어나 가장 ‘알제리’다운 문화를 회복하려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주의를 표방한 무장세력에 의하여 작가와 기자, 학자 등이 살해되었다.
모든 식민지의 절차가 그러하듯 알제리 역시 서구화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이에 대한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았다. 이슬람 국가인 알제리의 주요 세력인 이슬람주의 세력은 지식인과 여성을 문제 삼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여성이 계급을 막론하고 핍박받고 살해되었다.
언뜻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불똥이 튄 것 같지만 이는 서구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의 히잡, 직업, 여성의 지위 등이 프랑스 문화를 받아들이며 개방적으로 변한 것에 이슬람주의 세력이 크게 분노한 것이다. 당시 독립 이후에 극심한 국가적 정체성 혼란을 겪었던 알제리는 다시 ‘우리’를 찾는 일에 집중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는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이슬람 정책에 따르면 여성은 직업을 갖는 등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정절을 지켜야 했다. 특히 1984년에 가결된 ‘가족법’은 결혼, 이혼, 자녀 양육권 같은 문제를 남성 위주로 규정했다. 즉, 가족법은 남성의 권위를 세우고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여성은 결혼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었다. 아버지나 남자형제 같은 자신의 후견인이 여성의 결혼 상대를 결정했다. 또한 여성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남성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 법에 따르면 여성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이혼을 당하고, 궁핍한 생활 속에 내몰려도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알제리 여성은 아이러니하게도 식민지배를 당하는 동안 고등 교육을 받았다. 즉, 식민지배를 통해 여성의 지위가 어느정도 올라갔다고 할 수 있었는데, 알제리는 이에 대한 반발심이 컸다. 프랑스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는 과정에서 여성 지위의 상승 역시 배척해야 할 프랑스 문화의 잔재일 뿐이었다. 이들은 여성 해방이 식민지 유산이며, 이를 몰아내고 다시 이슬람주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여성들은 가족법에 저항했다. 이 때문에 이슬람주의 세력이 점점 권력의 중점이 됨에 따라 여성은 더욱 억압받았다. ‘가족법’이 지정한 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여성은 마땅히 폭력당하고 죽여도 되는 존재로 여겨졌다.
5. 1984년 알제리 의회에서 전격 가결된 가족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 알제리는 식민지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제적·문화적 혼란에 빠졌다. 20세기 후박에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은 쿠데타와 혁명을 겪어야 했다. 알제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알제리는 자신들의 지배했던 국가인 프랑스에 대한 분노가 컸다. 이들은 이에서 벗어나 가장 ‘알제리’다운 문화를 회복하려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주의를 표방한 무장세력에 의하여 작가와 기자, 학자 등이 살해되었다.
모든 식민지의 절차가 그러하듯 알제리 역시 서구화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이에 대한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았다. 이슬람 국가인 알제리의 주요 세력인 이슬람주의 세력은 지식인과 여성을 문제 삼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여성이 계급을 막론하고 핍박받고 살해되었다.
언뜻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불똥이 튄 것 같지만 이는 서구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의 히잡, 직업, 여성의 지위 등이 프랑스 문화를 받아들이며 개방적으로 변한 것에 이슬람주의 세력이 크게 분노한 것이다. 당시 독립 이후에 극심한 국가적 정체성 혼란을 겪었던 알제리는 다시 ‘우리’를 찾는 일에 집중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는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이슬람 정책에 따르면 여성은 직업을 갖는 등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정절을 지켜야 했다. 특히 1984년에 가결된 ‘가족법’은 결혼, 이혼, 자녀 양육권 같은 문제를 남성 위주로 규정했다. 즉, 가족법은 남성의 권위를 세우고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여성은 결혼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었다. 아버지나 남자형제 같은 자신의 후견인이 여성의 결혼 상대를 결정했다. 또한 여성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남성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 법에 따르면 여성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이혼을 당하고, 궁핍한 생활 속에 내몰려도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알제리 여성은 아이러니하게도 식민지배를 당하는 동안 고등 교육을 받았다. 즉, 식민지배를 통해 여성의 지위가 어느정도 올라갔다고 할 수 있었는데, 알제리는 이에 대한 반발심이 컸다. 프랑스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는 과정에서 여성 지위의 상승 역시 배척해야 할 프랑스 문화의 잔재일 뿐이었다. 이들은 여성 해방이 식민지 유산이며, 이를 몰아내고 다시 이슬람주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여성들은 가족법에 저항했다. 이 때문에 이슬람주의 세력이 점점 권력의 중점이 됨에 따라 여성은 더욱 억압받았다. ‘가족법’이 지정한 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여성은 마땅히 폭력당하고 죽여도 되는 존재로 여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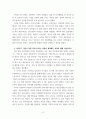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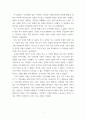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