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의복구성
목차
1. 한복 소재로 사용되는 천연섬유 직물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시오.
(10점) 교재 참고. p.19~24
2. 여자 한복의 옷차림과 여자 저고리의 시대별 변화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교재 참고. p.39~50
3. 남자 한복에서 반수의 또는 무수의 복식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시오.
(10점) 교재 참고. p.129~141
4. 침선소품 주머니에 대해 설명하고, 귀주머니와 두루주머니의 형태와 특징을
비교하시오.(10점) 교재 참고. p.297~308, 320~332
참고문헌
목차
1. 한복 소재로 사용되는 천연섬유 직물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시오.
(10점) 교재 참고. p.19~24
2. 여자 한복의 옷차림과 여자 저고리의 시대별 변화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교재 참고. p.39~50
3. 남자 한복에서 반수의 또는 무수의 복식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시오.
(10점) 교재 참고. p.129~141
4. 침선소품 주머니에 대해 설명하고, 귀주머니와 두루주머니의 형태와 특징을
비교하시오.(10점) 교재 참고. p.297~308, 320~332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사하는 풍속이 있었는데, 최남선의『朝鮮常識』에 “上亥日은 돗날, 上子日은 쥐날 이라 하여 민간에서는 각 해당하는 날에 그 취단(嘴端)을 초소(焦燒)하는 행사가 있으니, 대개 시(豕)와 서(鼠)는 농작물에 대한 대표적 해축(害畜)이므로 혹 콩을 볶거나 혹 무엇을 태우는 등의 그 주둥이를 지지는 표상적 주술로서 그 해가 적기를 기축(祈祝)함인데, …조정에서는 궁중의 小宦侍 十百 으로 하여금 거화행진(炬火行進) 행하여 ‘돗회부리 지진다’를 외치면서 궁중으로 주행(周行)케 하고 곡종(穀種)을 태워서 圓長二形의 錦囊에 넣어 閣臣과 宰相에 頒賜하니 다 年穀을 祈祝하는 意인데, 이주머니의 圓한 것을 해낭(亥囊), 長한 것을 자낭(子囊)이라 불렀다” 하였다.
또한『宮中撥記』에 보면 정월(正月) 첫 해일(亥日)에 궁내(宮內)는 물론 종친들에게 ‘주머니’를 하사하고 있다. 이들 주머니는 조그마한 물건이긴 하였지만 내인(內人)들의 정성어린 잔손이 가고 거기에다 부적 같은 뜻을 지녔기 때문에 환영받는 선물이었다 한다. 즉 그 주머니 속에는 볶은 콩 한 알씩 넣어 하사하였는데, 이를 정월(正月) 첫 해일(亥日)에 참으로서 일년내내 악귀를 물리치고 만복(萬福)을 받을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민간에서는 또한 붉은 바탕에 수놓은 주머니를 평생에 세 개를 이어서 차게 되면 후세에 좋은 곳에 간다는 속신(俗信)이 있어서 노인들은 붉은색의 자수주머니를 차는 것을 즐겼다. 그 이유는 수(繡)와 음(音)이 같은 수(壽)가 목숨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특히 어른들에게 드리는 주머니에는 장생(長生)을 기원하기 위해 십장생무늬를 수놓았다. 돌이나 환갑 같은 잔치 때에도 주머니를 선물하는 것이 통례였고, 새댁이 첫 근친을 갔다가 시댁으로 돌아 올때는‘효도주머니’라 하여 손수 정성껏 지은 주머니를 시댁 어른들게 드리는 것이 법도였다. 혼례 때에는 팥 아홉알과 씨가 박힌 목화 등을 넣은 두루주머니를 함 (函)안에 넣었다. 이것은 자손이 번창하라는 뜻을 지닌 것으로 지방에 따라 주머니 안에 내용물의 차이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반면 상(喪)을 당하면 위로는 왕에서부터 아래로는 천민에 이르기까지 소색(素色)주머니를 찼다.
주머니를 분류해보면 장식에 따라 비빈만이 차는 ‘眞珠琅子’부향낭 중 가장 고귀하게 만들어진 것은 “진주낭자”라고 하여 이것은 왕비 정장에만 찼던 것이라 하는데, 국말 윤비(純宗妃: 純貞孝皇后)의 것을 보면 홍색 공단 주머니 전면에 녹두알만한 아주 작은 진주를 수없이 금사에 꿰어달고 있어, 그 진주의 알들이 반짝이는 모습은 황홀한 정도였다 한다. 이것은 옆이 20cm, 높이가 12cm로서 크기로 보아 노리개에 매어단것은 아니고 염낭과 같이 단독으로 찬 것이라 하겠다.
터 수를 놓은 수낭(繡囊), 그 위에 금박(金箔)을 한 부금낭이 있고, 용도에 따라서는 향을 담는 향주머니, 약을 담은 약주머니, 부적을 몸에 지니기 위한 부적주머니, 부싯돌과 담배를 담은 부시주머니와 쌈지, 붓을 보관했던 필낭(筆囊), 도장을 보관했던 도장주머니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형태에 따라서는 크게 염낭(=亥囊), 귀주머니(=子囊), 약주머니, 사각주머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소재에 따라서는 숙고사(熟庫紗)주머니, 갑사(甲紗)주머니, 모본단(模本緞)주머니, 명주(明紬)주머니, 무명주머니, 가죽주머니, 종이 주머니 등이 있다.
염낭은 해낭(亥囊)이라고 하며 가장 흔히 쓰여진 주머니로 둥근 형태이다. 윗부분에 주름을 잡고 두 줄의 끈을 마주 꿰게 된 작은 주머니로 위는 모가 지고 아래는 둥근데, 끈을 졸라매면 위가 더욱 오그라져 전체가 둥근형태가 된다. 입구의 주름은 보통 5,7,9,11개 등 홀수로 접지만, 입구를 귀주머니식으로 접은 것도 있다.
귀주머니는 자낭(子囊)이라고도 하며 정사각형의 주머니 형태를 만들어 입구부분에서 세 골로 접어 아래의 양쪽으로 귀가 나오게 된 주머니이다. 귀주머니의 특징은 닳기 쉬운(제일 마찰이 심한 부분) 양쪽 모서리인 두 귀와 중앙부 아래쪽을 따라 감싸듯이 한 겹 덧 대고, 그 가장자리에 곱게 상침하여 장식적 효과와 실용적 효과를 겸하고 있다. 주머니의 기본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둥근 모양의 두루주머니(혹은 염낭, 환형낭丸形囊)와 각진 귀주머니(혹은 줌치, 각형낭角形囊)로 나뉜다. 두루주머니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주머니로 반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주머니의 끈이 주머니 상단에 꿰어져 있는 것을 고뉴高紐, 중간에 매어져 있는 것을 중뉴中紐, 하단에 매어져 있는 것을 저뉴低紐라고 한다. 귀주머니는 네모지게 꾸며서 입구 위를 두 번 접어 아래 양쪽으로 귀가 나와 양옆이 모가 진 형태의 주머니이다. 주머니는 별도의 천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옷을 짓고 남은 조각 천을 이용했다. ‘규합총서’를 쓴 빙허각 이씨는 귀주머니는 나비 5치 5푼, 길이 7치 5푼이면 귀까지 만든다고 하였으며, 두루주머니는 나비 5치, 길이 2치 5푼으로 만들어야 손실이 적다고 했다.
긴 직사각형의 천 2장을 마주대고 접어 창구멍으로 뒤집은 후, 사선으로 접어 솔기를 마주대고 겉에서 감침한 것으로 양옆 중앙에 주름을 잡아 끈을 꿰고 나머지 부분을 앞으로 넘기면 삼각형모양의 두껑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방법으로 길게 접어 만든 필낭이나 수저집의 형태도 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주머니의 형태는 둥근 모양의 두루주머니(염낭, 협낭(夾囊))와 각이 진 귀주머니(줌치, 각낭(角囊))가 대표적이다. 두루주머니는 둥글게 만들어 주머니 입에 주름을 잡는다.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9개까지 주름을 잡은 후, 입 양쪽으로 끈을 꿰어 잡아당긴다. 귀주머니는 네모지게 만들어 아래 양쪽으로 귀가 나오도록 한 후, 주머니의 중간쯤에 끈을 꿰어 잡아당긴다. 두루주머니. 부귀다남의 염원을 담아 수를 놓고 괴불, 연꽃, 봉술을 달아 장식한 복주머니다. 주로 두루주머니는 여성이, 귀주머니는 남성이 애용했다. 여기에 도장주머니, 향주머니, 붓주머니, 수저주머니, 부채주머니, 버선주머니 등 내용물에 따라 주머니의 모양을 다르게 한다.
[참고문헌]
교재『한국의복구성』박현정 이혜진 김순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또한『宮中撥記』에 보면 정월(正月) 첫 해일(亥日)에 궁내(宮內)는 물론 종친들에게 ‘주머니’를 하사하고 있다. 이들 주머니는 조그마한 물건이긴 하였지만 내인(內人)들의 정성어린 잔손이 가고 거기에다 부적 같은 뜻을 지녔기 때문에 환영받는 선물이었다 한다. 즉 그 주머니 속에는 볶은 콩 한 알씩 넣어 하사하였는데, 이를 정월(正月) 첫 해일(亥日)에 참으로서 일년내내 악귀를 물리치고 만복(萬福)을 받을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민간에서는 또한 붉은 바탕에 수놓은 주머니를 평생에 세 개를 이어서 차게 되면 후세에 좋은 곳에 간다는 속신(俗信)이 있어서 노인들은 붉은색의 자수주머니를 차는 것을 즐겼다. 그 이유는 수(繡)와 음(音)이 같은 수(壽)가 목숨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특히 어른들에게 드리는 주머니에는 장생(長生)을 기원하기 위해 십장생무늬를 수놓았다. 돌이나 환갑 같은 잔치 때에도 주머니를 선물하는 것이 통례였고, 새댁이 첫 근친을 갔다가 시댁으로 돌아 올때는‘효도주머니’라 하여 손수 정성껏 지은 주머니를 시댁 어른들게 드리는 것이 법도였다. 혼례 때에는 팥 아홉알과 씨가 박힌 목화 등을 넣은 두루주머니를 함 (函)안에 넣었다. 이것은 자손이 번창하라는 뜻을 지닌 것으로 지방에 따라 주머니 안에 내용물의 차이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반면 상(喪)을 당하면 위로는 왕에서부터 아래로는 천민에 이르기까지 소색(素色)주머니를 찼다.
주머니를 분류해보면 장식에 따라 비빈만이 차는 ‘眞珠琅子’부향낭 중 가장 고귀하게 만들어진 것은 “진주낭자”라고 하여 이것은 왕비 정장에만 찼던 것이라 하는데, 국말 윤비(純宗妃: 純貞孝皇后)의 것을 보면 홍색 공단 주머니 전면에 녹두알만한 아주 작은 진주를 수없이 금사에 꿰어달고 있어, 그 진주의 알들이 반짝이는 모습은 황홀한 정도였다 한다. 이것은 옆이 20cm, 높이가 12cm로서 크기로 보아 노리개에 매어단것은 아니고 염낭과 같이 단독으로 찬 것이라 하겠다.
터 수를 놓은 수낭(繡囊), 그 위에 금박(金箔)을 한 부금낭이 있고, 용도에 따라서는 향을 담는 향주머니, 약을 담은 약주머니, 부적을 몸에 지니기 위한 부적주머니, 부싯돌과 담배를 담은 부시주머니와 쌈지, 붓을 보관했던 필낭(筆囊), 도장을 보관했던 도장주머니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형태에 따라서는 크게 염낭(=亥囊), 귀주머니(=子囊), 약주머니, 사각주머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소재에 따라서는 숙고사(熟庫紗)주머니, 갑사(甲紗)주머니, 모본단(模本緞)주머니, 명주(明紬)주머니, 무명주머니, 가죽주머니, 종이 주머니 등이 있다.
염낭은 해낭(亥囊)이라고 하며 가장 흔히 쓰여진 주머니로 둥근 형태이다. 윗부분에 주름을 잡고 두 줄의 끈을 마주 꿰게 된 작은 주머니로 위는 모가 지고 아래는 둥근데, 끈을 졸라매면 위가 더욱 오그라져 전체가 둥근형태가 된다. 입구의 주름은 보통 5,7,9,11개 등 홀수로 접지만, 입구를 귀주머니식으로 접은 것도 있다.
귀주머니는 자낭(子囊)이라고도 하며 정사각형의 주머니 형태를 만들어 입구부분에서 세 골로 접어 아래의 양쪽으로 귀가 나오게 된 주머니이다. 귀주머니의 특징은 닳기 쉬운(제일 마찰이 심한 부분) 양쪽 모서리인 두 귀와 중앙부 아래쪽을 따라 감싸듯이 한 겹 덧 대고, 그 가장자리에 곱게 상침하여 장식적 효과와 실용적 효과를 겸하고 있다. 주머니의 기본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둥근 모양의 두루주머니(혹은 염낭, 환형낭丸形囊)와 각진 귀주머니(혹은 줌치, 각형낭角形囊)로 나뉜다. 두루주머니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주머니로 반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주머니의 끈이 주머니 상단에 꿰어져 있는 것을 고뉴高紐, 중간에 매어져 있는 것을 중뉴中紐, 하단에 매어져 있는 것을 저뉴低紐라고 한다. 귀주머니는 네모지게 꾸며서 입구 위를 두 번 접어 아래 양쪽으로 귀가 나와 양옆이 모가 진 형태의 주머니이다. 주머니는 별도의 천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옷을 짓고 남은 조각 천을 이용했다. ‘규합총서’를 쓴 빙허각 이씨는 귀주머니는 나비 5치 5푼, 길이 7치 5푼이면 귀까지 만든다고 하였으며, 두루주머니는 나비 5치, 길이 2치 5푼으로 만들어야 손실이 적다고 했다.
긴 직사각형의 천 2장을 마주대고 접어 창구멍으로 뒤집은 후, 사선으로 접어 솔기를 마주대고 겉에서 감침한 것으로 양옆 중앙에 주름을 잡아 끈을 꿰고 나머지 부분을 앞으로 넘기면 삼각형모양의 두껑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방법으로 길게 접어 만든 필낭이나 수저집의 형태도 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주머니의 형태는 둥근 모양의 두루주머니(염낭, 협낭(夾囊))와 각이 진 귀주머니(줌치, 각낭(角囊))가 대표적이다. 두루주머니는 둥글게 만들어 주머니 입에 주름을 잡는다.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9개까지 주름을 잡은 후, 입 양쪽으로 끈을 꿰어 잡아당긴다. 귀주머니는 네모지게 만들어 아래 양쪽으로 귀가 나오도록 한 후, 주머니의 중간쯤에 끈을 꿰어 잡아당긴다. 두루주머니. 부귀다남의 염원을 담아 수를 놓고 괴불, 연꽃, 봉술을 달아 장식한 복주머니다. 주로 두루주머니는 여성이, 귀주머니는 남성이 애용했다. 여기에 도장주머니, 향주머니, 붓주머니, 수저주머니, 부채주머니, 버선주머니 등 내용물에 따라 주머니의 모양을 다르게 한다.
[참고문헌]
교재『한국의복구성』박현정 이혜진 김순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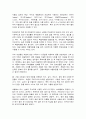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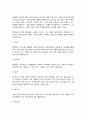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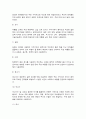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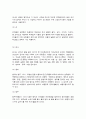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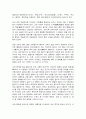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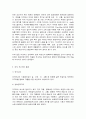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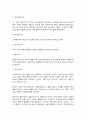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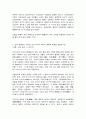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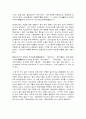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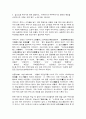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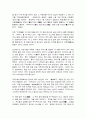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