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해서 사치품을 수입하는 남부는 관세를 낮추는 정책을 추구한다. 이러한 정책이 대립하면서 남북전쟁의 불씨가 되었다.
결국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은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흑인 노예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도록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경제적 대립들이 쌓이고 쌓여 노예문제로 귀결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남부와 북부로 분리될 위험에 처해진 미국 연방의 분열을 막고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진정한 노예 해방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이라는 전략적인 선택에 의해 남부에 몰려 있던 흑인 노예들이 북구로 유입되면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점과 한창 노예제도 폐지라는 흐름을 타고 있던 유럽과 맥락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남부에 대한 지원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이 남북전쟁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확실한 것은 링컨 대통령과 남북전쟁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노예해방 전쟁이 아니라 종교정치경제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분쟁과 갈등의 표출이라는 것이다. 남북전쟁의 원인이 흑인 노예들의 인권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과 관련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건 간에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링컨 대통령의 성과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당신과 나, 우리에겐 어느 누구보다 많은 어제가 있어.
이제 무엇이 됐든 내일이 필요해.”
“당신이 당신의 보배야, 세서.
바로 당신이.”
P.445
다시 사라져버린 빌러비드를 그리워하며 아파하는 세서에게 폴 디는 이런 말을 해준다. 우리는 세서처럼 많은 과거의 역사적 단편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는 과거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지만, 누군가는 과거에 파묻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과거에 머무름을 선택한다. 세서는 목을 그은 딸 아이가 살아 돌아온 빌러비드에게 지켜주지 못한 엄마의 미안함과 애뜻함을 모두 쏟아붓고, 빌러비드는 세서의 그 마음을 모두 받아 가지만 그 뒤에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을 부양하는 것은 덴버였다. 그 두 사람을 이해하지만, 덴버 역시도 엄마가 필요한 한 아이였을 뿐이다. 노예제도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우리의 시선이 세서와 빌러비드, 덴버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노예제도는 우리 모두의 아픈 상처이자 흔적이다. 누군가는 당사자이며, 누군가는 방관자이며, 누군가는 조력자가 된다. 세서와 베이비 석스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인에게 착취를 당하지만, 백인에게 도움을 받아 탈출을 하고, 백인에게 집을 얻고, 백인의 도움으로 직장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백인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는 세서의 시선과 백인에게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은 없다는 베이비 석스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흑인은 백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집을 받은 것이고, 백인은 흑인으로 인해 훌륭한 요리사를 얻었으며 흑인 노예를 착취함으로 막대한 부를 얻었기 때문에 결국 백인은 흑인 노예에게 그냥 무언가를 제공한 적이 결코 없다는 것이다. 수많은 방관자로 인해 노예무역과 노예제도가 묵인되어 왔으며, 수많은 조력자로 인해 그 제도가 무너졌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노예제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형태로 존속되고 있다. 아동노동착취문제, 저임금 노동력 착취, 불법 이주민 강제노동으로 인한 착취 등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새로운 노예제도가 폐지가 아닌 개선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링컨 대통령이 선언한 노예해방선언문의 첫 구절인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이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당연하게 요구하고 요구되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본다.
결국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은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흑인 노예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도록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경제적 대립들이 쌓이고 쌓여 노예문제로 귀결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남부와 북부로 분리될 위험에 처해진 미국 연방의 분열을 막고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진정한 노예 해방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이라는 전략적인 선택에 의해 남부에 몰려 있던 흑인 노예들이 북구로 유입되면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점과 한창 노예제도 폐지라는 흐름을 타고 있던 유럽과 맥락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남부에 대한 지원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이 남북전쟁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확실한 것은 링컨 대통령과 남북전쟁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노예해방 전쟁이 아니라 종교정치경제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분쟁과 갈등의 표출이라는 것이다. 남북전쟁의 원인이 흑인 노예들의 인권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과 관련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건 간에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링컨 대통령의 성과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당신과 나, 우리에겐 어느 누구보다 많은 어제가 있어.
이제 무엇이 됐든 내일이 필요해.”
“당신이 당신의 보배야, 세서.
바로 당신이.”
P.445
다시 사라져버린 빌러비드를 그리워하며 아파하는 세서에게 폴 디는 이런 말을 해준다. 우리는 세서처럼 많은 과거의 역사적 단편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는 과거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지만, 누군가는 과거에 파묻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과거에 머무름을 선택한다. 세서는 목을 그은 딸 아이가 살아 돌아온 빌러비드에게 지켜주지 못한 엄마의 미안함과 애뜻함을 모두 쏟아붓고, 빌러비드는 세서의 그 마음을 모두 받아 가지만 그 뒤에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을 부양하는 것은 덴버였다. 그 두 사람을 이해하지만, 덴버 역시도 엄마가 필요한 한 아이였을 뿐이다. 노예제도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우리의 시선이 세서와 빌러비드, 덴버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노예제도는 우리 모두의 아픈 상처이자 흔적이다. 누군가는 당사자이며, 누군가는 방관자이며, 누군가는 조력자가 된다. 세서와 베이비 석스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인에게 착취를 당하지만, 백인에게 도움을 받아 탈출을 하고, 백인에게 집을 얻고, 백인의 도움으로 직장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백인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는 세서의 시선과 백인에게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은 없다는 베이비 석스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흑인은 백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집을 받은 것이고, 백인은 흑인으로 인해 훌륭한 요리사를 얻었으며 흑인 노예를 착취함으로 막대한 부를 얻었기 때문에 결국 백인은 흑인 노예에게 그냥 무언가를 제공한 적이 결코 없다는 것이다. 수많은 방관자로 인해 노예무역과 노예제도가 묵인되어 왔으며, 수많은 조력자로 인해 그 제도가 무너졌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노예제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형태로 존속되고 있다. 아동노동착취문제, 저임금 노동력 착취, 불법 이주민 강제노동으로 인한 착취 등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새로운 노예제도가 폐지가 아닌 개선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링컨 대통령이 선언한 노예해방선언문의 첫 구절인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이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당연하게 요구하고 요구되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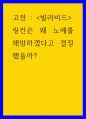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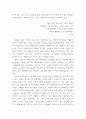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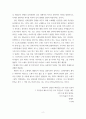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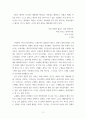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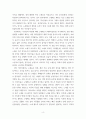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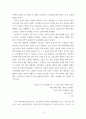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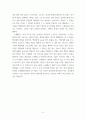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