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목차
Ⅰ. 성곽의 도시 수원·화성 개관
Ⅱ. 화성(華城)
Ⅲ. 융건릉(隆健陵)
Ⅳ. 창성사 진각국사 승탑비
Ⅴ. 용주사(龍珠寺)
Ⅱ. 화성(華城)
Ⅲ. 융건릉(隆健陵)
Ⅳ. 창성사 진각국사 승탑비
Ⅴ. 용주사(龍珠寺)
본문내용
위주에서 벗어나 옅은 청색과 갈색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선의 처리는 다소 필력이 약하여 박진감과 생동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조선시대 불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평면적, 도식적인 기법과는 거리가 멀다. 과장 없는 인체비례, 사실적인 얼굴표현, 침착한 설채법(設彩法) 등이 불화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특이한 것은 인물이 표현에 음영법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불화는 서양화법과 같은 원근법, 명암법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례인데, 후불탱화의 인물표현에 음영을 나타냈다는 것은 불화를 그리는 전문적인 화승의 작품이 아니라 당시 서양화법의 영향을 받은 문인화가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불화의 제작자에 대해서 과거부터 김홍도라고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그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이론도 있다. 김홍도의 작이라고 하는 것은 상기의 기록과 아울러 무엇보다도 후불탱이 지니고 있는 화풍이 그의 다른 도석인물화와 거의 같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술사가 최완수(崔完秀) 선생의 말을 빌리면, 우선 탱화에 표현된 불보살 및 그 권속들의 얼굴표현이 바로 단원풍의 얼굴모습들이며 길쭉한 정도로 긴 윤곽에 우리 얼굴치고는 코가 너무 크다고 할 만큼 우뚝 솟은 콧날을 가진 청수한 용모가 그것인데 이 얼굴 모습은 아마 단원 스스로의 용모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유연하고 날렵하게 젖혀지는 손목의 표현이나 그에 비해 무미하다고 할 만큼 아무 변화 없이 미끈하게 처리하는 팔뚝표현도 단원만이 가지는 인체표현의 특징이며 세장한 손가락과 고운 발 맵시 역시 단원 인물화에서 보이는 품위있는 표현법이다. 그리고 산들바람을 맞은 옷자락인 듯 유려하게 휘날리는 당풍세(當風勢)의 옷자락 표현이 또한 단원 인물화임을 증명해준다. 또한 후불탱의 은자서 축원문에 적혀있는 주상전하, 자궁전하, 왕비전하, 세자저하는 각각 정조와 생모인 혜경궁 홍씨, 왕비인 효의왕후 김씨, 왕세자였던 순조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조대에 최고의 화가였고 또 왕의 총애를 받았던 김홍도가 용주사의 창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은 당연한 일이고,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고 또 그 능사로써 용주사를 세우는데 당대 최고의 승려와 각종 기술자를 초빙하고 물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홍도는 대웅보전 의 후불탱을 제작했고 1796년에는《불설부모은중경판》의 변상도를 그리기도 하였다. 또한 절에 소장되어 있는 4폭의 김홍도가 그린 병풍도 이 무렵에 왕에게서 하사된 것이다.
3-3. 용주사 범종 : 국보 제120호
높이 144㎝, 입지름 87㎝. 국보 제120호. 고려 전기의 동종으로서는 드물게 보는 거종의 하나이며 신라동종의 양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동종의 정상에는 용뉴(龍)와 용통(甬筒)을 갖추었고, 특히 용통은 세잔한 연주문(聯珠文)으로 돌려서 6단으로 구분하고 당초문과 연판(蓮瓣)으로 장식하였는데, 연판은 원형·반원형·타원형 등 여러 형태이다. 종정(鐘頂)의 천판(天板)에는 문양이 없으며 상대와 하대의 문양은 서로 다른 형태의 문양대로 장식하였다.
다만 동일한 것은 상대·하대 연곽 · 당좌(撞座) 등의 내외 둘레만 세잔한 연주문대로 하였고 그 내부에 화려한 문양대로 장식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상대의 문양은 반원권(半圓圈) 문양을 상하 엇갈려서 장식하고 그 사이사이에 당초문으로 장식하였으며, 하대의 문양은 상대와 달리 연속되는 당초문으로 장식한 것이 다르다.
특히, 하대의 당초문에 있어서 당초가 한번 선곡(旋曲)하는 중앙에 8판 내지 9판의 연화문을 독립시켜 배치한 것이 이색적이다. 유곽 역시 연주문대 내에 당초문으로 장식하였고, 연뢰는 원형의 연판좌 위에 돌기된 9개의 유두를 가지고 있다.
4개소의 유곽 밑으로 원형의 당좌를 배치하고 있는데, 연화를 주문양으로 하고 그 둘레에 연주문대를 돌리고 다시 당초문으로 돌린 다음 또다시 연주문대로 조식하였다. 종신(鐘身)에는 천의를 날리며 승천하는 비천상과 결가부좌한 채 두광을 갖추고 합장하여 승천하는 3존상을 교대로 배치한 특수한 양식이다.
원래 이 동종은 무명종(無銘鐘)이었으나, 후각한 명문이 있어 이에 따라 854년(문성왕 16)에 주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는 동종의 형태와 일치되지 않는다. 종신의 1개소에는 32자의 명문이 각명(刻銘)되어 있고, 또 1개소에는 55자의 명문이 각명되어 있다. 또한, 이 동종은 신라동종의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고려 전기의 종으로, 반원권 문양을 상대에 장식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3-4. 불설부모은중경판
1972년 5월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다. 용주사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다. 조선 정조(正祖)가 억울하게 참화를 당한 부친 장헌세자에 대한 효심의 발로로 용주사에서 출간한 불설부모은중경(佛設父母恩重經)의 판본이다.
불설부모은중경은 부모가 자식을 잉태하여 낳고 기르기까지의 은혜와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불교경전으로서, 자식에게 효를 강조하는 것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까지 음미해 볼 수 있는 효에 관한 대승적 경전이다. 흔히 부모은중경이라 하며, 심우도(尋牛圖)와 함께 사찰의 벽화로 자주 인용되는 경전이다.
용주사 경판은 정조 20년(1796)에 한글과 한문을 혼용하여 출간한 판본이다. 부처님이 부모은중경을 설하게 된 동기를 비롯하여 부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10가지로 제시하고, 그 은혜를 갚기 어려움을 8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또 보은의 방법으로 남에게 베풀고 진리를 실현하면서 살 것을 권하며, 불효했을 때 받게 되는 업으로서의 아비무간지옥(阿鼻無間地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판본은 동판(銅板) 7판, 석판(石板) 24판, 목판(木板) 43판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동판은 매우 정교한 필치로 경전의 내용을 그린 21장면의 변상도(變相圖)이다. 이 변상도는 그린이를 알 수 없으나, 그 솜씨로 보아 당시 도화서원(圖畵署員)의 작품으로 보인다. 석판은 주로 한역 경문으로 채워졌고, 목판은 한글과 한문 혼용의 경전 및 변상도로 이루어졌다.
당시의 발달한 인쇄 기술을 보여 주고, 정조의 애틋한 부모 사랑을 상징적으로 알려 주는 자료이다.
불화의 제작자에 대해서 과거부터 김홍도라고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그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이론도 있다. 김홍도의 작이라고 하는 것은 상기의 기록과 아울러 무엇보다도 후불탱이 지니고 있는 화풍이 그의 다른 도석인물화와 거의 같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술사가 최완수(崔完秀) 선생의 말을 빌리면, 우선 탱화에 표현된 불보살 및 그 권속들의 얼굴표현이 바로 단원풍의 얼굴모습들이며 길쭉한 정도로 긴 윤곽에 우리 얼굴치고는 코가 너무 크다고 할 만큼 우뚝 솟은 콧날을 가진 청수한 용모가 그것인데 이 얼굴 모습은 아마 단원 스스로의 용모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유연하고 날렵하게 젖혀지는 손목의 표현이나 그에 비해 무미하다고 할 만큼 아무 변화 없이 미끈하게 처리하는 팔뚝표현도 단원만이 가지는 인체표현의 특징이며 세장한 손가락과 고운 발 맵시 역시 단원 인물화에서 보이는 품위있는 표현법이다. 그리고 산들바람을 맞은 옷자락인 듯 유려하게 휘날리는 당풍세(當風勢)의 옷자락 표현이 또한 단원 인물화임을 증명해준다. 또한 후불탱의 은자서 축원문에 적혀있는 주상전하, 자궁전하, 왕비전하, 세자저하는 각각 정조와 생모인 혜경궁 홍씨, 왕비인 효의왕후 김씨, 왕세자였던 순조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조대에 최고의 화가였고 또 왕의 총애를 받았던 김홍도가 용주사의 창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은 당연한 일이고,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고 또 그 능사로써 용주사를 세우는데 당대 최고의 승려와 각종 기술자를 초빙하고 물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홍도는 대웅보전 의 후불탱을 제작했고 1796년에는《불설부모은중경판》의 변상도를 그리기도 하였다. 또한 절에 소장되어 있는 4폭의 김홍도가 그린 병풍도 이 무렵에 왕에게서 하사된 것이다.
3-3. 용주사 범종 : 국보 제120호
높이 144㎝, 입지름 87㎝. 국보 제120호. 고려 전기의 동종으로서는 드물게 보는 거종의 하나이며 신라동종의 양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동종의 정상에는 용뉴(龍)와 용통(甬筒)을 갖추었고, 특히 용통은 세잔한 연주문(聯珠文)으로 돌려서 6단으로 구분하고 당초문과 연판(蓮瓣)으로 장식하였는데, 연판은 원형·반원형·타원형 등 여러 형태이다. 종정(鐘頂)의 천판(天板)에는 문양이 없으며 상대와 하대의 문양은 서로 다른 형태의 문양대로 장식하였다.
다만 동일한 것은 상대·하대 연곽 · 당좌(撞座) 등의 내외 둘레만 세잔한 연주문대로 하였고 그 내부에 화려한 문양대로 장식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상대의 문양은 반원권(半圓圈) 문양을 상하 엇갈려서 장식하고 그 사이사이에 당초문으로 장식하였으며, 하대의 문양은 상대와 달리 연속되는 당초문으로 장식한 것이 다르다.
특히, 하대의 당초문에 있어서 당초가 한번 선곡(旋曲)하는 중앙에 8판 내지 9판의 연화문을 독립시켜 배치한 것이 이색적이다. 유곽 역시 연주문대 내에 당초문으로 장식하였고, 연뢰는 원형의 연판좌 위에 돌기된 9개의 유두를 가지고 있다.
4개소의 유곽 밑으로 원형의 당좌를 배치하고 있는데, 연화를 주문양으로 하고 그 둘레에 연주문대를 돌리고 다시 당초문으로 돌린 다음 또다시 연주문대로 조식하였다. 종신(鐘身)에는 천의를 날리며 승천하는 비천상과 결가부좌한 채 두광을 갖추고 합장하여 승천하는 3존상을 교대로 배치한 특수한 양식이다.
원래 이 동종은 무명종(無銘鐘)이었으나, 후각한 명문이 있어 이에 따라 854년(문성왕 16)에 주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는 동종의 형태와 일치되지 않는다. 종신의 1개소에는 32자의 명문이 각명(刻銘)되어 있고, 또 1개소에는 55자의 명문이 각명되어 있다. 또한, 이 동종은 신라동종의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고려 전기의 종으로, 반원권 문양을 상대에 장식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3-4. 불설부모은중경판
1972년 5월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다. 용주사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다. 조선 정조(正祖)가 억울하게 참화를 당한 부친 장헌세자에 대한 효심의 발로로 용주사에서 출간한 불설부모은중경(佛設父母恩重經)의 판본이다.
불설부모은중경은 부모가 자식을 잉태하여 낳고 기르기까지의 은혜와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불교경전으로서, 자식에게 효를 강조하는 것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까지 음미해 볼 수 있는 효에 관한 대승적 경전이다. 흔히 부모은중경이라 하며, 심우도(尋牛圖)와 함께 사찰의 벽화로 자주 인용되는 경전이다.
용주사 경판은 정조 20년(1796)에 한글과 한문을 혼용하여 출간한 판본이다. 부처님이 부모은중경을 설하게 된 동기를 비롯하여 부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10가지로 제시하고, 그 은혜를 갚기 어려움을 8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또 보은의 방법으로 남에게 베풀고 진리를 실현하면서 살 것을 권하며, 불효했을 때 받게 되는 업으로서의 아비무간지옥(阿鼻無間地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판본은 동판(銅板) 7판, 석판(石板) 24판, 목판(木板) 43판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동판은 매우 정교한 필치로 경전의 내용을 그린 21장면의 변상도(變相圖)이다. 이 변상도는 그린이를 알 수 없으나, 그 솜씨로 보아 당시 도화서원(圖畵署員)의 작품으로 보인다. 석판은 주로 한역 경문으로 채워졌고, 목판은 한글과 한문 혼용의 경전 및 변상도로 이루어졌다.
당시의 발달한 인쇄 기술을 보여 주고, 정조의 애틋한 부모 사랑을 상징적으로 알려 주는 자료이다.
키워드
추천자료
 수원성의 문화재로서의 가치 - 수원화성 답사 보고서
수원성의 문화재로서의 가치 - 수원화성 답사 보고서 2021년 2학기 역사의현장을찾아서 기말시험 과제물(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답사기 작성)
2021년 2학기 역사의현장을찾아서 기말시험 과제물(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답사기 작성) 2021년 2학기 역사의현장을찾아서 기말시험 과제물(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답사기 작성)
2021년 2학기 역사의현장을찾아서 기말시험 과제물(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답사기 작성) 2021년 2학기 역사의현장을찾아서 기말시험 과제물(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답사기 작성)
2021년 2학기 역사의현장을찾아서 기말시험 과제물(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답사기 작성) 2022년 2학기 역사의현장을찾아서 기말시험 과제물(자신이 거주하는 주변 답사기 작성)
2022년 2학기 역사의현장을찾아서 기말시험 과제물(자신이 거주하는 주변 답사기 작성) 2022년 2학기 역사의현장을찾아서 기말시험 과제물(자신이 거주하는 주변 답사기 작성)
2022년 2학기 역사의현장을찾아서 기말시험 과제물(자신이 거주하는 주변 답사기 작성) 2022년 2학기 역사의현장을찾아서 기말시험 과제물(자신이 거주하는 주변 답사기 작성)
2022년 2학기 역사의현장을찾아서 기말시험 과제물(자신이 거주하는 주변 답사기 작성) 2023년 2학기 역사의현장을찾아서 기말시험 과제물(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체제상 특징 등)
2023년 2학기 역사의현장을찾아서 기말시험 과제물(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체제상 특징 등) 2023년 2학기 역사의현장을찾아서 기말시험 과제물(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체제상 특징 등)
2023년 2학기 역사의현장을찾아서 기말시험 과제물(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체제상 특징 등) 2023년 2학기 역사의현장을찾아서 기말시험 과제물(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체제상 특징 등)
2023년 2학기 역사의현장을찾아서 기말시험 과제물(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체제상 특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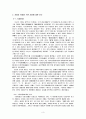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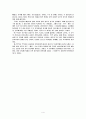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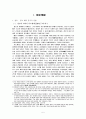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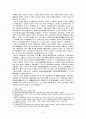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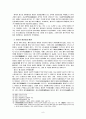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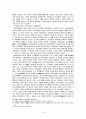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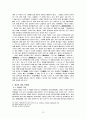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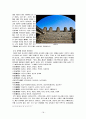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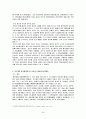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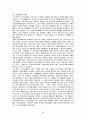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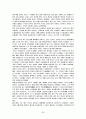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