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목차
Ⅰ. 강진 개관
Ⅱ. 월남사터 · 무위사 · 토동입석상
Ⅲ. 영랑생가 · 백련사 · 다산초당
Ⅱ. 월남사터 · 무위사 · 토동입석상
Ⅲ. 영랑생가 · 백련사 · 다산초당
본문내용
분리 배치하여 다원이라는 통일된 하나의 틀을 통해 융합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 말에 이르러 선비들의 전통적인 사고구조가 바뀌면서 실용성 위주로 조원 양식이 변했음을 이런 정원 구조상의 변화에서 엿 볼 수 있다. 관념적인 마당 가운데 다조를 두어 마당 또한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학파였던 정약용은 한평생 조원에 실용적인 사고를 접목시켜 활용했음을 그의 여러 문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 정원은 더 이상 관념의 유희가 아니라 실용적인 공간이었던 것이다. 정석(丁石)이라는 글자를 각인한 바위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시를 각인할 수 있었겠지만 간단하게 자신의 이름을 따서 바위 이름을 붙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초당의 사경(四景)을 기록한 『다산초당사경첩(茶山草堂四景帖)』은 각각 다룡(茶龍), 약천(藥泉), 정석(丁石), 연지석가산의 네 항목으로 정원 요소를 묘사하고 있는데 조선시대의 다른 별서정원과는 달리 작정(作庭)의 의도와 기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정약용이 정원을 매우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영했음을 보여준다.
<다산초당과 방지>
<태극선>
다산초당과 방지는 거의 비슷한 크기이면서 서로 약간 어긋난 형태로 나란히 서 있다. 따라서 다산초당과 방지는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대비되는 관계이다. 초당이 현실 속의 거처라면 방지 안의 삼신산은 상상 속의 거처라 할 수 있고, 초당이 양택이라면 지당은 신선도와 같은 불멸의 세계를 상징하므로 음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초당은 한 단을 높여 짓고 지당은 한 단을 낮추어 지었다. 이처럼 초당과 지당은 서로 내재된 의미에 있어서나 드러난 모습에 있어서나 대조를 이루며 조화의 묘를 꾀하고 있다. 완전한 대칭을 이루기보다는 약간 비켜서 서로 맞물리는 묘미를 택한 것이다. 정원의 평면도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얼핏 간단한 구조로 보이지만 태극의 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종류의 꽃을 많이 심고 관상하였던 다산초당은, 태극 주위의 사방에 나무와 꽃을 심어 태극에서부터 만물이 생성되는 이치를 재현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초당과 지당은 빛을 통해서 서로 화합을 이루는데 그 경지는 다음과 같은 그의 시에 잘 그려져 있다.
「바람 자니 연못은 닦아 놓은 거울이요
좋은 꽃 기이한 돌 물 속에 가득
돌머리 바위틈에 국화꽃 탐내보자
물속의 고기들이 물결지을까 두렵다」
「초당에 드린 발이 물빛에 흔들리며
다락 머리 실버들을 비추어 주네
바위에 눈 날려서 이상하다 여겼더니
봄바람에 버들솜 날려 맑은 못 희롱하네」
이처럼 서로 화합과 조화의 경지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초당과 지당은 태극의 원리에 따라 지어졌다.
<그림 속에 소리 넣기>
초당 근처의 솔밭 평석에 올라앉아 거문고를 뜯는 정약용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구절이다. 이는 곧 초당에서도 거문고를 즐겨 연주하였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구절이기도 하다. 초당에서 바라보는 삼신산과, 괴석이 아롱진 못의 그림 같은 풍경에 거문고의 가락을 띄워 경치의 운을 돋우는 그림 속 소리 넣기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실제로 다산초당에 걸려 있는 헌시를 보면 초당의 경치에 시와 노래를 곁들여 감상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다른 시를 살펴봐도 유배 생활 중이었던 그에게 거문고와 책은 각별한 치구 같은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은거하는 삶이라 생각할 일이 없고
오히려 스스로 지는 해를 아까워할 뿐
거문고 줄이 늘어지니 자주 조이며
책이 쇠잔해지니 다시 표지를 갈아입힌다.」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길>
다산은 강진에 유배된 기간에도 초당에 앉아 주변의 경치를 그림처럼 상상했음을 그의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의 시는 초당, 연못, 화계 등을 차례대로 노래하고 있는데 각각의 장소는 시를 통해 한 폭의 그림으로 변화된다. 따라서 초당, 연못, 화계로 이어지는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정원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의 각 지점에서 노래한 『다산팔경사(茶山八景詞)』는 다음과 같다.
<시작과 끝의 하나 됨>
다산초당의 구조는 지극히 간단하다. 초당과 방지, 삼신산을 형상화한 신선도, 화계가 그 전부이다. 그러나 20수로 된 『다산화사』를 살펴보면 다산초당의 구조는 간단히 하되 꽃과 괴석들을 즐비하게 배치하여 구조보다 화석(花石)들을 즐겼던 정원임을 알 수 있다.
『다산화사』의 첫째 수는 초당을, 둘째 수는 방지 안에 꾸민 석가산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절별로 피는 꽃들을 노래하고 있다. 꽃들외에 마지막 16수부터 18수까지는 약용식물에 대한 노래이다. 그리고 화경책과 수경책만 산정에 두고 있다는 제19수의 시구는 꽃과 괴석을 즐기는 것이 초당에서의 주된 소일거리임을 말해주고 있다. 방지의 주변 화계에 꽃을 심고 방지 가운데 괴석을 쌓아 석가산을 만들어 즐긴 것인데, 방지는 여기서 다양한 꽃과 괴석들을 하나로 담는 공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꽃들과 괴석은 다산화사의 2수처럼 방지 안에서 합일의 경지를 연출한다.
「조그마한 못 하나 초당의 얼굴인데
그 가운데 세 봉우리 석가산이 솟았구나
온갖 꽃 사시장철 퇴 밑에 둘러 피니
물 가운데 얼룩얼룩 자고 무늬 수 놓았네」
『다산화사』의 시적 구조 또한 어부사시사와 마찬가지로 대구를 두어 회귀하며 합일하는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첫 수와 마지막 수 또한 서로 대구로 합쳐진다.
두 수 모두 자연으로의 회귀를 그리고 있다. 자연 속의 집의 묘사에서 시작하여 정원에서 피는 꽃들을 계절별로 열거한 뒤 다시 집의 분위기로 마감하여 자연의 변화가 있는 집 속으로 들어와 합일을 노래하고 있다. 정원을 곧 합일의 장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신선을 부르는 섬>
다산 초당의 간략한 정원구조 가운데 가장 화려하게 치장된 곳은 연지의 석가산이다. 이 석가산은 신선들의 섬인 봉래도를 상징한다. 이는 정원 가운데 신선을 부르기 위함이다. 다산초당사경첩 중의 연지석가산 부분을 보면 석가산의 괴석들을 먼 바다에서 일부러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신선의 나라가 바다 가운데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신선의 나라에서 가져온 돌로 신들의 섬을 만든다는 구상인 것이다.
조선 말에 이르러 선비들의 전통적인 사고구조가 바뀌면서 실용성 위주로 조원 양식이 변했음을 이런 정원 구조상의 변화에서 엿 볼 수 있다. 관념적인 마당 가운데 다조를 두어 마당 또한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학파였던 정약용은 한평생 조원에 실용적인 사고를 접목시켜 활용했음을 그의 여러 문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 정원은 더 이상 관념의 유희가 아니라 실용적인 공간이었던 것이다. 정석(丁石)이라는 글자를 각인한 바위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시를 각인할 수 있었겠지만 간단하게 자신의 이름을 따서 바위 이름을 붙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초당의 사경(四景)을 기록한 『다산초당사경첩(茶山草堂四景帖)』은 각각 다룡(茶龍), 약천(藥泉), 정석(丁石), 연지석가산의 네 항목으로 정원 요소를 묘사하고 있는데 조선시대의 다른 별서정원과는 달리 작정(作庭)의 의도와 기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정약용이 정원을 매우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영했음을 보여준다.
<다산초당과 방지>
<태극선>
다산초당과 방지는 거의 비슷한 크기이면서 서로 약간 어긋난 형태로 나란히 서 있다. 따라서 다산초당과 방지는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대비되는 관계이다. 초당이 현실 속의 거처라면 방지 안의 삼신산은 상상 속의 거처라 할 수 있고, 초당이 양택이라면 지당은 신선도와 같은 불멸의 세계를 상징하므로 음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초당은 한 단을 높여 짓고 지당은 한 단을 낮추어 지었다. 이처럼 초당과 지당은 서로 내재된 의미에 있어서나 드러난 모습에 있어서나 대조를 이루며 조화의 묘를 꾀하고 있다. 완전한 대칭을 이루기보다는 약간 비켜서 서로 맞물리는 묘미를 택한 것이다. 정원의 평면도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얼핏 간단한 구조로 보이지만 태극의 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종류의 꽃을 많이 심고 관상하였던 다산초당은, 태극 주위의 사방에 나무와 꽃을 심어 태극에서부터 만물이 생성되는 이치를 재현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초당과 지당은 빛을 통해서 서로 화합을 이루는데 그 경지는 다음과 같은 그의 시에 잘 그려져 있다.
「바람 자니 연못은 닦아 놓은 거울이요
좋은 꽃 기이한 돌 물 속에 가득
돌머리 바위틈에 국화꽃 탐내보자
물속의 고기들이 물결지을까 두렵다」
「초당에 드린 발이 물빛에 흔들리며
다락 머리 실버들을 비추어 주네
바위에 눈 날려서 이상하다 여겼더니
봄바람에 버들솜 날려 맑은 못 희롱하네」
이처럼 서로 화합과 조화의 경지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초당과 지당은 태극의 원리에 따라 지어졌다.
<그림 속에 소리 넣기>
초당 근처의 솔밭 평석에 올라앉아 거문고를 뜯는 정약용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구절이다. 이는 곧 초당에서도 거문고를 즐겨 연주하였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구절이기도 하다. 초당에서 바라보는 삼신산과, 괴석이 아롱진 못의 그림 같은 풍경에 거문고의 가락을 띄워 경치의 운을 돋우는 그림 속 소리 넣기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실제로 다산초당에 걸려 있는 헌시를 보면 초당의 경치에 시와 노래를 곁들여 감상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다른 시를 살펴봐도 유배 생활 중이었던 그에게 거문고와 책은 각별한 치구 같은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은거하는 삶이라 생각할 일이 없고
오히려 스스로 지는 해를 아까워할 뿐
거문고 줄이 늘어지니 자주 조이며
책이 쇠잔해지니 다시 표지를 갈아입힌다.」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길>
다산은 강진에 유배된 기간에도 초당에 앉아 주변의 경치를 그림처럼 상상했음을 그의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의 시는 초당, 연못, 화계 등을 차례대로 노래하고 있는데 각각의 장소는 시를 통해 한 폭의 그림으로 변화된다. 따라서 초당, 연못, 화계로 이어지는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정원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의 각 지점에서 노래한 『다산팔경사(茶山八景詞)』는 다음과 같다.
<시작과 끝의 하나 됨>
다산초당의 구조는 지극히 간단하다. 초당과 방지, 삼신산을 형상화한 신선도, 화계가 그 전부이다. 그러나 20수로 된 『다산화사』를 살펴보면 다산초당의 구조는 간단히 하되 꽃과 괴석들을 즐비하게 배치하여 구조보다 화석(花石)들을 즐겼던 정원임을 알 수 있다.
『다산화사』의 첫째 수는 초당을, 둘째 수는 방지 안에 꾸민 석가산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절별로 피는 꽃들을 노래하고 있다. 꽃들외에 마지막 16수부터 18수까지는 약용식물에 대한 노래이다. 그리고 화경책과 수경책만 산정에 두고 있다는 제19수의 시구는 꽃과 괴석을 즐기는 것이 초당에서의 주된 소일거리임을 말해주고 있다. 방지의 주변 화계에 꽃을 심고 방지 가운데 괴석을 쌓아 석가산을 만들어 즐긴 것인데, 방지는 여기서 다양한 꽃과 괴석들을 하나로 담는 공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꽃들과 괴석은 다산화사의 2수처럼 방지 안에서 합일의 경지를 연출한다.
「조그마한 못 하나 초당의 얼굴인데
그 가운데 세 봉우리 석가산이 솟았구나
온갖 꽃 사시장철 퇴 밑에 둘러 피니
물 가운데 얼룩얼룩 자고 무늬 수 놓았네」
『다산화사』의 시적 구조 또한 어부사시사와 마찬가지로 대구를 두어 회귀하며 합일하는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첫 수와 마지막 수 또한 서로 대구로 합쳐진다.
두 수 모두 자연으로의 회귀를 그리고 있다. 자연 속의 집의 묘사에서 시작하여 정원에서 피는 꽃들을 계절별로 열거한 뒤 다시 집의 분위기로 마감하여 자연의 변화가 있는 집 속으로 들어와 합일을 노래하고 있다. 정원을 곧 합일의 장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신선을 부르는 섬>
다산 초당의 간략한 정원구조 가운데 가장 화려하게 치장된 곳은 연지의 석가산이다. 이 석가산은 신선들의 섬인 봉래도를 상징한다. 이는 정원 가운데 신선을 부르기 위함이다. 다산초당사경첩 중의 연지석가산 부분을 보면 석가산의 괴석들을 먼 바다에서 일부러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신선의 나라가 바다 가운데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신선의 나라에서 가져온 돌로 신들의 섬을 만든다는 구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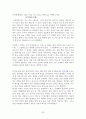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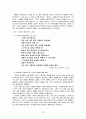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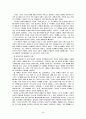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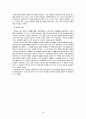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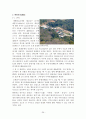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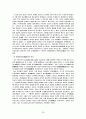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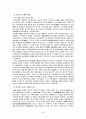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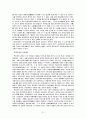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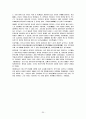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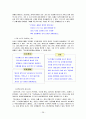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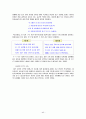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