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고성의 역사 개관
Ⅱ. 공룡의 나라 고성의 공룡 유적
Ⅲ. 고성의 고분군
Ⅳ. 고성의 전통사찰
옥천사 · 보현암 · 문수암
Ⅴ. 학동마을
Ⅵ. 당항포 해전
Ⅱ. 공룡의 나라 고성의 공룡 유적
Ⅲ. 고성의 고분군
Ⅳ. 고성의 전통사찰
옥천사 · 보현암 · 문수암
Ⅴ. 학동마을
Ⅵ. 당항포 해전
본문내용
가장 큰 마을이 되었다. 고성읍에서 공룡화석지로 유명한 상족암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 마을은 학이 알을 품은 형상이라 학동마을이라는 이름이었다.
이 마을의 옛 담장은 마을 옆 개천과 산에서 채취한 판석(납작한 돌)과 황토를 섞어 수평으로 차곡차곡 쌓은 것이 다른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당장 쌓기 방식이다. 마을 주변 대나무 숲과 잘 어울리며 마을 안길의 돌담길은 아름다운 경치를 연출하고 있다. 다만 돌담길을 따라 세워져 있는 전주와 전기 줄이 아름다운 경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편이다. 담장의 하부는 흙을 사용하지 않고 강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가 올 때 흙의 유실을 방지하고 배수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 최영덕(최필간) 고가
세세지장토를 누릴 곳 고성 학림리 학동(鶴洞)은 17c 후반 전주 최씨 문성공 최아(崔阿)의 16세손이며 임란공신 의민공 최균(崔均)의 현손 최형태(亨泰)공이 하늘에서 학이 내려와 이 마을에 알을 품고 있는 꿈을 꾸었다. 날이 밝자 그길로 꿈에서 본 그곳에 가보니 과연 명당이라, 세세지장토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 믿고 동네 이름을 학동으로 부르고 이 마을에 입주, 개척하기 시작했다. 입향조 형태공의 5세손 성화(聖和) 최필간(必侃)공이 큰댁에서 분가하니 이분이 최씨고가의 중시조이다. 손자인 매사(梅史) 최태순(泰淳)공이 현재 규모의 주택으로 확장 개축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최씨고가는 전형적인 남부지역 사대부 가옥의 형식으로, 모든 건물은 일자형 평면이며, 안채, 서익랑채, 곳간채, 사랑채, 대문채로 이루어져 있다. 안채(우진각 지붕)외 모두 팔작지붕건물이며, 사랑채 4귀에는 넓은 기둥이 설치되어 있다. 대문채는 맞배지붕의 솟을지붕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 중문 앞에 내외차단벽이 이채로우며, 사랑채-학림헌(鶴林軒)-은 당시 지방 수령-통영 통제사-이 있는 관아와 너무 멀어 민초들이 관청에 드나들기 힘든 시절 지방의 유력자인 최영덕(泳德)씨의 선조들에게 행정권을 위임해준 향소 역할을 했던 곳이다. 때문에 학림헌의 천정은 당시 관청의 그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지대(축담)에는 손 씻는 돌세면대. 소피를 보는 돌거북 등이 있다. 후원 텃밭에 있는 井자 모양의 화강석 우물 뚜껑에 난 3개의 구멍은 천지인을 뜻하며 당시 석공의 솜씨를 자랑한다.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자연석(개석)으로 쌓여져 있는 담장은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마을 전체의 돌담길-학동마을 옛담장-은 등록문화재 제258호로 지정되어 있다. 전주최씨 집안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육영재(育英齋,경남문화재 제208호)를 만들어 일제때 신 교육기관이 생길 때가지 운영하여 많은 한학자를 배출하여 집안에 약 20여권의 문집(文集)이 나왔으며, 1910년 국권침탈때 순국 자결한 우국지사 서비 최우순(西扉 崔宇淳)은 필간공의 종손자이며, 3대 국회의원 최갑환(甲煥), 최재구(載九,4선의원) 부자 등도 직계 증.고손이다.
학림리 최영덕고가
[매사고택(梅史古宅) 사랑채(뒷쪽)주련(柱聯) 作者: 梅史 崔泰淳]
월효풍청욕수시(月曉風淸欲隨時) 소화다몽별염기(素花多夢別艶欺)
청기핍인금불득(淸氣逼人禁不得) 차화진합재요지(此花眞合在瑤池)
새벽 달밝고 바람맑아 때를 따르고 싶어 흰꽃이 많이 어우러져 요염함이 속이려 하네
맑은 기운이 사람 가까이 와 금할수 없으니 이 꽃이 참으로 요지(신선궁)와 부합되네
[고성최필간고택 안채 주련(柱聯) 作者: 梅史 崔泰淳]
옥소취상대루선(玉簫吹上大樓船) 월명해저야무연(月明海底夜無烟)
기마귀래성곽시(騎馬歸來城郭是) 흡사서호설후천(恰似西湖雪後天)
옥 피리를 큰 배위에서 불고 달은 바다 밑까지 밝은데 밤은 안개도 없네
말타고 돌아오니 성곽이 여기일세 흡사 서호에 눈이 온 뒤의 하늘과 같구려!
Ⅵ. 당항포 해전
1592년 6월 1일 정오 무렵, 이순신 함대는 삼천포 앞바다를 거쳐 사량도에 이르렀다. 2일 아침, 이순신 함대는 \"당포에 적선들이 정박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당포로 진출하였다. 그곳에는 높은 누각에 비단 휘장을 둘러 장식한 지휘선 및 대 전함 아홉 척과 중· 소 전함 열두 척이 정박하고 있었으며, 병력은 당포에 상륙하여 민가를 약탈하고 있었다. 이순신은 거북선을 정면으로 돌진시켜 적 선단을 좌우로 양단시킨 뒤, 전 함대로 적선을 공격하였다.
선두의 거북선은 총통 사격으로 적선을 격파하거나, 선체를 충돌시켜 적선을 격침시켰다. 판옥선들도 총통과 활로 적선에 사격을 집중하거나, 쇠갈고리로 적선을 끌어당겨 거기에 시한폭탄인 발화통을 던져 폭파시키기도 하였다. 이순신 함대가 공세를 계속하여 대소 전함 스물한 척을 모조리 격침시키자, 일본 수군은 마침내 다수의 사상자를 내 버려 둔 채 내륙으로 달아나 버렸다.
1592년 6월 5일, 전라좌수사 이순신과 전라우수사 이억기, 경상우수사 원균이 지휘하는 오십여 척의 선단은 거제도 주민들로부터 \"일본 함선들이 고성의 당항포에 정박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조선 수군 선단은 당항포 포구까지 이십여 리의 긴 해협을 따라 일렬종대로 진입하였다.
당항포 포구에는 일본군의 대형 전함 아홉 척, 중형 전함 네 척, 소형 전함 열 세 척이 정박 중이었다.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의 선단이 포구로 접근하자 일제히 조총을 사격하면서 대응태세를 취하였다. 이순신은 일본 수군의 육지 탈출을 봉쇄하기 위해 그들을 바다 가운데로 유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수군 선단이 철수하는 척 하자, 일본군은 조선 수군의 뒤를 추격하였다.
일본군 선단이 포구 밖으로 나오자, 조선 수군은 신속히 진형을 바꾸어 퇴로를 차단하고 거북선을 뒤따르던 판옥선에 탄 군사들이 불화살을 쏘아 누각선이 화염에 휩싸이자, 당황한 적장은 우왕좌왕하다가 조선군의 화살에 사살되고 말았다. 전의를 상실한 일본 수군 선단의 대다수는 당항포 먼 바다에서 격침되었으며, 일부 함선이 포구 안으로 도피했으나 이튿날 새벽에 탈출을 시도하다가 해협 입구를 지키고 있던 조선 수군에 의하여 모두 격침되고 말았다. 조선 수군은 이 당항포 해전에서 적선 스물여섯 척과 승선 병력 전원을 수장시키는 큰 전과를 거두었다.
이 마을의 옛 담장은 마을 옆 개천과 산에서 채취한 판석(납작한 돌)과 황토를 섞어 수평으로 차곡차곡 쌓은 것이 다른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당장 쌓기 방식이다. 마을 주변 대나무 숲과 잘 어울리며 마을 안길의 돌담길은 아름다운 경치를 연출하고 있다. 다만 돌담길을 따라 세워져 있는 전주와 전기 줄이 아름다운 경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편이다. 담장의 하부는 흙을 사용하지 않고 강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가 올 때 흙의 유실을 방지하고 배수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 최영덕(최필간) 고가
세세지장토를 누릴 곳 고성 학림리 학동(鶴洞)은 17c 후반 전주 최씨 문성공 최아(崔阿)의 16세손이며 임란공신 의민공 최균(崔均)의 현손 최형태(亨泰)공이 하늘에서 학이 내려와 이 마을에 알을 품고 있는 꿈을 꾸었다. 날이 밝자 그길로 꿈에서 본 그곳에 가보니 과연 명당이라, 세세지장토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 믿고 동네 이름을 학동으로 부르고 이 마을에 입주, 개척하기 시작했다. 입향조 형태공의 5세손 성화(聖和) 최필간(必侃)공이 큰댁에서 분가하니 이분이 최씨고가의 중시조이다. 손자인 매사(梅史) 최태순(泰淳)공이 현재 규모의 주택으로 확장 개축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최씨고가는 전형적인 남부지역 사대부 가옥의 형식으로, 모든 건물은 일자형 평면이며, 안채, 서익랑채, 곳간채, 사랑채, 대문채로 이루어져 있다. 안채(우진각 지붕)외 모두 팔작지붕건물이며, 사랑채 4귀에는 넓은 기둥이 설치되어 있다. 대문채는 맞배지붕의 솟을지붕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 중문 앞에 내외차단벽이 이채로우며, 사랑채-학림헌(鶴林軒)-은 당시 지방 수령-통영 통제사-이 있는 관아와 너무 멀어 민초들이 관청에 드나들기 힘든 시절 지방의 유력자인 최영덕(泳德)씨의 선조들에게 행정권을 위임해준 향소 역할을 했던 곳이다. 때문에 학림헌의 천정은 당시 관청의 그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지대(축담)에는 손 씻는 돌세면대. 소피를 보는 돌거북 등이 있다. 후원 텃밭에 있는 井자 모양의 화강석 우물 뚜껑에 난 3개의 구멍은 천지인을 뜻하며 당시 석공의 솜씨를 자랑한다.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자연석(개석)으로 쌓여져 있는 담장은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마을 전체의 돌담길-학동마을 옛담장-은 등록문화재 제258호로 지정되어 있다. 전주최씨 집안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육영재(育英齋,경남문화재 제208호)를 만들어 일제때 신 교육기관이 생길 때가지 운영하여 많은 한학자를 배출하여 집안에 약 20여권의 문집(文集)이 나왔으며, 1910년 국권침탈때 순국 자결한 우국지사 서비 최우순(西扉 崔宇淳)은 필간공의 종손자이며, 3대 국회의원 최갑환(甲煥), 최재구(載九,4선의원) 부자 등도 직계 증.고손이다.
학림리 최영덕고가
[매사고택(梅史古宅) 사랑채(뒷쪽)주련(柱聯) 作者: 梅史 崔泰淳]
월효풍청욕수시(月曉風淸欲隨時) 소화다몽별염기(素花多夢別艶欺)
청기핍인금불득(淸氣逼人禁不得) 차화진합재요지(此花眞合在瑤池)
새벽 달밝고 바람맑아 때를 따르고 싶어 흰꽃이 많이 어우러져 요염함이 속이려 하네
맑은 기운이 사람 가까이 와 금할수 없으니 이 꽃이 참으로 요지(신선궁)와 부합되네
[고성최필간고택 안채 주련(柱聯) 作者: 梅史 崔泰淳]
옥소취상대루선(玉簫吹上大樓船) 월명해저야무연(月明海底夜無烟)
기마귀래성곽시(騎馬歸來城郭是) 흡사서호설후천(恰似西湖雪後天)
옥 피리를 큰 배위에서 불고 달은 바다 밑까지 밝은데 밤은 안개도 없네
말타고 돌아오니 성곽이 여기일세 흡사 서호에 눈이 온 뒤의 하늘과 같구려!
Ⅵ. 당항포 해전
1592년 6월 1일 정오 무렵, 이순신 함대는 삼천포 앞바다를 거쳐 사량도에 이르렀다. 2일 아침, 이순신 함대는 \"당포에 적선들이 정박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당포로 진출하였다. 그곳에는 높은 누각에 비단 휘장을 둘러 장식한 지휘선 및 대 전함 아홉 척과 중· 소 전함 열두 척이 정박하고 있었으며, 병력은 당포에 상륙하여 민가를 약탈하고 있었다. 이순신은 거북선을 정면으로 돌진시켜 적 선단을 좌우로 양단시킨 뒤, 전 함대로 적선을 공격하였다.
선두의 거북선은 총통 사격으로 적선을 격파하거나, 선체를 충돌시켜 적선을 격침시켰다. 판옥선들도 총통과 활로 적선에 사격을 집중하거나, 쇠갈고리로 적선을 끌어당겨 거기에 시한폭탄인 발화통을 던져 폭파시키기도 하였다. 이순신 함대가 공세를 계속하여 대소 전함 스물한 척을 모조리 격침시키자, 일본 수군은 마침내 다수의 사상자를 내 버려 둔 채 내륙으로 달아나 버렸다.
1592년 6월 5일, 전라좌수사 이순신과 전라우수사 이억기, 경상우수사 원균이 지휘하는 오십여 척의 선단은 거제도 주민들로부터 \"일본 함선들이 고성의 당항포에 정박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조선 수군 선단은 당항포 포구까지 이십여 리의 긴 해협을 따라 일렬종대로 진입하였다.
당항포 포구에는 일본군의 대형 전함 아홉 척, 중형 전함 네 척, 소형 전함 열 세 척이 정박 중이었다.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의 선단이 포구로 접근하자 일제히 조총을 사격하면서 대응태세를 취하였다. 이순신은 일본 수군의 육지 탈출을 봉쇄하기 위해 그들을 바다 가운데로 유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수군 선단이 철수하는 척 하자, 일본군은 조선 수군의 뒤를 추격하였다.
일본군 선단이 포구 밖으로 나오자, 조선 수군은 신속히 진형을 바꾸어 퇴로를 차단하고 거북선을 뒤따르던 판옥선에 탄 군사들이 불화살을 쏘아 누각선이 화염에 휩싸이자, 당황한 적장은 우왕좌왕하다가 조선군의 화살에 사살되고 말았다. 전의를 상실한 일본 수군 선단의 대다수는 당항포 먼 바다에서 격침되었으며, 일부 함선이 포구 안으로 도피했으나 이튿날 새벽에 탈출을 시도하다가 해협 입구를 지키고 있던 조선 수군에 의하여 모두 격침되고 말았다. 조선 수군은 이 당항포 해전에서 적선 스물여섯 척과 승선 병력 전원을 수장시키는 큰 전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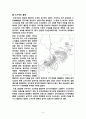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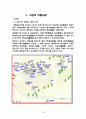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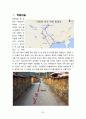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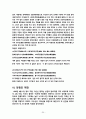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