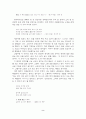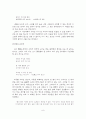목차
1.시인은 왜 시를 쓰는가
2.소리도 보이는 시인
3.애정과 서정
4.넘나들기의 자유로움
5.경중정의 시세계
6.그의 고향과 전통의 뿌리
7.시조를 쓰는 이유
2.소리도 보이는 시인
3.애정과 서정
4.넘나들기의 자유로움
5.경중정의 시세계
6.그의 고향과 전통의 뿌리
7.시조를 쓰는 이유
본문내용
불퉁 늙은 모과
서리 묻은 달 같은 것이
광주리에 앉아 있다.
타고난 모양새대로
서너 개나 앉아 있다.
시골서 보내온 모과
우리 형님 닮은 모과
주름진 고향산처럼
근심스레 앉아 있다.
먼 마을 개 짖는 소리
그 소리로 앉아 있다.
시골서 보내 온 모과
등불처럼 타는 모과
어느 날 비라도 젖어
혼자 돌아오는 밤은
수수한 바람소리로
온 방안에 앉아 있다. - <木瓜>
어찌 생각하면 그냥 보통 모과로도 이만한 정경이며 이쯤의 소리며를 들을 수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굳이 그것이 '고향서 보내 온 모과'인 데서 우리는 모든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공감의 길로 손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고향이라는 거의 원형질적인 것이 발휘하는 위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그의 고향 생각은 언제나 따뜻하다.
서울역 매표소에서
차표 한 장 사서 든다
내 고향 시냇물의
버들붕어만한 차표
오늘밤
별무리 찬란할
하늘 한 장 사서 든다. - <고향차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에게서나 들을 수 있을 법한 고향의 환상을 이 노시인에게서 확인하는 마음이 흥겹기만 하다. 물론 이 시인에게도 고향이 안타깝고 구차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던 시절도 없지 않았다. '내 고향 하늘빛은 열무김치 서러운 맛-<고향 생각>'인 적도 있었고 '어머님 켜 놓고 간 등불만한 설움-<紅枾>'이기도 했으며, '虛心한 하늘-<鄕山心曲>'의 땅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만한 세월의 물굽이를 스쳐 온 뒤, 고향은 '남겨 둔 까치밥 같은-<까치밥>' 것이고 생각만 해도 '꿈의 도랑물 흐르는-<눈감고 앉아>' 곳이다.
누구나 살 만큼 살고 나면 고향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삼라만상을 사랑하는 바탕에 고향이 있고 보면, 그 거의 본능이나 맹목에 가까운 그리움에 있고 보면, 어찌 그 무엇 혹은 어느 하난들 무심한 것이 있겠으며, 그래서 그것을 사랑에 충만하여 정을 실어 바라보다 보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답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고 보면 어느 작품에서나 묻어 날 것만 같은 고향은 시인만의 고향이라기보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둑거리는 인정의 세계라 할 만하다. 이 시인은 음악이 빠져 나간 공백에 이 원형질적인 고향의 정서를 떡하니 버텨 놓음으로써 누구나 낯익은 느낌을 갖게 하고, 그 말이 내 말, 내 마음, 내 노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셈이다. 이런 것을 굳이 전통이라고 지칭하는 것조차 번거로울 듯하다.
시조를 쓰는 이유
근자에 들어 이 노시인은 經典에나 있을 법한 말을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든다.
고향에 내려가니
고향은 거기 없고
고향에서 돌아오니
고향은 거기 있고.....
흑염소 울음소리만
내가 몰고 왔네요 - <고향은 없고>
이 시는 얼핏 역설적 상황을 생각하게 하고, 또 나아가 '色卽是空 空卽是色'을 떠올리게 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순된 존재이기에 손에 쥐면 딴 것을 바라보고, 잃고 나면 그것을 그리워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와지는 거라고도 하지만, 알면서도 깨달음에 이르기는 좀체로 어려운 경지라서 부처의 말을 떠올리게도 된다.
물론 이 시인이 부처와 다른 것은 아직도 '흑염소 울음소리'와 더불어 있기 때문일 것이며,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에나 정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이 시인의 성품 때문이지 본질은 결국 한가지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 날 내 고향은
慶尙道라 일렀는데
요즘은 내 本鄕이
구름 너머 저곳일세
아닐세
구름도 더 너머
하늘 너머 저곳일세 - <구름3>
이 시를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은 이런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살면 그리 되는가를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는 어쩌면 그 대답을 구하려고 시인이 시를 쓰는 이유를 물었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알 듯 알 듯 하면서도 그 정체를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한 것 같지는 않다. 근원에 고향 생각처럼 따뜻한 마음을 두고 사랑으로 바라보면 소리도 보이고 세상 사는 일도 보이고, 그래서 보이는 것만 말해도 물안개같은 情이 피어 오르게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한참을 살다 보면 우리 사는 일이 무엇이란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인지.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되는 일이라면 굳이 시인이 되어야 할 까닭도 없을 듯싶다. 그러나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말을 아껴 왔지만, 시조가 시조인 까닭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형식의 문제임은 췌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체가 45자 안팎으로 된다는 그 자체가 우선 시조다움의 출발이다. 그 안에 복잡하게 살펴 볼 만한 여러 특징이 더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45자 정도로 말을 아껴 아껴 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래야 시조답다.
白水 鄭椀永선생의 시조를 살피면서 굳이 형식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던 것은 그런 논의가 큰 의미를 띄지 않기 때문이었다. 말을 지극히 삼가 제한된 울타리를 크게 넘어서는 일이 적었던 시인에게 형식 문제를 들이대는 것은 논의하기에 편할는지 몰라도 이미 저 스스로 드러난 것을 굳이 들추어 번거로움을 빚는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또 이미 그런 생각을 시인 스스로 분명히 밝혀 두기도 하였다.
다른 이들은 틀이 좁아 할 말을 다 못 담겠다지만 나는 천지의 말씀을 다 내려 앉혀도 오히려 남을 이 그릇에 채울 말을 찾지 못한다. - 시집 <난(蘭)보다 푸른 돌> 서문
그러고 보면 시조 시인이 시조를 쓰는 이유와 삶의 모든 것이 환히 보이는 이치를 이제는 얼마간 알 수도 있을 듯하다.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보이건만, 그것을 아껴 아껴 말을 삼가고 줄이다 보면 그 究竟에 가서는 法語 같은 말을 뚝뚝 던질 수가 있게 되는가 보다.
그것은 이 시인이 세상을 들여다보고 바라다보며 걸어 온 길일 것이다. 사랑으로 깨닫고 세상 이치를 말하기 위하여 시인은 시를 쓰는가 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시에서 그러한 시인의 길을 읽는다.
저만치 벗어 논 안경
이만치에 눈감은 나
그 사이 흐르는 것은
세월인가 강물인가
삿대로 江流를 찌르면
秋水共長 天一色을. - <안경5> *끝*
서리 묻은 달 같은 것이
광주리에 앉아 있다.
타고난 모양새대로
서너 개나 앉아 있다.
시골서 보내온 모과
우리 형님 닮은 모과
주름진 고향산처럼
근심스레 앉아 있다.
먼 마을 개 짖는 소리
그 소리로 앉아 있다.
시골서 보내 온 모과
등불처럼 타는 모과
어느 날 비라도 젖어
혼자 돌아오는 밤은
수수한 바람소리로
온 방안에 앉아 있다. - <木瓜>
어찌 생각하면 그냥 보통 모과로도 이만한 정경이며 이쯤의 소리며를 들을 수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굳이 그것이 '고향서 보내 온 모과'인 데서 우리는 모든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공감의 길로 손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고향이라는 거의 원형질적인 것이 발휘하는 위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그의 고향 생각은 언제나 따뜻하다.
서울역 매표소에서
차표 한 장 사서 든다
내 고향 시냇물의
버들붕어만한 차표
오늘밤
별무리 찬란할
하늘 한 장 사서 든다. - <고향차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에게서나 들을 수 있을 법한 고향의 환상을 이 노시인에게서 확인하는 마음이 흥겹기만 하다. 물론 이 시인에게도 고향이 안타깝고 구차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던 시절도 없지 않았다. '내 고향 하늘빛은 열무김치 서러운 맛-<고향 생각>'인 적도 있었고 '어머님 켜 놓고 간 등불만한 설움-<紅枾>'이기도 했으며, '虛心한 하늘-<鄕山心曲>'의 땅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만한 세월의 물굽이를 스쳐 온 뒤, 고향은 '남겨 둔 까치밥 같은-<까치밥>' 것이고 생각만 해도 '꿈의 도랑물 흐르는-<눈감고 앉아>' 곳이다.
누구나 살 만큼 살고 나면 고향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삼라만상을 사랑하는 바탕에 고향이 있고 보면, 그 거의 본능이나 맹목에 가까운 그리움에 있고 보면, 어찌 그 무엇 혹은 어느 하난들 무심한 것이 있겠으며, 그래서 그것을 사랑에 충만하여 정을 실어 바라보다 보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답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고 보면 어느 작품에서나 묻어 날 것만 같은 고향은 시인만의 고향이라기보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둑거리는 인정의 세계라 할 만하다. 이 시인은 음악이 빠져 나간 공백에 이 원형질적인 고향의 정서를 떡하니 버텨 놓음으로써 누구나 낯익은 느낌을 갖게 하고, 그 말이 내 말, 내 마음, 내 노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셈이다. 이런 것을 굳이 전통이라고 지칭하는 것조차 번거로울 듯하다.
시조를 쓰는 이유
근자에 들어 이 노시인은 經典에나 있을 법한 말을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든다.
고향에 내려가니
고향은 거기 없고
고향에서 돌아오니
고향은 거기 있고.....
흑염소 울음소리만
내가 몰고 왔네요 - <고향은 없고>
이 시는 얼핏 역설적 상황을 생각하게 하고, 또 나아가 '色卽是空 空卽是色'을 떠올리게 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순된 존재이기에 손에 쥐면 딴 것을 바라보고, 잃고 나면 그것을 그리워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와지는 거라고도 하지만, 알면서도 깨달음에 이르기는 좀체로 어려운 경지라서 부처의 말을 떠올리게도 된다.
물론 이 시인이 부처와 다른 것은 아직도 '흑염소 울음소리'와 더불어 있기 때문일 것이며,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에나 정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이 시인의 성품 때문이지 본질은 결국 한가지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 날 내 고향은
慶尙道라 일렀는데
요즘은 내 本鄕이
구름 너머 저곳일세
아닐세
구름도 더 너머
하늘 너머 저곳일세 - <구름3>
이 시를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은 이런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살면 그리 되는가를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는 어쩌면 그 대답을 구하려고 시인이 시를 쓰는 이유를 물었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알 듯 알 듯 하면서도 그 정체를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한 것 같지는 않다. 근원에 고향 생각처럼 따뜻한 마음을 두고 사랑으로 바라보면 소리도 보이고 세상 사는 일도 보이고, 그래서 보이는 것만 말해도 물안개같은 情이 피어 오르게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한참을 살다 보면 우리 사는 일이 무엇이란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인지.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되는 일이라면 굳이 시인이 되어야 할 까닭도 없을 듯싶다. 그러나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말을 아껴 왔지만, 시조가 시조인 까닭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형식의 문제임은 췌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체가 45자 안팎으로 된다는 그 자체가 우선 시조다움의 출발이다. 그 안에 복잡하게 살펴 볼 만한 여러 특징이 더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45자 정도로 말을 아껴 아껴 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래야 시조답다.
白水 鄭椀永선생의 시조를 살피면서 굳이 형식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던 것은 그런 논의가 큰 의미를 띄지 않기 때문이었다. 말을 지극히 삼가 제한된 울타리를 크게 넘어서는 일이 적었던 시인에게 형식 문제를 들이대는 것은 논의하기에 편할는지 몰라도 이미 저 스스로 드러난 것을 굳이 들추어 번거로움을 빚는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또 이미 그런 생각을 시인 스스로 분명히 밝혀 두기도 하였다.
다른 이들은 틀이 좁아 할 말을 다 못 담겠다지만 나는 천지의 말씀을 다 내려 앉혀도 오히려 남을 이 그릇에 채울 말을 찾지 못한다. - 시집 <난(蘭)보다 푸른 돌> 서문
그러고 보면 시조 시인이 시조를 쓰는 이유와 삶의 모든 것이 환히 보이는 이치를 이제는 얼마간 알 수도 있을 듯하다.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보이건만, 그것을 아껴 아껴 말을 삼가고 줄이다 보면 그 究竟에 가서는 法語 같은 말을 뚝뚝 던질 수가 있게 되는가 보다.
그것은 이 시인이 세상을 들여다보고 바라다보며 걸어 온 길일 것이다. 사랑으로 깨닫고 세상 이치를 말하기 위하여 시인은 시를 쓰는가 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시에서 그러한 시인의 길을 읽는다.
저만치 벗어 논 안경
이만치에 눈감은 나
그 사이 흐르는 것은
세월인가 강물인가
삿대로 江流를 찌르면
秋水共長 天一色을. - <안경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