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설
II. 전통사회와 근대법
1. 민주주의의 소개
2. 법치주의의 강조
III 식민지 시대의 법과 생활
1. 문제의 제기
2. 법체제와 법학
3. 법생활
IV.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현
V. 결 론
II. 전통사회와 근대법
1. 민주주의의 소개
2. 법치주의의 강조
III 식민지 시대의 법과 생활
1. 문제의 제기
2. 법체제와 법학
3. 법생활
IV.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현
V. 결 론
본문내용
of the Constitution, 1885. 10 th ed., 1971. pp. 202-203. 안경환 김종철 공역, 헌법학입문, 경세원, 1993 참조.
가 혼재하는 기이한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소극적, 시민적인 법치주의로부터 적극적, 사회적 법치주의로 이론적인 변모를 신속하게 소개하고 수용한 점을 두번째의 특색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원리는 자유당 정권의 필요에 의한 그때 그때의 헌법개정으로 건국초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정치현실에서부터 헌법의 규범성과 최고법규성은 도전을 받으면서권력자들은 국민에게 법질서의 준수를 강요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드러내었다.
하나의 재미있는 예를 들어 본다. 1961년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장군은 꼭 두 달 뒤에 맞은 제13회 제헌절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즉 \"객관적이어야할 헌법의 모든 규정은 오로지 그때 그때의 집권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침해되기가 일쑤였고 . . . . 부정과 부패는 횡행하고, 국민의 빈곤은 확대되어 그 어떠한 수술을 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것을 구출할 수 없는 말기적 현상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1. 최고회의편, 대한공론사, 1973, 13면 참조.
이와 같이 그는 5.16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스스로 변명하고 강조하였으나 그의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그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반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치주의원리의 사법적 보장이란 측면에서 볼때 대법원의 헌법해석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형식논리에 입각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 머무른 것이 많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상세한 것은 김효전, 한국 헌법판례의 형식논리주의, 한국법학교수회편, 한국 판례형성의 문제점과 그 과제, 1986, 39-48면 참조.
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인적 독립이란 면에서 볼때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한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 동안에 임명한 대법원판사의 수는 33인 인데 반하여, 전두환 대통령이 통치한 1980년부터 1987년까지의 7년 동안에 임명한 대법원판사의 수는 무려 24인에 달한다.
) 김효전, 한국의 헌법재판, 금랑 김철수교수화갑기념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3 참조.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대법원의 신진대사, 세대교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부, 특히 불안정하고 행정부에 의해서 좌우되는 대법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동안 한국의 법치주의가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 밖에 유신 헌법하의 긴급조치 남용과 제5공화국 말기 시대의 헌법개정 논의에 대해서 당시의 청와대에서는 \'호헌의지의 천명\'이라고 하여 직선제 개헌의 가능성을 배제하려고한 해괴한 발상을 법치주의의 남용 내지 오용한 예로서 들 수 있다.
V. 결 론
요컨대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법치국가 내지 법치주의라는 말은 시민의 자치를 위한 권력구속의 규범이기보다는 오히려 질서의 원리로서 국민의 준법정신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180도 전환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권력자들은 법률에 의한 통치라는 미명 하에 독재를 호도하기도 하였다.
자고로 \'법의 극치는 불법의 극치\'(Summum ius, summa iniuria)라는 로마의 法諺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한국에서도 진리임이 입증되었다.
이제 법치국가의 원리는 과거처럼 단순한 법률국가(Gesetzesstaat)이어서는 아니되며,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의미의 진정한 민주적 법치국가이어야 한다. 그 의미와 내용은 자연법적 규범에도 구속되는 보편타당한 것으로서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 혼재하는 기이한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소극적, 시민적인 법치주의로부터 적극적, 사회적 법치주의로 이론적인 변모를 신속하게 소개하고 수용한 점을 두번째의 특색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원리는 자유당 정권의 필요에 의한 그때 그때의 헌법개정으로 건국초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정치현실에서부터 헌법의 규범성과 최고법규성은 도전을 받으면서권력자들은 국민에게 법질서의 준수를 강요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드러내었다.
하나의 재미있는 예를 들어 본다. 1961년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장군은 꼭 두 달 뒤에 맞은 제13회 제헌절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즉 \"객관적이어야할 헌법의 모든 규정은 오로지 그때 그때의 집권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침해되기가 일쑤였고 . . . . 부정과 부패는 횡행하고, 국민의 빈곤은 확대되어 그 어떠한 수술을 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것을 구출할 수 없는 말기적 현상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1. 최고회의편, 대한공론사, 1973, 13면 참조.
이와 같이 그는 5.16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스스로 변명하고 강조하였으나 그의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그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반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치주의원리의 사법적 보장이란 측면에서 볼때 대법원의 헌법해석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형식논리에 입각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 머무른 것이 많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상세한 것은 김효전, 한국 헌법판례의 형식논리주의, 한국법학교수회편, 한국 판례형성의 문제점과 그 과제, 1986, 39-48면 참조.
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인적 독립이란 면에서 볼때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한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 동안에 임명한 대법원판사의 수는 33인 인데 반하여, 전두환 대통령이 통치한 1980년부터 1987년까지의 7년 동안에 임명한 대법원판사의 수는 무려 24인에 달한다.
) 김효전, 한국의 헌법재판, 금랑 김철수교수화갑기념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3 참조.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대법원의 신진대사, 세대교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부, 특히 불안정하고 행정부에 의해서 좌우되는 대법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동안 한국의 법치주의가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 밖에 유신 헌법하의 긴급조치 남용과 제5공화국 말기 시대의 헌법개정 논의에 대해서 당시의 청와대에서는 \'호헌의지의 천명\'이라고 하여 직선제 개헌의 가능성을 배제하려고한 해괴한 발상을 법치주의의 남용 내지 오용한 예로서 들 수 있다.
V. 결 론
요컨대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법치국가 내지 법치주의라는 말은 시민의 자치를 위한 권력구속의 규범이기보다는 오히려 질서의 원리로서 국민의 준법정신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180도 전환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권력자들은 법률에 의한 통치라는 미명 하에 독재를 호도하기도 하였다.
자고로 \'법의 극치는 불법의 극치\'(Summum ius, summa iniuria)라는 로마의 法諺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한국에서도 진리임이 입증되었다.
이제 법치국가의 원리는 과거처럼 단순한 법률국가(Gesetzesstaat)이어서는 아니되며,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의미의 진정한 민주적 법치국가이어야 한다. 그 의미와 내용은 자연법적 규범에도 구속되는 보편타당한 것으로서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추천자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자치행정의 환경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자치행정의 환경 전자 민주주의 각국의 전자 민주주의 전개 과정과 현황 전자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과제 우...
전자 민주주의 각국의 전자 민주주의 전개 과정과 현황 전자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과제 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시민운동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시민운동 민족주의 사관과 민주주의 사관 비교논술
민족주의 사관과 민주주의 사관 비교논술 최장집논문을 읽고 '민주주의'
최장집논문을 읽고 '민주주의' Dewey의 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연구
Dewey의 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연구 어떤 민주주의인가
어떤 민주주의인가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에 관하여 논하라.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에 관하여 논하라. 부르주아 계급의 민주주의 혁명
부르주아 계급의 민주주의 혁명 인터넷과 민주주의정치
인터넷과 민주주의정치 일본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비교
일본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비교 정보화와 민주주의 정의, 특징, 비관적 전망, 보완, 변화, 특성, 현황, 사례, 관리, 역할, 시...
정보화와 민주주의 정의, 특징, 비관적 전망, 보완, 변화, 특성, 현황, 사례, 관리, 역할, 시... 참여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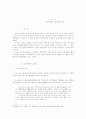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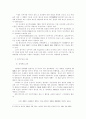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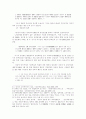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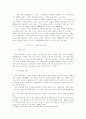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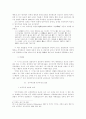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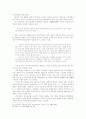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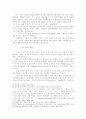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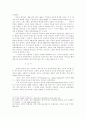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