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유연전문화론의 이론에 대한 검토
III. 유연전문화의 사례
1. 에밀리아 산업지구
2. 대량생산 산업에서 유연생산체제의 등장
IV. 유연전문화론에 대한 비판
II. 유연전문화론의 이론에 대한 검토
III. 유연전문화의 사례
1. 에밀리아 산업지구
2. 대량생산 산업에서 유연생산체제의 등장
IV. 유연전문화론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유연전문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연전문화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비판들이 쏟아졌는데 이를 크게 나누면 유연생산체제가 성립할 수 있는 근거인 수요조건의 변화 여부와 유연생산체제의 상대적 효율성이 집약적으로 표현되는 산업지구의 경제적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전자와 관련된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개념적)으로는 대량생산과 유연생산의 구별이 가능하지만 현실의 기업이나 산업에서 유연생산과 대량생산을 구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어 유연생산과 대량생산을 구분하는 잣대인 전용자산의 경우, 대량생산과 유연생산이 구분되는 임계점, 즉 기계의 전용성(specific) 정도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또한 자산의 전용성이 높으면서도 제품 생산주기는 짧은 경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를 대량생산이라 해야 할지 유연생산이라 해야 할지 불분명하다. 대량생산과 유연생산은 상호 구분되고 대립적인 생산방식이라기 보다는 현실에서는 두 개의 특성이 공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K. Williams, et al(1987), pp.414-417.
둘째, 기존의 대중소비재(대량생산재)시장이 이미 포화(saturated)상태에 이르렀고 소비자의 수요 다양화로 인해 제품시장에서 분리(break up)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이다.
먼저 대량시장(특히 내구소비재)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피오르와 세이블의 논의는 시장이 성숙되면 대체수요의 양이 상당히 커고 안정적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막대하고 안정적인 대체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은 포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된다. 그리고 특히 가전제품 시장에서 처럼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 수요가 새로이 창출되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시장 분할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피오르와 세이블이 말하는 것처럼 대량생산체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소비자들의 선호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수요는 몇 가지 타이프의 상품에 국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자동차시장에서 소비자의 수요는 small/light/medium/large car의 네 가지 형태에 국한되어 있다. 물론 같은 규모 내에서 다양한 모델(3 door, 5 door)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생산라인의 변경을 요구할만큼의 다양성은 아니다.
셋째, 수요의 포화와 다양성으로 인해 대량생산체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유연적 전문화를 통해 대량생산체제의 위기를 야기했던 이러한 수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아무리 유연적 전문화라 하더라도 총수요의 감퇴로부터 빠져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 유연전문화론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의 주장이다.
) Amin A.(1991), p.255.
유연생산체제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제시되는 산업지구의 경제적 성과는 유연전문화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렇게 우수하지 않다는 것이 비판자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첫째, 1980년대에는 대기업의 혁신성이 소기업의 혁신성을 훨씬 앞질렀다. 그 결과 1983-85년 사이 소기업들의 이윤율은 명백히 하락했으며, 대기업과의 이윤율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이태리 산업지구에 포진하고 있는 소기업들의 이윤율 증가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생산의 유연성이 아니라 열악한 임금과 장시간 노동이었다는 것이다. 소기업들의 유연성이란 곧 \"자기착취와 가족노동의 사용, 세금과 사회보장의 회피, 낮은 간접비용과 특히 비숙련작업에서의 값싼 여성·약년 노동자의 사용과 같은 요인들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Amin A.(1991), p.272.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보았듯이 유연전문화론과 이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간의 대립은 \'유연생산체제는 대안적인 생산체제\'라는 주장과 \'유연생산체제는 지배적인 생산체제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생산체제\'라는 주장의 불일치로 표현된다. 여기에 \'수요구조의 변화 여부\'에 대한 판단차이가 대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불일치의 근원에는 가치판단의 차이가 도사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현상에 대해 상이한 가치판단이 공존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대상이 뚜렷한 형체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 참 고 문 헌 >
Piore M.J. & C.F. Sabel(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Basic Books.
Williams K. et al(1987), \"The End of Mass Production?\", Economy and Society, Vol16-3.
Brusco S.(1982), \"The Emilian Model : productive decentralisation and social integra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6.
Tomaney J.(1990), \"The Reality of Workplace Flexibility\", Capital & Class Vol.40.
Perulli P.(1990), \"Industrial Flexibility and Small Firm Districts:The Italian Case\", Econmic and Industrial Democracy, Vol.11.
Murray F.(1983), \"The Decentralisation of Production-the Decline of the Mass-collective Worker?\", Capital & Class, Vol.7.
しげもりあきら(1992), 分權社會の政治經濟學-産業自治と生産民主主義-,靑木書店.
홍장표(1993), 한국에서의 하청계열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Amin A.(1991), \"Flexible Specialization and Small Firms in Italy:Myths and Realities\", in A. Pollert(ed.), Farewell to Flexibility?, Basil Blackwell, pp.119-37.(강석재 외 역(1993): \"유연적 전문화와 이태리의 소기업들:신화와 현실\", 생산혁신과 노동의 변화, 새길)
유연전문화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비판들이 쏟아졌는데 이를 크게 나누면 유연생산체제가 성립할 수 있는 근거인 수요조건의 변화 여부와 유연생산체제의 상대적 효율성이 집약적으로 표현되는 산업지구의 경제적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전자와 관련된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개념적)으로는 대량생산과 유연생산의 구별이 가능하지만 현실의 기업이나 산업에서 유연생산과 대량생산을 구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어 유연생산과 대량생산을 구분하는 잣대인 전용자산의 경우, 대량생산과 유연생산이 구분되는 임계점, 즉 기계의 전용성(specific) 정도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또한 자산의 전용성이 높으면서도 제품 생산주기는 짧은 경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를 대량생산이라 해야 할지 유연생산이라 해야 할지 불분명하다. 대량생산과 유연생산은 상호 구분되고 대립적인 생산방식이라기 보다는 현실에서는 두 개의 특성이 공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K. Williams, et al(1987), pp.414-417.
둘째, 기존의 대중소비재(대량생산재)시장이 이미 포화(saturated)상태에 이르렀고 소비자의 수요 다양화로 인해 제품시장에서 분리(break up)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이다.
먼저 대량시장(특히 내구소비재)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피오르와 세이블의 논의는 시장이 성숙되면 대체수요의 양이 상당히 커고 안정적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막대하고 안정적인 대체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은 포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된다. 그리고 특히 가전제품 시장에서 처럼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 수요가 새로이 창출되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시장 분할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피오르와 세이블이 말하는 것처럼 대량생산체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소비자들의 선호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수요는 몇 가지 타이프의 상품에 국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자동차시장에서 소비자의 수요는 small/light/medium/large car의 네 가지 형태에 국한되어 있다. 물론 같은 규모 내에서 다양한 모델(3 door, 5 door)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생산라인의 변경을 요구할만큼의 다양성은 아니다.
셋째, 수요의 포화와 다양성으로 인해 대량생산체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유연적 전문화를 통해 대량생산체제의 위기를 야기했던 이러한 수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아무리 유연적 전문화라 하더라도 총수요의 감퇴로부터 빠져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 유연전문화론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의 주장이다.
) Amin A.(1991), p.255.
유연생산체제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제시되는 산업지구의 경제적 성과는 유연전문화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렇게 우수하지 않다는 것이 비판자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첫째, 1980년대에는 대기업의 혁신성이 소기업의 혁신성을 훨씬 앞질렀다. 그 결과 1983-85년 사이 소기업들의 이윤율은 명백히 하락했으며, 대기업과의 이윤율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이태리 산업지구에 포진하고 있는 소기업들의 이윤율 증가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생산의 유연성이 아니라 열악한 임금과 장시간 노동이었다는 것이다. 소기업들의 유연성이란 곧 \"자기착취와 가족노동의 사용, 세금과 사회보장의 회피, 낮은 간접비용과 특히 비숙련작업에서의 값싼 여성·약년 노동자의 사용과 같은 요인들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Amin A.(1991), p.272.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보았듯이 유연전문화론과 이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간의 대립은 \'유연생산체제는 대안적인 생산체제\'라는 주장과 \'유연생산체제는 지배적인 생산체제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생산체제\'라는 주장의 불일치로 표현된다. 여기에 \'수요구조의 변화 여부\'에 대한 판단차이가 대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불일치의 근원에는 가치판단의 차이가 도사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현상에 대해 상이한 가치판단이 공존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대상이 뚜렷한 형체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 참 고 문 헌 >
Piore M.J. & C.F. Sabel(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Basic Books.
Williams K. et al(1987), \"The End of Mass Production?\", Economy and Society, Vol16-3.
Brusco S.(1982), \"The Emilian Model : productive decentralisation and social integra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6.
Tomaney J.(1990), \"The Reality of Workplace Flexibility\", Capital & Class Vol.40.
Perulli P.(1990), \"Industrial Flexibility and Small Firm Districts:The Italian Case\", Econmic and Industrial Democracy, Vol.11.
Murray F.(1983), \"The Decentralisation of Production-the Decline of the Mass-collective Worker?\", Capital & Class, Vol.7.
しげもりあきら(1992), 分權社會の政治經濟學-産業自治と生産民主主義-,靑木書店.
홍장표(1993), 한국에서의 하청계열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Amin A.(1991), \"Flexible Specialization and Small Firms in Italy:Myths and Realities\", in A. Pollert(ed.), Farewell to Flexibility?, Basil Blackwell, pp.119-37.(강석재 외 역(1993): \"유연적 전문화와 이태리의 소기업들:신화와 현실\", 생산혁신과 노동의 변화, 새길)
추천자료
 북한 난민과 중국 조선족
북한 난민과 중국 조선족 [아동인권]소년병의 실태와 국제기구의 노력조사
[아동인권]소년병의 실태와 국제기구의 노력조사 유전자 형질 전환
유전자 형질 전환 [청소년인권][청소년인권침해][청소년인권침해 사례][청소년인권][청소년인권보호][청소년복...
[청소년인권][청소년인권침해][청소년인권침해 사례][청소년인권][청소년인권보호][청소년복... 환경보존과 경제발전
환경보존과 경제발전 UN 평화유지활동의 현황과 평가 및 대책 :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UN 평화유지활동의 현황과 평가 및 대책 :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어교육 아랍어과목 의의와 신설, 외국어교육 아랍어과목 목표와 중학교교육과정, 외국어...
외국어교육 아랍어과목 의의와 신설, 외국어교육 아랍어과목 목표와 중학교교육과정, 외국어... 국제원자력
국제원자력 unicef(완성)
unicef(완성)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독후감(내용,분석,적용) 및 핵심용어정리 _ 장 지글러 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독후감(내용,분석,적용) 및 핵심용어정리 _ 장 지글러 저 [국제레짐][국제경제레짐][국제환경보호레짐]국제레짐의 의미, 국제레짐의 형성과 정책결정과...
[국제레짐][국제경제레짐][국제환경보호레짐]국제레짐의 의미, 국제레짐의 형성과 정책결정과... [인권][인권 국가주의][인권 국가권력][인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인권의 권리, 인권의 ...
[인권][인권 국가주의][인권 국가권력][인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인권의 권리, 인권의 ... [1990년 이후 UN 평화유지활동의 현황과 평가 및 대책 -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1990년 이후 UN 평화유지활동의 현황과 평가 및 대책 -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복지의 과제
국제사회복지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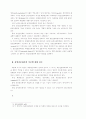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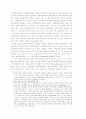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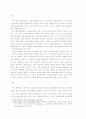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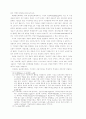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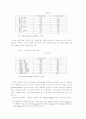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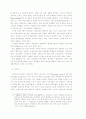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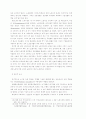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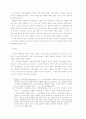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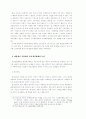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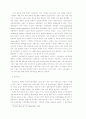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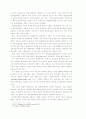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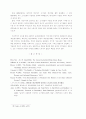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