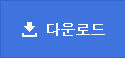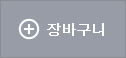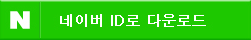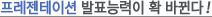목차
1. 네티즌은 없다
2. 인터넷의 규제와 통제
3. 윤리 사회? 감시 사회?
2. 인터넷의 규제와 통제
3. 윤리 사회? 감시 사회?
본문내용
하자면 대답은 유감스럽게도 "No"이다.
첫째, 실효성의 측면에서 네티켓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네티켓이란 일종의 인터넷 윤리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인터넷 윤리가 과연 네티즌들의 실제 인터넷 이용과정에 제대로 수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이수한 우리 나라 국민 대다수는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정규과목을 통해 윤리 교육을 받아 왔다. 하지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윤리적인가? 우리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그렇게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누구도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윤리 교과서의 내용은 그저 당위론적으로만 옳은 이야기일 뿐 현실에서의 생활은 교과서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인터넷 윤리교육을 더 첨가한다고 해서 네티즌들이 네티켓이 가르치는 대로 충실히 움직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특히 인터넷은 현실세계보다 훨씬 더 탈규범적인 공간이 아니던가.
둘째, 네티켓 교육에 담겨진 기본 취지나 접근방식도 문제이다. 지금의 네티켓은 일정한 윤리강령을 만들어 놓고 네티즌들을 이에 따르도록 훈육시키고 계몽시키려는 상명하달식 접근방식을 띤다는 점에서, 규제와 감시라는 채찍의 전략과 본질적으로는 맥을 같이 한다. 다만 한결 부드러운 전략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여기서 네티즌들의 자유의지나 자발적인 행동이 개입될 여지는 별로 없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현실세계의 규범이나 윤리라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장구한 세월에 걸쳐 온갖 실험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문화적 산물이다. 인터넷이란 공간 역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현실세계의 경험이 그 과정을 단축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현실세계의 규범과 윤리를 강요하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는 식으로 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규제와 훈육에 의해서 윤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우리는 과연 건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감시와 통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정녕 안전한 삶이 될 수 있을까? 혹시 20~30년이 지난 후 어느 대학 강의실에서 "옛날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일었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다시 학생들이 포복절도하며 웃게 되지나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첫째, 실효성의 측면에서 네티켓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네티켓이란 일종의 인터넷 윤리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인터넷 윤리가 과연 네티즌들의 실제 인터넷 이용과정에 제대로 수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이수한 우리 나라 국민 대다수는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정규과목을 통해 윤리 교육을 받아 왔다. 하지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윤리적인가? 우리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그렇게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누구도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윤리 교과서의 내용은 그저 당위론적으로만 옳은 이야기일 뿐 현실에서의 생활은 교과서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인터넷 윤리교육을 더 첨가한다고 해서 네티즌들이 네티켓이 가르치는 대로 충실히 움직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특히 인터넷은 현실세계보다 훨씬 더 탈규범적인 공간이 아니던가.
둘째, 네티켓 교육에 담겨진 기본 취지나 접근방식도 문제이다. 지금의 네티켓은 일정한 윤리강령을 만들어 놓고 네티즌들을 이에 따르도록 훈육시키고 계몽시키려는 상명하달식 접근방식을 띤다는 점에서, 규제와 감시라는 채찍의 전략과 본질적으로는 맥을 같이 한다. 다만 한결 부드러운 전략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여기서 네티즌들의 자유의지나 자발적인 행동이 개입될 여지는 별로 없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현실세계의 규범이나 윤리라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장구한 세월에 걸쳐 온갖 실험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문화적 산물이다. 인터넷이란 공간 역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현실세계의 경험이 그 과정을 단축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현실세계의 규범과 윤리를 강요하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는 식으로 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규제와 훈육에 의해서 윤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우리는 과연 건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감시와 통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정녕 안전한 삶이 될 수 있을까? 혹시 20~30년이 지난 후 어느 대학 강의실에서 "옛날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일었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다시 학생들이 포복절도하며 웃게 되지나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