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는 闇齋는 퇴계에게 한걸음 양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퇴계의『聖學十圖』를 보기만 하면 명백해지리라. 闇齋는 朱子의 眞正의 說을 듣고, 이것에 따랐지만, 감히 자기가 발명한 곳을 顯示시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태도를 훈계했다. 闇齋는 朱子의 저작의 表章에 가장 정력을 쏟고, 朱子學의 神髓라 여겨지는 것을 朱子의 문집이나 어류 중에서 抄出하고, 그 가운데는 간단하긴 하지만 校註를 덧붙인 것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개 朱子의 說을 중심으로 朱子의 주지를 얻었다고 여겨지는 후학의 所說을 그것에 달아서 朱子의 저작을 해명한다는 형식으로 이것을 편집하고 있는 점에 있다. 이것은 朱子 자신으로 하여금 자기 저작에 自註를 붙이고 傳을 달게 하는 방법이다. 林 峰의 말을 빌린다면 「文公(朱子)의 말(言)을 가지고 문공의 말을 연역한다」라고 말하는 것 이외의 것이 아니다.
) 玉山講義 附錄 跋.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北溪字義詳講」의 저자 陳北溪는 朱子學의 개념의 해설은 師說에 근거를 두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역시 私見의 개입을 면하지는 못하고 있으리라.
) 同.
闇齋의 이와 같은 방법은, 朱子로 하여금 墓中에서 회생시켜, 朱子 자신으로 하여금 면전에서 自說에 관해서 講說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闇齋는 실은 朱子의 강설의 名助産婦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공자는 옛 성현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여 만들지 않고 믿어서 옛것을 좋아한다」
) 近思錄 序.
라고 말했다. 闇齋의 朱說에 관한 태도는 바로 이것과 같은 것이며, 만약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狂者不 之罪」라 하였다.
) 垂加草 권3(闇齋全集 上, 15면)
『山崎先生語錄』에는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것이 기술되어 있다.
-564-
「선생은 항상 발명한다는 자와 만나면, 그것 滋味있다고 말하고 何書에 나온 것이냐고 물었다. 그 사람이 이것은 내가 발명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면, 그와 같이 발명같은 것을 하지 말라. 그대가 滋味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것을, 성현의 書에 남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闇齋의 朱子學이 深切한 존양을 주로 한 體認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은 다음에 게재하는 闇齋의『近思錄序』 중의 문구에 의하여 이것을 알 수 있다.
「夫學之道在致知力行之二, 而存養則貫其二者也. 漢唐之間非無知者也. 非無行者也. 但未曾聞存養之道, 則其所知之分域, 所行之氣象, 終非聖人之徒矣.」
存養은 致知와 力行의 근저라고 말하는 것이 闇齋의 所說이지만, 闇齋의 경우는 오히려 역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지행을 꿰뚫는 敬의 존양을 敎說해도, 그것이 오로지 마음의 각성에 그친다고 하면 佛老의 허무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해서 「敬身」을 說했다. 闇齋의 시에,
-565-
蜀魄攪眠聲亦頻, 枕頭思得古之人,
齊家治國平天下, 道在明倫本敬身
) 寫本, 山崎先生批桑名松雲書.
이라 한 것이 있다. 또한 易의 「敬義內外」의 해석에 있어서도, 內를 心, 外를 身이라고 한 문인의 說을 물리치고 內를 身, 外를 국가천하라 하여 설사 內를 心이라 說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부득이한 論이며 內를 心, 外를 또는 事라 하면, 易의 이른바 「直內」가 把握案排를 면치 못하며, 결국에는 이단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했다. 身을 敬한다고 해도 平淺에 떨어지면 下學에 머물고 上達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靜坐 存心의 요체를 교설하고, 당시의 유자가 主情을 배운다고 하면서 정좌에 힘을 쏟지 않고, 이것을 이단이라 함을 非라 하여, 이것을 우려해야 할 일이라 했다.
) 垂加草 권11, 跋三子傳心錄後(闇齋全集, 上, 87면)
그러나 「身」이라고 해도 內에 心을 藏하고 있으므로, 敬身도 心의 내면적 공부를 망각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으나, 闇齋의 경우에는 역시 行, 특히 도의적 실천에 중점이 놓여졌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퇴계의 경우는 심의 내면적 공부에 힘을 기울인 감이 있다. 퇴계가『心經附註』를 독실하게 존신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앞에 게재한
「先生嘗論, 心經附註將義理略從 裏過處. 因云, 今人略從 裏過亦不肯, 尤可嘆也.」
) 言行錄 권2, 類編, 學問第1(全集4, 34면)
라는 어구 및 또한 「不本諸本心而但外講儀節者, 誠無異於扮戱子」
) 李子粹語 권4(全書5, 444면)
라는 어구는 퇴계의 心法要視를 나타낸 것이라 해도 좋다. 심법을 중시한다는 것은 엄격한 의리 예절의 실천을 방해하지 않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566-
「第一須先將世間窮通得失榮辱一切置之道外, 不以累於靈臺. 旣辦得此心, 則所患已五七分休歇矣.」
) 自省錄(全集 下, 32면)
라는 어구도 퇴계의 심법을 아는 경우, 주의를 요한다. 이것은 퇴계의 심법이 얼마나 實事에 입각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것이리라. 또한 퇴계가 얼마나 심법을 중시했던가는『聖學十圖』속에 心術에 관계되는 도면이 5매나 있는 것으로 보아도 추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심법을 중시하고 마음의 주체성을 세우는 공부를 요긴한 것이라 했다 해도, 세계를 향해서 활동하기를 잊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心의 內奧로부터의 요구에 기초를 두기를 희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퇴계가 「思」를 중시하여 事理의 內外融釋, 그것의 자득을 요긴한 것이라 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존양의 공부는 思를 통해서만 본원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퇴계는 「人心道心圖」의 개정이 충분하게 정당 정밀한 곳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躬行 心得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했다.
) 退溪書抄 권6, 趙士敬問答(全集 下, 125면)
퇴계의 「爲己」의 학은 참으로 愼密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퇴계는 말하기를, 「凡百當以愼密二字爲第一義」라고. 퇴계가 朱子의 도를 배우는 태도는 실로 眞切 愼密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퇴계가 朱子學을 발명한 곳도 적지 않다. 유명한 四七論은 그것이 朱子의 설과 합치하느냐 않느냐보다도 용케도 老佛의 허무와 세속의 공리를 초극한 朱子의 이상주의의 정신을 체득한 퇴계의 이상주의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에 생각이 미친다면, 퇴계가 얼마나 잘 朱子의 도를 배웠던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567-
(김 소 암 譯)
) 玉山講義 附錄 跋.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北溪字義詳講」의 저자 陳北溪는 朱子學의 개념의 해설은 師說에 근거를 두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역시 私見의 개입을 면하지는 못하고 있으리라.
) 同.
闇齋의 이와 같은 방법은, 朱子로 하여금 墓中에서 회생시켜, 朱子 자신으로 하여금 면전에서 自說에 관해서 講說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闇齋는 실은 朱子의 강설의 名助産婦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공자는 옛 성현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여 만들지 않고 믿어서 옛것을 좋아한다」
) 近思錄 序.
라고 말했다. 闇齋의 朱說에 관한 태도는 바로 이것과 같은 것이며, 만약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狂者不 之罪」라 하였다.
) 垂加草 권3(闇齋全集 上, 15면)
『山崎先生語錄』에는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것이 기술되어 있다.
-564-
「선생은 항상 발명한다는 자와 만나면, 그것 滋味있다고 말하고 何書에 나온 것이냐고 물었다. 그 사람이 이것은 내가 발명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면, 그와 같이 발명같은 것을 하지 말라. 그대가 滋味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것을, 성현의 書에 남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闇齋의 朱子學이 深切한 존양을 주로 한 體認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은 다음에 게재하는 闇齋의『近思錄序』 중의 문구에 의하여 이것을 알 수 있다.
「夫學之道在致知力行之二, 而存養則貫其二者也. 漢唐之間非無知者也. 非無行者也. 但未曾聞存養之道, 則其所知之分域, 所行之氣象, 終非聖人之徒矣.」
存養은 致知와 力行의 근저라고 말하는 것이 闇齋의 所說이지만, 闇齋의 경우는 오히려 역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지행을 꿰뚫는 敬의 존양을 敎說해도, 그것이 오로지 마음의 각성에 그친다고 하면 佛老의 허무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해서 「敬身」을 說했다. 闇齋의 시에,
-565-
蜀魄攪眠聲亦頻, 枕頭思得古之人,
齊家治國平天下, 道在明倫本敬身
) 寫本, 山崎先生批桑名松雲書.
이라 한 것이 있다. 또한 易의 「敬義內外」의 해석에 있어서도, 內를 心, 外를 身이라고 한 문인의 說을 물리치고 內를 身, 外를 국가천하라 하여 설사 內를 心이라 說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부득이한 論이며 內를 心, 外를 또는 事라 하면, 易의 이른바 「直內」가 把握案排를 면치 못하며, 결국에는 이단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했다. 身을 敬한다고 해도 平淺에 떨어지면 下學에 머물고 上達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靜坐 存心의 요체를 교설하고, 당시의 유자가 主情을 배운다고 하면서 정좌에 힘을 쏟지 않고, 이것을 이단이라 함을 非라 하여, 이것을 우려해야 할 일이라 했다.
) 垂加草 권11, 跋三子傳心錄後(闇齋全集, 上, 87면)
그러나 「身」이라고 해도 內에 心을 藏하고 있으므로, 敬身도 心의 내면적 공부를 망각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으나, 闇齋의 경우에는 역시 行, 특히 도의적 실천에 중점이 놓여졌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퇴계의 경우는 심의 내면적 공부에 힘을 기울인 감이 있다. 퇴계가『心經附註』를 독실하게 존신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앞에 게재한
「先生嘗論, 心經附註將義理略從 裏過處. 因云, 今人略從 裏過亦不肯, 尤可嘆也.」
) 言行錄 권2, 類編, 學問第1(全集4, 34면)
라는 어구 및 또한 「不本諸本心而但外講儀節者, 誠無異於扮戱子」
) 李子粹語 권4(全書5, 444면)
라는 어구는 퇴계의 心法要視를 나타낸 것이라 해도 좋다. 심법을 중시한다는 것은 엄격한 의리 예절의 실천을 방해하지 않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566-
「第一須先將世間窮通得失榮辱一切置之道外, 不以累於靈臺. 旣辦得此心, 則所患已五七分休歇矣.」
) 自省錄(全集 下, 32면)
라는 어구도 퇴계의 심법을 아는 경우, 주의를 요한다. 이것은 퇴계의 심법이 얼마나 實事에 입각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것이리라. 또한 퇴계가 얼마나 심법을 중시했던가는『聖學十圖』속에 心術에 관계되는 도면이 5매나 있는 것으로 보아도 추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심법을 중시하고 마음의 주체성을 세우는 공부를 요긴한 것이라 했다 해도, 세계를 향해서 활동하기를 잊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心의 內奧로부터의 요구에 기초를 두기를 희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퇴계가 「思」를 중시하여 事理의 內外融釋, 그것의 자득을 요긴한 것이라 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존양의 공부는 思를 통해서만 본원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퇴계는 「人心道心圖」의 개정이 충분하게 정당 정밀한 곳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躬行 心得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했다.
) 退溪書抄 권6, 趙士敬問答(全集 下, 125면)
퇴계의 「爲己」의 학은 참으로 愼密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퇴계는 말하기를, 「凡百當以愼密二字爲第一義」라고. 퇴계가 朱子의 도를 배우는 태도는 실로 眞切 愼密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퇴계가 朱子學을 발명한 곳도 적지 않다. 유명한 四七論은 그것이 朱子의 설과 합치하느냐 않느냐보다도 용케도 老佛의 허무와 세속의 공리를 초극한 朱子의 이상주의의 정신을 체득한 퇴계의 이상주의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에 생각이 미친다면, 퇴계가 얼마나 잘 朱子의 도를 배웠던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567-
(김 소 암 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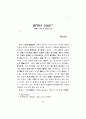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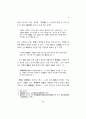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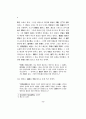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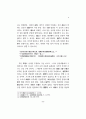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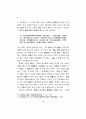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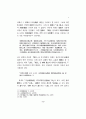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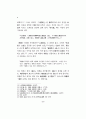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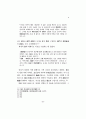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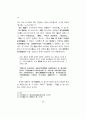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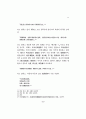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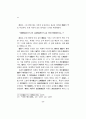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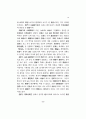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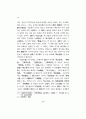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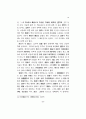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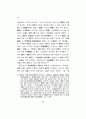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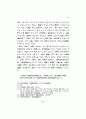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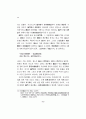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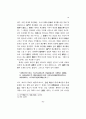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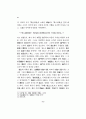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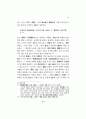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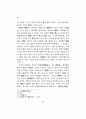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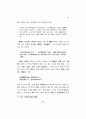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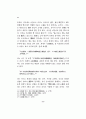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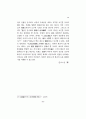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