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목차
Ⅰ. 마음의 정의
Ⅱ. 마음에 관한 논쟁
1. 심선동성선동
2. 이심관심
3. 심무체용
Ⅲ. 마음의 본질
1. 마음에 관한 논의의 근거
2. 마음의 본질
Ⅳ. 결론: 퇴계철학의 재해석 가능성
Ⅱ. 마음에 관한 논쟁
1. 심선동성선동
2. 이심관심
3. 심무체용
Ⅲ. 마음의 본질
1. 마음에 관한 논의의 근거
2. 마음의 본질
Ⅳ. 결론: 퇴계철학의 재해석 가능성
본문내용
음이 所當然으로서의 性을 直覺하고 그것으로써 所以然으로서의 대상세계를 體證해가는 과정이 바로 統攝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적어도 퇴계철학에 한정한다면 牟宗三이 말하는 이른바 縱的 영역이 인정된다고 본다. 그리고 性은 엄밀히 말해 이른바 縱的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퇴계는 心統性情이 縱的 영역과 橫的 영역에 각기 적용된다고 보았다기 보다는 橫的 영역과 縱的 영역을 統攝하는, 다시 말해서 知覺작용과 直覺작용을 統攝하는 것이 곧 心統性情이라고 보았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Ⅳ. 결론: 퇴계철학의 재해석 가능성
우리는 지금까지 퇴계철학에서 마음이 어떻게 정의되었으며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해 고찰하였다. 실상 퇴계 시대의 유학자들은 마음에 관해서 수많은 논의를 하였으면서도 마음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소홀히 다룬 느낌이 든다. 四七論辨, 人心道心論 등도 마음과 관련되므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쩐지 본질을 다루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당시의 학자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송대 학자들도 해당되지만, 性情과 理氣가 어떻게 서로 개념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논리성을 유지하는가에 주목하였지 性情과 理氣의 논리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 자체로서 얼마나 논리적인가를 중시하였지 \'인간\'에게 얼마나 논리적인가에는 소홀하였다는 것이다. 이점은 오늘날 전통철학이 현대인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31-
퇴계철학을 마음의 측면에서 고찰해 본 동기도 여기에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퇴계철학에서의 마음의 본질을 \'知覺性\'·\'直覺性\'·\'統攝性\'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정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일차적으로는 퇴계철학을 心學이라고 할 때 그 心學의 개념을 정의해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퇴계에 있어 마음의 존재론적 근원은 氣이고 작용상의 본질은 知覺性·直覺性·統攝性으로 정의된다면, 心學은 마음의 知覺性과 直覺性이 내포하는 본질적인 모순성을 統攝하고 性과 物 그리고 天과 人의 合一을 지향하는 학문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을 敬이라는 한 마디로 표현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퇴계가 전개한 많은 性理논쟁들 중에 마음의 본질에 대한 기본 이해와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간과함으로써 야기된 쟁점들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많은 쟁점들에 대해 재해석을 시도하겠지만,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쟁점이라고 하는 四七論辨에 대한 재해석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데 그치기로 한다.
-232-
論辨의 쟁점은 理氣互發이냐 氣發一途냐의 문제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 온 맥락에 관련되는 핵심만을 추려서 말한다면, 퇴계는 자신의 지론인 分開看과 渾淪看의 通看이라는 관점에서 「마음에서(就心中)의 互發」을 주장하였으며, 高峰은 유명한 「天地之性天上月, 氣質之性水中月」이라는 비유처럼 실질적인 性이란 理가 氣質에 墮在한 氣質之性이요 그 외에 별도의 性이 없다는 관점에서 一途를 주장하였다. 퇴계는 주희의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을 증거로 들어 互發을 뒷받침하는 \'對待\'의 논리라고 하였으며, 高峰은 그 말이 對待의 논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七情이 四端을 포괄함을 의미하는 \'因說\'을 피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희가 착각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공히 나름대로 \'인간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는 의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퇴계는 高峰이 의거하고 있는 理氣論에 관한 일반 원칙을 납득하면서도 자신이 주장하는 互發論은 인간존재의 정신적 특성을 해명하는 데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임을 내세우고 있고, 高峰은 마찬가지로 관념론이 아닌 현실에 실재하는 인간을 설명한다 하여 墮在性을 주장한 것이다. 문제는 두 사람이 인간존재에 관해 서로 더 타당한 근거에 의거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理氣의 개념만을 붙들고 논쟁하였지 四七論의 진리성이 마음의 정체성 문제와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심각한 사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理氣論으로 다루어져야 할 이른바 본체론적 차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실제 주자학의 많은 부분이 이 분야에 할애되어 있다. 그러나 四七論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로서 접근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찰한 바로는 퇴계철학에 있어서 마음은 \'知覺性\'·\'直覺性\'·\'統攝性\'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만약 이 규정을 四七論에 적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퇴계 자신이 理發·氣發·對待로만 알았던 것의 본질이 마음의 知覺性(←氣發)·直覺性(←理發)·統攝性(←對待)임을 알게 된다. 또 高峰이 氣發一途를 주장한 것은 마음의 知覺性(←氣發)만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과 理發을 인정치 않은 것은 결국 直覺性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統攝도 知覺과정에 한정됨을 주장한 것이 된다. 양자가 논쟁을 벌인 것은 性理를 논하면서도 마음 자체에서 구하지 않고 우주만물을 설명하는 理氣論의 일반 원칙에 의존한 결과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자연계의 「理, 無計度無造作」의 원칙이 마음에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두고 논쟁하였지만, 마음 속에 直覺性이라는 형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주만물 속에서 인간의 독자성을 의식하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해명하는 정확한 방법론을 찾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주희에게로 소급될 수 있을 것이다.
-233-
논쟁의 본질을 해명하기 위한 방법론상의 문제점은 퇴계와 고봉에서 끝나지 않았다. 현재 학계에서 四七論의 문제를 다룬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단지 理氣兩發說과 理氣兩動說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퇴계와 고봉의 한계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감이 든다. 다만 본론에서 잠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일부의 연구자들이 意識作用이란 측면에서 理發과 氣發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옳은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Ⅳ. 결론: 퇴계철학의 재해석 가능성
우리는 지금까지 퇴계철학에서 마음이 어떻게 정의되었으며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해 고찰하였다. 실상 퇴계 시대의 유학자들은 마음에 관해서 수많은 논의를 하였으면서도 마음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소홀히 다룬 느낌이 든다. 四七論辨, 人心道心論 등도 마음과 관련되므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쩐지 본질을 다루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당시의 학자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송대 학자들도 해당되지만, 性情과 理氣가 어떻게 서로 개념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논리성을 유지하는가에 주목하였지 性情과 理氣의 논리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 자체로서 얼마나 논리적인가를 중시하였지 \'인간\'에게 얼마나 논리적인가에는 소홀하였다는 것이다. 이점은 오늘날 전통철학이 현대인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31-
퇴계철학을 마음의 측면에서 고찰해 본 동기도 여기에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퇴계철학에서의 마음의 본질을 \'知覺性\'·\'直覺性\'·\'統攝性\'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정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일차적으로는 퇴계철학을 心學이라고 할 때 그 心學의 개념을 정의해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퇴계에 있어 마음의 존재론적 근원은 氣이고 작용상의 본질은 知覺性·直覺性·統攝性으로 정의된다면, 心學은 마음의 知覺性과 直覺性이 내포하는 본질적인 모순성을 統攝하고 性과 物 그리고 天과 人의 合一을 지향하는 학문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을 敬이라는 한 마디로 표현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퇴계가 전개한 많은 性理논쟁들 중에 마음의 본질에 대한 기본 이해와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간과함으로써 야기된 쟁점들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많은 쟁점들에 대해 재해석을 시도하겠지만,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쟁점이라고 하는 四七論辨에 대한 재해석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데 그치기로 한다.
-232-
論辨의 쟁점은 理氣互發이냐 氣發一途냐의 문제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 온 맥락에 관련되는 핵심만을 추려서 말한다면, 퇴계는 자신의 지론인 分開看과 渾淪看의 通看이라는 관점에서 「마음에서(就心中)의 互發」을 주장하였으며, 高峰은 유명한 「天地之性天上月, 氣質之性水中月」이라는 비유처럼 실질적인 性이란 理가 氣質에 墮在한 氣質之性이요 그 외에 별도의 性이 없다는 관점에서 一途를 주장하였다. 퇴계는 주희의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을 증거로 들어 互發을 뒷받침하는 \'對待\'의 논리라고 하였으며, 高峰은 그 말이 對待의 논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七情이 四端을 포괄함을 의미하는 \'因說\'을 피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희가 착각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공히 나름대로 \'인간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는 의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퇴계는 高峰이 의거하고 있는 理氣論에 관한 일반 원칙을 납득하면서도 자신이 주장하는 互發論은 인간존재의 정신적 특성을 해명하는 데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임을 내세우고 있고, 高峰은 마찬가지로 관념론이 아닌 현실에 실재하는 인간을 설명한다 하여 墮在性을 주장한 것이다. 문제는 두 사람이 인간존재에 관해 서로 더 타당한 근거에 의거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理氣의 개념만을 붙들고 논쟁하였지 四七論의 진리성이 마음의 정체성 문제와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심각한 사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理氣論으로 다루어져야 할 이른바 본체론적 차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실제 주자학의 많은 부분이 이 분야에 할애되어 있다. 그러나 四七論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로서 접근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찰한 바로는 퇴계철학에 있어서 마음은 \'知覺性\'·\'直覺性\'·\'統攝性\'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만약 이 규정을 四七論에 적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퇴계 자신이 理發·氣發·對待로만 알았던 것의 본질이 마음의 知覺性(←氣發)·直覺性(←理發)·統攝性(←對待)임을 알게 된다. 또 高峰이 氣發一途를 주장한 것은 마음의 知覺性(←氣發)만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과 理發을 인정치 않은 것은 결국 直覺性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統攝도 知覺과정에 한정됨을 주장한 것이 된다. 양자가 논쟁을 벌인 것은 性理를 논하면서도 마음 자체에서 구하지 않고 우주만물을 설명하는 理氣論의 일반 원칙에 의존한 결과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자연계의 「理, 無計度無造作」의 원칙이 마음에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두고 논쟁하였지만, 마음 속에 直覺性이라는 형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주만물 속에서 인간의 독자성을 의식하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해명하는 정확한 방법론을 찾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주희에게로 소급될 수 있을 것이다.
-233-
논쟁의 본질을 해명하기 위한 방법론상의 문제점은 퇴계와 고봉에서 끝나지 않았다. 현재 학계에서 四七論의 문제를 다룬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단지 理氣兩發說과 理氣兩動說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퇴계와 고봉의 한계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감이 든다. 다만 본론에서 잠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일부의 연구자들이 意識作用이란 측면에서 理發과 氣發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옳은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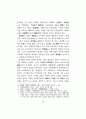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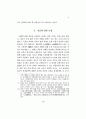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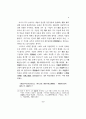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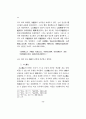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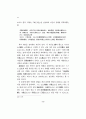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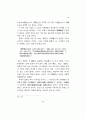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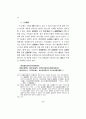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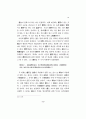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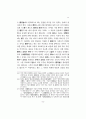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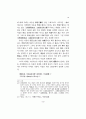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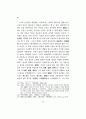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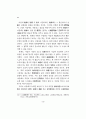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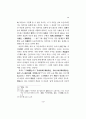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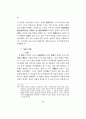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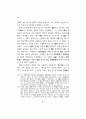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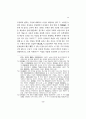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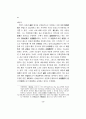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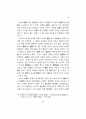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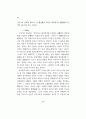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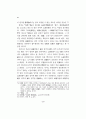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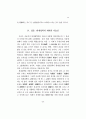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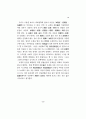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