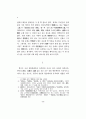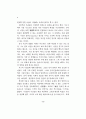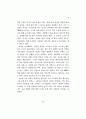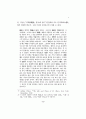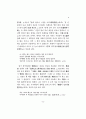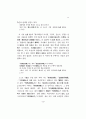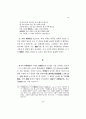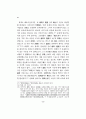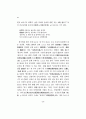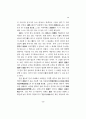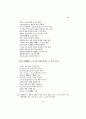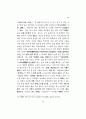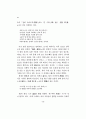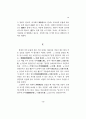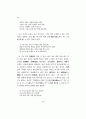본문내용
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典故의 운용이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 신묘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433-
그러나 用典의 윤기와 정감이 함께 고고한 것으로 말하자면, 나는 일찍이 퇴계의 「산에 노닐며 만나는 대로 쓴 열두 수(遊山書事十二首)」 중의 「집에 돌아오다(還家)」라는 한 수를(文集 卷2, 全書 第1冊, p.89) 더욱 칭찬하고 싶다.
산에 노니는 것에 무슨 얻을 것이 있는가?
농사꾼이 가을에 수확하는 것과 똑 같지.
거처하던 옛날의 서실에 돌아 와서,
고요히 향 연기를 대하고 있노라.
오히려 산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은,
다행스럽게도 진세의 근심이 없다는 것이네.
이것 또한 표면적으로 말하자면, 보기만 하여서는 마치 전고를 전혀 쓰지 않은 듯하다. 『書經·盤庚上』에는 반경의 농사를 지음에 밭에 가서 힘써 심어야 또한 가을에 거두는 것이 있느니라 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이는 이 시의 둘째 구에 쓰인 가장 빠른 출전일 것이다. 한시에 쓰인 전고의 묘함은 가장 으뜸이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전고를 사용하되 마치 전고를 사용하지 않은 듯하여 거의 백거이 시와 같이 노파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또한 雅正함을 잃지 않는 것이며, 그 다음은 용전을 쓰더라도 마땅히 가장 빠른 것을 사용하여 여러 용전에 있어서의 선조를 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위의 시에 쓰인 한 구절은 이상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시 중에서도 빼어난 것이라 하겠다.
-434-
퇴계는 對仗에 있어서도 일찍이 虛字로 句의 마지막에 押韻을 하여, 자못 기이한 흥취에 이르렀다. 문집 卷1 「팔월 보름날 밤에 읊다(八月十五日夜吟)」 (全書 第1冊, p.69)의 頸聯과 같은 것이다.
사시사철 누가 할 일 없는 자가 되려는지,
뭇 벌레들 다투어 불평을 호소하네.
者'와 如'는 모두 虛詞로 對를 하였다. 윗구에서 居者는 누구나 일이 없다고 하고, 아래 구에서는 여러 곤충들이 불평을 호소하는 듯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無事者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문법에 있어서도 또한 하나의 名詞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어휘의 뒤섞임이 이와 같으니 調理와 흥취가 비로소 마음에 흡족하기도 하면서 여전히 율격에 어긋나지 않는다. 虛字는 본래 항상 쓰지 않는 것이나, 여기에서는 그 기묘함을 잘 발휘하고 있으니, 진부한 것을 신기한 것으로 변화시킨 것이라 하겠다.
Ⅳ.
퇴계의 여러 문집에 실린 시편 중에는 아름다운 시들이 매우 많아 작은 글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듯하다. 그 문장을 읽었을 때, 늘 잊기 어려운 것은 오언절구인 속집 卷1의 「문경 경운루의 서쪽 누각은…(聞慶慶雲樓西閣…)」(全書 第3冊, p.20)과 별집 卷1 「그림의 제목으로 여덟 수의 절구를 짓다(題畵八絶)」 중의 「원숭이( )」(全書 第2冊, p.533)와 칠언절구인 속집 卷1 「갑진년 늦여름에 병으로 사헌부의 일을 그만두고…(甲辰(1544)季夏病解臺務…)」(全書 第3冊, p.24)와 칠언율시인 문집 卷3의 「도산에서 뜻을 말하다(陶山言志)」(全書 第1冊, p.114)와 오언고시인 속집 卷1의 「가을밤에 바람이 몹시 불고 소낙비가 내려서 느낌이 있다(秋夜疾風驟雨有感)」(全書 第3冊, p.19)와 같은 것들은 모두 홀로 자리를 압도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시들은 당·송대 명인들의 문집에 넣어 두더라도 여전히 극히 뛰어난 것으로 추천될 수 있을 듯하다.
-435-
그렇다면 내가 퇴계의 非哲理詩를 보았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이 조예의 지극한 경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 아래 퇴계의 시 세 수를 함께 감상해 보기로 하자. 하나는 외집 卷1에 실려 있는 「웅사의 시 두루말이에 쓰다(題雄師詩卷)」 (全書 第2冊, p.557)라는 칠언절구이다.
한가히 지내는 이월에 풍광이 좋아,
시냇가 푸른 산에 두견화가 피려 하네.
묻노라, 선방에는 무엇이 있는지,
일천 봉 그림자 속에 푸른 안개 자욱하네.
나는 이것이 소리로 듣고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도달할 수 있는 근본이라고 말한다. 문집 卷5 「먼 숲의 하얀 안개(遠林白烟)」라는 시는 (全書 第1冊, p.160) 다음과 같다.
긴 수풀 아득 아득 먼 마을을 곁에 두었는데,
바람이 일어나자 하늘의 울림은 아득하여 들리지 않네.
태평이란 형상이 없는 것이라 말을 하지 마오,
한 가닥 아침 안개를 눈 여겨 바라본다면.
-436-
이 시는 흡사 菩薩戒를 받는 것 같이, 하고 싶은 바를 씻어 내고 모든 것을 쓸어 내어도 여전히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것이 있는 듯하다. 남송말 胡應麟의 『困學紀聞』 卷18에는 司空表聖은 戴容州가 詩歌의 정경은 "남전에 햇빛이 따뜻하고, 좋은 옥에서 연기가 피어나네"와도 같은 것이어서, 바라볼 수는 있어도 눈앞에다 둘 수는 없는 것이다. 李義山의 "옥에서 연기가 피어난다"라는 구절은 아마도 여기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고 되어 있다. 戴容州는 바로 戴叔倫으로 蕭穎士의 문인이며 『新唐書』 卷143에 전기가 있다. 그의 이야기는 이러한 경계와 흡사한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것을 느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퇴계문집』 卷3 「도산잡영(陶山雜詠)」의 「절구 이십 육 수(二十六絶)」와 「설경(雪徑)」 한 수(全書 第1冊, p.106)는 더욱 뛰어난 하나의 경계를 열어 젖혔다.
한 가닥 오솔길이 강을 끼고 있는데,
높다 낮다 끊겼다 다시 감도네.
눈이 쌓여 사람 자취 전혀 없는데,
뜬구름 저 밖에서 중이 오고 있네.
이는 참으로 德人의 음이며 부드러운 仁者의 마음이어서 두 번째 경지인 義'까지는 더 이상 가지 않는 것이다. 남송의 嚴滄浪(羽)은 대저 시는 別材가 있어서 책과는 관계가 없으며, 시는 別趣가 있어서 이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독서를 많이 하지 않고 궁리를 많이 하지 않으면 그 지극함에 미칠 수는 없다 라고 하였다.(『滄浪詩話』 卷1) 조선의 시인 퇴계는 독서를 많이 하고 궁리를 많이 한 사람으로 창랑이 理의 길에 빠지지 않고 말의 통발에 걸리지도 않은 것이 뛰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한 경계, 바로 여기에 있는 듯하다.
-437-
(우 재 호 譯)
-433-
그러나 用典의 윤기와 정감이 함께 고고한 것으로 말하자면, 나는 일찍이 퇴계의 「산에 노닐며 만나는 대로 쓴 열두 수(遊山書事十二首)」 중의 「집에 돌아오다(還家)」라는 한 수를(文集 卷2, 全書 第1冊, p.89) 더욱 칭찬하고 싶다.
산에 노니는 것에 무슨 얻을 것이 있는가?
농사꾼이 가을에 수확하는 것과 똑 같지.
거처하던 옛날의 서실에 돌아 와서,
고요히 향 연기를 대하고 있노라.
오히려 산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은,
다행스럽게도 진세의 근심이 없다는 것이네.
이것 또한 표면적으로 말하자면, 보기만 하여서는 마치 전고를 전혀 쓰지 않은 듯하다. 『書經·盤庚上』에는 반경의 농사를 지음에 밭에 가서 힘써 심어야 또한 가을에 거두는 것이 있느니라 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이는 이 시의 둘째 구에 쓰인 가장 빠른 출전일 것이다. 한시에 쓰인 전고의 묘함은 가장 으뜸이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전고를 사용하되 마치 전고를 사용하지 않은 듯하여 거의 백거이 시와 같이 노파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또한 雅正함을 잃지 않는 것이며, 그 다음은 용전을 쓰더라도 마땅히 가장 빠른 것을 사용하여 여러 용전에 있어서의 선조를 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위의 시에 쓰인 한 구절은 이상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시 중에서도 빼어난 것이라 하겠다.
-434-
퇴계는 對仗에 있어서도 일찍이 虛字로 句의 마지막에 押韻을 하여, 자못 기이한 흥취에 이르렀다. 문집 卷1 「팔월 보름날 밤에 읊다(八月十五日夜吟)」 (全書 第1冊, p.69)의 頸聯과 같은 것이다.
사시사철 누가 할 일 없는 자가 되려는지,
뭇 벌레들 다투어 불평을 호소하네.
者'와 如'는 모두 虛詞로 對를 하였다. 윗구에서 居者는 누구나 일이 없다고 하고, 아래 구에서는 여러 곤충들이 불평을 호소하는 듯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無事者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문법에 있어서도 또한 하나의 名詞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어휘의 뒤섞임이 이와 같으니 調理와 흥취가 비로소 마음에 흡족하기도 하면서 여전히 율격에 어긋나지 않는다. 虛字는 본래 항상 쓰지 않는 것이나, 여기에서는 그 기묘함을 잘 발휘하고 있으니, 진부한 것을 신기한 것으로 변화시킨 것이라 하겠다.
Ⅳ.
퇴계의 여러 문집에 실린 시편 중에는 아름다운 시들이 매우 많아 작은 글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듯하다. 그 문장을 읽었을 때, 늘 잊기 어려운 것은 오언절구인 속집 卷1의 「문경 경운루의 서쪽 누각은…(聞慶慶雲樓西閣…)」(全書 第3冊, p.20)과 별집 卷1 「그림의 제목으로 여덟 수의 절구를 짓다(題畵八絶)」 중의 「원숭이( )」(全書 第2冊, p.533)와 칠언절구인 속집 卷1 「갑진년 늦여름에 병으로 사헌부의 일을 그만두고…(甲辰(1544)季夏病解臺務…)」(全書 第3冊, p.24)와 칠언율시인 문집 卷3의 「도산에서 뜻을 말하다(陶山言志)」(全書 第1冊, p.114)와 오언고시인 속집 卷1의 「가을밤에 바람이 몹시 불고 소낙비가 내려서 느낌이 있다(秋夜疾風驟雨有感)」(全書 第3冊, p.19)와 같은 것들은 모두 홀로 자리를 압도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시들은 당·송대 명인들의 문집에 넣어 두더라도 여전히 극히 뛰어난 것으로 추천될 수 있을 듯하다.
-435-
그렇다면 내가 퇴계의 非哲理詩를 보았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이 조예의 지극한 경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 아래 퇴계의 시 세 수를 함께 감상해 보기로 하자. 하나는 외집 卷1에 실려 있는 「웅사의 시 두루말이에 쓰다(題雄師詩卷)」 (全書 第2冊, p.557)라는 칠언절구이다.
한가히 지내는 이월에 풍광이 좋아,
시냇가 푸른 산에 두견화가 피려 하네.
묻노라, 선방에는 무엇이 있는지,
일천 봉 그림자 속에 푸른 안개 자욱하네.
나는 이것이 소리로 듣고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도달할 수 있는 근본이라고 말한다. 문집 卷5 「먼 숲의 하얀 안개(遠林白烟)」라는 시는 (全書 第1冊, p.160) 다음과 같다.
긴 수풀 아득 아득 먼 마을을 곁에 두었는데,
바람이 일어나자 하늘의 울림은 아득하여 들리지 않네.
태평이란 형상이 없는 것이라 말을 하지 마오,
한 가닥 아침 안개를 눈 여겨 바라본다면.
-436-
이 시는 흡사 菩薩戒를 받는 것 같이, 하고 싶은 바를 씻어 내고 모든 것을 쓸어 내어도 여전히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것이 있는 듯하다. 남송말 胡應麟의 『困學紀聞』 卷18에는 司空表聖은 戴容州가 詩歌의 정경은 "남전에 햇빛이 따뜻하고, 좋은 옥에서 연기가 피어나네"와도 같은 것이어서, 바라볼 수는 있어도 눈앞에다 둘 수는 없는 것이다. 李義山의 "옥에서 연기가 피어난다"라는 구절은 아마도 여기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고 되어 있다. 戴容州는 바로 戴叔倫으로 蕭穎士의 문인이며 『新唐書』 卷143에 전기가 있다. 그의 이야기는 이러한 경계와 흡사한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것을 느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퇴계문집』 卷3 「도산잡영(陶山雜詠)」의 「절구 이십 육 수(二十六絶)」와 「설경(雪徑)」 한 수(全書 第1冊, p.106)는 더욱 뛰어난 하나의 경계를 열어 젖혔다.
한 가닥 오솔길이 강을 끼고 있는데,
높다 낮다 끊겼다 다시 감도네.
눈이 쌓여 사람 자취 전혀 없는데,
뜬구름 저 밖에서 중이 오고 있네.
이는 참으로 德人의 음이며 부드러운 仁者의 마음이어서 두 번째 경지인 義'까지는 더 이상 가지 않는 것이다. 남송의 嚴滄浪(羽)은 대저 시는 別材가 있어서 책과는 관계가 없으며, 시는 別趣가 있어서 이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독서를 많이 하지 않고 궁리를 많이 하지 않으면 그 지극함에 미칠 수는 없다 라고 하였다.(『滄浪詩話』 卷1) 조선의 시인 퇴계는 독서를 많이 하고 궁리를 많이 한 사람으로 창랑이 理의 길에 빠지지 않고 말의 통발에 걸리지도 않은 것이 뛰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한 경계, 바로 여기에 있는 듯하다.
-437-
(우 재 호 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