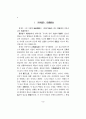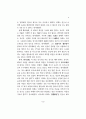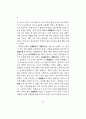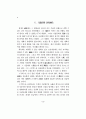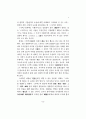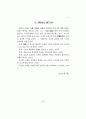목차
Ⅰ. 재이견고, 공구수성
Ⅱ. 항룡유회 거안려위
Ⅲ. 소제경화 진우치평
Ⅱ. 항룡유회 거안려위
Ⅲ. 소제경화 진우치평
본문내용
龍을 빌어 象으로 삼고 있는 데 주의한다. 용은 변화막측과 숨고 드러나는 것에 일정함이 없는 하나의 상징이며 우주만물의 이치와 인간세상의 변화에 일정함이 없는 상태를 대표하고 있다. 건괘 上九의 '亢龍'은 그 지위가 극에 이르러 더 할 수 없이 높은 곳에 있으며 주위를 돌아보아도 망연하기만 한 자리이다. 이미 더 나아갈 곳이 없고 또 내려갈 수도 없으므로 우울하고 고민스러운 것이다. 지위가 지나치게 높으면 후회와 걱정이 반드시 생기는 것은 필연적 추세이다. 이를 추론하면 '物은 극에 다다르면 되돌아온다.' '즐거움이 극도에 이르면 슬픔이 생기게 된다'는 도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퇴계가 임금에게 주역 건괘를 강의할 때 그 중점이 '亢龍有悔'에 있었다. 그가 나타내고자 했던 뜻은, 지나치게 존귀하게 되면 安身立命의 지위가 없어지게 되고 지나치게 교만하게 되면 민중의 지지를 일고 현명한 신하의 보좌까지 잃게 되어 자연히 만사에 후회할 일만 생길 것이라는 데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亢龍之災'를 피할 수 있는 것일까? 퇴계는 "그러므로 옛 현군은 이 도리를 깊히 알아 늘 자기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고 하였다. 주역 의 원리에 의하면 陰陽·剛柔·强弱·上下·尊卑·雌雄 등이 대립과 통일이라는 양방면의 교감작용을 하여 우주의 만물을 化育 生長시키는 것이다. 대립하는 쌍방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轉化할 수 있는 것이다. 군주가 통치지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知柔知剛' '剛柔相應'의 도리를 알아 '剛健中正'하여 中正의 도리에 합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剛居柔下' '損剛益柔'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군신간의 존비관계를 처리할 때 '以貴下賤' '損上益下'의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군주 자신은 겸손한 군자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겸양과 공손으로써 스스로 오만하지 않는 군주는 오히려 백성들의 옹호와 복종을 받게 되는 것이다. 퇴계가 貶仰降屈의 도리를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618-
'亢龍有悔'의 명제에 대해 퇴계는 진퇴존망의 도리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진일보적인 闡發을 하였다. 그는 진퇴, 존망, 득실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 轉化的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편파적인 것에 빠지게 된다. 다만 두 가지를 다 알아야만 정상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퇴계는 "임금의 세력과 지위가 지나치게 높아 만약 進이 극에 달하면 退해야 하며 存이 있으면 亡이 있고 得이 있으면 失도 있다는 도리를 알지 못하면" 이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퇴계는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安危·存亡·治亂의 변증적인 관계를 알아, 안일에 빠지면 망국의 화를 가져 오고, 자만에 빠지면 動亂의 위기가 생긴다는 이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대처하는 데는 '편안할 때 위험을 대비한다'는 居安思危의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였다.
그에 의하면 화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사람은 오랜 안일에서 방만해지는 것이므로 우환의식 속에서는 삶의 길을 열 수 있고, 안락에서는 사망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居安思危하여 갑자기 일어나는 변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바탕하여 퇴계는 '治世를 걱정하고 明主에게서 위험을 느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퇴계의 盛世危言 가운데는 사상가로서의 변증법적 광채와 정치가로서의 深謀遠慮가 구현되어 있으며 강렬한 우환의식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消除更化 臻于治平
어떻게 天災와 人禍·內優와 外患에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퇴계는 일련의 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戊辰六條疏》에서 갖가지 장애를 물리치고 치국평천하에 이르는 방안 16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퇴계가 임금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구체적 조치이며 퇴계 應變思想의 요점을 선명히 드러낸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관점을 여섯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19-
첫째, 應變 즉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의 근본적인 방안은 임금 본인이 스스로 덕을 닦는 데 있다는 것이다.
둘째, 人心이 화합하면 災異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中正으로써 협조하여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검소를 숭상하고 사치를 경계하며 양식을 저장하여 흉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요새를 설치하여 변경을 굳게 지키고 군사력을 길러 국방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상벌을 분명히 하여 잘못한 자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언 종 譯)
그렇다면 어떻게 '亢龍之災'를 피할 수 있는 것일까? 퇴계는 "그러므로 옛 현군은 이 도리를 깊히 알아 늘 자기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고 하였다. 주역 의 원리에 의하면 陰陽·剛柔·强弱·上下·尊卑·雌雄 등이 대립과 통일이라는 양방면의 교감작용을 하여 우주의 만물을 化育 生長시키는 것이다. 대립하는 쌍방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轉化할 수 있는 것이다. 군주가 통치지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知柔知剛' '剛柔相應'의 도리를 알아 '剛健中正'하여 中正의 도리에 합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剛居柔下' '損剛益柔'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군신간의 존비관계를 처리할 때 '以貴下賤' '損上益下'의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군주 자신은 겸손한 군자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겸양과 공손으로써 스스로 오만하지 않는 군주는 오히려 백성들의 옹호와 복종을 받게 되는 것이다. 퇴계가 貶仰降屈의 도리를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618-
'亢龍有悔'의 명제에 대해 퇴계는 진퇴존망의 도리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진일보적인 闡發을 하였다. 그는 진퇴, 존망, 득실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 轉化的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편파적인 것에 빠지게 된다. 다만 두 가지를 다 알아야만 정상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퇴계는 "임금의 세력과 지위가 지나치게 높아 만약 進이 극에 달하면 退해야 하며 存이 있으면 亡이 있고 得이 있으면 失도 있다는 도리를 알지 못하면" 이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퇴계는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安危·存亡·治亂의 변증적인 관계를 알아, 안일에 빠지면 망국의 화를 가져 오고, 자만에 빠지면 動亂의 위기가 생긴다는 이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대처하는 데는 '편안할 때 위험을 대비한다'는 居安思危의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였다.
그에 의하면 화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사람은 오랜 안일에서 방만해지는 것이므로 우환의식 속에서는 삶의 길을 열 수 있고, 안락에서는 사망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居安思危하여 갑자기 일어나는 변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바탕하여 퇴계는 '治世를 걱정하고 明主에게서 위험을 느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퇴계의 盛世危言 가운데는 사상가로서의 변증법적 광채와 정치가로서의 深謀遠慮가 구현되어 있으며 강렬한 우환의식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消除更化 臻于治平
어떻게 天災와 人禍·內優와 外患에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퇴계는 일련의 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戊辰六條疏》에서 갖가지 장애를 물리치고 치국평천하에 이르는 방안 16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퇴계가 임금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구체적 조치이며 퇴계 應變思想의 요점을 선명히 드러낸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관점을 여섯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19-
첫째, 應變 즉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의 근본적인 방안은 임금 본인이 스스로 덕을 닦는 데 있다는 것이다.
둘째, 人心이 화합하면 災異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中正으로써 협조하여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검소를 숭상하고 사치를 경계하며 양식을 저장하여 흉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요새를 설치하여 변경을 굳게 지키고 군사력을 길러 국방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상벌을 분명히 하여 잘못한 자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언 종 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