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상단의 인심을 받아서, 인욕을 끊어 버리기 위한 공부와 그 효험을, 왼쪽 반의 「戒懼」 「操存」 「心思」 「養心」 「盡心」 「七十而從心」의 여섯은, 상단의 「도심」을 받아서, 천리를 보존하기 위한 공부와 그 효험을 제각기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栗谷은 인욕을 끊는 공부와 천리를 보존하는 공부를 兩邊으로 나누는 것도 이상한 터에, 「愼獨」 「克復」 「心在」다음에 「求放心」을 놓은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말해, 결론적으로 <心學圖>는 틀린 곳이 많고 조잡한 책이라고 가차없이 비판하고 있다.
-103-
<心學圖>중의 각 사항의 上과 下 위치 관계에 대해서는 趙士敬도 문제삼고 있다. 즉 상위에 있는 것은 초보적인 공부로, 하위에 있는 것일수록 고차적인 공부로 된다고 할 경우, 예를 들어 「養心」을 「心思」 뒤에 놓기도 하고, 「求放心」을 「愼獨」 「克復」 「心在」다음에 놓기도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 의문 가운데 다만 「心在」과 「求放心」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는 퇴계 자신도 마음에 걸린 탓인지
) 退溪文集 권23, 答趙士敬 제37書.
「心在」와 「求放心」만은 양자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말하고 있다. 퇴계는 「求放心」이던 「養心」이던간에 이것들은 반드시 초학자에게만 요구되는 공부는 아니라고 한다. 「養心」에 대해서는 朱子의 ≪養心亭記≫에 있는 것처럼, 성현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은 아니며, 반드시 마음을 함양하므로써 도달하는 것이다. 程林隱의 이른바 「養心」도 이와 마찬가지로, 공부의 초기 단계에 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로써 유추해 보면 「求放心」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만약 초학자에게만 요구되는 공부라면, 孟子는 「학문의 시작은 마땅히 방심을 거두어들임에 있다.」라고 말했을 터인데, 그러나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없다. 오직 방심을 거두어들임에 있을 뿐이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求放心」의 공부는 초학자에게만 요구되는 공부는 아니고 대현이라고 일컬어지는 顔子에게도 해당되는 공부라고.
) 退溪文集 권23, 答趙士敬 참조.
<心學圖>에 있어서의 각 사항의 상하 좌우의 위치 관계는, 圖를 작성할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렇게 된 것으로, 例를 들면 ≪大學≫의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의 순서에서 보는 것 같은 엄격한 선후 관계를 염두에 두고 배열한 것은 아니다. 요컨대 성현이 논하고 있는 心法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그 一部分만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전체를 알고 그 전부에 걸쳐서 수양을 수행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정림은의 ≪心學圖≫도 실은 이를 밝히려고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퇴계의 결론이었다.
) 退溪文集 권14, 答李叔獻.
-104-
Ⅵ.
다음에 「人心道心章」 ≪附註≫에 수록되어 있는 <人心道心圖>와 그 ≪說≫에 대해 말하면, 인심도심 문제는 심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 동시에 鄭秋巒 원작의 ≪天命圖≫를 개정하기도 하고, ≪성학십도≫를 작성해서 幼主 宣祖에게 헌상하기도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상을 표현하거나 전달할 경우, 도표가 아주 유효한 수단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퇴계이므로, 당연히 퇴계는 이 ≪人心道心章≫에도 강한 관심을 보였다. 다만 이 <圖>와 <說>은 그 됨됨이 그다지 신통치 못하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의미가 통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 여기에 퇴계는 어떻게 해서든 의미가 통하도록 몇 번인가 圖의 改定을 시도해 보았으나, 결국 마음에 흡족한 것은 만들 수 없었던 것 같다.
) 退溪文集 권14, 答李叔獻問目, 同 권23, 答趙士敬.
다음 ≪心經≫ 권4에 수록되어 있는 范蘭溪의 ≪心箴≫인데, 이 ≪心箴≫은 朱子가 ≪孟子集注≫ 告子章句上에 채택했기 때문에 일약 유명해진 것이다. 형체상으로는 지극히 미소한 인간이, 한편에서는 천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삼재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실은 心에 있는 것이라고 하고, 그러므로써 心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상은, 心을 일신의 주재라고 하는 사상과 함께 宋明시대 유학자가 심학을 중시하는 최대의 이유였으며, 朱子가 젊은 시절에 지은 <存齋記>
) 朱子文集 권77.
에도 보이며, 또한 元의 許魯齋의 ≪心法≫이나 程篁 의 ≪心經附註≫서문 중에도 표명되어 있다. 퇴계심학도 이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 ≪心箴≫이 퇴계 문하의 중요한 교과서였던 것은 거의 틀림이 없다.
이 ≪心箴≫이외에도 范蘭溪의 저작으로서 ≪心經附註≫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권2 「大學誠意章」에 ≪愼獨齋記≫, 권3 「孟子牛山之木章」에 ≪存心齋記≫가 있다. 그 중 특히 퇴계 문하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存心齋記≫로, 문인 崔見叔이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
) 退溪文集 권12, 答崔見叔問目.
-105-
程朱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動靜相對의 상을 초월한 곳에 지정한 것을 구해서 그것을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佛老의 異端사상이다. 이에 대해서 정주학자는 어디까지나 마음을 一動一靜의 상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마음의 체용을 보려고 했다. 퇴계가 崔見叔의 의의에 찬의를 표하고 范蘭溪의 심설을 비판한 이유도, 실은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存心齋記≫중의 范蘭溪의 심설에 불노의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心箴≫도 당연히 문제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과연 「心箴章」의 ≪附註≫에서는 불교의 관심설에 「求心之病」
) 朱子는 佛敎心學에는 「求心의 病」이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張橫浦, 謝上蔡와 그의 영향하에 있었던 湖南學派, 象山학파의 학문에도 거의 같은 경향이 있다고 하고, 이것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해서 비판하고 있다. 퇴계에게도 「마음으로 마음을 보는 說」을 비판하는 자료가 退溪文集 권37, 答李 平叔에 있다.
이 있다고 비판했던 朱子의 「觀心說」
) 朱子文集 권67.
을 수록해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불노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퇴계 문하에는 范蘭溪에 관한 한, ≪存心齋記≫중의 일문에 대한 비판에 그쳐서, 范蘭溪의 심설에 관한 그 이 이상의 깊이 파고드는 의논은 없었다.
이상 퇴계의 心學과 표리를 이루는 퇴계의 心說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타일을 기하기로 한다.
-106-
(박 양 자 譯)
-103-
<心學圖>중의 각 사항의 上과 下 위치 관계에 대해서는 趙士敬도 문제삼고 있다. 즉 상위에 있는 것은 초보적인 공부로, 하위에 있는 것일수록 고차적인 공부로 된다고 할 경우, 예를 들어 「養心」을 「心思」 뒤에 놓기도 하고, 「求放心」을 「愼獨」 「克復」 「心在」다음에 놓기도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 의문 가운데 다만 「心在」과 「求放心」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는 퇴계 자신도 마음에 걸린 탓인지
) 退溪文集 권23, 答趙士敬 제37書.
「心在」와 「求放心」만은 양자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말하고 있다. 퇴계는 「求放心」이던 「養心」이던간에 이것들은 반드시 초학자에게만 요구되는 공부는 아니라고 한다. 「養心」에 대해서는 朱子의 ≪養心亭記≫에 있는 것처럼, 성현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은 아니며, 반드시 마음을 함양하므로써 도달하는 것이다. 程林隱의 이른바 「養心」도 이와 마찬가지로, 공부의 초기 단계에 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로써 유추해 보면 「求放心」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만약 초학자에게만 요구되는 공부라면, 孟子는 「학문의 시작은 마땅히 방심을 거두어들임에 있다.」라고 말했을 터인데, 그러나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없다. 오직 방심을 거두어들임에 있을 뿐이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求放心」의 공부는 초학자에게만 요구되는 공부는 아니고 대현이라고 일컬어지는 顔子에게도 해당되는 공부라고.
) 退溪文集 권23, 答趙士敬 참조.
<心學圖>에 있어서의 각 사항의 상하 좌우의 위치 관계는, 圖를 작성할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렇게 된 것으로, 例를 들면 ≪大學≫의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의 순서에서 보는 것 같은 엄격한 선후 관계를 염두에 두고 배열한 것은 아니다. 요컨대 성현이 논하고 있는 心法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그 一部分만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전체를 알고 그 전부에 걸쳐서 수양을 수행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정림은의 ≪心學圖≫도 실은 이를 밝히려고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퇴계의 결론이었다.
) 退溪文集 권14, 答李叔獻.
-104-
Ⅵ.
다음에 「人心道心章」 ≪附註≫에 수록되어 있는 <人心道心圖>와 그 ≪說≫에 대해 말하면, 인심도심 문제는 심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 동시에 鄭秋巒 원작의 ≪天命圖≫를 개정하기도 하고, ≪성학십도≫를 작성해서 幼主 宣祖에게 헌상하기도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상을 표현하거나 전달할 경우, 도표가 아주 유효한 수단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퇴계이므로, 당연히 퇴계는 이 ≪人心道心章≫에도 강한 관심을 보였다. 다만 이 <圖>와 <說>은 그 됨됨이 그다지 신통치 못하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의미가 통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 여기에 퇴계는 어떻게 해서든 의미가 통하도록 몇 번인가 圖의 改定을 시도해 보았으나, 결국 마음에 흡족한 것은 만들 수 없었던 것 같다.
) 退溪文集 권14, 答李叔獻問目, 同 권23, 答趙士敬.
다음 ≪心經≫ 권4에 수록되어 있는 范蘭溪의 ≪心箴≫인데, 이 ≪心箴≫은 朱子가 ≪孟子集注≫ 告子章句上에 채택했기 때문에 일약 유명해진 것이다. 형체상으로는 지극히 미소한 인간이, 한편에서는 천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삼재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실은 心에 있는 것이라고 하고, 그러므로써 心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상은, 心을 일신의 주재라고 하는 사상과 함께 宋明시대 유학자가 심학을 중시하는 최대의 이유였으며, 朱子가 젊은 시절에 지은 <存齋記>
) 朱子文集 권77.
에도 보이며, 또한 元의 許魯齋의 ≪心法≫이나 程篁 의 ≪心經附註≫서문 중에도 표명되어 있다. 퇴계심학도 이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 ≪心箴≫이 퇴계 문하의 중요한 교과서였던 것은 거의 틀림이 없다.
이 ≪心箴≫이외에도 范蘭溪의 저작으로서 ≪心經附註≫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권2 「大學誠意章」에 ≪愼獨齋記≫, 권3 「孟子牛山之木章」에 ≪存心齋記≫가 있다. 그 중 특히 퇴계 문하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存心齋記≫로, 문인 崔見叔이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
) 退溪文集 권12, 答崔見叔問目.
-105-
程朱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動靜相對의 상을 초월한 곳에 지정한 것을 구해서 그것을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佛老의 異端사상이다. 이에 대해서 정주학자는 어디까지나 마음을 一動一靜의 상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마음의 체용을 보려고 했다. 퇴계가 崔見叔의 의의에 찬의를 표하고 范蘭溪의 심설을 비판한 이유도, 실은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存心齋記≫중의 范蘭溪의 심설에 불노의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心箴≫도 당연히 문제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과연 「心箴章」의 ≪附註≫에서는 불교의 관심설에 「求心之病」
) 朱子는 佛敎心學에는 「求心의 病」이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張橫浦, 謝上蔡와 그의 영향하에 있었던 湖南學派, 象山학파의 학문에도 거의 같은 경향이 있다고 하고, 이것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해서 비판하고 있다. 퇴계에게도 「마음으로 마음을 보는 說」을 비판하는 자료가 退溪文集 권37, 答李 平叔에 있다.
이 있다고 비판했던 朱子의 「觀心說」
) 朱子文集 권67.
을 수록해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불노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퇴계 문하에는 范蘭溪에 관한 한, ≪存心齋記≫중의 일문에 대한 비판에 그쳐서, 范蘭溪의 심설에 관한 그 이 이상의 깊이 파고드는 의논은 없었다.
이상 퇴계의 心學과 표리를 이루는 퇴계의 心說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타일을 기하기로 한다.
-106-
(박 양 자 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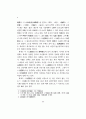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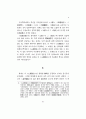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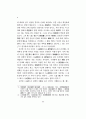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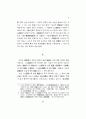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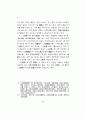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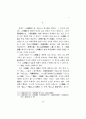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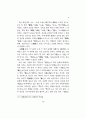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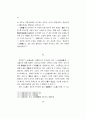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