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논
Ⅱ. 나정암 비판
Ⅲ. 왕양명 비판
Ⅳ. 결 논
Ⅱ. 나정암 비판
Ⅲ. 왕양명 비판
Ⅳ. 결 논
본문내용
의 사람들이 잠깐 강습 토론하고, 진실을 知得함을 기다려 비로소 行의 공부 習練을 하는 까닭에 마침내 종신토록 행하지 않으며, 또한 드디어 종신토록 알지 못한다.」고 말한 데 대하여,
이 말은 진실로 末學이 쓸데없이 口耳를 일삼을 뿐인 폐단에 해당한다.
) 此言切中末學徒事口耳之弊. (同上 334면 上)
그리고 또한, 陽明이 好色을 보고 惡臭를 맡음을 知에 속한다 하고, 호색을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함을 行에 속한다 해서 「見聞할 때 이미 자기 스스로 好惡하고 있다. 본 뒤에 또한 이 마음을 세워서 좋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맡은 뒤에 달리 이 마음을 세워서 싫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퇴계는 「이것을 가지고 지행합일의 증명으로 한 것은 그럴 듯하다.」
) 以此爲知行合一之證者 (似矣-同上)
라고 설하여 이것을 인정한다. 이것은 인간의 감각적 분야에 있어서, 陽明이 말하는 것 같은 지행합일이 성립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퇴계는 인간의 이성적 분야에 있어서는 지행합일이 성립하지 않는다 했다. 즉 말하기를,
陽明이 참말로, 사람이 善을 보고 이것을 좋아하는 것은, 과연 능히 호색을 보고 자기 스스로 능히 이것을 좋아함의 진실과 같다고 생각했을까. 사람이 不善을 보고 이것을 싫어하는 것은 과연 능히 악취를 맡고 자기 스스로 능히 이것을 싫어함의 진실과 같다고 생각했을까.
) 陽明信以爲人之見善而好之, 果能如見好色自能好之之誠乎, 人之見不善而惡之, 果能如聞惡臭自能惡之之實乎(同上).
라고. 이렇게 해서 퇴계는 또다시 감각 감정과 이성 의리의 변별을 상론하여
사람의 마음이 形氣에서 발하는 것은, 곧 배우지 않고서 스스로 알게 되며, 힘쓰지 않고서 스스로 잘 할 수 있으며, 好惡이 있는 곳에 表裏가 하나인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약간의 好色을 보면 곧 그 좋음을 알아서 마음이 참말로 이것을 좋아하고, 약간의 악취를 맡으면 곧 그 싫어함을 알아서 마음이 참말로 이것을 싫어한다. 行은 知에 깃든다고 말하지만, 역시 可하다. 의리에 이르러서는 그렇지 않다. 배우지 않으면 모르고 힘쓰지 않으면 잘 할 수 없다. 그 밖에 행해지는 것이 아직 반드시 그 속에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善을 보면서도 善을 알지 못하는 일이 있으며, 善을 알면서도 마음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善을 볼때 이미 스스로 좋아한다고 말해도 좋을 것인가. 不善을 보면서도 惡을 알지 못하는 일이 있으며, 악인 줄 알면서도, 마음이 싫지 않은 일이 있는데, 이것을 악을 알때 이미 스스로 싫어한다고 말해서 좋을 것인가.
) 人之心發於形氣者, 則不學而自知, 不勉而自能, 好惡所在, 表裏如一. 故才見好色, 卽知其好而心誠好之, 才聞惡臭, 卽知其惡而心實惡之, 雖曰行寓於知, 猶之可也. 至於義理, 則不然也. 不學則不知, 不勉則不能, 其行於外者, 未必誠於內. 故見善而不知善者有之, 見知善而心不好者有之, 謂之見善時已好可乎, 見不善而不知惡者有之, 知惡而心不惡者有之, 謂之知惡時已自惡可乎(同上).
-271-
라고 말한다. 形氣에서 발하는 것과 이성에서 발하는 것을 體認 식별하고 있었던 퇴계에 있어서는, 陽明의 지행합일설은 그 形氣的 측면에서는 가능하지만 그 이성적 측면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된다. 이것은 바로 퇴계 獨自의 陽明 비판이며, 그의 성정론과 엄격히 결부되는 것이다. 퇴계가 前言에 이어서,
陽明은 곧 그 形氣가 행하는 바를 인용하여, 이로써 의리의 지행(합일)의 설을 밝히고자 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그러므로 의리의 지행은 합쳐서 이것을 말하면 원래부터 서로 더불어 병행해서 하나를 뺄 수는 없다. 나누어서 이것을 말하면 知는 이것을 行이라고 말해서는 안되는 것은, 行은 이것을 知라고 말해서는 안되는 것과 같다. 어찌 합쳐서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 陽明乃引彼形氣之所爲, 以名此義理知行之說, 則大不可. 故義理之知行, 合而言之, 固相須竝行, 而不可缺一. 分而言之, 知不可謂之行, 猶行不可謂之知也. 豈合而爲一乎(同上 334면 하).
라고 說하는 것도 전술한 말과 다름 없다. 理氣性情對待의 변증론과 동일한 사고법이 知行의 관계에 관해서도 인지된다. 이상, 제1부터 제3조까지는 주로 주자의 관점에서부터의 비판이지만, 제4조에 이르러서는 퇴계 독자의 관점에서부터의 비판을 발견할 수 있다.
-272-
Ⅳ. 結 論
整菴은 理氣渾融一體의 說을 이룩하여, 明道에 贊意를 표하고 伊川 朱子의 「所以然之故」·理體太極을 배척하고, 이 현실의 세계는 卽氣 卽理라고 했다. 그가 주자 未定의 「一陰一陽, 往來不息, 卽是道之全體」라는 어구를 존중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그는 氣를 인지해서 理로 할 것이 아니고, 氣로 나아가 理를 認取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整菴의 설에는 理氣不離不雜의 변증론이 뚜렷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퇴계는 整菴에 있어서의 理氣 性情의 對待 分看이 명료치 않은 점을 찔러서, 그의 설을 理氣一物이라 단정하여 이것을 배척했다. 이것은 퇴계의 설이 理氣 性情이 對待 辨證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陽明에 관해서는 그 心卽理說에 物理心知의 대립이 없으며, 지식존중의 궁리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는 또한 그 지행합일설이 감각감정의 분야에서는 성립되지만 理性 의리의 분야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등을 명시하여 陽明의 설을 배척했다.
陽明의 心則理說은 인욕에 가리워져 있지 않은 이 마음(心)은 그대로 天理이며 이것은 일상의 세계에 生生流動하여 그치지 않는 생명이라 하는 것이며, 또한 「知는 바로 行의 主意, 行은 바로 知의 工夫」라고 說하는 지행합일설도 이것을 「자각은 실천의 주체로서의 의향, 실천은 자각의 工夫習練」이라 해석함으로써 비로서 陽明의 뜻에 들어맞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陽明의 說은 心과 理知와 行이라는 그 대립을 통하여 통일로 향하는 주자의 사색적 입장을 거부하고 오로지 양자의 통일면을 주체인 마음(心)에 근거해서 전개시키는 생명의 철학이었다. 주자학을 계승한 퇴계가 陽明에 반대한 것도 당연한 일이며 우리는 陽明에 대한 퇴계의 반론 속에서 그의 理氣性情不離不雜對待의 辨證論을 발견할 수 있다.
-273-
(퇴계학연구원 譯)
이 말은 진실로 末學이 쓸데없이 口耳를 일삼을 뿐인 폐단에 해당한다.
) 此言切中末學徒事口耳之弊. (同上 334면 上)
그리고 또한, 陽明이 好色을 보고 惡臭를 맡음을 知에 속한다 하고, 호색을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함을 行에 속한다 해서 「見聞할 때 이미 자기 스스로 好惡하고 있다. 본 뒤에 또한 이 마음을 세워서 좋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맡은 뒤에 달리 이 마음을 세워서 싫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퇴계는 「이것을 가지고 지행합일의 증명으로 한 것은 그럴 듯하다.」
) 以此爲知行合一之證者 (似矣-同上)
라고 설하여 이것을 인정한다. 이것은 인간의 감각적 분야에 있어서, 陽明이 말하는 것 같은 지행합일이 성립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퇴계는 인간의 이성적 분야에 있어서는 지행합일이 성립하지 않는다 했다. 즉 말하기를,
陽明이 참말로, 사람이 善을 보고 이것을 좋아하는 것은, 과연 능히 호색을 보고 자기 스스로 능히 이것을 좋아함의 진실과 같다고 생각했을까. 사람이 不善을 보고 이것을 싫어하는 것은 과연 능히 악취를 맡고 자기 스스로 능히 이것을 싫어함의 진실과 같다고 생각했을까.
) 陽明信以爲人之見善而好之, 果能如見好色自能好之之誠乎, 人之見不善而惡之, 果能如聞惡臭自能惡之之實乎(同上).
라고. 이렇게 해서 퇴계는 또다시 감각 감정과 이성 의리의 변별을 상론하여
사람의 마음이 形氣에서 발하는 것은, 곧 배우지 않고서 스스로 알게 되며, 힘쓰지 않고서 스스로 잘 할 수 있으며, 好惡이 있는 곳에 表裏가 하나인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약간의 好色을 보면 곧 그 좋음을 알아서 마음이 참말로 이것을 좋아하고, 약간의 악취를 맡으면 곧 그 싫어함을 알아서 마음이 참말로 이것을 싫어한다. 行은 知에 깃든다고 말하지만, 역시 可하다. 의리에 이르러서는 그렇지 않다. 배우지 않으면 모르고 힘쓰지 않으면 잘 할 수 없다. 그 밖에 행해지는 것이 아직 반드시 그 속에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善을 보면서도 善을 알지 못하는 일이 있으며, 善을 알면서도 마음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善을 볼때 이미 스스로 좋아한다고 말해도 좋을 것인가. 不善을 보면서도 惡을 알지 못하는 일이 있으며, 악인 줄 알면서도, 마음이 싫지 않은 일이 있는데, 이것을 악을 알때 이미 스스로 싫어한다고 말해서 좋을 것인가.
) 人之心發於形氣者, 則不學而自知, 不勉而自能, 好惡所在, 表裏如一. 故才見好色, 卽知其好而心誠好之, 才聞惡臭, 卽知其惡而心實惡之, 雖曰行寓於知, 猶之可也. 至於義理, 則不然也. 不學則不知, 不勉則不能, 其行於外者, 未必誠於內. 故見善而不知善者有之, 見知善而心不好者有之, 謂之見善時已好可乎, 見不善而不知惡者有之, 知惡而心不惡者有之, 謂之知惡時已自惡可乎(同上).
-271-
라고 말한다. 形氣에서 발하는 것과 이성에서 발하는 것을 體認 식별하고 있었던 퇴계에 있어서는, 陽明의 지행합일설은 그 形氣的 측면에서는 가능하지만 그 이성적 측면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된다. 이것은 바로 퇴계 獨自의 陽明 비판이며, 그의 성정론과 엄격히 결부되는 것이다. 퇴계가 前言에 이어서,
陽明은 곧 그 形氣가 행하는 바를 인용하여, 이로써 의리의 지행(합일)의 설을 밝히고자 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그러므로 의리의 지행은 합쳐서 이것을 말하면 원래부터 서로 더불어 병행해서 하나를 뺄 수는 없다. 나누어서 이것을 말하면 知는 이것을 行이라고 말해서는 안되는 것은, 行은 이것을 知라고 말해서는 안되는 것과 같다. 어찌 합쳐서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 陽明乃引彼形氣之所爲, 以名此義理知行之說, 則大不可. 故義理之知行, 合而言之, 固相須竝行, 而不可缺一. 分而言之, 知不可謂之行, 猶行不可謂之知也. 豈合而爲一乎(同上 334면 하).
라고 說하는 것도 전술한 말과 다름 없다. 理氣性情對待의 변증론과 동일한 사고법이 知行의 관계에 관해서도 인지된다. 이상, 제1부터 제3조까지는 주로 주자의 관점에서부터의 비판이지만, 제4조에 이르러서는 퇴계 독자의 관점에서부터의 비판을 발견할 수 있다.
-272-
Ⅳ. 結 論
整菴은 理氣渾融一體의 說을 이룩하여, 明道에 贊意를 표하고 伊川 朱子의 「所以然之故」·理體太極을 배척하고, 이 현실의 세계는 卽氣 卽理라고 했다. 그가 주자 未定의 「一陰一陽, 往來不息, 卽是道之全體」라는 어구를 존중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그는 氣를 인지해서 理로 할 것이 아니고, 氣로 나아가 理를 認取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整菴의 설에는 理氣不離不雜의 변증론이 뚜렷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퇴계는 整菴에 있어서의 理氣 性情의 對待 分看이 명료치 않은 점을 찔러서, 그의 설을 理氣一物이라 단정하여 이것을 배척했다. 이것은 퇴계의 설이 理氣 性情이 對待 辨證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陽明에 관해서는 그 心卽理說에 物理心知의 대립이 없으며, 지식존중의 궁리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는 또한 그 지행합일설이 감각감정의 분야에서는 성립되지만 理性 의리의 분야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등을 명시하여 陽明의 설을 배척했다.
陽明의 心則理說은 인욕에 가리워져 있지 않은 이 마음(心)은 그대로 天理이며 이것은 일상의 세계에 生生流動하여 그치지 않는 생명이라 하는 것이며, 또한 「知는 바로 行의 主意, 行은 바로 知의 工夫」라고 說하는 지행합일설도 이것을 「자각은 실천의 주체로서의 의향, 실천은 자각의 工夫習練」이라 해석함으로써 비로서 陽明의 뜻에 들어맞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陽明의 說은 心과 理知와 行이라는 그 대립을 통하여 통일로 향하는 주자의 사색적 입장을 거부하고 오로지 양자의 통일면을 주체인 마음(心)에 근거해서 전개시키는 생명의 철학이었다. 주자학을 계승한 퇴계가 陽明에 반대한 것도 당연한 일이며 우리는 陽明에 대한 퇴계의 반론 속에서 그의 理氣性情不離不雜對待의 辨證論을 발견할 수 있다.
-273-
(퇴계학연구원 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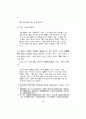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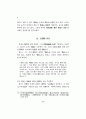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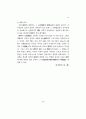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