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 목 : 실크로드의 악마들
□ 총 페이지수 :
□ 목 차:
실크로드의 악마들에 대한 내용과 서평이 있습니다....
기우에 불과하겠지만,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이른바 판타지 소설 같은 것으로 오인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런 책은 아니고, 표지의 제목 위에 `중앙아시아 탐험의 역사`라는 글이 적혀있다. 원제가 Foreign Devils on the Silk Road (Oxford University Press, 1980)이니, 직역하면 `실크로드의 외국 악마들` 정도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서 악마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중앙아시아 지역을 탐사했던 서양인들을 가리킨다. 역자의 설명대로, 중국인들이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으면서 서양인을 서양 귀신이라는 뜻의 양귀자(洋鬼子)라는 말로 부르기도 했음을 감안하면, 수긍이 가는 제목이다. (반은 농담이지만, `실크로드의 인디애나 존스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어도 어울릴 것 같다.)
널리 알려져 있는 돈황 석굴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의 고대 유물, 유적은 20세기 초에 스타인, 펠리오, 오타니(일본인) 등에 의해 비로소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인미답의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 고대 문화의 유산을 탐구하는 작업이었겠으나, 중앙아시아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문화재 도둑질 이상이 못된다. 이른바 서세동점이라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가능했던 탐사인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저명한 동양학 연구자 아서 웨일리가 스타인의 탐사 작업을 가리켜 `돈황 서가의 약탈 사건`으로 부르면서 했다는 다음과 같은 말이 촌철살인이다.
□ 총 페이지수 :
□ 목 차:
실크로드의 악마들에 대한 내용과 서평이 있습니다....
기우에 불과하겠지만,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이른바 판타지 소설 같은 것으로 오인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런 책은 아니고, 표지의 제목 위에 `중앙아시아 탐험의 역사`라는 글이 적혀있다. 원제가 Foreign Devils on the Silk Road (Oxford University Press, 1980)이니, 직역하면 `실크로드의 외국 악마들` 정도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서 악마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중앙아시아 지역을 탐사했던 서양인들을 가리킨다. 역자의 설명대로, 중국인들이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으면서 서양인을 서양 귀신이라는 뜻의 양귀자(洋鬼子)라는 말로 부르기도 했음을 감안하면, 수긍이 가는 제목이다. (반은 농담이지만, `실크로드의 인디애나 존스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어도 어울릴 것 같다.)
널리 알려져 있는 돈황 석굴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의 고대 유물, 유적은 20세기 초에 스타인, 펠리오, 오타니(일본인) 등에 의해 비로소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인미답의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 고대 문화의 유산을 탐구하는 작업이었겠으나, 중앙아시아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문화재 도둑질 이상이 못된다. 이른바 서세동점이라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가능했던 탐사인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저명한 동양학 연구자 아서 웨일리가 스타인의 탐사 작업을 가리켜 `돈황 서가의 약탈 사건`으로 부르면서 했다는 다음과 같은 말이 촌철살인이다.
본문내용
당장 사라질 위험에 처한 유물을 구제하면서 동시에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한 곳으로 옮기는 자신의 일에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발굴 작업으로부터 한 세기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선 모든 상황에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실크로드의 존재가 역사의 조명을 받게 되면서 그 지역의 국가(특히 중국)가 국가로서의 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 서양인들의 발굴 작업 결과 체계적인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틀림없지만, 이것은 반대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유물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 게다가 이들은 이제 역사와 민족 의식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말이다. 또한 유물을 구제한다라는 서양인들의 명분과는 정반대로, 전쟁과 무관심 속에 실크로드에서 발굴된 유물은 서구에서조차 상당수 소멸되거나 행방불명된 상황이다.
즉 과거 서양인들이 최초로 유물을 발굴한 뒤, 임시로 구제하여 보존하고 그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실크로드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그 유적과 유물에 대해 과거의 주인들의 당당하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서양인들이 유물을 구제하였다는 사실 역시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또한 이성적인 해결책은 물론 유물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겠지만, 과연 국제 사회에서 이처럼 이상적인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칫 완전히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유적과 유물에 대한 최초의 발굴자이자 연구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대가, 그리고 그 유적과 유물에 대한 원래 주인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권리. 이 두 가지 주장에 있어서 언젠가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미디어 서평
고고학적 도둑질
외규장각 도서 문제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적이 있다. 외규장각 소장품은 한 주권국가가 소중히 보관하던 문화재를 다른 국가가 강탈해 간 것이고, 따라서 돌려받을 권리와 돌려줄 의무가 분명한 사안이다. 그러나 아무도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버려둔 사막의 사라진 도시에서 뜯어간 유적들의 경우, 그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실크로드의 악마들](피터 홉커크 지음 김영종 옮김·사계절·2000)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중앙아시아의 유적들을 발굴하고 수집하는데 목숨을 건 탐험가 6명의 행적을 좇으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마르코 폴로 이래 가장 위대한 아시아 탐험가’라 불린 오렐 스타인을 위시한 이들 탐험가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사막에 묻혀 있던 문화재를 발굴하고 반출함으로써 그 존재를 서양에 알렸지만, 오늘날의 안목에서 보면 ‘고고학적 도둑’들이었다.
물론 당시에는 중국 정부도 이들의 발굴을 저지하지 않았다. 서양인만이 유적을 훼손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미처 반출하지 못한 문화재는 그 지역의 종교적 종족적 갈등 속에서 없어졌고, 그리고 비료로 쓰기 위해 벽화의 안료를 마구 긁어간 현지 주민들의 무지에 의해서도 사라져갔다. 그렇다면 ‘도둑’들이 문화재를 그나마 구해낸 것이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자는 ‘고고학적 도둑질’이 없었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유물이 보존될 수 있었을까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구출’을 위한 것이었다 해도 한 민족에게서 그들의 유산을 박탈해 버린 행위가 과연 도덕적인가 하는 미묘한 문제를 제기한다.
10년쯤 전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고고하게 서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면서, 런던에 따로 떨어져 있는 엘긴 마블이 합쳐진다면 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얼마나 더 황홀할까 상상해 보고 짜릿함을 느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대영박물관에 기세 좋게 전시되어 있는 엘긴 마블처럼만 대접받는다면 유적이 굳이 본래 장소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 책의 저자도 지적하듯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수집된 유물의 대부분이 서양의 거대 박물관에서 제대로 전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소장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괄시받고 있는 것이다. 그럴 바에야 본고장으로 돌려준다면 본국에서 그 문화재들의 가치가 한껏 빛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문제는 문화 유적이 누구의 것인가의 차원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 그 진가가 온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어느 특정 민족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지켜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발굴 작업으로부터 한 세기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선 모든 상황에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실크로드의 존재가 역사의 조명을 받게 되면서 그 지역의 국가(특히 중국)가 국가로서의 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 서양인들의 발굴 작업 결과 체계적인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틀림없지만, 이것은 반대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유물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 게다가 이들은 이제 역사와 민족 의식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말이다. 또한 유물을 구제한다라는 서양인들의 명분과는 정반대로, 전쟁과 무관심 속에 실크로드에서 발굴된 유물은 서구에서조차 상당수 소멸되거나 행방불명된 상황이다.
즉 과거 서양인들이 최초로 유물을 발굴한 뒤, 임시로 구제하여 보존하고 그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실크로드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그 유적과 유물에 대해 과거의 주인들의 당당하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서양인들이 유물을 구제하였다는 사실 역시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또한 이성적인 해결책은 물론 유물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겠지만, 과연 국제 사회에서 이처럼 이상적인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칫 완전히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유적과 유물에 대한 최초의 발굴자이자 연구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대가, 그리고 그 유적과 유물에 대한 원래 주인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권리. 이 두 가지 주장에 있어서 언젠가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미디어 서평
고고학적 도둑질
외규장각 도서 문제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적이 있다. 외규장각 소장품은 한 주권국가가 소중히 보관하던 문화재를 다른 국가가 강탈해 간 것이고, 따라서 돌려받을 권리와 돌려줄 의무가 분명한 사안이다. 그러나 아무도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버려둔 사막의 사라진 도시에서 뜯어간 유적들의 경우, 그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실크로드의 악마들](피터 홉커크 지음 김영종 옮김·사계절·2000)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중앙아시아의 유적들을 발굴하고 수집하는데 목숨을 건 탐험가 6명의 행적을 좇으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마르코 폴로 이래 가장 위대한 아시아 탐험가’라 불린 오렐 스타인을 위시한 이들 탐험가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사막에 묻혀 있던 문화재를 발굴하고 반출함으로써 그 존재를 서양에 알렸지만, 오늘날의 안목에서 보면 ‘고고학적 도둑’들이었다.
물론 당시에는 중국 정부도 이들의 발굴을 저지하지 않았다. 서양인만이 유적을 훼손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미처 반출하지 못한 문화재는 그 지역의 종교적 종족적 갈등 속에서 없어졌고, 그리고 비료로 쓰기 위해 벽화의 안료를 마구 긁어간 현지 주민들의 무지에 의해서도 사라져갔다. 그렇다면 ‘도둑’들이 문화재를 그나마 구해낸 것이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자는 ‘고고학적 도둑질’이 없었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유물이 보존될 수 있었을까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구출’을 위한 것이었다 해도 한 민족에게서 그들의 유산을 박탈해 버린 행위가 과연 도덕적인가 하는 미묘한 문제를 제기한다.
10년쯤 전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고고하게 서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면서, 런던에 따로 떨어져 있는 엘긴 마블이 합쳐진다면 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얼마나 더 황홀할까 상상해 보고 짜릿함을 느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대영박물관에 기세 좋게 전시되어 있는 엘긴 마블처럼만 대접받는다면 유적이 굳이 본래 장소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 책의 저자도 지적하듯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수집된 유물의 대부분이 서양의 거대 박물관에서 제대로 전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소장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괄시받고 있는 것이다. 그럴 바에야 본고장으로 돌려준다면 본국에서 그 문화재들의 가치가 한껏 빛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문제는 문화 유적이 누구의 것인가의 차원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 그 진가가 온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어느 특정 민족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지켜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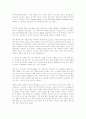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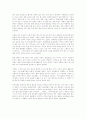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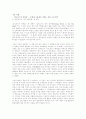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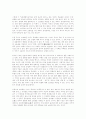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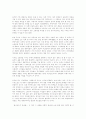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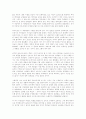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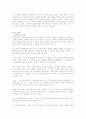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