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이끄는 말
Ⅱ 초기교서에 밝혀진 工夫
1 불법연구회 규약 (원기12년 3월판)
2 불법연구회 규약 (원기19년 5월판)
3 수양연구요론 (원기12년 5월 판)
4 육대요령 (원기17년도판)
Ⅲ 원경(정전)에서 본 공부
1 교의편에 나타난 공부
⑴ 교법의 시작과 끝에서본 공부
⑵ 사은 사요와 공부
⑶ 삼학수행,오래오래 工夫하는 길
⑷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
2 수행편에 나타난 공부
⑴ 훈련법과 공부
⑵ 수행법과 공부
⑶ 실천법과 工夫
⑷ 정전에 밝힌 공부의 의미
Ⅳ 통경을 통해본 공부
1 마음공부의 의미.
2 삼학수행과 마음공부
⑴ 공부하는 삼학
⑵ 유무념의 삼학공부
⑶ 경계속의 삼학
3 불법과 마음공부
⑴ 일체유심조
⑵ 통만법 명일심
⑶ 평상심시도
⑷ 만법귀일
Ⅴ 결 어
Ⅰ 이끄는 말
Ⅱ 초기교서에 밝혀진 工夫
1 불법연구회 규약 (원기12년 3월판)
2 불법연구회 규약 (원기19년 5월판)
3 수양연구요론 (원기12년 5월 판)
4 육대요령 (원기17년도판)
Ⅲ 원경(정전)에서 본 공부
1 교의편에 나타난 공부
⑴ 교법의 시작과 끝에서본 공부
⑵ 사은 사요와 공부
⑶ 삼학수행,오래오래 工夫하는 길
⑷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
2 수행편에 나타난 공부
⑴ 훈련법과 공부
⑵ 수행법과 공부
⑶ 실천법과 工夫
⑷ 정전에 밝힌 공부의 의미
Ⅳ 통경을 통해본 공부
1 마음공부의 의미.
2 삼학수행과 마음공부
⑴ 공부하는 삼학
⑵ 유무념의 삼학공부
⑶ 경계속의 삼학
3 불법과 마음공부
⑴ 일체유심조
⑵ 통만법 명일심
⑶ 평상심시도
⑷ 만법귀일
Ⅴ 결 어
본문내용
』821
.... 「견성에 다섯계단이 있나니, 첫째는 만법귀일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이요,둘째는 진공의 소식을 아는 것이요, 세째는 묘유의 진리를 보는 것이요, 네째는 보림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대기대용으로 이를 활용함이니라.」 한점에서 만법귀일은 견성의 첫단계에 속하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사실은 이 萬法歸一의 소식이 공부의 시작에만 그치는 것이아니라 구경에도 만법귀일로 정리되어야 하는 점에서 이의미는 始終如一의 소식을 찾는 것으로 보아 대종사의 一圓相의 眞理나, 정산종법사의 三同倫理의 정신이나, 대산종법사의 한울안 법문이 모두 이 萬法歸一에 의한 응용법문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하나로 된 마음공부가 우리에게 소중한 법문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이상 원불교에서 전통불교의 사상을 우리것으로 소화시켜 능히 공부하고 능히 사통오달로 열리게 하는 불법을 의미한다.이것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밝힌 의지는 다음과 같다.
① 섬품을 여의지 안는 佛法工夫
자성의 본래를 찾아 不離自性하는 진경을 찾아 불법을 중심한
불법공부.
② 삼학을 병진하는 佛法工夫.
삼학을 우리 심신간에 한시 반시도 떠날 수 없는 생명을 연속하는 공부이니, 이것은 능히 삼학을 병게하되 동정간에 간단 없이 행하는 마음공부에 이르게 하는 마음공부를 제기 한것이다.
『대종경』 「교의품」
③ 職業을 여의지 않는 佛法工夫
미래의 불법은 士農工商을 여의지 않고 직업을 여의지않는 마음공부를 불법에서 연원하고자 함이 였보인다.
『대종경』 「서품」15
④ 人間生活 속에 평등한 佛法工夫
돌아오는 세상의 佛法은 在家出家의 차별을 없애고 누구에게나공부만 잘하면 법위를 인정해주고 공부와 신앙을 아울러 일하면서 누구나 차별없이 행하는 불법의 공부를 개척하였다.
『대종경』 「서품」18
공부만 잘하면 차별없이 평등하게 인정해주는 불법공부
Ⅴ. 결 어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경계속에서 항상 삼학의 대중을 잡아갈 것이니 마치 배를 운전하는데 나침판과도 같고 기관수와도 같다할것이다. 따라서 원불교에서는 마음공부에 공부의 주축을 이루고 마음공부는 삼학의 공부로서 비록 삼학을 공부한다하지만 공부인의 삼학을 행할지언정 부지불각에 이루어지는 삼학을 삼학으로 관계지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대종경』 「수행품」11
그러므로 삼학은 공부인이 행하는 삼학만이 훈련의 대상이 된다고 본것이다.
따라서 이 마음공부는 마음을 찾는 공부, 마음을 키우는 공부,마음을 쓰는 공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마음을 찾는 공부오해하게되면 마침내 見性이되는 것이고,
마음을 키우는 공부는 養性하는 공부이며,
마음을 쓰는 공부는 곧 率性하는 공부로 집약된다.
여기에서 마음을 찾는 공부로서 우리는 一圓相의 眞理를 찾아 제법이 개공한 자리에서 空寂靈知의 光明을 따라 새롭게 개척하는 것을 찾아나가는 공부를 밝힌바 있다.이에따라 마음을 본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것은 다름이 아닌 空 圓 正으로 된 모습임을 밝히고 있다.이 것은 곧 마음을 키우게하는 길을 밝혀 능히 바르게 함양하는 공부가 그 과제이다.따라서 그 표준은 集心 觀心 無心 能心 등으로 밝히고 있다. 이것은 마음을 키워 성숙해가는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땅이 키우는 공부라고 볼 수 있다.
마음을 쓰는 공부이니 이것을 용심 또는 솔성이라 부른다. 솔성요론 16조에 밝혔듯이 마음쓰는 공부를 법있게하고, 처사하는 법을 공부심갖이고 하는 마음공부의 바른 행위가 다름아닌 이 마음쓰는 공부에서 이루언진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공부의 결실인 마음을 잘쓰는 공부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음을 함양하야 성숙한 마음으로 능히 활용하는 길을 우리는 마음잘 쓰는 공부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쓸것인가 먼저 아울러쓰는 공부를 밝히고 있다.즉 병진하는 공부가 그것이다.
『대종경』 서품 8
이것은 병진하는 공부로서 능히 도학과 과학을 병진하여 참문명세계를 이루도록 하는 길이 세상에 용심잘하는 길라고 볼수 있다.
골라맞아서 공부와 사업을 병진하게 함이니 이것이 곧 공부와 사업을 아울르는 가운데 공부와 사업의 한갈같은 공부를 하는 것임을 알어야할것이다.
또한 돌아오는 불법은 어느한구석에 끌리는 것이아니라 서로 하나로 만나고 통하는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부와 사업, 재가와 출가,정신과 육신의 어느한곳에도 끌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힘쓰는 공부가 우리가 바라는 공부길이다.
따라서 영육쌍전 이사병행 그리고 어느한구석에 매이지않는 길을 개척하기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염원하는 공부는 다름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전일한 속에서 서로만나지는 공부이니 이것이 곧 마음공부에서 시작하여 세상에 함께하는 공부길로 지향하는 것인바 이것이 우리의 공부속에 현실과 함께하는 길이며, 무한한 세계에 생명력있는 길이 열린다 하겠다.
따라서 마음공부는 곧 공도사업에 이르게하는 길이 밝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정산종사 법어집』 「무본편」34
일찍이 삼학은 공부인의 삼학과 비공부인의 삼학으로 나누어볼수 있다하였다. 여기에서 공부인의 삼학은 곧 공부심으로 일관하면서 살어가는 가운데 삼학으로 살어가게 되면 반드시 공부하는 삼학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은 곧 정신의 삼학과 의식주삼방면이 함께하는 길이되는 것이니 삼학이 곧 공부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라 하겠다.
『대종경』「교의품」18
그렇다면 이것은 곧 삼학으로 생활하는 길로서 영육쌍전의 길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다.
이리하여 공부가 곧 사은에 보은 하는 길이 되고 공부가 곧 공도에 현신하는 길이 되는 점에서 공부는 가장기초적인 길인 동시에 세상의 구경에 이르는 길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영생을 두고 공부심을 놓지 않어야만 능히 제도와 천도를 받는 것이니, 영원한 세상에 서원과 마음공부가 끝이지 않어야만 능히 바라는 길이 열리리라고 밝히고있다.
『대종경』 「천도품」17, 19쪽
이런 점에서 이 공부를 깊이 색여보면 우리의 영원한 길이 열리리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공부는 마음의 뿌리요, 줄기요, 가지를 거처 결실에 이르는 것이요,동시에 우리마음의 공부요, 함께하는 공부며 동시에 두루하는 공부요 따라서 영생을 두고 하는 공부임을 알어야한다.
.... 「견성에 다섯계단이 있나니, 첫째는 만법귀일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이요,둘째는 진공의 소식을 아는 것이요, 세째는 묘유의 진리를 보는 것이요, 네째는 보림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대기대용으로 이를 활용함이니라.」 한점에서 만법귀일은 견성의 첫단계에 속하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사실은 이 萬法歸一의 소식이 공부의 시작에만 그치는 것이아니라 구경에도 만법귀일로 정리되어야 하는 점에서 이의미는 始終如一의 소식을 찾는 것으로 보아 대종사의 一圓相의 眞理나, 정산종법사의 三同倫理의 정신이나, 대산종법사의 한울안 법문이 모두 이 萬法歸一에 의한 응용법문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하나로 된 마음공부가 우리에게 소중한 법문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이상 원불교에서 전통불교의 사상을 우리것으로 소화시켜 능히 공부하고 능히 사통오달로 열리게 하는 불법을 의미한다.이것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밝힌 의지는 다음과 같다.
① 섬품을 여의지 안는 佛法工夫
자성의 본래를 찾아 不離自性하는 진경을 찾아 불법을 중심한
불법공부.
② 삼학을 병진하는 佛法工夫.
삼학을 우리 심신간에 한시 반시도 떠날 수 없는 생명을 연속하는 공부이니, 이것은 능히 삼학을 병게하되 동정간에 간단 없이 행하는 마음공부에 이르게 하는 마음공부를 제기 한것이다.
『대종경』 「교의품」
③ 職業을 여의지 않는 佛法工夫
미래의 불법은 士農工商을 여의지 않고 직업을 여의지않는 마음공부를 불법에서 연원하고자 함이 였보인다.
『대종경』 「서품」15
④ 人間生活 속에 평등한 佛法工夫
돌아오는 세상의 佛法은 在家出家의 차별을 없애고 누구에게나공부만 잘하면 법위를 인정해주고 공부와 신앙을 아울러 일하면서 누구나 차별없이 행하는 불법의 공부를 개척하였다.
『대종경』 「서품」18
공부만 잘하면 차별없이 평등하게 인정해주는 불법공부
Ⅴ. 결 어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경계속에서 항상 삼학의 대중을 잡아갈 것이니 마치 배를 운전하는데 나침판과도 같고 기관수와도 같다할것이다. 따라서 원불교에서는 마음공부에 공부의 주축을 이루고 마음공부는 삼학의 공부로서 비록 삼학을 공부한다하지만 공부인의 삼학을 행할지언정 부지불각에 이루어지는 삼학을 삼학으로 관계지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대종경』 「수행품」11
그러므로 삼학은 공부인이 행하는 삼학만이 훈련의 대상이 된다고 본것이다.
따라서 이 마음공부는 마음을 찾는 공부, 마음을 키우는 공부,마음을 쓰는 공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마음을 찾는 공부오해하게되면 마침내 見性이되는 것이고,
마음을 키우는 공부는 養性하는 공부이며,
마음을 쓰는 공부는 곧 率性하는 공부로 집약된다.
여기에서 마음을 찾는 공부로서 우리는 一圓相의 眞理를 찾아 제법이 개공한 자리에서 空寂靈知의 光明을 따라 새롭게 개척하는 것을 찾아나가는 공부를 밝힌바 있다.이에따라 마음을 본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것은 다름이 아닌 空 圓 正으로 된 모습임을 밝히고 있다.이 것은 곧 마음을 키우게하는 길을 밝혀 능히 바르게 함양하는 공부가 그 과제이다.따라서 그 표준은 集心 觀心 無心 能心 등으로 밝히고 있다. 이것은 마음을 키워 성숙해가는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땅이 키우는 공부라고 볼 수 있다.
마음을 쓰는 공부이니 이것을 용심 또는 솔성이라 부른다. 솔성요론 16조에 밝혔듯이 마음쓰는 공부를 법있게하고, 처사하는 법을 공부심갖이고 하는 마음공부의 바른 행위가 다름아닌 이 마음쓰는 공부에서 이루언진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공부의 결실인 마음을 잘쓰는 공부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음을 함양하야 성숙한 마음으로 능히 활용하는 길을 우리는 마음잘 쓰는 공부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쓸것인가 먼저 아울러쓰는 공부를 밝히고 있다.즉 병진하는 공부가 그것이다.
『대종경』 서품 8
이것은 병진하는 공부로서 능히 도학과 과학을 병진하여 참문명세계를 이루도록 하는 길이 세상에 용심잘하는 길라고 볼수 있다.
골라맞아서 공부와 사업을 병진하게 함이니 이것이 곧 공부와 사업을 아울르는 가운데 공부와 사업의 한갈같은 공부를 하는 것임을 알어야할것이다.
또한 돌아오는 불법은 어느한구석에 끌리는 것이아니라 서로 하나로 만나고 통하는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부와 사업, 재가와 출가,정신과 육신의 어느한곳에도 끌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힘쓰는 공부가 우리가 바라는 공부길이다.
따라서 영육쌍전 이사병행 그리고 어느한구석에 매이지않는 길을 개척하기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염원하는 공부는 다름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전일한 속에서 서로만나지는 공부이니 이것이 곧 마음공부에서 시작하여 세상에 함께하는 공부길로 지향하는 것인바 이것이 우리의 공부속에 현실과 함께하는 길이며, 무한한 세계에 생명력있는 길이 열린다 하겠다.
따라서 마음공부는 곧 공도사업에 이르게하는 길이 밝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정산종사 법어집』 「무본편」34
일찍이 삼학은 공부인의 삼학과 비공부인의 삼학으로 나누어볼수 있다하였다. 여기에서 공부인의 삼학은 곧 공부심으로 일관하면서 살어가는 가운데 삼학으로 살어가게 되면 반드시 공부하는 삼학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은 곧 정신의 삼학과 의식주삼방면이 함께하는 길이되는 것이니 삼학이 곧 공부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라 하겠다.
『대종경』「교의품」18
그렇다면 이것은 곧 삼학으로 생활하는 길로서 영육쌍전의 길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다.
이리하여 공부가 곧 사은에 보은 하는 길이 되고 공부가 곧 공도에 현신하는 길이 되는 점에서 공부는 가장기초적인 길인 동시에 세상의 구경에 이르는 길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영생을 두고 공부심을 놓지 않어야만 능히 제도와 천도를 받는 것이니, 영원한 세상에 서원과 마음공부가 끝이지 않어야만 능히 바라는 길이 열리리라고 밝히고있다.
『대종경』 「천도품」17, 19쪽
이런 점에서 이 공부를 깊이 색여보면 우리의 영원한 길이 열리리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공부는 마음의 뿌리요, 줄기요, 가지를 거처 결실에 이르는 것이요,동시에 우리마음의 공부요, 함께하는 공부며 동시에 두루하는 공부요 따라서 영생을 두고 하는 공부임을 알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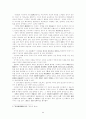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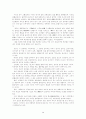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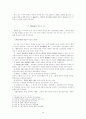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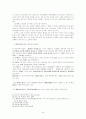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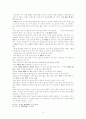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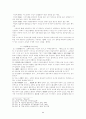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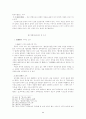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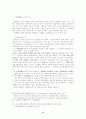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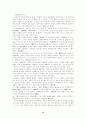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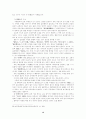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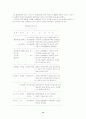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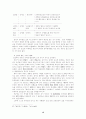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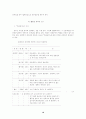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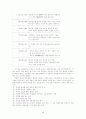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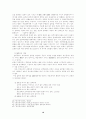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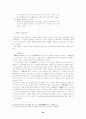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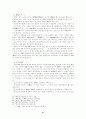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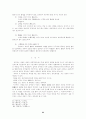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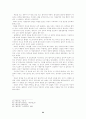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