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관리무역의 개념과 배경
1. 관리무역의 개념
2. 관리무역의 배경
Ⅲ. 관리무역의 유형과 성격
1. 관리무역의 유형
2. 관리무역의 성격
Ⅳ. 관리무역의 대표적 정책수단
Ⅴ. 관리무역의 평가와 전망
Ⅱ. 관리무역의 개념과 배경
1. 관리무역의 개념
2. 관리무역의 배경
Ⅲ. 관리무역의 유형과 성격
1. 관리무역의 유형
2. 관리무역의 성격
Ⅳ. 관리무역의 대표적 정책수단
Ⅴ. 관리무역의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무역체제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무역체제로서 관리무역체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즉, 관리무역은 \"자유무역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체제의 확립과 불공정무역관행의 제거를 위해 합의된 보호수단의 사용을 허용하는 과도기적이고 묵시적인 타협적 체제\"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무역체제는 미국이 주장하는 관리무역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 현재 미국이 주장하는 관리무역은 지금까지 살펴본 관리무역중 미시적 섹터별관리무역의 하나인 결과지향적 관리무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 관리무역보다는 훨씬 더 협의의 개념이며 자국중심적 해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의 관리무역을 사용하기 위한 명분으로 미국은 항상 광의의 관리무역인 관리무역체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관리무역이 하나의 체제로서 성립가능한가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관리무역수단들의 향후 잔존가능성을 토대로 미래를 전망해보기로 하겠다.
현재의 국제무역환경으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世界貿易機構)는 과거 GATT체제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무역주의를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1995년 1월 1일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WTO체제내에서 향후 殘存可能性을 지닌 무역관리수단은 直接的인 貿易規制手段 보다는 다자간 또는 쌍무적인 무역협상을 통한 間接的인 規制手段(즉, 상대국의 자발적인 규제를 유도하는 수단)인 VERs나 VIEs 등의 자율적 관리무역수단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무역규제수단은 상대국의 경제적 저항과 국내외의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상을 이용하여 상대국의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는 자율적 관리무역수단들이 향후 국제무역에서 잔존할 가능성이 어느정도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VERs와 VIEs는 WTO체제하에서는 灰色地帶措置로 판정되고 있다. WTO체제하에서 이러한 회색지대조치는(이와 유사한 조치라도) 모색하거나 또는 유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기존에 존재하는 조치들도 당해 최초 적용된 일자로부터 8년 이내에 또는 WTO협정 발효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어느 편이든 보다 늦게 도래되는 기간내에 종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그러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자국의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灰色地帶措置들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懷疑的인 것처럼 보인다. 현재 미국은 WTO체제에서 WTO협정문과 위배되는 수퍼 301조와 같은 조치를 철폐하기 보다 이를 통한 우선협상관행(PFEC)를 지정하려는 등의 행동을 취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 WTO체제를 탈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 WTO의 紛爭解決節次를 무시할 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국제무역세계에서 WTO체제가 표명하고 있는 全品目의 關稅化라는 원칙이 완전히 지켜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제 대국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개도국지위의 인정(규제에 대한 핸디캡의 고려)이라는 특혜를 받은 신흥공업국 기업들과의 교역은 不公正貿易인 것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다. 거시적 측면에서도 자국의 경제력이 후발산업화국의 경제력에 비해 압도적 위치에 있지 않는 한 후발산업화국의 追擊發展은 선발산업화국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自律的 管理貿易手段은 어떠한 형태로든지(기존의 형태 그대로나 또는 변형된 형태로든지) 향후 잔존하게 될 것이 확실하고 또한 이러한 수단들은 국제무역의 세계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처럼 보인다.
한편 관리무역의 나머지 정책수단인 R&D보조금의 잔존가능성은 동조치의 WTO체제포함과정을 살펴보면 예측할 수 있다. 사실 WTO체제 내에서의 R&D보조금은 미 클린턴 행정부의 변화된 과학기술정책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산업R&D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면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클린턴 행정부는 \"전략적 기술\"개발 및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의 방향수정을 꾀하고 있다. R&D 보조금의 제한적 허용규정은 이러한 미국정부의 노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정연, 1994].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해서 R&D보조금은 WTO에 포함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세계경제질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주도한 R&D보조금 허용은 자국의 수출을 장려하는 무역관리수단으로서 관련국들간의 양해속에서 당분간 허용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잔존할 가능성도 높은 관리무역정책수단인 것이다.
지금까지 각 管理貿易政策手段들의 잔존가능성을 우선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향후 국제무역계에서 관리무역이라는 용어가 충분히 의미를 가질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만연해가는 관리무역수단들이 과연 관리무역체제를 하나의 무역체제로서 성립시킬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있다. 사실 관리무역수단들은 모두 보호무역수단에 포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수단을 표현수단으로 사용하는 자유무역체제인 관리무역체제를 새로운 국제무역체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管理貿易體制가 하나의 國際貿易體制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리무역을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만의 우선적인 이익추구를 뒤로하고 거시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적의 자유무역상태를 위해 관리무역정책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도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무역체제의 成立可能性에 대한 전망은 아직 내릴 수 없다. 하지만 관리무역이 하나의 새로운 통상체제로서 자리잡는다고는 전망할 수 없으나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통상정책으로서 앞으로 더욱더 확산될것이라는 데에는 의문이 없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관리무역은 그 정책적 유용성때문에 초강대국인 미국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EU를 비롯한 여려 선진국들의 대외통상정책으로 표방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무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무역체제는 미국이 주장하는 관리무역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 현재 미국이 주장하는 관리무역은 지금까지 살펴본 관리무역중 미시적 섹터별관리무역의 하나인 결과지향적 관리무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 관리무역보다는 훨씬 더 협의의 개념이며 자국중심적 해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의 관리무역을 사용하기 위한 명분으로 미국은 항상 광의의 관리무역인 관리무역체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관리무역이 하나의 체제로서 성립가능한가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관리무역수단들의 향후 잔존가능성을 토대로 미래를 전망해보기로 하겠다.
현재의 국제무역환경으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世界貿易機構)는 과거 GATT체제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무역주의를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1995년 1월 1일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WTO체제내에서 향후 殘存可能性을 지닌 무역관리수단은 直接的인 貿易規制手段 보다는 다자간 또는 쌍무적인 무역협상을 통한 間接的인 規制手段(즉, 상대국의 자발적인 규제를 유도하는 수단)인 VERs나 VIEs 등의 자율적 관리무역수단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무역규제수단은 상대국의 경제적 저항과 국내외의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상을 이용하여 상대국의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는 자율적 관리무역수단들이 향후 국제무역에서 잔존할 가능성이 어느정도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VERs와 VIEs는 WTO체제하에서는 灰色地帶措置로 판정되고 있다. WTO체제하에서 이러한 회색지대조치는(이와 유사한 조치라도) 모색하거나 또는 유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기존에 존재하는 조치들도 당해 최초 적용된 일자로부터 8년 이내에 또는 WTO협정 발효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어느 편이든 보다 늦게 도래되는 기간내에 종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그러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자국의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灰色地帶措置들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懷疑的인 것처럼 보인다. 현재 미국은 WTO체제에서 WTO협정문과 위배되는 수퍼 301조와 같은 조치를 철폐하기 보다 이를 통한 우선협상관행(PFEC)를 지정하려는 등의 행동을 취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 WTO체제를 탈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 WTO의 紛爭解決節次를 무시할 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국제무역세계에서 WTO체제가 표명하고 있는 全品目의 關稅化라는 원칙이 완전히 지켜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제 대국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개도국지위의 인정(규제에 대한 핸디캡의 고려)이라는 특혜를 받은 신흥공업국 기업들과의 교역은 不公正貿易인 것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다. 거시적 측면에서도 자국의 경제력이 후발산업화국의 경제력에 비해 압도적 위치에 있지 않는 한 후발산업화국의 追擊發展은 선발산업화국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自律的 管理貿易手段은 어떠한 형태로든지(기존의 형태 그대로나 또는 변형된 형태로든지) 향후 잔존하게 될 것이 확실하고 또한 이러한 수단들은 국제무역의 세계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처럼 보인다.
한편 관리무역의 나머지 정책수단인 R&D보조금의 잔존가능성은 동조치의 WTO체제포함과정을 살펴보면 예측할 수 있다. 사실 WTO체제 내에서의 R&D보조금은 미 클린턴 행정부의 변화된 과학기술정책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산업R&D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면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클린턴 행정부는 \"전략적 기술\"개발 및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의 방향수정을 꾀하고 있다. R&D 보조금의 제한적 허용규정은 이러한 미국정부의 노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정연, 1994].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해서 R&D보조금은 WTO에 포함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세계경제질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주도한 R&D보조금 허용은 자국의 수출을 장려하는 무역관리수단으로서 관련국들간의 양해속에서 당분간 허용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잔존할 가능성도 높은 관리무역정책수단인 것이다.
지금까지 각 管理貿易政策手段들의 잔존가능성을 우선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향후 국제무역계에서 관리무역이라는 용어가 충분히 의미를 가질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만연해가는 관리무역수단들이 과연 관리무역체제를 하나의 무역체제로서 성립시킬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있다. 사실 관리무역수단들은 모두 보호무역수단에 포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수단을 표현수단으로 사용하는 자유무역체제인 관리무역체제를 새로운 국제무역체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管理貿易體制가 하나의 國際貿易體制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리무역을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만의 우선적인 이익추구를 뒤로하고 거시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적의 자유무역상태를 위해 관리무역정책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도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무역체제의 成立可能性에 대한 전망은 아직 내릴 수 없다. 하지만 관리무역이 하나의 새로운 통상체제로서 자리잡는다고는 전망할 수 없으나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통상정책으로서 앞으로 더욱더 확산될것이라는 데에는 의문이 없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관리무역은 그 정책적 유용성때문에 초강대국인 미국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EU를 비롯한 여려 선진국들의 대외통상정책으로 표방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무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추천자료
 총체적 품질관리의 개념을 언급하고 그주요원칙을 설명.
총체적 품질관리의 개념을 언급하고 그주요원칙을 설명. 사례관리의 개념 및 적용
사례관리의 개념 및 적용 물류의 개념과 물류관리 - 물류의 정의와 목적, 상물분리의 원칙과 경제적 효과, 제 3자 물류
물류의 개념과 물류관리 - 물류의 정의와 목적, 상물분리의 원칙과 경제적 효과, 제 3자 물류 건설사업관리(CM)의 개념, 건설사업관리(CM)의 분류, 건설사업관리(CM)의 배경,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CM)의 개념, 건설사업관리(CM)의 분류, 건설사업관리(CM)의 배경, 건설사업관리... 스타 매니지먼트의 개념, 유래, 연예, 마케팅 성공사례, 성공요인, 전략, 경영, 마케팅, 변화...
스타 매니지먼트의 개념, 유래, 연예, 마케팅 성공사례, 성공요인, 전략, 경영, 마케팅, 변화... CRM의 이해, 개념, 등장배경, 중요성, 사례, 시장 동향, 전략방안, 고객관리의 중요성, e-CRM...
CRM의 이해, 개념, 등장배경, 중요성, 사례, 시장 동향, 전략방안, 고객관리의 중요성, e-CRM... 건설산업에서의 공급사슬관리 (SCM : Supply Chain Management In Construction Industry) - ...
건설산업에서의 공급사슬관리 (SCM : Supply Chain Management In Construction Industry) - ... 공급체인관리(SCM)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개념을 정의하고, 성공적으로 구축한 기업사례...
공급체인관리(SCM)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개념을 정의하고, 성공적으로 구축한 기업사례... [FTA(자유무역협정), FTA(자유무역협정) 개념, FTA(자유무역협정) 효과, FTA(자유무역협정) ...
[FTA(자유무역협정), FTA(자유무역협정) 개념, FTA(자유무역협정) 효과, FTA(자유무역협정) ... 위험관리(리스크관리)의 개념, 위험관리(리스크관리)의 의의, 위험관리(리스크관리)의 구조, ...
위험관리(리스크관리)의 개념, 위험관리(리스크관리)의 의의, 위험관리(리스크관리)의 구조, ... 자산부채종합관리(ALM)의 개념, 자산부채종합관리(ALM)의 형성배경, 자산부채종합관리(ALM)의...
자산부채종합관리(ALM)의 개념, 자산부채종합관리(ALM)의 형성배경, 자산부채종합관리(ALM)의... [정보통계학과] [방통대 경영학과 4학년 생산관리 공통]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1)개념 및...
[정보통계학과] [방통대 경영학과 4학년 생산관리 공통]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1)개념 및... 의사소통, 의사소통개념, 의사소통목적, 의사소통유형, 조직과의사소통, 간호관리와의사소통,...
의사소통, 의사소통개념, 의사소통목적, 의사소통유형, 조직과의사소통, 간호관리와의사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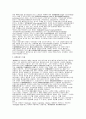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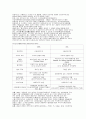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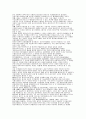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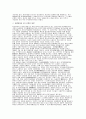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