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반부 - 스투디움과 푼크툼
2. 후반부 - 어머니를 찾아서
3. 그림자료
4. 자화상1855, 예술가의 어머니 혹은 아내1890
5. 바이올리니스트의 발라드 아보니 1921
2. 후반부 - 어머니를 찾아서
3. 그림자료
4. 자화상1855, 예술가의 어머니 혹은 아내1890
5. 바이올리니스트의 발라드 아보니 1921
본문내용
자는 자신이 (앞으로)죽을 것임을, 그리고 (사진 안에서)이미 죽었음을 안다.
4.
사진은 너무도 명징하다. 언어는 불가해하고 복잡한 힘과 구조로 의미를 숨기지만, 사진은 단순소박한 그 명징성으로 의미를 튕겨 낸다.
\"마치 흔들림 없는 수면처럼, [사진을]나의 시선으로 스쳐갈 수밖에 없다. 사진은 평평하다는 말의 모든 의미에서 평평한 것이고, 나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강조는 바르트. p.106].\"
\"기술적인 기원을 이유로 사진을 어두운 통로(어두운 방 : camera obscura)라는 개념과 결합시키는 것은 참으로 잘못이다. 밝은 방(camera lucida)이라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
[…] [그리고 여기서 바르트는 블랑쇼를 인용한다]\'영상의 본질은 내면성이 없는 채, 완전히 외부에 있다는 점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보다도 더 접근하기 어렵고 신비스럽다.
그것은 의미를 갖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모든 방향에서 깊이를 불러오고,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뚜렷하게 보여주는데, 영상의 본질은 바다의 요정 세이렌들의 매력과 황홀인 <있음-부재>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같은 쪽].\"
5.
나다르. <예술가의 어머니 혹은
아내>. 1890년.
바르트가 사진이라는 괴물과 벌이는 분투는 이 사진이라는 것을 통해, 죽은 어머니를 \'되찾으려는\' 시도이다.
어머니가 죽은 후 어머니의 사진을 정리하면서, 바르트는 \'사랑했던 얼굴의 진실을 찾아 헤매었다.\'
수많은 여인 가운데서 어머니를 알아보는 건 여럿 중에 구별하는 것에 불과할 뿐, 어머니의 동일성의 본질을 찾은 건 아니었다.
\"나는 나의 가족을 \'가족\'의 일반적인 의미로 환원시키고 싶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어머니를 일반적인 \'어머니\'라는 존재로 환원시키고 싶지 않다[p.77].\"
마침내 그는 어머니가 다섯 살 때 오빠와 함께 온실 앞에서 찍은 사진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닮음\'을 넘어서는 갑작스러운 깨어남, 말들이 쇠잔해지고마는 홀연한 깨달음[여기서 바르트는 일본어 \'사토리\'를 쓴다. 선(禪)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참으로 그렇게, 그리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유일하고도 희귀한 명증성이다[p.108].\"
익숙한 단어를 붙들려는, 필자처럼 아둔한 독자를 위한 것인 듯, 바르트는 이것이 일종의 \'분위기\'라고 덧붙인다.
\"그 자리에는 나이가 없는, 그러나 시간을 벗어나지는 않는 하나의 영혼이 남았는데, 왜냐하면 이 분위기는 어머니의 삶의 긴 나날들에서 내가 보아 왔던 어머니의 얼굴과 동질의, 바로 그 분위기였기 때문이다[같은 쪽].\"
\"분위기는 그러므로 육체에 동반하는 빛나는 그림자이다[같은 쪽].\"
그러나, 바르트는 그토록 소중한 <온실 사진>을 이 책에 싣지 않았다. <온실 사진>의 \'푼크툼\' 은 어디까지나 바르트 자신에게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실--나를 위한 진실이었다[강조는 바르트. p.110].\"
나다르. 예술가의 어머니 혹은 아내 1890
나다르 자화상 1855
바이올리니스트의 발라드
아보니.헝가리. 1921
4.
사진은 너무도 명징하다. 언어는 불가해하고 복잡한 힘과 구조로 의미를 숨기지만, 사진은 단순소박한 그 명징성으로 의미를 튕겨 낸다.
\"마치 흔들림 없는 수면처럼, [사진을]나의 시선으로 스쳐갈 수밖에 없다. 사진은 평평하다는 말의 모든 의미에서 평평한 것이고, 나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강조는 바르트. p.106].\"
\"기술적인 기원을 이유로 사진을 어두운 통로(어두운 방 : camera obscura)라는 개념과 결합시키는 것은 참으로 잘못이다. 밝은 방(camera lucida)이라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
[…] [그리고 여기서 바르트는 블랑쇼를 인용한다]\'영상의 본질은 내면성이 없는 채, 완전히 외부에 있다는 점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보다도 더 접근하기 어렵고 신비스럽다.
그것은 의미를 갖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모든 방향에서 깊이를 불러오고,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뚜렷하게 보여주는데, 영상의 본질은 바다의 요정 세이렌들의 매력과 황홀인 <있음-부재>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같은 쪽].\"
5.
나다르. <예술가의 어머니 혹은
아내>. 1890년.
바르트가 사진이라는 괴물과 벌이는 분투는 이 사진이라는 것을 통해, 죽은 어머니를 \'되찾으려는\' 시도이다.
어머니가 죽은 후 어머니의 사진을 정리하면서, 바르트는 \'사랑했던 얼굴의 진실을 찾아 헤매었다.\'
수많은 여인 가운데서 어머니를 알아보는 건 여럿 중에 구별하는 것에 불과할 뿐, 어머니의 동일성의 본질을 찾은 건 아니었다.
\"나는 나의 가족을 \'가족\'의 일반적인 의미로 환원시키고 싶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어머니를 일반적인 \'어머니\'라는 존재로 환원시키고 싶지 않다[p.77].\"
마침내 그는 어머니가 다섯 살 때 오빠와 함께 온실 앞에서 찍은 사진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닮음\'을 넘어서는 갑작스러운 깨어남, 말들이 쇠잔해지고마는 홀연한 깨달음[여기서 바르트는 일본어 \'사토리\'를 쓴다. 선(禪)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참으로 그렇게, 그리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유일하고도 희귀한 명증성이다[p.108].\"
익숙한 단어를 붙들려는, 필자처럼 아둔한 독자를 위한 것인 듯, 바르트는 이것이 일종의 \'분위기\'라고 덧붙인다.
\"그 자리에는 나이가 없는, 그러나 시간을 벗어나지는 않는 하나의 영혼이 남았는데, 왜냐하면 이 분위기는 어머니의 삶의 긴 나날들에서 내가 보아 왔던 어머니의 얼굴과 동질의, 바로 그 분위기였기 때문이다[같은 쪽].\"
\"분위기는 그러므로 육체에 동반하는 빛나는 그림자이다[같은 쪽].\"
그러나, 바르트는 그토록 소중한 <온실 사진>을 이 책에 싣지 않았다. <온실 사진>의 \'푼크툼\' 은 어디까지나 바르트 자신에게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실--나를 위한 진실이었다[강조는 바르트. p.110].\"
나다르. 예술가의 어머니 혹은 아내 1890
나다르 자화상 1855
바이올리니스트의 발라드
아보니.헝가리. 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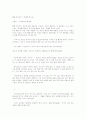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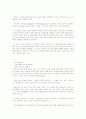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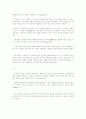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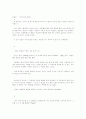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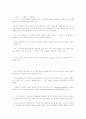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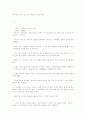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