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castration)\'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결여 양태 사이에는 그 질과 대상의 차이가 있어서, \'박탈\'은 \'실제적 대상의 상상적 결여\'를, \'상실\'은 \'상징적 대상의 실제적 결여\'를, 끝으로 \'거세\'는 \'이미지적 대상의 상징적 결여\'를 각각 의미한다.(Lacan, Seminaire IV (1956-1957) : La relation d\'objet, p.25-39)
9. Freud, Jenseits des Lustprinzips(1920), S.E., XVIII, p.1-64. 프로이트는 어느 날 자신의 입장을 확인시켜 주는 관찰을 하게 된다. 한 어린아이가 끈으로 묶은 나무 실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흔히 보통의 아이들은 그 경우 실패를 끈으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자동차 놀이를 할 테지만 그 어린아이는 독특하게 실패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실패를 침대 가장자리로 넘겨 커튼 쪽으로 던져서 그 실패가 안보이게 되면 \'오오(o-o-o-o)\'라고 외치고, 끈을 잡아 당겨 다시 실패가 눈앞에 나타나면 기쁨에 넘쳐서 \'다(da)\'라고 외치는 것을 관찰하였다. 어린아이가 외치는 \'오오\'라는 발음은 \'멀리\' 또는 \'떠난\' 등을 뜻하는 독어의 \'fort\'를 의미하며, \'da\'는 우리말로 \'여기\'를 뜻한다.
10. Lacan, Ecrits, p.319.
11. Lacan, Ecrits, p.557. 논의의 편의상 라깡의 원래 공식에서 \'S\'\'를 \'S1\'으로 \'S\'를 \'S2\'로 바꾸었다.
12. Lacan, Ecrits, p.557.
13. Anika Lemaire, Jacques Lacan, p.295.
14. \'분열(die Spaltung)\'이라는 용어는 예비적 고찰을 필요로 한다.(Cf. J.Laplanche et J.-B.Pontalis, Vocabulaire de la psychanalyse, p.67-70) 정신적 \'분열\'이라는 개념은 이미 19세기 말엽의 정신병리학에 의해 암시적으로나마 형성되어 자네(Pierre Janet, 1859-1947)의 연구에서 그 윤곽이 분명하게 잡혔으며, 특히 브로이어(J.Breuer, 1842-1925)와 프로이트의 공저인 『히스테리 연구(Studien uber Hysterie)』(1893-1895)에 등장하는 \'이중 의식\' 또는 \'의식의 유리(遊離)\'와 같은 표현들은 바로 \'주체의 정신적 분열\'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열\'의 개념은 \'의식의 분열\', \'의식 내용의 분열\', \'정신분열\' 등의 표현형태 속에서도 발견되며, 바로 이런 표현들을 바탕으로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는 일관된 개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미 1893년부터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상태에서 의식 주체는 그의 표상들 중의 일부분으로부터 분리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립하였다. 따라서 무의식은 억압에 의해 의식의 영역과는 분리된 채로 유지될 수 있는 독립된 장소로서 나타나며, 바로 이런 점에서 정신 또는 의식의 분열을 주체의 분열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프로이트에 있어서 \'분열\'의 개념은 차후에 \'자아분열(die Ichspaltung)\'이라는 그의 용어에서도 발견되는데, 이 \'자아분열\' 개념은 프로이트의 저서 가운데 특히 1927년부터 1938년까지의 작업에서 점차적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말하는 \'자아분열\'은 고유한 의미의 \'정신분열\'과는 일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라쁠랑쉬와 뽕딸리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자아분열\'은 무엇보다도 자아라는 하나의 조직 또는 영역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체계내 분열(le clivage intrasystemique)\'인 반면, \'정신분열\'은 조직들 사이의 분열과 같은 \'체계간 분열(la division intersystemique)\'이다. 프로이트가 브로이어와 함께 『히스테리 연구』에서 밝힌 \'분열\'은 바로 이 \'체계간 분열\'이었으며, 예를 들어 프로이트가 1920년부터 발전시킨 - 흔히 그의 제2의 \'장소론(die Topik)\'으로 약칭되는 - 인격개념에 비추어 보면 \'자아\'와 \'이드(le ca)\' 사이의 분열도 역시 \'체계간 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프로이트에 있어서 \'분열\'의 개념은 이렇듯 다의적(多義的)이다. \'분열\'은 심적 장치가 여러 영역으로 구분됨을 뜻하기도 하며, 또 한편 하나의 정신 영역 그 자체가 분리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15. Anika Lemaire, Jacques Lacan, p.14.
16. 라깡의 이와 같은 이론은 당대의 정신분석과는 확연한 차이를 갖고 있었으며 그 대립이 극적으로 표출되기도 하여서, 저 유명한 \'본느발 회의(le colloque de Bonneval)\'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1960년 에이(H.Ey)에 의해서 조직된 이 토론회는 \'무의식\'을 주제로 본느발에서 개최되었는데, 거기서 라쁠랑쉬(J.Laplanche)는 라깡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을 발표하였다. 라쁠랑쉬에 따르면 무의식이 언어의 조건이며 (라깡에서처럼) 언어가 무의식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라깡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개입하였고 그 텍스트는 『에크리(Ecrits)』 속에 「무의식의 위치」라는 제목을 달고 실려 있으며 앞서 언급한 르메르(Lemaire)의 책 서문에서도 그 때의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17. Lacan, Ecrits, p.514.
18. Lacan, Ecrits, p.276.
19. J.-A.Miller, \"La suture\", Cahiers pour l\'analyse, 1966, n°1-2, p.39.
20. Lacan, Ecrits, p.842.
21. 이와 같은 언어 기호의 속성을 가리켜 소쉬르(Saussure)가 \'기호의 가치(la valeur du signe)\'라고 명명하였다는 것과 그것이 라깡의 \'접합점(le point de capiton)\' 개념과 공통의 외연(外延)을 갖는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발화 연쇄상에서 하나의 기표는 차후에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됨을 \'접합점\'은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2. Lacan, Ecrits, p.805.
9. Freud, Jenseits des Lustprinzips(1920), S.E., XVIII, p.1-64. 프로이트는 어느 날 자신의 입장을 확인시켜 주는 관찰을 하게 된다. 한 어린아이가 끈으로 묶은 나무 실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흔히 보통의 아이들은 그 경우 실패를 끈으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자동차 놀이를 할 테지만 그 어린아이는 독특하게 실패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실패를 침대 가장자리로 넘겨 커튼 쪽으로 던져서 그 실패가 안보이게 되면 \'오오(o-o-o-o)\'라고 외치고, 끈을 잡아 당겨 다시 실패가 눈앞에 나타나면 기쁨에 넘쳐서 \'다(da)\'라고 외치는 것을 관찰하였다. 어린아이가 외치는 \'오오\'라는 발음은 \'멀리\' 또는 \'떠난\' 등을 뜻하는 독어의 \'fort\'를 의미하며, \'da\'는 우리말로 \'여기\'를 뜻한다.
10. Lacan, Ecrits, p.319.
11. Lacan, Ecrits, p.557. 논의의 편의상 라깡의 원래 공식에서 \'S\'\'를 \'S1\'으로 \'S\'를 \'S2\'로 바꾸었다.
12. Lacan, Ecrits, p.557.
13. Anika Lemaire, Jacques Lacan, p.295.
14. \'분열(die Spaltung)\'이라는 용어는 예비적 고찰을 필요로 한다.(Cf. J.Laplanche et J.-B.Pontalis, Vocabulaire de la psychanalyse, p.67-70) 정신적 \'분열\'이라는 개념은 이미 19세기 말엽의 정신병리학에 의해 암시적으로나마 형성되어 자네(Pierre Janet, 1859-1947)의 연구에서 그 윤곽이 분명하게 잡혔으며, 특히 브로이어(J.Breuer, 1842-1925)와 프로이트의 공저인 『히스테리 연구(Studien uber Hysterie)』(1893-1895)에 등장하는 \'이중 의식\' 또는 \'의식의 유리(遊離)\'와 같은 표현들은 바로 \'주체의 정신적 분열\'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열\'의 개념은 \'의식의 분열\', \'의식 내용의 분열\', \'정신분열\' 등의 표현형태 속에서도 발견되며, 바로 이런 표현들을 바탕으로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는 일관된 개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미 1893년부터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상태에서 의식 주체는 그의 표상들 중의 일부분으로부터 분리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립하였다. 따라서 무의식은 억압에 의해 의식의 영역과는 분리된 채로 유지될 수 있는 독립된 장소로서 나타나며, 바로 이런 점에서 정신 또는 의식의 분열을 주체의 분열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프로이트에 있어서 \'분열\'의 개념은 차후에 \'자아분열(die Ichspaltung)\'이라는 그의 용어에서도 발견되는데, 이 \'자아분열\' 개념은 프로이트의 저서 가운데 특히 1927년부터 1938년까지의 작업에서 점차적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말하는 \'자아분열\'은 고유한 의미의 \'정신분열\'과는 일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라쁠랑쉬와 뽕딸리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자아분열\'은 무엇보다도 자아라는 하나의 조직 또는 영역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체계내 분열(le clivage intrasystemique)\'인 반면, \'정신분열\'은 조직들 사이의 분열과 같은 \'체계간 분열(la division intersystemique)\'이다. 프로이트가 브로이어와 함께 『히스테리 연구』에서 밝힌 \'분열\'은 바로 이 \'체계간 분열\'이었으며, 예를 들어 프로이트가 1920년부터 발전시킨 - 흔히 그의 제2의 \'장소론(die Topik)\'으로 약칭되는 - 인격개념에 비추어 보면 \'자아\'와 \'이드(le ca)\' 사이의 분열도 역시 \'체계간 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프로이트에 있어서 \'분열\'의 개념은 이렇듯 다의적(多義的)이다. \'분열\'은 심적 장치가 여러 영역으로 구분됨을 뜻하기도 하며, 또 한편 하나의 정신 영역 그 자체가 분리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15. Anika Lemaire, Jacques Lacan, p.14.
16. 라깡의 이와 같은 이론은 당대의 정신분석과는 확연한 차이를 갖고 있었으며 그 대립이 극적으로 표출되기도 하여서, 저 유명한 \'본느발 회의(le colloque de Bonneval)\'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1960년 에이(H.Ey)에 의해서 조직된 이 토론회는 \'무의식\'을 주제로 본느발에서 개최되었는데, 거기서 라쁠랑쉬(J.Laplanche)는 라깡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을 발표하였다. 라쁠랑쉬에 따르면 무의식이 언어의 조건이며 (라깡에서처럼) 언어가 무의식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라깡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개입하였고 그 텍스트는 『에크리(Ecrits)』 속에 「무의식의 위치」라는 제목을 달고 실려 있으며 앞서 언급한 르메르(Lemaire)의 책 서문에서도 그 때의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17. Lacan, Ecrits, p.514.
18. Lacan, Ecrits, p.276.
19. J.-A.Miller, \"La suture\", Cahiers pour l\'analyse, 1966, n°1-2, p.39.
20. Lacan, Ecrits, p.842.
21. 이와 같은 언어 기호의 속성을 가리켜 소쉬르(Saussure)가 \'기호의 가치(la valeur du signe)\'라고 명명하였다는 것과 그것이 라깡의 \'접합점(le point de capiton)\' 개념과 공통의 외연(外延)을 갖는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발화 연쇄상에서 하나의 기표는 차후에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됨을 \'접합점\'은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2. Lacan, Ecrits, p.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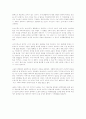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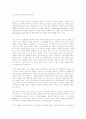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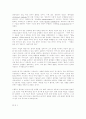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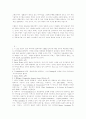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