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굳이 \"여성들\"의 것이라고 볼 까닭은 없을 것 같다. 이러한 로망스에서 여성들의 젠더는 백마의 기사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판타지를 통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허준>이라는 로망스를 통해 한국의 대중은 남녀를 불문하고 더욱 강화되는 자본주의적 합리화 또는 계급적 분열에 대항하는 상상적 공동체에 대한 이미지를 안타깝게 붙잡으려고 했던 셈인데, 황수정은 여기에서 이 집단적 로망스와 개인적 판타지를 매개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내가 볼 때 이 개인적 판타지가 깨어지자 사람들은 공격성을 띄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 공격성을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시각화의 은폐로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의 활용인데, 따라서 황수정을 향해 가해지는 도덕적 비난은 엄밀히 말해서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서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이상한 가역반응\"을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해석을 불허한다. 한마디로 이데올로기는 어떠한 서사의 개입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황수정에 대한 윤리적 옹호나 비난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작동상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셈이다. 윤리가 전제하는 어떠한 합리성도 이러한 상황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황수정은 자본주의의 리얼리티를 억압하고 있었던 일종의 상상적 판타지로서 한국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거울 이미지의 동일성으로 인식되었다. 이 판타지를 가능하게 한 것은 자본주의적 리얼리티 -- 경제위기, 정리해고, 가족해체, 위험사회와 같은 외상을 견디기 위한 일종의 방어심리였다. 이 판타지를 통해 우리는 가혹한 리얼리티의 생채기를 망각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황수정 사건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상처를 다시 직시하도록 만드는 리얼리티의 귀환인 셈인데, 개인은 이러한 외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없기에 집단적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적 장치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황수정의 이미지가 억압하고 있었던 리얼리티는 이제 이데올로기의 단계에서 다시 황급히 봉합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번 황수정 사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비합리적 반응의 원인이 지속적으로 로망스의 붕괴라는 재현적 위기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집단적 노력이 언제나 또 다른 폭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아이러니일지도 모른다.
<허준>이라는 로망스를 통해 한국의 대중은 남녀를 불문하고 더욱 강화되는 자본주의적 합리화 또는 계급적 분열에 대항하는 상상적 공동체에 대한 이미지를 안타깝게 붙잡으려고 했던 셈인데, 황수정은 여기에서 이 집단적 로망스와 개인적 판타지를 매개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내가 볼 때 이 개인적 판타지가 깨어지자 사람들은 공격성을 띄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 공격성을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시각화의 은폐로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의 활용인데, 따라서 황수정을 향해 가해지는 도덕적 비난은 엄밀히 말해서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서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이상한 가역반응\"을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해석을 불허한다. 한마디로 이데올로기는 어떠한 서사의 개입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황수정에 대한 윤리적 옹호나 비난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작동상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셈이다. 윤리가 전제하는 어떠한 합리성도 이러한 상황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황수정은 자본주의의 리얼리티를 억압하고 있었던 일종의 상상적 판타지로서 한국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거울 이미지의 동일성으로 인식되었다. 이 판타지를 가능하게 한 것은 자본주의적 리얼리티 -- 경제위기, 정리해고, 가족해체, 위험사회와 같은 외상을 견디기 위한 일종의 방어심리였다. 이 판타지를 통해 우리는 가혹한 리얼리티의 생채기를 망각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황수정 사건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상처를 다시 직시하도록 만드는 리얼리티의 귀환인 셈인데, 개인은 이러한 외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없기에 집단적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적 장치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황수정의 이미지가 억압하고 있었던 리얼리티는 이제 이데올로기의 단계에서 다시 황급히 봉합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번 황수정 사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비합리적 반응의 원인이 지속적으로 로망스의 붕괴라는 재현적 위기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집단적 노력이 언제나 또 다른 폭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아이러니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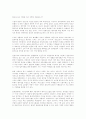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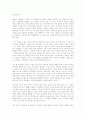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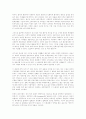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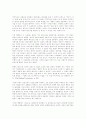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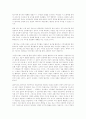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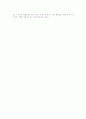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