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문예 운동(文藝運動)의 폐해(弊害)
2.예술주의의 문예와 인도주의의 문예 중 어떤 것이 좋은가
3.요점 정리
4.내용 연구
5.이해와 감상
2.예술주의의 문예와 인도주의의 문예 중 어떤 것이 좋은가
3.요점 정리
4.내용 연구
5.이해와 감상
본문내용
력에 의한 민중 직접 혁명을 주장하였다.
이 선언은 일제의 침략과 압제를 경험하면서 성장한 민중세력을 일제의 이족통치(異族統治)로부터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약탈적 · 불평등적인 제국주의 체제를 타파하는 주인공으로 부각시켰다는 의미에서 그의 민족주의 이념의 폭과 질의 강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1922년 1월 초 상해에서 개최된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創造派)의 맹장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개조파(改造派)와의 대립으로 5월 회의가 결렬되자, 북경으로 돌아와 석등암(石燈庵)에 우거하면서 한국고대사연구에 전념하였다. 이 무렵 북경대학 도서관에 출입하면서 이석증(李石曾) · 이대교(李大釗)와 교유하게 되었다.
1924년경부터 그가 쓴 평론과 논문들이 ≪ 동아일보 ≫ · ≪ 조선일보 ≫ 등에 발표되었다. 그의 연보에 의하면, 1925년에 민족독립운동의 방편으로 대만인 임병문(林炳文)의 소개로 무정부주의동방연맹(無政府主義東方聯盟)에 가입하였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1928년에 발표된 〈 용과 용의 대격전 〉 · 〈 꿈하늘 〉 등의 사상소설에서는 자유 · 평등 · 폭력 · 혁명을 예찬하는 무정부주의의 논리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1928년 4월 무정부주의동방연맹대회에 참석해 활동하는 등 점점 행동 투쟁에 나섰던 그는, 5월 대만에서 외국위체위조사건(外國爲替僞造事件)의 연루자로 체포되어 대련(大連)으로 이송, 1930년 5월 대련지방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여순감옥(旅順監獄)으로 이감, 복역하던 중 뇌일혈로 순국하였다.
신채호는 한말의 애국계몽운동과 일제 하 국권회복운동에 헌신하면서, 그러한 운동 못지않게 한국사연구를 통한 민족운동에 앞장섰다. 한말 ≪ 대한매일신보 ≫ 에 사론을 싣기도 하였고, ≪ 소년 ≫ 에 〈 국사사론 〉 을 연재했으며, 최영 · 이순신 · 을지문덕 등 국난을 극복한 민족영웅에 관한 전기도 썼다.
이 무렵 그는 역사의 주체를 영웅으로 보는 영웅중심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1910년 해외에 망명한 그는 본격적으로 국사연구에 노력해, 1920년대에 이르러 ≪ 조선상고사 朝鮮上古史 ≫ · ≪ 조선상고문화사 朝鮮上古文化史 ≫ · ≪ 조선사연구초 朝鮮史硏究草 ≫ 등 주저(主著)들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에 ≪ 동아일보 ≫ · ≪ 조선일보 ≫ 에 연재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저서들에 보이는 그의 역사학은, 첫째 사학의 이념이나 방법론에서 중세의 사학을 극복하고 근대적인 사학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둘째 당시 일본 관학자(官學者)들의 조선사 연구 자세에서 보이는 식민주의적 사학을 극복하는, 민족주의적 사학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셋째 조선혁명선언 이후 역사의 주체를 민중에게서 발견하려는 민중중심사관이 뚜렷이 나타나며, 넷째 역사를 ‘ 아(我) ’ 와 ‘ 비아(非我) ’ 의 투쟁의 기록으로서 파악하는 한편, 역사 연구에 있어서 실증(實證)을 강조하게 되었다.
‘ 아 ’ 와 ‘ 비아 ’ 의 투쟁으로서의 역사학의 인식은 변증법적 역사발전에 대한 인식으로 보인다. 그는 앞에서 열거한 한국고대사관계의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러한 논술들은 민족주의 이념에 입각해 독자적인 경지를 내보인 것으로, 과거의 유교주의에 입각한 관학적 역사학과 재야(在野)에서 면면히 이어온 비유교적인 사학을 종합한 데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의 사학은 한국사학사의 여러 흐름들을 종합한 것이다. 그의 한국사 기술은 거의 고대사에 국한되고 있는 바, 그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단군 · 부여 · 고구려 중심으로 상고사를 체계화했고, 둘째 상고사의 무대를 한반도 · 만주 중심의 종래의 학설에서 벗어나 중국 동북지역과 요서지방(遼西地方)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셋째 종래 한반도내에 존재했다는 한사군 ( 漢四郡 )을 반도 밖에 존재했거나 혹은 전혀 실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넷째 상고시대의 조선족과 삼국시대의 백제가 중국의 산둥반도 등에 진출했다는 것이며, 다섯째 삼한의 이동설 및 ‘ 전후 삼한설 ’ 을 주장했고, 여섯째 부여와 고구려 중심의 역사인식에 따라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것 등이라 하겠다.
이러한 그의 역사학은 우리 나라의 근대사학 및 민족주의사학의 출발로서 평가되기도 하나, 민족주의 사상의 역사 연구에의 지나친 투영이 그의 역사이론 및 한국 고대사 인식을 교조적(敎條的) · 독단적으로 이끌어갔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 참고문헌 ≫ 丹齋申采浩全集(丹齋申采浩全集編纂委員會, 乙酉文化社, 1972), 丹齋申采浩先生誕辰100週年紀念論集(丹齋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 1980), 申采浩의 歷史思想硏究(申一澈, 高麗大學校出版部, 1981), 申采浩의 民族主義思想(崔洪奎, 丹齋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 1983), 申采浩의 社會思想硏究(愼鏞廈, 한길사, 1984), 丹齋史學의 理念(洪以燮, 世界 2-4, 國際文化硏究所, 1960), 丹齋史學의 一面一半島的史觀의 批判과 高句麗舊疆論(洪以燮, 白山學報 3, 1967), 丹齋의 思想-愛國啓蒙思想을 中心으로-(金泳鎬, 나라사랑 3, 1971), 申采浩의 自强論的國史像-淸末嚴復梁啓超의 變法自强論의 西歐受容과 관련하여- (申一澈, 韓國思想 10, 1972), 丹齋申采浩의 古代史認識試考(李萬烈, 韓國史硏究 15, 1977), 申采浩의 無政府主義思想-丹齋申采浩의 歷史思想硏究의 第三部로서-(申一澈, 韓國思想 15, 1977), 丹齋小說에 나타난 郎家思想-丹齋申采浩全集(補遺) 所收 9篇을 대상으로-(李東洵, 어문논총 12, 1978), 丹齋史學에서의 民族主義問題(李基白, 문예진흥 48, 1979), 丹齋史學의 背景(李萬烈, 韓國史學 1,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0), 申采浩의 愛國啓蒙思想(愼鏞廈, 韓國學報 19 · 20, 1980), 丹齋史學의 배경과 구조(李萬烈, 創作과 批評 15-2, 1980), 丹齋申采浩의 民族主義(安秉直, 自由 106, 1981), 丹齋申采浩의 生涯와 思想(李鍾春, 淸州敎育大學論文集 19, 1983), 大韓民國獨立有功人物錄(國家報勳處, 1997).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 선언은 일제의 침략과 압제를 경험하면서 성장한 민중세력을 일제의 이족통치(異族統治)로부터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약탈적 · 불평등적인 제국주의 체제를 타파하는 주인공으로 부각시켰다는 의미에서 그의 민족주의 이념의 폭과 질의 강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1922년 1월 초 상해에서 개최된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創造派)의 맹장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개조파(改造派)와의 대립으로 5월 회의가 결렬되자, 북경으로 돌아와 석등암(石燈庵)에 우거하면서 한국고대사연구에 전념하였다. 이 무렵 북경대학 도서관에 출입하면서 이석증(李石曾) · 이대교(李大釗)와 교유하게 되었다.
1924년경부터 그가 쓴 평론과 논문들이 ≪ 동아일보 ≫ · ≪ 조선일보 ≫ 등에 발표되었다. 그의 연보에 의하면, 1925년에 민족독립운동의 방편으로 대만인 임병문(林炳文)의 소개로 무정부주의동방연맹(無政府主義東方聯盟)에 가입하였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1928년에 발표된 〈 용과 용의 대격전 〉 · 〈 꿈하늘 〉 등의 사상소설에서는 자유 · 평등 · 폭력 · 혁명을 예찬하는 무정부주의의 논리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1928년 4월 무정부주의동방연맹대회에 참석해 활동하는 등 점점 행동 투쟁에 나섰던 그는, 5월 대만에서 외국위체위조사건(外國爲替僞造事件)의 연루자로 체포되어 대련(大連)으로 이송, 1930년 5월 대련지방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여순감옥(旅順監獄)으로 이감, 복역하던 중 뇌일혈로 순국하였다.
신채호는 한말의 애국계몽운동과 일제 하 국권회복운동에 헌신하면서, 그러한 운동 못지않게 한국사연구를 통한 민족운동에 앞장섰다. 한말 ≪ 대한매일신보 ≫ 에 사론을 싣기도 하였고, ≪ 소년 ≫ 에 〈 국사사론 〉 을 연재했으며, 최영 · 이순신 · 을지문덕 등 국난을 극복한 민족영웅에 관한 전기도 썼다.
이 무렵 그는 역사의 주체를 영웅으로 보는 영웅중심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1910년 해외에 망명한 그는 본격적으로 국사연구에 노력해, 1920년대에 이르러 ≪ 조선상고사 朝鮮上古史 ≫ · ≪ 조선상고문화사 朝鮮上古文化史 ≫ · ≪ 조선사연구초 朝鮮史硏究草 ≫ 등 주저(主著)들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에 ≪ 동아일보 ≫ · ≪ 조선일보 ≫ 에 연재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저서들에 보이는 그의 역사학은, 첫째 사학의 이념이나 방법론에서 중세의 사학을 극복하고 근대적인 사학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둘째 당시 일본 관학자(官學者)들의 조선사 연구 자세에서 보이는 식민주의적 사학을 극복하는, 민족주의적 사학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셋째 조선혁명선언 이후 역사의 주체를 민중에게서 발견하려는 민중중심사관이 뚜렷이 나타나며, 넷째 역사를 ‘ 아(我) ’ 와 ‘ 비아(非我) ’ 의 투쟁의 기록으로서 파악하는 한편, 역사 연구에 있어서 실증(實證)을 강조하게 되었다.
‘ 아 ’ 와 ‘ 비아 ’ 의 투쟁으로서의 역사학의 인식은 변증법적 역사발전에 대한 인식으로 보인다. 그는 앞에서 열거한 한국고대사관계의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러한 논술들은 민족주의 이념에 입각해 독자적인 경지를 내보인 것으로, 과거의 유교주의에 입각한 관학적 역사학과 재야(在野)에서 면면히 이어온 비유교적인 사학을 종합한 데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의 사학은 한국사학사의 여러 흐름들을 종합한 것이다. 그의 한국사 기술은 거의 고대사에 국한되고 있는 바, 그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단군 · 부여 · 고구려 중심으로 상고사를 체계화했고, 둘째 상고사의 무대를 한반도 · 만주 중심의 종래의 학설에서 벗어나 중국 동북지역과 요서지방(遼西地方)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셋째 종래 한반도내에 존재했다는 한사군 ( 漢四郡 )을 반도 밖에 존재했거나 혹은 전혀 실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넷째 상고시대의 조선족과 삼국시대의 백제가 중국의 산둥반도 등에 진출했다는 것이며, 다섯째 삼한의 이동설 및 ‘ 전후 삼한설 ’ 을 주장했고, 여섯째 부여와 고구려 중심의 역사인식에 따라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것 등이라 하겠다.
이러한 그의 역사학은 우리 나라의 근대사학 및 민족주의사학의 출발로서 평가되기도 하나, 민족주의 사상의 역사 연구에의 지나친 투영이 그의 역사이론 및 한국 고대사 인식을 교조적(敎條的) · 독단적으로 이끌어갔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 참고문헌 ≫ 丹齋申采浩全集(丹齋申采浩全集編纂委員會, 乙酉文化社, 1972), 丹齋申采浩先生誕辰100週年紀念論集(丹齋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 1980), 申采浩의 歷史思想硏究(申一澈, 高麗大學校出版部, 1981), 申采浩의 民族主義思想(崔洪奎, 丹齋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 1983), 申采浩의 社會思想硏究(愼鏞廈, 한길사, 1984), 丹齋史學의 理念(洪以燮, 世界 2-4, 國際文化硏究所, 1960), 丹齋史學의 一面一半島的史觀의 批判과 高句麗舊疆論(洪以燮, 白山學報 3, 1967), 丹齋의 思想-愛國啓蒙思想을 中心으로-(金泳鎬, 나라사랑 3, 1971), 申采浩의 自强論的國史像-淸末嚴復梁啓超의 變法自强論의 西歐受容과 관련하여- (申一澈, 韓國思想 10, 1972), 丹齋申采浩의 古代史認識試考(李萬烈, 韓國史硏究 15, 1977), 申采浩의 無政府主義思想-丹齋申采浩의 歷史思想硏究의 第三部로서-(申一澈, 韓國思想 15, 1977), 丹齋小說에 나타난 郎家思想-丹齋申采浩全集(補遺) 所收 9篇을 대상으로-(李東洵, 어문논총 12, 1978), 丹齋史學에서의 民族主義問題(李基白, 문예진흥 48, 1979), 丹齋史學의 背景(李萬烈, 韓國史學 1,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0), 申采浩의 愛國啓蒙思想(愼鏞廈, 韓國學報 19 · 20, 1980), 丹齋史學의 배경과 구조(李萬烈, 創作과 批評 15-2, 1980), 丹齋申采浩의 民族主義(安秉直, 自由 106, 1981), 丹齋申采浩의 生涯와 思想(李鍾春, 淸州敎育大學論文集 19, 1983), 大韓民國獨立有功人物錄(國家報勳處, 1997).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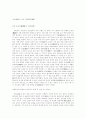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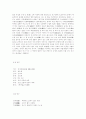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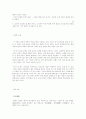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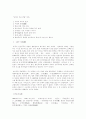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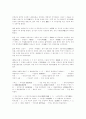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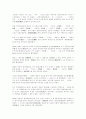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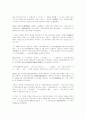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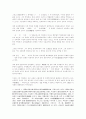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