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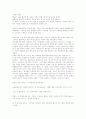 1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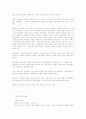 2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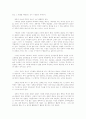 3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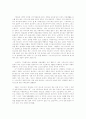 4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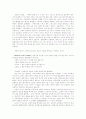 5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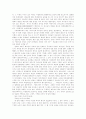 6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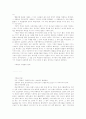 7
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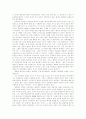 8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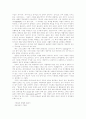 9
9
-
 10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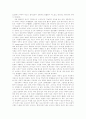 11
11
-
 12
12
-
 13
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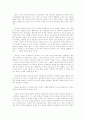 14
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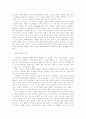 15
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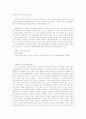 16
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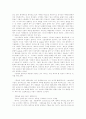 17
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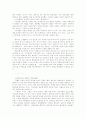 18
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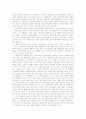 19
19
-
 20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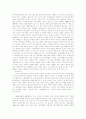 21
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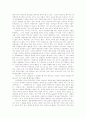 22
22
-
 23
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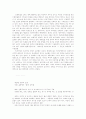 24
24
-
 25
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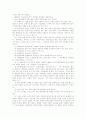 26
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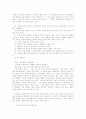 27
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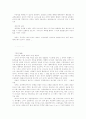 28
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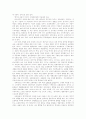 29
29
-
 30
30
-
 31
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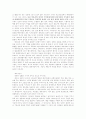 32
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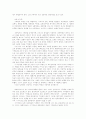 33
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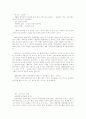 34
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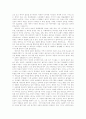 35
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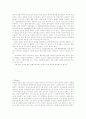 36
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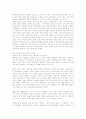 37
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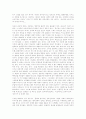 38
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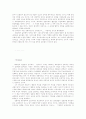 39
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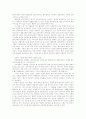 40
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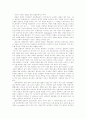 41
4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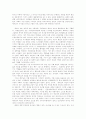 42
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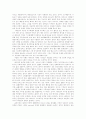 43
4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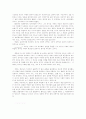 44
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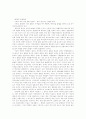 45
45
-
 46
4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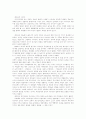 47
4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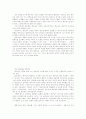 48
48
-
 49
4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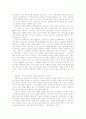 50
50
-
 51
5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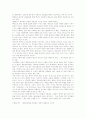 52
52
-
 53
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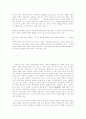 54
5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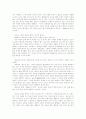 55
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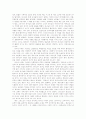 56
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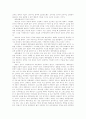 57
57
-
 58
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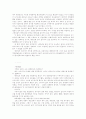 59
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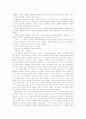 60
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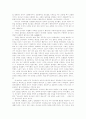 61
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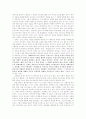 62
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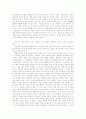 63
63
-
 64
64
-
 65
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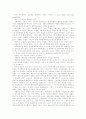 66
6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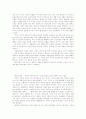 67
6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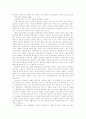 68
6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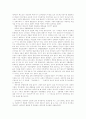 69
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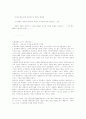 70
70
-
 71
7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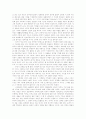 72
7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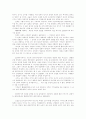 73
7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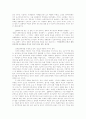 74
7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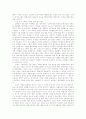 75
7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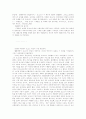 76
7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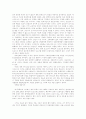 77
7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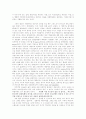 78
7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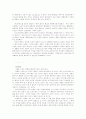 79
7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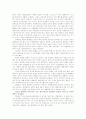 80
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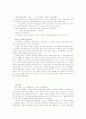 81
8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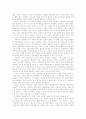 82
8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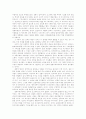 83
83
-
 84
84
-
 85
8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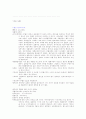 86
8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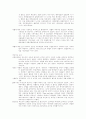 87
8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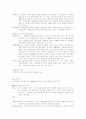 88
8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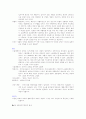 89
8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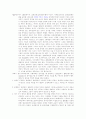 90
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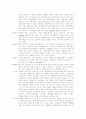 91
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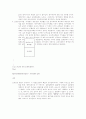 92
9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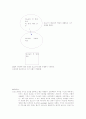 93
93
-
 94
9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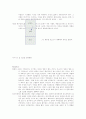 95
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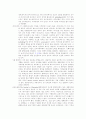 96
9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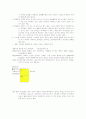 97
9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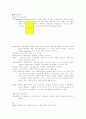 98
98
-
 99
99
-
 100
100
-
 101
101
-
 102
102
-
 103
103
-
 104
104
본 자료는 10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본문내용
고 만다. 그러면서도 왜 헤겔리안인가? 그는 역사에서 관념으로 나갔다. 관념론을 발전시킨다. 인간의 아키타입을 끌어낸다. 인간의 이상적인 형상을 모든 인간의 가능성으로 열려있다. 이러한 슈툴하우스의 사상은 특수성의 스켄들을 인식을 했지만 해결해 나가지 못했다. 역사와 신학의 문제를 종합하는 길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신자로 갔다. 그러나 중요하다. 기독론적 접근에서 역사적인 탐구의 과제를 피할 수 없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역사적 예수와 신화적 그리스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리츨은 슈툴하우스처럼 헤겔적이지 않고 칸트적으로 해석했다. 신칸트학파가 다시 유럽인들의 사고를 지배했다. 그러한 칸트의 영향력아래 리츨이 기독론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했다. 슐라이에르마허를 이해할 때에 계몽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계몽주의를 비판했다. 종교의 본질은 이성적이고 관념적이지 않고 인간의 경험감정이다라고 했다. 절대의존의 감정이다. 보다 좀더 직접적인 것이다. 의식보다는 좀 앞서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을 때 신학자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는가? 그들은 실존적인 문제에 있어서 황당해 한다. 그런 것이 아니다. 시골의 할머니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절대 의존하기 때문이다. 절대의존... 무식해야 잘 믿나? 그건 아니다. 심층의 감정. \'감정\'이라는 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 계몽주의상황에서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에게 종교를 가르쳐준다. 주지주의적인 상황에서 감정적인 것을 활용한다. 리츨은 이에 반해서 보다 역사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실천적인 범주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슈툴하우스와 비슷하게 역사적인 접근을 하지만 헤겔로 가지는 않는다. 칸트적인 이원론으로 간다.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의 이원론으로 간다. 칸트는 종교를 이런 이원론적인 틀로 이해를 했다. 종교를 (379쪽 두 번째 참고)실천의 문제이고 도덕적 자유의 문제이다. 이것은 실천이성의 영역이다. 칸트의 얘기다.
metaphysic으로 가서는 안 된다.
.
칸트는 신학자가 아니라서 리츨이 신학적으로 설명한다. 이성은 철저히 경험된 것에 의존하기에 초월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논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이성적인 증거가 아니라 실천이성의 영역에서 증명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있어야 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지옥간다.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필요하다. 도덕적인 필요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역사실증학파는 아니다. 역사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역사의 객관성 보편성 가치중립성을 물론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역사적인 예수는 순수한 역사로 생각을 했지만 리츨학파에서는 신앙은 사실판단영역으로 보지 않고 가치판단의 영역이다. 물론 이것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종교의 영역은 가치판단의 영역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사적인 예수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 신앙의 예수을 찾으려고 했다. 루터를 좋아했다. 루터의 실존적인 기독론을 좋아했다.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그분의 실존적인 은혜와 가치를 아는 것이다. 가치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영역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레데오스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라는 종교적인 가치판단의 본질은 윤리적인 문제이다. 종교적인 가치판단은 그분의 윤리적인 삶이다. 완전히 실현된 한 인간에서 나온다. 베레데오스는 베레호모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의 모범에서 종교적인 의미도 다가온다. 윤리의 범주안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이끌어 온다. 전통적인 도식과는 반대다. 종교 => 윤리에서 윤리 => 종교로 바꾸었다. 윤교수는 윤리와 종교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는다. 두 개는 하나다라고 본다.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를 지상의 삶의 연속성에서 봐야 한다. 역사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구원론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다. 구원을 가져오는 마술적인 힘이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칭의 화해도 이런 모티브로 해석했다. 전통적인 칭의는
객관
칭의
주관
칭의
켈러 : 해봐야 딴소리만 하므로 도달한 결론은 토탈픽쳐로 보자. 디테일하게 보지말고 케뤼그마로 가자. 역사적인 접근에 대한 회의를 가진다. 신학을 역사가의 손에서 구출해야 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다시 케뤼그마로 간다. 우리가 추구할 그리스도는 케뤼그마의 그리스도이다. 히스토릭컬 예수와 히스토릭 예수를 구별한다. 각주 391에 나온다. 히스토리와 게쉬이테를 구분한다. 불트만이 먼저 한 얘기가 아니다. 히스토리는 객관적 사실, 게쉬이테는 신앙사건의 역사이다. 객관적, 사실적 역사vs실존적, 주관적, 신앙적 역사를 개발하고 자신은 후자로 간다. 불트만의 실존론적인 해석으로 간다. 오늘날 틸리히도 (마틴 켈러의 제자) 그렇다. 켈러가 역사적 접근 자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케뤼그마의 그리스도로 갔다면
존바이스반대로 역사적 접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한다. 제대로 해보자! 이러구 들어갔더니, 이게 결국 슈바이처에게로 간다. 19세기 사람들은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 실제로는 자기가 가지고 간 것을 가지고 들어갔다. 헤겔리안은 헤겔을, 칸트는 칸트를 가지고 간다. 결국 실패한다. 하나님나라의 개념을 칸트주의자들은 이땅의 윤리적인 공동체로 생각한다. 바이스나 슈바이처는 AD 1세기의 강한 묵시적인 선포가 있다. 점진적인 유토피아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역사를 끝장내는 임박한 하나님나라에 대한 비젼이다. 슈바이처는 \'철저한 종말론\'을 말한다. 이것은 임박한 가까운 종말이다. 19세기 한 세기동안 이뤄진 역사적 과업들에 대한 비판을 슈바이처가 내렸다. 역사적인 예수를 보려고 우물을 보면서 자기의 얼굴을 봤다. 도그마로부터 해방으로 역사적 예수를 택했다. 역사적인 예수는 오는 듯 하더니 다시 돌아갔다. 새 세상을 개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선포하였다. 슈바이처가 말한 것은 결론적으로 새로운 세상은 오지 않았다. 십자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세우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슈바이처는 그냥 역사가로 남는다. 신학적인 접근은 하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았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리츨은 슈툴하우스처럼 헤겔적이지 않고 칸트적으로 해석했다. 신칸트학파가 다시 유럽인들의 사고를 지배했다. 그러한 칸트의 영향력아래 리츨이 기독론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했다. 슐라이에르마허를 이해할 때에 계몽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계몽주의를 비판했다. 종교의 본질은 이성적이고 관념적이지 않고 인간의 경험감정이다라고 했다. 절대의존의 감정이다. 보다 좀더 직접적인 것이다. 의식보다는 좀 앞서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을 때 신학자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는가? 그들은 실존적인 문제에 있어서 황당해 한다. 그런 것이 아니다. 시골의 할머니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절대 의존하기 때문이다. 절대의존... 무식해야 잘 믿나? 그건 아니다. 심층의 감정. \'감정\'이라는 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 계몽주의상황에서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에게 종교를 가르쳐준다. 주지주의적인 상황에서 감정적인 것을 활용한다. 리츨은 이에 반해서 보다 역사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실천적인 범주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슈툴하우스와 비슷하게 역사적인 접근을 하지만 헤겔로 가지는 않는다. 칸트적인 이원론으로 간다.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의 이원론으로 간다. 칸트는 종교를 이런 이원론적인 틀로 이해를 했다. 종교를 (379쪽 두 번째 참고)실천의 문제이고 도덕적 자유의 문제이다. 이것은 실천이성의 영역이다. 칸트의 얘기다.
metaphysic으로 가서는 안 된다.
.
칸트는 신학자가 아니라서 리츨이 신학적으로 설명한다. 이성은 철저히 경험된 것에 의존하기에 초월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논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이성적인 증거가 아니라 실천이성의 영역에서 증명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있어야 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지옥간다.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필요하다. 도덕적인 필요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역사실증학파는 아니다. 역사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역사의 객관성 보편성 가치중립성을 물론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역사적인 예수는 순수한 역사로 생각을 했지만 리츨학파에서는 신앙은 사실판단영역으로 보지 않고 가치판단의 영역이다. 물론 이것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종교의 영역은 가치판단의 영역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사적인 예수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 신앙의 예수을 찾으려고 했다. 루터를 좋아했다. 루터의 실존적인 기독론을 좋아했다.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그분의 실존적인 은혜와 가치를 아는 것이다. 가치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영역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레데오스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라는 종교적인 가치판단의 본질은 윤리적인 문제이다. 종교적인 가치판단은 그분의 윤리적인 삶이다. 완전히 실현된 한 인간에서 나온다. 베레데오스는 베레호모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의 모범에서 종교적인 의미도 다가온다. 윤리의 범주안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이끌어 온다. 전통적인 도식과는 반대다. 종교 => 윤리에서 윤리 => 종교로 바꾸었다. 윤교수는 윤리와 종교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는다. 두 개는 하나다라고 본다.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를 지상의 삶의 연속성에서 봐야 한다. 역사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구원론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다. 구원을 가져오는 마술적인 힘이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칭의 화해도 이런 모티브로 해석했다. 전통적인 칭의는
객관
칭의
주관
칭의
켈러 : 해봐야 딴소리만 하므로 도달한 결론은 토탈픽쳐로 보자. 디테일하게 보지말고 케뤼그마로 가자. 역사적인 접근에 대한 회의를 가진다. 신학을 역사가의 손에서 구출해야 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다시 케뤼그마로 간다. 우리가 추구할 그리스도는 케뤼그마의 그리스도이다. 히스토릭컬 예수와 히스토릭 예수를 구별한다. 각주 391에 나온다. 히스토리와 게쉬이테를 구분한다. 불트만이 먼저 한 얘기가 아니다. 히스토리는 객관적 사실, 게쉬이테는 신앙사건의 역사이다. 객관적, 사실적 역사vs실존적, 주관적, 신앙적 역사를 개발하고 자신은 후자로 간다. 불트만의 실존론적인 해석으로 간다. 오늘날 틸리히도 (마틴 켈러의 제자) 그렇다. 켈러가 역사적 접근 자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케뤼그마의 그리스도로 갔다면
존바이스반대로 역사적 접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한다. 제대로 해보자! 이러구 들어갔더니, 이게 결국 슈바이처에게로 간다. 19세기 사람들은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 실제로는 자기가 가지고 간 것을 가지고 들어갔다. 헤겔리안은 헤겔을, 칸트는 칸트를 가지고 간다. 결국 실패한다. 하나님나라의 개념을 칸트주의자들은 이땅의 윤리적인 공동체로 생각한다. 바이스나 슈바이처는 AD 1세기의 강한 묵시적인 선포가 있다. 점진적인 유토피아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역사를 끝장내는 임박한 하나님나라에 대한 비젼이다. 슈바이처는 \'철저한 종말론\'을 말한다. 이것은 임박한 가까운 종말이다. 19세기 한 세기동안 이뤄진 역사적 과업들에 대한 비판을 슈바이처가 내렸다. 역사적인 예수를 보려고 우물을 보면서 자기의 얼굴을 봤다. 도그마로부터 해방으로 역사적 예수를 택했다. 역사적인 예수는 오는 듯 하더니 다시 돌아갔다. 새 세상을 개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선포하였다. 슈바이처가 말한 것은 결론적으로 새로운 세상은 오지 않았다. 십자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세우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슈바이처는 그냥 역사가로 남는다. 신학적인 접근은 하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았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키워드
추천자료
 본회펴의 교회론에 관한연구
본회펴의 교회론에 관한연구 마태복음 성서 고찰
마태복음 성서 고찰 칼 바르트 화해론
칼 바르트 화해론 성령에 대한 이해
성령에 대한 이해 퀸네트의 글에 대한 서론적 토론
퀸네트의 글에 대한 서론적 토론 총신신대원서철원교수의교리사요약
총신신대원서철원교수의교리사요약 중세교회사 심창섭의 중세교회사 중세사
중세교회사 심창섭의 중세교회사 중세사 교회사 안에 나타난 이단과 정통(헤럴드 브라운)
교회사 안에 나타난 이단과 정통(헤럴드 브라운) 네스토리우스와 시릴의 갈등
네스토리우스와 시릴의 갈등 바울복음의_기원
바울복음의_기원 기독교 역사적 발전과정과 정통성의 표준(사이비 이단에 대한 판단기준) _ 중세시대와 16세기...
기독교 역사적 발전과정과 정통성의 표준(사이비 이단에 대한 판단기준) _ 중세시대와 16세기... 기독교 역사적 발전과정과 정통성의 표준(사이비 이단 판단 기준) _ 신약성경 시대, 교부시대...
기독교 역사적 발전과정과 정통성의 표준(사이비 이단 판단 기준) _ 신약성경 시대, 교부시대... 기독교 역사적 발전과정과 정통성의 표준(사이비 이단에 대한 판단기준) _ 교부시대 및 고대 ...
기독교 역사적 발전과정과 정통성의 표준(사이비 이단에 대한 판단기준) _ 교부시대 및 고대 ...


















소개글